목차
I. 머리말
II. 전시과 제도의 정비과정
III.토지의 여러 유형과 경영형태
IV.맺음말
<보론>토지지배관계에 관련된 토지국유제설과 그 비판
II. 전시과 제도의 정비과정
III.토지의 여러 유형과 경영형태
IV.맺음말
<보론>토지지배관계에 관련된 토지국유제설과 그 비판
본문내용
그는 한국의 토지제도는 공전제=토지국유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1910년대 총독부가 단행한 토지조사사업의 실무책임자 중 하나였다. 그는 <조선 토지,지세제도조사보고서>에서 삼국성립이전과 삼국시대의 한국사회는 원시적인 부족공산제였으며, 그 후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부족적공산제가 공전제도로 발전하였는데, 이 제도에서는 모든 토지는 공유, 국유였으며,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는 큰 틀의 변화 없이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전제 하에서도 私田이라는 토지가 존재했지만, 이는 공전의 범주 내에서 수조권이 위임된 토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아가 고려말 사전이 확대되고 공전제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과전법의 실시로 다시 공전제화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의 이 같은 이른바 “토지의 사유불인정”은 결과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을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1)그의 주장은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으로 엄밀한 학문적 검증이 없이 주장되었으며, 2)고려 때는 신라장적에 보이는 연수유전답과 계통을 같이하는 광대한 토지가 존재하였는데, 이것이 일반백성의 소유지인 민전이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 민전의 주된 경작자는 白丁농민이었으며, 이들은 국가에 일정 조세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로 생계를 꾸려간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민전은 매매, 증여, 상속도 가능하여 모든 토지가 국유라는 토지국유제론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3)유물 사관의 주장
유물사관에서는 “아시아사회에서 사적 토지 소유는 결여되어있고, 조세와 지대는 일치하며, 따라서 국가는 최고의 지주”라는 입장에서, 삼국시대 이래 토지제도는 국유제로서 고려왕조에서도 “集權的 公田制”가 시행되었으며, 전시과체제도 그 같은 집권적 토지국유의 기반위에서 존립한다고 보았다. 사전이 있긴 했지만 수조권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소유권은 오로지 국가가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유물사관입장에서 토지국유론을 주장한 대표자는 백남운인데 이러한 토지국유론에 대해서는 1)“아시아 사회에서의 사적 토지 결여, 국가가 최고의 지주”라는 명제에만 치우쳐 사실 검증에 소홀했으며, 2)민전이나 군인전, 장,처전은 租 만 납부하면 국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최고의 지주라는 명제는 타당성을 잃게 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국가는 단지 적은 면적의 공유지만 지주 행세를 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토지는 지주 행세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진철,『개정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옥근,『고려재정사연구』 일조각 1996
______,『한국 경제사의 이해』 신지서원 2003
박용운,『고려 사회의 여러 역사상』 신서원 2002
______,『고려시대사』 일지사 2002
최정환,『고려,조선시대 녹봉제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한국중세사학회, 『고려시대사강의』늘함께 1997
홍승기,『고려사회경제사연구』일조각 2001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1)그의 주장은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으로 엄밀한 학문적 검증이 없이 주장되었으며, 2)고려 때는 신라장적에 보이는 연수유전답과 계통을 같이하는 광대한 토지가 존재하였는데, 이것이 일반백성의 소유지인 민전이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 민전의 주된 경작자는 白丁농민이었으며, 이들은 국가에 일정 조세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로 생계를 꾸려간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민전은 매매, 증여, 상속도 가능하여 모든 토지가 국유라는 토지국유제론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3)유물 사관의 주장
유물사관에서는 “아시아사회에서 사적 토지 소유는 결여되어있고, 조세와 지대는 일치하며, 따라서 국가는 최고의 지주”라는 입장에서, 삼국시대 이래 토지제도는 국유제로서 고려왕조에서도 “集權的 公田制”가 시행되었으며, 전시과체제도 그 같은 집권적 토지국유의 기반위에서 존립한다고 보았다. 사전이 있긴 했지만 수조권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소유권은 오로지 국가가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유물사관입장에서 토지국유론을 주장한 대표자는 백남운인데 이러한 토지국유론에 대해서는 1)“아시아 사회에서의 사적 토지 결여, 국가가 최고의 지주”라는 명제에만 치우쳐 사실 검증에 소홀했으며, 2)민전이나 군인전, 장,처전은 租 만 납부하면 국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최고의 지주라는 명제는 타당성을 잃게 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국가는 단지 적은 면적의 공유지만 지주 행세를 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토지는 지주 행세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진철,『개정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옥근,『고려재정사연구』 일조각 1996
______,『한국 경제사의 이해』 신지서원 2003
박용운,『고려 사회의 여러 역사상』 신서원 2002
______,『고려시대사』 일지사 2002
최정환,『고려,조선시대 녹봉제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한국중세사학회, 『고려시대사강의』늘함께 1997
홍승기,『고려사회경제사연구』일조각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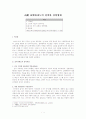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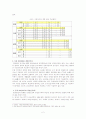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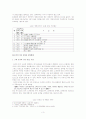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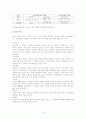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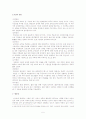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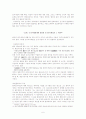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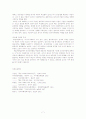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