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동북공정의 의미및 배경
2. 동북공정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통일 코리아의 조선족 싹 자르기… '간도 점유 부당하다'는 역공 긴요"
4. 간도는 ‘영토 분쟁 지역’
5. 중국, 조선족에 ‘3관교육’ 강요
6. 역사전쟁이 영토분쟁으로 번질 우려 커
7. 1962년 체결된 북한과 중국의 ‘조중변계조약’
8. '역사 지우기'는 新조공체제 부활, 패배주의 떨치며 대응 카드 내밀어야
9. 국가통일·민족단결·변경안정이 목표
10. 현실성이 결여된 고구려재단 설립
11. 신조공체제 우려마저 일어
12. 東北工程으로 협력 동반자 관계 상처
13. 중국에 그저 순응할 수만은 없는 노릇
2. 동북공정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통일 코리아의 조선족 싹 자르기… '간도 점유 부당하다'는 역공 긴요"
4. 간도는 ‘영토 분쟁 지역’
5. 중국, 조선족에 ‘3관교육’ 강요
6. 역사전쟁이 영토분쟁으로 번질 우려 커
7. 1962년 체결된 북한과 중국의 ‘조중변계조약’
8. '역사 지우기'는 新조공체제 부활, 패배주의 떨치며 대응 카드 내밀어야
9. 국가통일·민족단결·변경안정이 목표
10. 현실성이 결여된 고구려재단 설립
11. 신조공체제 우려마저 일어
12. 東北工程으로 협력 동반자 관계 상처
13. 중국에 그저 순응할 수만은 없는 노릇
본문내용
저관세 수입 제한 물량을 늘리는 양보를 하고 긴급 관세 조치는 결국 명목뿐인 빈껍데기가 되어버렸다.
궁극적인 질문은 만일 중국이 경제적 보복으로 응수할 경우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다. 한국의 제2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무려 15.2%에 이른다. 2003년 한국 해외투자 총액의 40% 정도가 중국에 집중되었다. 또 한국 무역흑자 총액의 88%가 중국교역에서 온 것이다. 상당한 국민적 합의와 인내 없이는 적극적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경제적 가치로 쉽게 환산할 수 없는 ‘국격’의 하락과 향후 중국과의 장기적 관계 설정 문제를 고려하면 그 계산은 또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우리 정부 - 더 넓게는 정치권 - 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일수록 준비되지 않은 언급을 삼가고 전반적으로 말수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중국이 항상 덕목으로 내세우는 “말은 적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多做少說)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치밀한 - 예의 대충주의를 과감히 벗어난 - 준비와 계산 속에서 대응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론 또한 근시안적 비판주의를 벗고 가능한 한 응집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핵이나 ‘탈북자’ 문제와 연계할 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지렛대를 지금부터라도 폭넓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12. 東北工程으로 협력 동반자 관계 상처
올해로 수교 12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이미 그 짧았던 ‘밀월기’가 끝나고 성숙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그동안 유지되었던 아주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로부터 천천히 ‘정상적인 파트너십’(normal partnership)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양국 간에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全面合作性同伴關係) 계획이 이번 동북공정으로 적잖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년이 넘게 한·중 관계를 지켜본 필자로서는 이토록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중국의 모습이 아쉽고도 안타깝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에 많은 기대를 가졌던 한국 국민과 여론 주도층들도 ‘지금의 중국이 이 정도라면 10년, 20년 후에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의 활발한 대중국 투자와 이로 인한 한국경제의 공동화(空洞化) 걱정 때문에 생겨난 소위 ‘공중증’(恐中症)이라는 말이 불행히 이제는 정치·외교적 측면까지 포함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 아시아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선린외교(穆隣外交)를 주창해 왔고 몇 년 전부터는 ‘책임지는 대국외교’(負責任的大國外交)와 함께 ‘평화로운 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왔다. 최근 들어 ‘평화로운 부상’(和平堀起)의 원칙이 중국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부국강병’이 제시된다는 말도 들려온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검광을 쉽게 보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오면 해야 할 일들을 완수하자”(韜光養晦 有所作爲)면서 제시했던 중국외교의 원칙 중에서 이제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만약 동북공정도 그 일환이라면 중국의 ‘부상’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대중국 전략과 21세기 대외관계의 좌표는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北京)대 교수인 첸펑쥔(陳峰君)은 베이징대 출판부에서 출간한 자신의 2002년 저서 <아태대국여조선반도>(亞太大國與朝鮮半島)에서 ‘역사에 나타난 중국의 속국들은 모두 독립국가였으며 자주적으로 내정과 외교를 처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藩屬國都是獨立國家 具有獨立自主地處理本國內政外交的權利: 279쪽)고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상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역사 해석으로 중국은 빨리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동북공정이 제기하는 소위 ‘변방내지화’(邊疆內地化) 개념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모든 주변국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제고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중국이 주장하는 ‘선린외교’나 ‘평화적 부상’과는 상치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동북공정은 중국이 과연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이며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에 중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즉, 중국에 대해 그저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부분 우리의 아젠다에 따라 ‘적응’해낼 수 있는 대상인지, 그것도 아니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 각각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준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점이다.
13. 중국에 그저 순응할 수만은 없는 노릇
한·중 관계에 대해 소위 ‘잘못 끼운 첫 단추’라는 말들을 종종 하고는 한다. 즉, 1992년 당시 재임 기간중 중국과 수교를 서둘렀던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것을 요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놓쳤으며 이로 인해 한·중 관계가 시작부터 많이 일그러졌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초반 ‘기(氣)싸움’의 열세를 만회하기도 전에 ‘마늘분쟁’과 북핵 문제로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느껴왔다. 이번의 동북공정은 마치 이러한 추세에 쐐기를 박는 듯하다.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를 지켜보는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를 중국이 오랫동안 면밀히 지켜보았듯 한·중 관계 역시 미국·일본·러시아 등이 큰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역사적 정체성과 주권에 대한 도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어쩌면 ‘자주국방’과 ‘동북아시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경 없는 협력’과 ‘세계화’를 아무리 외쳐도 냉엄한 국제정치의 도전은 주권과 ‘국격’을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이 단순히 중국이나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질문은 만일 중국이 경제적 보복으로 응수할 경우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다. 한국의 제2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무려 15.2%에 이른다. 2003년 한국 해외투자 총액의 40% 정도가 중국에 집중되었다. 또 한국 무역흑자 총액의 88%가 중국교역에서 온 것이다. 상당한 국민적 합의와 인내 없이는 적극적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경제적 가치로 쉽게 환산할 수 없는 ‘국격’의 하락과 향후 중국과의 장기적 관계 설정 문제를 고려하면 그 계산은 또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우리 정부 - 더 넓게는 정치권 - 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일수록 준비되지 않은 언급을 삼가고 전반적으로 말수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중국이 항상 덕목으로 내세우는 “말은 적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多做少說)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치밀한 - 예의 대충주의를 과감히 벗어난 - 준비와 계산 속에서 대응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론 또한 근시안적 비판주의를 벗고 가능한 한 응집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핵이나 ‘탈북자’ 문제와 연계할 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지렛대를 지금부터라도 폭넓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12. 東北工程으로 협력 동반자 관계 상처
올해로 수교 12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이미 그 짧았던 ‘밀월기’가 끝나고 성숙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그동안 유지되었던 아주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로부터 천천히 ‘정상적인 파트너십’(normal partnership)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양국 간에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全面合作性同伴關係) 계획이 이번 동북공정으로 적잖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년이 넘게 한·중 관계를 지켜본 필자로서는 이토록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중국의 모습이 아쉽고도 안타깝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에 많은 기대를 가졌던 한국 국민과 여론 주도층들도 ‘지금의 중국이 이 정도라면 10년, 20년 후에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의 활발한 대중국 투자와 이로 인한 한국경제의 공동화(空洞化) 걱정 때문에 생겨난 소위 ‘공중증’(恐中症)이라는 말이 불행히 이제는 정치·외교적 측면까지 포함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 아시아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선린외교(穆隣外交)를 주창해 왔고 몇 년 전부터는 ‘책임지는 대국외교’(負責任的大國外交)와 함께 ‘평화로운 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왔다. 최근 들어 ‘평화로운 부상’(和平堀起)의 원칙이 중국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부국강병’이 제시된다는 말도 들려온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검광을 쉽게 보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오면 해야 할 일들을 완수하자”(韜光養晦 有所作爲)면서 제시했던 중국외교의 원칙 중에서 이제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만약 동북공정도 그 일환이라면 중국의 ‘부상’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대중국 전략과 21세기 대외관계의 좌표는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北京)대 교수인 첸펑쥔(陳峰君)은 베이징대 출판부에서 출간한 자신의 2002년 저서 <아태대국여조선반도>(亞太大國與朝鮮半島)에서 ‘역사에 나타난 중국의 속국들은 모두 독립국가였으며 자주적으로 내정과 외교를 처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藩屬國都是獨立國家 具有獨立自主地處理本國內政外交的權利: 279쪽)고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상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역사 해석으로 중국은 빨리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동북공정이 제기하는 소위 ‘변방내지화’(邊疆內地化) 개념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모든 주변국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제고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중국이 주장하는 ‘선린외교’나 ‘평화적 부상’과는 상치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동북공정은 중국이 과연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이며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에 중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즉, 중국에 대해 그저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부분 우리의 아젠다에 따라 ‘적응’해낼 수 있는 대상인지, 그것도 아니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 각각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준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점이다.
13. 중국에 그저 순응할 수만은 없는 노릇
한·중 관계에 대해 소위 ‘잘못 끼운 첫 단추’라는 말들을 종종 하고는 한다. 즉, 1992년 당시 재임 기간중 중국과 수교를 서둘렀던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것을 요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놓쳤으며 이로 인해 한·중 관계가 시작부터 많이 일그러졌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초반 ‘기(氣)싸움’의 열세를 만회하기도 전에 ‘마늘분쟁’과 북핵 문제로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느껴왔다. 이번의 동북공정은 마치 이러한 추세에 쐐기를 박는 듯하다.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를 지켜보는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를 중국이 오랫동안 면밀히 지켜보았듯 한·중 관계 역시 미국·일본·러시아 등이 큰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역사적 정체성과 주권에 대한 도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어쩌면 ‘자주국방’과 ‘동북아시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경 없는 협력’과 ‘세계화’를 아무리 외쳐도 냉엄한 국제정치의 도전은 주권과 ‘국격’을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이 단순히 중국이나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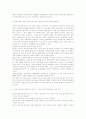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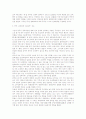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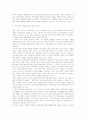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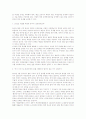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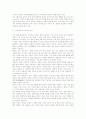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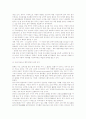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