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로 통합했으며, 무사계급도 士族과 卒族으로 나누었다. 중앙관제도 신지(神祗), 태정(太政)의 두 관직을 두고, 太政官에는 太政大臣, 左大臣, 右大臣, 대납언(大納言), 參議(참의) 등을 두었다. 그 밑에 民部(민부), 大藏(대장) 등 ‘省’의 장관을 두었다. 이 단계에서는 각료직에 해당하는 참의직이 중요한 관직 이었다.
한편 유신정부는 막부가 외국에 팔아넘긴 민족적 권리를 되찾으려 했다. 비록 거절 당하기는 하였으나 1867년 12월 열강에 대하여 조약 개정을 요구 하였으며, 1869년과 1870년에는 막부가 미국인에게 주었던 철도 부설권을 빼앗았다. 에노모또 다께아끼가 홋가이도를 탈출해 프러시아인에게 99년간의 기한부로 할양해 주었던 하꼬다떼 근교의 땅도 막대한 보상금을 주고 되찾았다.
유신정부의 중앙집권화를 가능하게 한 경제적 기초는 농민의 무거운 소작료와 대상인으로부터의 부채였다. 미쓰이, 고노이께 등은 유신정부에 대한 최대의 채권자 였다. 이들로 부터 진 빚은 1868년에만도 384만냥에 달하는데 이는 그해 세입 366만냥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부족 한 것은 불환지폐인 ‘태정관찰(太政官札)’ 4,800만냥 으로써 메웠다. 이 적자재정은 결국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들 대상인은 정부와 결탁, ‘정상(政商)’으로 성장해 일본경제를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집권화를 추진한 것이 이른바 ‘유신관료’였다. 그들은 사쓰마, 죠슈, 히젠 번 등의 출신으로, 이 시기의 역사 변동에서 주체적으로 활약하였다. 이들은 출신 번과의 관계를 전혀 끊을 수는 없었으나,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는 갈등도 있었으나, 정부 강화를 위하여는 타협과 협력도 아끼지 않았다. 오꾸보 도시미찌기도 다까요시히로사와 사네오미(이상 長州), 사사끼 다까유끼사이또 도시유끼(이상 土佐), 소에지마 다네오미오꾸마 시게노부(이상 佐賀縣) 등 실력자들이 균형있게 ‘참의’에 취임하였다.
2) 개혁에 대한 민중의 불만
명치정부의 일련의 개혁에도 민중의 생활상태는 거의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은 토지개혁과 소작료 경감을 요구하면서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중에서도 1869년 8월에 일어난 신슈(信州, 지금의 長野縣)의 폭동은 가장 큰 규모였다. 이러한 농민 폭동과 더불어 무사계급의 정리를 반대하는 하급사족들의 폭동도 일어 났다. 1869년 말 기병대(奇兵隊)를 해산할 때에 일어난 반란은 농민들이 지지하는 바람에 대규모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농민반란은 1870년에 접어들어서 더욱더 확대되었다. 정부가 내란 시기에 거두지 못한 토지조세까지도 소급해 거두는 ‘검견(檢見)규칙’ 檢見은 毛見이라고도 표기하는데, 벼의 털을 본다는 뜻에서, 벼 수확 전에 정부 또는 영주로부터 관리가 파견되어 풍작흉작 여부를 검사하고 소작료(年貢)를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는 중세적인 착취방법을 선포했기 때문이었다. 이해 7월 니가따의 도찌오현의 농민폭동과 역시 같은 해 11월 신슈쇼다이 번의 농민 7만여명의 봉기는 극렬했다. 특히 신슈쇼다이 번의 폭동은 빈농이 주동이 되고, 여기에나가노의 상민들이 호응한 투쟁으로서, 재산의 균등소유, 불환지폐의 회수 등을 요구하고 고리대금업자들을 습격했다. 1870년 가을에서 1871년 초에 걸쳐서 북규슈(北九州) 일대에서 수만 명의 농민이 봉기하자 士族들도 이에 호응하여 대규모의 반란으로 발전하였다.
3) 廢藩置縣의 강행
민중의 투쟁이 藩의 단위를 넘어서 뭉치기 시작하자 유신정부는 분산된 번의 힘으로써는 탄압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1871년부터 준비에 착수한 유신정부는 고향에 은퇴해 있던 사이고 다까모리를 참의에 앉히고 사쓰마, 죠슈, 도사 세 번에서 8천여명의 군대를 도쿄에 모아 유신정부의 직속군대로 만들어 놓고, 7월 14일 쿠데타의 방식으로 폐번치현(廢藩置縣)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전국은 72개의 縣(그 후, 47개로 준다), 3개의 府(東京京都大阪)로 정리되고 부지사(府知事)와 현령(縣令)이 중앙에서 임명되었다. 이리하여 비로소 통일국가가 완성된 셈이다.
이어 8월에는 중앙관제도 재정비하였다. 太政大臣과 右大臣, 각료급인 참의가 실권을 장악하도록 했고 다른 직제는 폐지했다. 태정대신에 산죠 사네또미, 우대신에 이와꾸라 도모미, 참의에는 사이고 다까모리, 기도 다까요시, 이따가끼 다이스께, 오꾸마 시게노부의 네 사람이 임명되었다. 이리하여 대명공경 출신의 각료급 인물들은 다 물러가고 하급무사 출신이 정부의 요직을 독점하다 시피 하였다. 폐번치현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폐번치현의 결과 지방분권적인 여러 번들이 없어지고 비로소 전국의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번 사이의 관세장벽의 철폐, 전국적 상업활동의 자유 등이 시민계급이 원하던 것들이 실현된 셈이다. 한편 봉건제후에 의한 토지소유제의 폐기로 지주들은 명실상부한 토지소유자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이 명치유신이 발생하기 전의 국내외적 상황과 당시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諸 問題를 살펴 보면서, 명치유신이 가지는 일본 근대사의 의의를 살펴 보았다.
명치유신의 전개 후에 나타난 여러가지 변화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근대적인 중앙집권체제를 다지기 위한 정책으로, 천왕의 절대적 숭배를 강조하는 神道의 국교화와 신정부의 개명적 정책인 시민 징병제, 교육령 제정을 통한 學制를 마련하였으며, 내각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제국헌법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꾸게 된다.
둘째는, 서양의 근대화부국강병화를 모방한 脫亞入毆적인 정책과, 조선과 만주를 신 정권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征韓論 및 동북아에서의 해상권 및 해양무역권 획득을 위한 琉球國을 점령하여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는 등의 일련의 대외 확장 정책을 통한 군국주의적인 체제로의 이행이 시작된다.
이 모든 일들의 연원은 일본 역사에서 가장 큰 변혁이라는 명치유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현재의 일본 있게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유신정부는 막부가 외국에 팔아넘긴 민족적 권리를 되찾으려 했다. 비록 거절 당하기는 하였으나 1867년 12월 열강에 대하여 조약 개정을 요구 하였으며, 1869년과 1870년에는 막부가 미국인에게 주었던 철도 부설권을 빼앗았다. 에노모또 다께아끼가 홋가이도를 탈출해 프러시아인에게 99년간의 기한부로 할양해 주었던 하꼬다떼 근교의 땅도 막대한 보상금을 주고 되찾았다.
유신정부의 중앙집권화를 가능하게 한 경제적 기초는 농민의 무거운 소작료와 대상인으로부터의 부채였다. 미쓰이, 고노이께 등은 유신정부에 대한 최대의 채권자 였다. 이들로 부터 진 빚은 1868년에만도 384만냥에 달하는데 이는 그해 세입 366만냥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부족 한 것은 불환지폐인 ‘태정관찰(太政官札)’ 4,800만냥 으로써 메웠다. 이 적자재정은 결국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들 대상인은 정부와 결탁, ‘정상(政商)’으로 성장해 일본경제를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집권화를 추진한 것이 이른바 ‘유신관료’였다. 그들은 사쓰마, 죠슈, 히젠 번 등의 출신으로, 이 시기의 역사 변동에서 주체적으로 활약하였다. 이들은 출신 번과의 관계를 전혀 끊을 수는 없었으나,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는 갈등도 있었으나, 정부 강화를 위하여는 타협과 협력도 아끼지 않았다. 오꾸보 도시미찌기도 다까요시히로사와 사네오미(이상 長州), 사사끼 다까유끼사이또 도시유끼(이상 土佐), 소에지마 다네오미오꾸마 시게노부(이상 佐賀縣) 등 실력자들이 균형있게 ‘참의’에 취임하였다.
2) 개혁에 대한 민중의 불만
명치정부의 일련의 개혁에도 민중의 생활상태는 거의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은 토지개혁과 소작료 경감을 요구하면서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중에서도 1869년 8월에 일어난 신슈(信州, 지금의 長野縣)의 폭동은 가장 큰 규모였다. 이러한 농민 폭동과 더불어 무사계급의 정리를 반대하는 하급사족들의 폭동도 일어 났다. 1869년 말 기병대(奇兵隊)를 해산할 때에 일어난 반란은 농민들이 지지하는 바람에 대규모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농민반란은 1870년에 접어들어서 더욱더 확대되었다. 정부가 내란 시기에 거두지 못한 토지조세까지도 소급해 거두는 ‘검견(檢見)규칙’ 檢見은 毛見이라고도 표기하는데, 벼의 털을 본다는 뜻에서, 벼 수확 전에 정부 또는 영주로부터 관리가 파견되어 풍작흉작 여부를 검사하고 소작료(年貢)를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는 중세적인 착취방법을 선포했기 때문이었다. 이해 7월 니가따의 도찌오현의 농민폭동과 역시 같은 해 11월 신슈쇼다이 번의 농민 7만여명의 봉기는 극렬했다. 특히 신슈쇼다이 번의 폭동은 빈농이 주동이 되고, 여기에나가노의 상민들이 호응한 투쟁으로서, 재산의 균등소유, 불환지폐의 회수 등을 요구하고 고리대금업자들을 습격했다. 1870년 가을에서 1871년 초에 걸쳐서 북규슈(北九州) 일대에서 수만 명의 농민이 봉기하자 士族들도 이에 호응하여 대규모의 반란으로 발전하였다.
3) 廢藩置縣의 강행
민중의 투쟁이 藩의 단위를 넘어서 뭉치기 시작하자 유신정부는 분산된 번의 힘으로써는 탄압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1871년부터 준비에 착수한 유신정부는 고향에 은퇴해 있던 사이고 다까모리를 참의에 앉히고 사쓰마, 죠슈, 도사 세 번에서 8천여명의 군대를 도쿄에 모아 유신정부의 직속군대로 만들어 놓고, 7월 14일 쿠데타의 방식으로 폐번치현(廢藩置縣)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전국은 72개의 縣(그 후, 47개로 준다), 3개의 府(東京京都大阪)로 정리되고 부지사(府知事)와 현령(縣令)이 중앙에서 임명되었다. 이리하여 비로소 통일국가가 완성된 셈이다.
이어 8월에는 중앙관제도 재정비하였다. 太政大臣과 右大臣, 각료급인 참의가 실권을 장악하도록 했고 다른 직제는 폐지했다. 태정대신에 산죠 사네또미, 우대신에 이와꾸라 도모미, 참의에는 사이고 다까모리, 기도 다까요시, 이따가끼 다이스께, 오꾸마 시게노부의 네 사람이 임명되었다. 이리하여 대명공경 출신의 각료급 인물들은 다 물러가고 하급무사 출신이 정부의 요직을 독점하다 시피 하였다. 폐번치현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폐번치현의 결과 지방분권적인 여러 번들이 없어지고 비로소 전국의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번 사이의 관세장벽의 철폐, 전국적 상업활동의 자유 등이 시민계급이 원하던 것들이 실현된 셈이다. 한편 봉건제후에 의한 토지소유제의 폐기로 지주들은 명실상부한 토지소유자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이 명치유신이 발생하기 전의 국내외적 상황과 당시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諸 問題를 살펴 보면서, 명치유신이 가지는 일본 근대사의 의의를 살펴 보았다.
명치유신의 전개 후에 나타난 여러가지 변화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근대적인 중앙집권체제를 다지기 위한 정책으로, 천왕의 절대적 숭배를 강조하는 神道의 국교화와 신정부의 개명적 정책인 시민 징병제, 교육령 제정을 통한 學制를 마련하였으며, 내각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제국헌법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꾸게 된다.
둘째는, 서양의 근대화부국강병화를 모방한 脫亞入毆적인 정책과, 조선과 만주를 신 정권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征韓論 및 동북아에서의 해상권 및 해양무역권 획득을 위한 琉球國을 점령하여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는 등의 일련의 대외 확장 정책을 통한 군국주의적인 체제로의 이행이 시작된다.
이 모든 일들의 연원은 일본 역사에서 가장 큰 변혁이라는 명치유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현재의 일본 있게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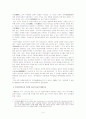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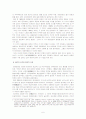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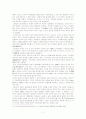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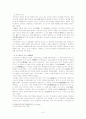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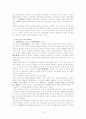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