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 겪고 느낀 모든 것을 ‘거짓말’이나 ‘허구’로 치부할 사람들에게는 그의 소설이 아무 것도 아닐 것이고, 아무 것도 아니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들은 성석제의 소설이 너무 가볍다고, 재미는 있지만 읽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진정으로 무거워져야지 또한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먼저 무거워지라는 주문은 사실상 가벼워지지 말라는 주문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앤디 워홀은 코카콜라 깡통과 마릴린 먼로의 사진 같은 가장 대중적인 오브제들로 미국이란 사회에 걸맞은 예술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가 ‘먼저 무거워져서’ 그렇게 가볍게 ‘떠오른’ 것 같지는 않다.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대로 이루고 싶은 것을 하면 되겠고 무거운 사람은 무거운 대로 자기 갈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
아이가 아이를 본다. 아이가 아이에게 홀린다. 아이들이 웃기 시작한다. 홀리게 한 아이가 먼저 웃고 홀린 아이가 나중에 웃는다. 저 녀석이 왜 웃는 거지? 똑같이 생각하며 웃는다.
웃는다.
(성석제, 「홀림」,『홀림』,문학과 지성사, 1999)
「홀림」은 글 전체에서 단 한번 문단 구분이 된다. 그것도 글의 맨 마지막에서 맨 마지막 한 문장만의 세 글자 ‘웃는다’만을 이전의 한 문단과 분리시킨 새로운 문단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마치 첫 문단 전체를 또는 이 단편 소설 전체를 단숨에 써내려 간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단락 구분 없이 이어지는 「홀림」의 회오리 같은 문장들은 그 자체 홀린다는 것을 구체화하여 ‘홀림’의 불가항력을 입증한다. 소설의 마지막 ‘아이가 아이를 본다. 아이가 아이에게 홀린다’ 부분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홀린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디부터가 회상이고, 어디부터가 현실인지 모호한 구조 속에서 성석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홀린 듯이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글은 빠르다. 담백하다. 군더더기가 없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현실을 비껴지나가지만 그 사실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쭉쭉 내달리게 된다. 별 의미 없이 툭툭 던져진 언어들처럼 보이지만, 읽는 이의 가슴을 숭덩숭덩 주물러대는 그의 솜씨 속에 현상에 대한 깊고 정교한 인지가 빠져 있을 리 없다. 다만 불편하고 민감한 부분들을 낙천으로 한 차례 버무려 밖으로 쏟아낸 것일 뿐이다. 바로 이런 낙천의 힘이 바로 그가 활자 위에서 여유롭게 노닐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본다.
어떤 사람들은 성석제의 소설이 너무 가볍다고, 재미는 있지만 읽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진정으로 무거워져야지 또한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먼저 무거워지라는 주문은 사실상 가벼워지지 말라는 주문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앤디 워홀은 코카콜라 깡통과 마릴린 먼로의 사진 같은 가장 대중적인 오브제들로 미국이란 사회에 걸맞은 예술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가 ‘먼저 무거워져서’ 그렇게 가볍게 ‘떠오른’ 것 같지는 않다.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대로 이루고 싶은 것을 하면 되겠고 무거운 사람은 무거운 대로 자기 갈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
아이가 아이를 본다. 아이가 아이에게 홀린다. 아이들이 웃기 시작한다. 홀리게 한 아이가 먼저 웃고 홀린 아이가 나중에 웃는다. 저 녀석이 왜 웃는 거지? 똑같이 생각하며 웃는다.
웃는다.
(성석제, 「홀림」,『홀림』,문학과 지성사, 1999)
「홀림」은 글 전체에서 단 한번 문단 구분이 된다. 그것도 글의 맨 마지막에서 맨 마지막 한 문장만의 세 글자 ‘웃는다’만을 이전의 한 문단과 분리시킨 새로운 문단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마치 첫 문단 전체를 또는 이 단편 소설 전체를 단숨에 써내려 간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단락 구분 없이 이어지는 「홀림」의 회오리 같은 문장들은 그 자체 홀린다는 것을 구체화하여 ‘홀림’의 불가항력을 입증한다. 소설의 마지막 ‘아이가 아이를 본다. 아이가 아이에게 홀린다’ 부분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홀린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디부터가 회상이고, 어디부터가 현실인지 모호한 구조 속에서 성석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홀린 듯이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글은 빠르다. 담백하다. 군더더기가 없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현실을 비껴지나가지만 그 사실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쭉쭉 내달리게 된다. 별 의미 없이 툭툭 던져진 언어들처럼 보이지만, 읽는 이의 가슴을 숭덩숭덩 주물러대는 그의 솜씨 속에 현상에 대한 깊고 정교한 인지가 빠져 있을 리 없다. 다만 불편하고 민감한 부분들을 낙천으로 한 차례 버무려 밖으로 쏟아낸 것일 뿐이다. 바로 이런 낙천의 힘이 바로 그가 활자 위에서 여유롭게 노닐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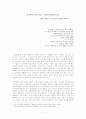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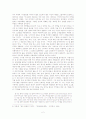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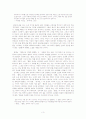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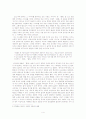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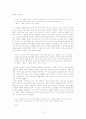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