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김해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
(1)자연환경
(2)고대
2. 유물과 유적
3. 답사자료
1)수로왕비릉(사적 제74호)
2)구지봉(구지봉, 기념물 58호)
3)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4)대성동 고분 박물관
5)수로왕릉(사적 제73호)
6)봉황대 유적(사적 제66호)
7)회현리 조개더미(사적 제2호)
8)김해 양동 고분군(金海良洞古墳群)
9)예안리 고분군
10)분산성(盆山城)
(1)자연환경
(2)고대
2. 유물과 유적
3. 답사자료
1)수로왕비릉(사적 제74호)
2)구지봉(구지봉, 기념물 58호)
3)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4)대성동 고분 박물관
5)수로왕릉(사적 제73호)
6)봉황대 유적(사적 제66호)
7)회현리 조개더미(사적 제2호)
8)김해 양동 고분군(金海良洞古墳群)
9)예안리 고분군
10)분산성(盆山城)
본문내용
였던 것으로 현재 김해시 방면의 경사면에 900m 가량의 산성이 남아 있다.
한편 산성의 정상부에는 지금까지도 신라 토기나 가야토기의 파편들이 산재하고 있어 산성의 시축은 통일신라나 가야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분산 정상부의 좁은 터에는 약간의 체력단련 시설이 있는데, 학계에 보고되어 있지는 않으나 굴식돌방무덤으로 보이는 유구가 있어 신라 가야토기의 파편들은 여기에서 반출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김해 시민들에게는 분산성보다 만장대(萬丈臺)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시대 대원군이 척화의 전진기지로서 칭호를 내렸던 것에 기인하며, 정상부 뒤에 있는 바위에 만장대라는 대원군의 친필 휘호가 새겨져 있다. 만장대 최정상에는 송이버섯 모양의 나무가 서 있어 김해시 일원의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식이 되고 있으며, 여러 곳의 오르는 길이 있으나 활천고개 정상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가야랜드 앞에서 오르는 길은 소형차도 올라 갈 수 있다. 만장대에 오르면 김해시 김해평야 낙동강 남해가 한눈에 들어와 땀을 흘리며 오른 보람을 느끼게 하며, 가락국의 입지조건을 살피는 최적지이다.
이 산성의 평면은 장타원형(長楕圓形)으로 둘레는 904m정도이며, 높이는 3~4m, 성벽폭은 1.12m이다. 성문은 동문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성내로 옹성(壅城)과 같은 \'ㄱ\'자 모양의 꺾임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성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은 동, 서, 북벽이며, 남쪽은 자연암벽 그대로 이용한 듯하여 북벽의 경우는 기단석(基壇石) 내외에 보축(補築)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성내에는 암자(庵子)가 위치하고 있는데 주위 일부를 개간(開墾)하여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부근에 정국군박공위축성사적비(靖國君朴公爲築城事蹟碑), 흥선대원군만세불망비(興宣大院君萬世不忘碑), 부사통정대부정현석영불망비(府使通政大夫鄭顯奭永世不忘碑)가 각각 세워져 있던 것을 김해문화협의회 주관으로 충의각을 건립, 비를 한곳에 모았다.
이 분산성은 성내외에 흩어진 토기파편(土器破片)이나 산성의 입지조건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야시대에 축조되었던 것을 고려시대에 와서 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까지 중요시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김해시의 복원공사로 김해시내에서 보면 그 성벽이 보인다.
참고자료 - 고분의 이해
고분이란 용어는 단순히 \'고대의 분묘(분묘)\'라는 말을 줄인 것이 아니며 고대의 분묘 전부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대체로 한정된 시대에 몇 가지 요소를 구비한 지배층의 분묘를 고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분은 지배층인 피장자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를 잘 나타내며 당시의 매장 관념과 함께 피장자가 속하고 있던 시대상, 사회상 등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분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하고 지역에 따라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고분의 발생시기는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여러 나라의 성립시기가 동일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의하여 고구려에서는 서기전 1세기경, 백제에서는 3세기 초, 신라와 가야에서는 3세기 중엽 경에 고분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가야 구분은 옛 영역이었던 경상남북도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데 특히 낙동강 유역에 군집하고 있으며 구릉의 정상 또는 비탈에 입지하고 있다. 가야를 대표하는 무덤으로는 전기를 대표하는 널무덤[木棺墓]과 덧널무덤[木槨墓]이 있고, 후기를 대표하는 돌덧널무덤[石槨墓]이 있으며 이외에도 독무덤[甕棺墓], 돌널무덤[石棺墓], 돌방무덤[石室墳]이 있으며 여기에서 각종의 토기와 철기 및 장신구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조사, 발견된 무덤들의 층위상의 선후관계와 부장유물의 형식학적 고찰을 통하여 볼 때, 가야의 무덤은 널무덤→덧널무덤→돌덧널무덤→돌방무덤의 순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구덩무덤
적당한 크기의 구덩을 판 뒤, 따로 널 따위를 쓰지 않고 직접 주검을 묻는 방식
구덩식 덧널무덤(수혈식 석관묘)
주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넣는 수혈식(4벽을 쌓고 널을 위로부터 넣고 덮개돌을 덮은 형식)과 길이 없이 옆으로 넣는 횡구식(3벽과 덮개돌을 완성한 다음 옆에서 널을 넣고 한벽을 막는 방식이다.)이 있으며 수혈식이 횡구식보다 앞선 형식으로 판단된다.(구덩식은 주로 낙동강 서안의 가야지역에 분포하고 앞트기식은 낙동강 동안의 신라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돌덧널무덤은 신라의 도읍이라고 생각되는 경주를 제외한 경상도 전역과 전라북도 남원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가야와 신라, 백제의 관계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덧널무덤(토광목곽묘 , 木槨墓)
기본적인 방법은 널무덤(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널 안에 주검을 넣어 매장하는 무덤형식의 하나로 철기시대 이래 계속되어왔다)과 같으나 덧널을 만들고 덧널안에 각종 부장품과 주검을 안치하는 것으로 주검을 안치할 때는, 널을 쓰기도 하고 간혹 널없이 그대로 안치하기도 한다.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조사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야전기를 대표하는 무덤으로 이해되는 한편, 풍부한 부장품 중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유물들이 있어 임나일본부의 문제를 밝혀주리라 기대되는 무덤이다.
돌널무덤 ( 석관묘, 石棺墓 )
깬돌이나 판돌을 잇대어 널을 만들어 사용한 무덤형식으로 주로 청동기시대에 사용되었다.
돌무지무덤 ( 적석총, 積石塚)
주검을 넣은 돌널 위를 쌓아 올린 무덤. 고구려의 장군총이 대표적인 무덤이다.
돌무지덧널무덤 ( 적석목곽분, 積石木槨墳 )
덧널 위를 쌓은 사람머리크기의 냇돌로 덮어 쌓은 무덤으로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이다.
창녕 교동 제 12호분, 부산 복천동 제2호, 3호분 등이 알려져 있다. 토광을 파고 바닥에 자갈, 강돌 등을 깔고서 목곽을 짜고 에 목곽 뚜껑을 덮고 곽의 주위에 돌을 쌓은 다음 흙을 덮어 만들었다.
돌방무덤 (석실묘, 石室墓)
가야말기에 백제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널방과 널길을 가진 무덤양식으로 고령, 산청, 진주 등지에서 조사되었다. 특히 고령 고아동 고분은 연화문이 그려진 벽화가 있는 벽화분이다.
앞트기식 돌방무덤(횡구식 석실분)
널길이 달린, 돌로 쌓아 만든 무덤
한편 산성의 정상부에는 지금까지도 신라 토기나 가야토기의 파편들이 산재하고 있어 산성의 시축은 통일신라나 가야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분산 정상부의 좁은 터에는 약간의 체력단련 시설이 있는데, 학계에 보고되어 있지는 않으나 굴식돌방무덤으로 보이는 유구가 있어 신라 가야토기의 파편들은 여기에서 반출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김해 시민들에게는 분산성보다 만장대(萬丈臺)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시대 대원군이 척화의 전진기지로서 칭호를 내렸던 것에 기인하며, 정상부 뒤에 있는 바위에 만장대라는 대원군의 친필 휘호가 새겨져 있다. 만장대 최정상에는 송이버섯 모양의 나무가 서 있어 김해시 일원의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식이 되고 있으며, 여러 곳의 오르는 길이 있으나 활천고개 정상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가야랜드 앞에서 오르는 길은 소형차도 올라 갈 수 있다. 만장대에 오르면 김해시 김해평야 낙동강 남해가 한눈에 들어와 땀을 흘리며 오른 보람을 느끼게 하며, 가락국의 입지조건을 살피는 최적지이다.
이 산성의 평면은 장타원형(長楕圓形)으로 둘레는 904m정도이며, 높이는 3~4m, 성벽폭은 1.12m이다. 성문은 동문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성내로 옹성(壅城)과 같은 \'ㄱ\'자 모양의 꺾임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성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은 동, 서, 북벽이며, 남쪽은 자연암벽 그대로 이용한 듯하여 북벽의 경우는 기단석(基壇石) 내외에 보축(補築)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성내에는 암자(庵子)가 위치하고 있는데 주위 일부를 개간(開墾)하여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부근에 정국군박공위축성사적비(靖國君朴公爲築城事蹟碑), 흥선대원군만세불망비(興宣大院君萬世不忘碑), 부사통정대부정현석영불망비(府使通政大夫鄭顯奭永世不忘碑)가 각각 세워져 있던 것을 김해문화협의회 주관으로 충의각을 건립, 비를 한곳에 모았다.
이 분산성은 성내외에 흩어진 토기파편(土器破片)이나 산성의 입지조건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야시대에 축조되었던 것을 고려시대에 와서 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까지 중요시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김해시의 복원공사로 김해시내에서 보면 그 성벽이 보인다.
참고자료 - 고분의 이해
고분이란 용어는 단순히 \'고대의 분묘(분묘)\'라는 말을 줄인 것이 아니며 고대의 분묘 전부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대체로 한정된 시대에 몇 가지 요소를 구비한 지배층의 분묘를 고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분은 지배층인 피장자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를 잘 나타내며 당시의 매장 관념과 함께 피장자가 속하고 있던 시대상, 사회상 등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분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하고 지역에 따라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고분의 발생시기는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여러 나라의 성립시기가 동일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의하여 고구려에서는 서기전 1세기경, 백제에서는 3세기 초, 신라와 가야에서는 3세기 중엽 경에 고분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가야 구분은 옛 영역이었던 경상남북도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데 특히 낙동강 유역에 군집하고 있으며 구릉의 정상 또는 비탈에 입지하고 있다. 가야를 대표하는 무덤으로는 전기를 대표하는 널무덤[木棺墓]과 덧널무덤[木槨墓]이 있고, 후기를 대표하는 돌덧널무덤[石槨墓]이 있으며 이외에도 독무덤[甕棺墓], 돌널무덤[石棺墓], 돌방무덤[石室墳]이 있으며 여기에서 각종의 토기와 철기 및 장신구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조사, 발견된 무덤들의 층위상의 선후관계와 부장유물의 형식학적 고찰을 통하여 볼 때, 가야의 무덤은 널무덤→덧널무덤→돌덧널무덤→돌방무덤의 순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구덩무덤
적당한 크기의 구덩을 판 뒤, 따로 널 따위를 쓰지 않고 직접 주검을 묻는 방식
구덩식 덧널무덤(수혈식 석관묘)
주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넣는 수혈식(4벽을 쌓고 널을 위로부터 넣고 덮개돌을 덮은 형식)과 길이 없이 옆으로 넣는 횡구식(3벽과 덮개돌을 완성한 다음 옆에서 널을 넣고 한벽을 막는 방식이다.)이 있으며 수혈식이 횡구식보다 앞선 형식으로 판단된다.(구덩식은 주로 낙동강 서안의 가야지역에 분포하고 앞트기식은 낙동강 동안의 신라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돌덧널무덤은 신라의 도읍이라고 생각되는 경주를 제외한 경상도 전역과 전라북도 남원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가야와 신라, 백제의 관계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덧널무덤(토광목곽묘 , 木槨墓)
기본적인 방법은 널무덤(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널 안에 주검을 넣어 매장하는 무덤형식의 하나로 철기시대 이래 계속되어왔다)과 같으나 덧널을 만들고 덧널안에 각종 부장품과 주검을 안치하는 것으로 주검을 안치할 때는, 널을 쓰기도 하고 간혹 널없이 그대로 안치하기도 한다.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조사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야전기를 대표하는 무덤으로 이해되는 한편, 풍부한 부장품 중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유물들이 있어 임나일본부의 문제를 밝혀주리라 기대되는 무덤이다.
돌널무덤 ( 석관묘, 石棺墓 )
깬돌이나 판돌을 잇대어 널을 만들어 사용한 무덤형식으로 주로 청동기시대에 사용되었다.
돌무지무덤 ( 적석총, 積石塚)
주검을 넣은 돌널 위를 쌓아 올린 무덤. 고구려의 장군총이 대표적인 무덤이다.
돌무지덧널무덤 ( 적석목곽분, 積石木槨墳 )
덧널 위를 쌓은 사람머리크기의 냇돌로 덮어 쌓은 무덤으로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이다.
창녕 교동 제 12호분, 부산 복천동 제2호, 3호분 등이 알려져 있다. 토광을 파고 바닥에 자갈, 강돌 등을 깔고서 목곽을 짜고 에 목곽 뚜껑을 덮고 곽의 주위에 돌을 쌓은 다음 흙을 덮어 만들었다.
돌방무덤 (석실묘, 石室墓)
가야말기에 백제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널방과 널길을 가진 무덤양식으로 고령, 산청, 진주 등지에서 조사되었다. 특히 고령 고아동 고분은 연화문이 그려진 벽화가 있는 벽화분이다.
앞트기식 돌방무덤(횡구식 석실분)
널길이 달린, 돌로 쌓아 만든 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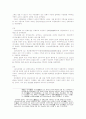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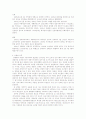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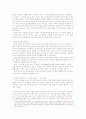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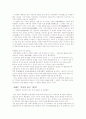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