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 문제
2.Killing(殺人)
3.The role of the physician(醫師의 역할)
요약과 결론
[안락사] : 법률상담 사례
[안락사] 안락사란...
2. 의료분쟁의 문제
3. 낙태
2.Killing(殺人)
3.The role of the physician(醫師의 역할)
요약과 결론
[안락사] : 법률상담 사례
[안락사] 안락사란...
2. 의료분쟁의 문제
3. 낙태
본문내용
같다. 이는 아마 과실이 있는 사고는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나한테 묻는 사례는 그래도 의사들이 과실이 없다고 믿으며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예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의료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의료행위의 일부분은 사고로 귀결한다면 의료행위가 증가하면 의료사고도 증가한다. 의료행위가 증가하는 까닭에는 의료보험 확대로 쉽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의학의 발전으로 전에는 할 수 없던 의료행위(예컨대 심장수술과 같은 것)가 늘어났는데 대개 이런 의료행위에는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점, 의료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따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억제할 수도 억제하여서도 안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침습행위인데 다만 질병이라는 위험을 대처하기 위하여 적은 위험(의료)을 적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행위에는 ①위험내재성, ②예측곤란성, ③불회피성, ④감행성,⑤이율배반성, ⑥자유재량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골치아플 것 같으니 설명은 않는다.)
어쨌든 의료사고는 생긴다. 그러나 모든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의료사고를 모르고 넘어가거나, 이해하거나 또는 체념하면 의료사고는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분쟁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의료인 쪽을 살펴보면, 의사들은 전근대적인 의료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를 醫療父權主義라고도 하는데, \"환자의 병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판단은 내가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럴 것이나, 이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한 때이다.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자기가 한다, 의사가 아니라. 그런데도 의사들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명 없이 동의도 하지 않은 행위로 원치 않는 사고가 생겼다면 당연히 불만은 크다. 또 의외로 의사들은 이런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무식하고, 또 직업적인 체면의식이 강하다.
환자들은 의료에 대한 권리의식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의료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즉, 의료행위가 위험한 행위라는 이해는 없이 무조건 \'의료의 결과는 완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완치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만을 터뜨린다. 의료계약과 관련된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행위 채무\'인 것을!
더 웃기는 건 사회적으로 아무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라도 그렇듯, 사고가 생기면 우선 해야 할 일은 사실확인이다. 의료사고가 생기면 과연 의사의 잘못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따위를 전문기구가 없다. 물론 형사사건이면 검찰이 수사하겠지만, 검사들이 의료행위를 얼마나 알겠는가? 나도 잘 모르는데. 결국 여기저기 물어보지만 확실하게 자신있게 대답해 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의료사고를 심사하는 일은 의사만으로도 안된다. 객관적인 의사, 의사 쪽 의사, 환자 쪽 의사, 의사 쪽 법률가, 환자 쪽 법률가, 객관적인 법률가 들이 모여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부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의료사고를 심사하는 기관도 없을 뿐더러, 피해를 보상해줄 제도도 없다.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라면 의사가 배상할 수 없다. (예방접종사고가 그 예이다.) 그럼 피해를 본 환자는 어떻게 하나? 또 만약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에게 배상을 명령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당해 의사에게 지워진 부담은 너무 크다. 즉 보험과 같은 제도가 있어 위험을 분담하면 좋겠는데 의료사고 보험도 없다. 어쨌거나 피해를 본 환자 쪽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던 없던 당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의사들은 당연히 위험한 의료행위는 삼가하게 되고 (의료위축), 의료행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많은 검사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어적 의료).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넘어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는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추신; 위에서 예를 든 사건은 결국 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환자 측에 시달린 의사는 당연히 한 푼도 배상할 생각이 없었으나, 전혀 다른 이유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위의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의사의 입장이다. 그리고 의사로써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숙소 전화벨이 울렸다. 시간은 새벽 5시 30분.
\" ADI 환자요, BP 안잡히는데요 \"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가보니 EKG moniter상 flat.. CPR을 시작했다. epi하고 NB를 막 줘도 전혀 반응이 없다. DC 때릴 여지조차도 없었다.
20분 동안 massage하다 intern선생님과 교대하고 보호자를 찾았다. 물론 munt는 전날 expire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보호자는 쉽게 agree했다. 집으로 모신다고 한다. ambulance를 부르고 chart 정리를 했다. 어느덧 훤해졌다.
환자가 먹은건 organophosphate계통었다. 내원당시 coma로발견되고, 언제 먹었는지 조차도 모른채 왔었다. cyanosis도 심하고 intubation하면서 보니까 aspiration도 많이 된것 같았었다. 하지만 5시 vital도 괜찮고 ABG도 12시것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자마자 ventilator 달걸 그랬나 ? 도대체 왜respiration이 갑자기 가버렸을까 ? atropine을 너무 많이 줬을까 ? 아님 너무 적게 줬나 ? 그냥 all night keeping할걸 그랬나 ? organophosphte 죽이면 그건 주치의가 게을러서라는데... 잠자기는 다 틀렸다.
주치의 시작한지도 6달하고 반이 넘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않았지만 사망한 환자가 (주치의들은 \'별\'달았다고들 한다)20명이 넘은것 같다. CV하고 GI를 거쳤는데 그정도면 성적좋은거지.. 하고 자위도 해보지만 그 20명이 넘는 환자중에내가아닌 더 부지런하고 더 똑똑한 주치의를 만났으면 아직살아있을 환자는
전체적으로 의료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의료행위의 일부분은 사고로 귀결한다면 의료행위가 증가하면 의료사고도 증가한다. 의료행위가 증가하는 까닭에는 의료보험 확대로 쉽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의학의 발전으로 전에는 할 수 없던 의료행위(예컨대 심장수술과 같은 것)가 늘어났는데 대개 이런 의료행위에는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점, 의료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따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억제할 수도 억제하여서도 안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침습행위인데 다만 질병이라는 위험을 대처하기 위하여 적은 위험(의료)을 적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행위에는 ①위험내재성, ②예측곤란성, ③불회피성, ④감행성,⑤이율배반성, ⑥자유재량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골치아플 것 같으니 설명은 않는다.)
어쨌든 의료사고는 생긴다. 그러나 모든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의료사고를 모르고 넘어가거나, 이해하거나 또는 체념하면 의료사고는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분쟁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의료인 쪽을 살펴보면, 의사들은 전근대적인 의료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를 醫療父權主義라고도 하는데, \"환자의 병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판단은 내가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럴 것이나, 이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한 때이다.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자기가 한다, 의사가 아니라. 그런데도 의사들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명 없이 동의도 하지 않은 행위로 원치 않는 사고가 생겼다면 당연히 불만은 크다. 또 의외로 의사들은 이런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무식하고, 또 직업적인 체면의식이 강하다.
환자들은 의료에 대한 권리의식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의료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즉, 의료행위가 위험한 행위라는 이해는 없이 무조건 \'의료의 결과는 완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완치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만을 터뜨린다. 의료계약과 관련된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행위 채무\'인 것을!
더 웃기는 건 사회적으로 아무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라도 그렇듯, 사고가 생기면 우선 해야 할 일은 사실확인이다. 의료사고가 생기면 과연 의사의 잘못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따위를 전문기구가 없다. 물론 형사사건이면 검찰이 수사하겠지만, 검사들이 의료행위를 얼마나 알겠는가? 나도 잘 모르는데. 결국 여기저기 물어보지만 확실하게 자신있게 대답해 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의료사고를 심사하는 일은 의사만으로도 안된다. 객관적인 의사, 의사 쪽 의사, 환자 쪽 의사, 의사 쪽 법률가, 환자 쪽 법률가, 객관적인 법률가 들이 모여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부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의료사고를 심사하는 기관도 없을 뿐더러, 피해를 보상해줄 제도도 없다.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라면 의사가 배상할 수 없다. (예방접종사고가 그 예이다.) 그럼 피해를 본 환자는 어떻게 하나? 또 만약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에게 배상을 명령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당해 의사에게 지워진 부담은 너무 크다. 즉 보험과 같은 제도가 있어 위험을 분담하면 좋겠는데 의료사고 보험도 없다. 어쨌거나 피해를 본 환자 쪽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던 없던 당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의사들은 당연히 위험한 의료행위는 삼가하게 되고 (의료위축), 의료행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많은 검사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어적 의료).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넘어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는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추신; 위에서 예를 든 사건은 결국 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환자 측에 시달린 의사는 당연히 한 푼도 배상할 생각이 없었으나, 전혀 다른 이유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위의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의사의 입장이다. 그리고 의사로써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숙소 전화벨이 울렸다. 시간은 새벽 5시 30분.
\" ADI 환자요, BP 안잡히는데요 \"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가보니 EKG moniter상 flat.. CPR을 시작했다. epi하고 NB를 막 줘도 전혀 반응이 없다. DC 때릴 여지조차도 없었다.
20분 동안 massage하다 intern선생님과 교대하고 보호자를 찾았다. 물론 munt는 전날 expire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보호자는 쉽게 agree했다. 집으로 모신다고 한다. ambulance를 부르고 chart 정리를 했다. 어느덧 훤해졌다.
환자가 먹은건 organophosphate계통었다. 내원당시 coma로발견되고, 언제 먹었는지 조차도 모른채 왔었다. cyanosis도 심하고 intubation하면서 보니까 aspiration도 많이 된것 같았었다. 하지만 5시 vital도 괜찮고 ABG도 12시것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자마자 ventilator 달걸 그랬나 ? 도대체 왜respiration이 갑자기 가버렸을까 ? atropine을 너무 많이 줬을까 ? 아님 너무 적게 줬나 ? 그냥 all night keeping할걸 그랬나 ? organophosphte 죽이면 그건 주치의가 게을러서라는데... 잠자기는 다 틀렸다.
주치의 시작한지도 6달하고 반이 넘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않았지만 사망한 환자가 (주치의들은 \'별\'달았다고들 한다)20명이 넘은것 같다. CV하고 GI를 거쳤는데 그정도면 성적좋은거지.. 하고 자위도 해보지만 그 20명이 넘는 환자중에내가아닌 더 부지런하고 더 똑똑한 주치의를 만났으면 아직살아있을 환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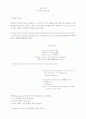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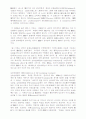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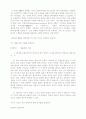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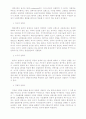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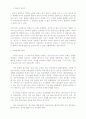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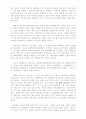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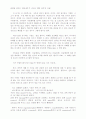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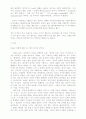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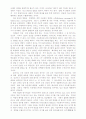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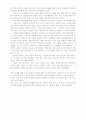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