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연적으로 예고된 1946년의 민중항쟁
2. 10월 인민항쟁의 배경
3. 10월 인민항쟁
ⅰ. 10월 인민항쟁의 촉발
ⅱ. 대구에서의 10월 인민항쟁
ⅲ. 경북에서의 10월 인민항쟁
ⅳ. 다른 지역에서의 10월 인민항쟁
ⅴ. 10월 인민항쟁의 결과
4. 10월 인민항쟁의 분석
5. 10월 인민항쟁의 실패요인
Ⅲ. 맺음말
Ⅱ. 본론
1. 필연적으로 예고된 1946년의 민중항쟁
2. 10월 인민항쟁의 배경
3. 10월 인민항쟁
ⅰ. 10월 인민항쟁의 촉발
ⅱ. 대구에서의 10월 인민항쟁
ⅲ. 경북에서의 10월 인민항쟁
ⅳ. 다른 지역에서의 10월 인민항쟁
ⅴ. 10월 인민항쟁의 결과
4. 10월 인민항쟁의 분석
5. 10월 인민항쟁의 실패요인
Ⅲ. 맺음말
본문내용
쇄를 공포하였고 미군정과 경찰은 초기 인민위파괴로부터 얻은 자신감과 현대적 무기, 통신망을 통해 좌익과의 대결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탄압의 과정에서 미군정은 주로 경찰력의 투입을 우선시 했으며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미군정은 9월, 10월 항쟁을 제압하면서 형식적 입법기관을 설치하려 했다. 그것은 내부적 저항을 하루속히 무마하기 위한 선전용이었다. 미군정은 남한에 임시적인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를 치루었다. 이때는 10월 민중항쟁과정 중이므로 미군정과 우익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하여 좌익세력의 참여 없이 미군정의 지원을 받는 우익세력만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구성되었다. 민주주의를 부르짓는 미국이 행한 한국에서의 첫 선거는 가장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민중의 눈과 귀를 가리운 채 형식적인 투표과정을 통해 우익의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Ⅲ.맺음말
해방 이후 우리 나라의 상황은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건준이나 인민위원회등이 만들어져 우리 민족 스스로의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정치경제적 독립을 절실히 이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는데 경제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세계시장의 구축을 위해 신생 독립 국가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였고 우리 나라 역시 그 예외국이 될 수 없었다. 결국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그 이전까지의 건준이나 인민위원회의 활동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미군정의 일제의 잔재들을 끌고와 정치를 했고 우익과 손을 잡고 좌익을 제거하려하였다. 그리고 일제시대보다 더한 미곡정책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들이 따르는 등 사회의 불만이 커져갔으나 미군정은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오히려 새로운 변혁에 역행하는 미군정에 대해 일반민중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일반 민중들은 투쟁의 전선으로 뛰어들었고 우선은 좌익의 지도하에 의해 계획되어 행동하였다. 9월 총파업에 이은 10월 인민항쟁은 비록 미군정의 타파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였으나 지동층의 지도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 투쟁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인민항쟁으로의 성격 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10월 인민항쟁은 ‘지방적이고 자연발생적이며 조직적 미숙에서 나온 농민반란’, ‘당시 좌익지도부의 모험적인 강경 투쟁’ 등등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중에 대한 계급적, 민족적 억압체제가 무너지고 해방이 도래했을 때 기대했던 민중적인 새로운 질서가 거부된 데 대한 좌절의 표시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10월 인민항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 분과 『한국 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1』도서출판 녹두 1993
참고문헌
박현채, 강남식 외(저)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민중운동사 연구회 『해방 후 한국 변혁 운동사』도서출판 녹진 1990
정해구(저) 『10월 인민항쟁 연구』열음사 1988
한국 정치 연구회 정치사 분과 『한국 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1』도서출판 녹두 1993
한편 미군정은 9월, 10월 항쟁을 제압하면서 형식적 입법기관을 설치하려 했다. 그것은 내부적 저항을 하루속히 무마하기 위한 선전용이었다. 미군정은 남한에 임시적인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를 치루었다. 이때는 10월 민중항쟁과정 중이므로 미군정과 우익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하여 좌익세력의 참여 없이 미군정의 지원을 받는 우익세력만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구성되었다. 민주주의를 부르짓는 미국이 행한 한국에서의 첫 선거는 가장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민중의 눈과 귀를 가리운 채 형식적인 투표과정을 통해 우익의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Ⅲ.맺음말
해방 이후 우리 나라의 상황은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건준이나 인민위원회등이 만들어져 우리 민족 스스로의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정치경제적 독립을 절실히 이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는데 경제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세계시장의 구축을 위해 신생 독립 국가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였고 우리 나라 역시 그 예외국이 될 수 없었다. 결국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그 이전까지의 건준이나 인민위원회의 활동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미군정의 일제의 잔재들을 끌고와 정치를 했고 우익과 손을 잡고 좌익을 제거하려하였다. 그리고 일제시대보다 더한 미곡정책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들이 따르는 등 사회의 불만이 커져갔으나 미군정은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오히려 새로운 변혁에 역행하는 미군정에 대해 일반민중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일반 민중들은 투쟁의 전선으로 뛰어들었고 우선은 좌익의 지도하에 의해 계획되어 행동하였다. 9월 총파업에 이은 10월 인민항쟁은 비록 미군정의 타파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였으나 지동층의 지도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 투쟁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인민항쟁으로의 성격 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10월 인민항쟁은 ‘지방적이고 자연발생적이며 조직적 미숙에서 나온 농민반란’, ‘당시 좌익지도부의 모험적인 강경 투쟁’ 등등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중에 대한 계급적, 민족적 억압체제가 무너지고 해방이 도래했을 때 기대했던 민중적인 새로운 질서가 거부된 데 대한 좌절의 표시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10월 인민항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 분과 『한국 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1』도서출판 녹두 1993
참고문헌
박현채, 강남식 외(저)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민중운동사 연구회 『해방 후 한국 변혁 운동사』도서출판 녹진 1990
정해구(저) 『10월 인민항쟁 연구』열음사 1988
한국 정치 연구회 정치사 분과 『한국 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1』도서출판 녹두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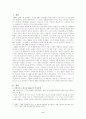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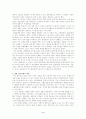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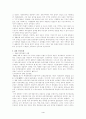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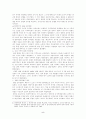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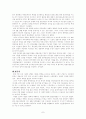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