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1910년대 독립운동
2) 1920년대 독립운동
(1) 노동.농민운동
(2) 청년운동
(3) 여성운동
3) 1930년대.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
(1) 민족주의 좌파
(2) 민족주의 우파
(3) 사회주의자
(4) 중국에서의 독립운동과 협동전선 형성 노력
3. 결론
2. 본론
1) 1910년대 독립운동
2) 1920년대 독립운동
(1) 노동.농민운동
(2) 청년운동
(3) 여성운동
3) 1930년대.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
(1) 민족주의 좌파
(2) 민족주의 우파
(3) 사회주의자
(4) 중국에서의 독립운동과 협동전선 형성 노력
3. 결론
본문내용
을 결정한다. 이들은 1941년 7월 팔로군 지역으로 이동을 완료하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되었다.
중국 국민당정부는 좌우세력의 합작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39년 광복연합과 민족전선의 합작이 추진되었다. 7당회의 5당회의를 통해 전국연합진선협회를 결성하고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세력의 통합신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자격문제 토지국유화문제 임정추대문제 등으로 결국 결렬되었다.
1941년 중엽이면 민족해방운동세력이 3분된다. 중경 본부의 한독당(대한민국임시정부계열), 민족전선(민족혁명당과 화북이동을 거부한 일부 투쟁동맹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그것이다. 그 가운데 한독당과 민족전선이 임시정부의 틀 속에 통합된다. 1942년 중국군사위원회는 황하이남의 잔류의용대원에 대해 한국광복군 편입을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1942년 5월 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되었으며 1942년 10월 제34차 임시정부 의정원회의에서 민족혁명당 측의 의정원 참여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좌우세력의 일정한 통합이 이루어진 의정원이 구성된 것이다. 이제 임정은 결성 당시의 위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민족적 대표성을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세력을 결집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화북지방을 투쟁의 무대를 옮겨간 세력은 여전히 독자적 세력으로 남았다.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후 팔로군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반일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1942년 7월 연안에서 김두봉을 주석으로 화북조선독립동맹(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 이 해 8월에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칭하고 무정을 총사령으로 하였다. 조선의용군은 요문구전투, 백초평전투, 화순전투 등 여러 차례 격전을 치렀으며 해방 당시 2천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총사령 무정은 함경북도 경성 태생으로 김씨였다. 김무정은 20세에 하남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포병과를 졸업하고 1935년에는 중국공산당의 대장정에 참여하여 연안 공산군 포병대 총사령을 지냈다. 1941년 10월 36세의 나이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조직하였고 1942년 7월 조선의용군을 발족하였다.
김두봉, 무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동맹의 세력들은 해방이후 중국공산당과의 연계를 배경으로 북한 정권을 움직여 가는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임시정부는 1932년 1월 상해사변 발발 이후 5월 상해를 떠나 항주로 이전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쟁 발발까지 항주에 머물렀다. 이후 호남성 장사, 광동성 남해현성, 광서성 유주, 사천성 기강, 등지를 거쳐 1940년 9월 중경에 정착하였다. 임시정부는 이 때 비로소 광복군을 창설한다. 독자적 군대를 육성하여 대일 항전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군대의 창설과 유지에 드는 인력과 자원을 충당할 길이 없어 미루다가 우선 장교들만으로 군대를 구성하고 병사를 모집하자는 결론에 이른다.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열린 광복군 창군식에서 총사령부 장교는 12명이었다. 이후 1년 동안 300명 정도의 병력을 모집하여 창군당시에 비해 10배가 넘는 숫자가 되었다.
1941년 11월 19일 중국정부의 군사원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원의 대가로 광복군은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이라는 것을 수용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광복군은 중국군 참모총장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단지 명목상으로만 광복군 통수권을 가질 뿐이었다. 광복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상실한 데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우선은 중국의 지원 속에서 광복군의 규모를 증대시켜야 하였다. 한편 중국정부는 좌우를 막론하고 조선인들의 군사조직이 통합되기를 희망하였다. 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중국정부의 관할영토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까닭으로 중국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대일전선에서의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독립운동세력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1942년 4월 20일 마침내 군사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조선의용대는 광복군의 제1지대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광복군 1 2 지대는 모두 정원 277명에 크게 미달하였다. 제3지대는 1945년 초에야 창설되었으며 인원은 70명뿐이었다.
광복군은 창군 후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지휘체계 속에 있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군과 함께 참전하기도 하였지만 소수의 병력이 주로 미얀마 전선의 한인 징병자들을 대상으로 첩보 선무 공작을 하였을 뿐으로, 전반적으로 보아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 훈련하고 병력을 양성하는 단계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Ⅲ. 결론
19세기중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역사는 국권의 수호 ,민족의 독립, 그리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줄기찬 운동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시대를 살아간 사회의 각층은 저마다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하던 시기에서부터 독립을 이루기까지 한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입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참고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편간,『한국독립운동사(1~5)』, 1965~1969
맥켄지(이광린 역),『한국의 독립운동』, 일조각, 1969
국사편찬위원회 편간,『한국독립운동사-자료편 1~7』, 1970~1977
金正明 편,『朝鮮立運動』(1235), 原書房, 196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1~10), 원호처, 1969~1978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일제하의 민족운동사』, 1971
켄달,『한국독립운동의 진상』, 탐구당, 1975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22-근대 민족운동의 전개』, 1978
姜万吉,『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1985
趙東杰,『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지식산업사, 1989
한국사학회 편 『한국현대사의 제문제1』을유문화사, 1987
강만길,『{한국사15, 16 -민족해방운동의 전개』한길사, 1994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치민지 김민주,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신진균,『역사교육』19호.1993
중국 국민당정부는 좌우세력의 합작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39년 광복연합과 민족전선의 합작이 추진되었다. 7당회의 5당회의를 통해 전국연합진선협회를 결성하고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세력의 통합신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자격문제 토지국유화문제 임정추대문제 등으로 결국 결렬되었다.
1941년 중엽이면 민족해방운동세력이 3분된다. 중경 본부의 한독당(대한민국임시정부계열), 민족전선(민족혁명당과 화북이동을 거부한 일부 투쟁동맹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그것이다. 그 가운데 한독당과 민족전선이 임시정부의 틀 속에 통합된다. 1942년 중국군사위원회는 황하이남의 잔류의용대원에 대해 한국광복군 편입을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1942년 5월 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되었으며 1942년 10월 제34차 임시정부 의정원회의에서 민족혁명당 측의 의정원 참여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좌우세력의 일정한 통합이 이루어진 의정원이 구성된 것이다. 이제 임정은 결성 당시의 위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민족적 대표성을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세력을 결집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화북지방을 투쟁의 무대를 옮겨간 세력은 여전히 독자적 세력으로 남았다.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후 팔로군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반일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1942년 7월 연안에서 김두봉을 주석으로 화북조선독립동맹(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 이 해 8월에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칭하고 무정을 총사령으로 하였다. 조선의용군은 요문구전투, 백초평전투, 화순전투 등 여러 차례 격전을 치렀으며 해방 당시 2천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총사령 무정은 함경북도 경성 태생으로 김씨였다. 김무정은 20세에 하남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포병과를 졸업하고 1935년에는 중국공산당의 대장정에 참여하여 연안 공산군 포병대 총사령을 지냈다. 1941년 10월 36세의 나이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조직하였고 1942년 7월 조선의용군을 발족하였다.
김두봉, 무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동맹의 세력들은 해방이후 중국공산당과의 연계를 배경으로 북한 정권을 움직여 가는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임시정부는 1932년 1월 상해사변 발발 이후 5월 상해를 떠나 항주로 이전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쟁 발발까지 항주에 머물렀다. 이후 호남성 장사, 광동성 남해현성, 광서성 유주, 사천성 기강, 등지를 거쳐 1940년 9월 중경에 정착하였다. 임시정부는 이 때 비로소 광복군을 창설한다. 독자적 군대를 육성하여 대일 항전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군대의 창설과 유지에 드는 인력과 자원을 충당할 길이 없어 미루다가 우선 장교들만으로 군대를 구성하고 병사를 모집하자는 결론에 이른다.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열린 광복군 창군식에서 총사령부 장교는 12명이었다. 이후 1년 동안 300명 정도의 병력을 모집하여 창군당시에 비해 10배가 넘는 숫자가 되었다.
1941년 11월 19일 중국정부의 군사원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원의 대가로 광복군은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이라는 것을 수용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광복군은 중국군 참모총장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단지 명목상으로만 광복군 통수권을 가질 뿐이었다. 광복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상실한 데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우선은 중국의 지원 속에서 광복군의 규모를 증대시켜야 하였다. 한편 중국정부는 좌우를 막론하고 조선인들의 군사조직이 통합되기를 희망하였다. 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중국정부의 관할영토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까닭으로 중국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대일전선에서의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독립운동세력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1942년 4월 20일 마침내 군사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조선의용대는 광복군의 제1지대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광복군 1 2 지대는 모두 정원 277명에 크게 미달하였다. 제3지대는 1945년 초에야 창설되었으며 인원은 70명뿐이었다.
광복군은 창군 후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지휘체계 속에 있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군과 함께 참전하기도 하였지만 소수의 병력이 주로 미얀마 전선의 한인 징병자들을 대상으로 첩보 선무 공작을 하였을 뿐으로, 전반적으로 보아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 훈련하고 병력을 양성하는 단계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Ⅲ. 결론
19세기중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역사는 국권의 수호 ,민족의 독립, 그리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줄기찬 운동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시대를 살아간 사회의 각층은 저마다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하던 시기에서부터 독립을 이루기까지 한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입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참고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편간,『한국독립운동사(1~5)』, 1965~1969
맥켄지(이광린 역),『한국의 독립운동』, 일조각, 1969
국사편찬위원회 편간,『한국독립운동사-자료편 1~7』, 1970~1977
金正明 편,『朝鮮立運動』(1235), 原書房, 196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1~10), 원호처, 1969~1978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일제하의 민족운동사』, 1971
켄달,『한국독립운동의 진상』, 탐구당, 1975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22-근대 민족운동의 전개』, 1978
姜万吉,『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1985
趙東杰,『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지식산업사, 1989
한국사학회 편 『한국현대사의 제문제1』을유문화사, 1987
강만길,『{한국사15, 16 -민족해방운동의 전개』한길사, 1994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치민지 김민주,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신진균,『역사교육』19호.1993
추천자료
 일제시대 사회복지의 발달사적 구분에 관한 연구
일제시대 사회복지의 발달사적 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 - 조선시대의 체육과 개화기, 일제시대의 체육
한국체육사 - 조선시대의 체육과 개화기, 일제시대의 체육 일제시대의 대중음악
일제시대의 대중음악 일제시대의 경제시각
일제시대의 경제시각 일제시대 경찰
일제시대 경찰 [일본경영, 경제발전, 디자인전략, 품질장려상, 지상파방송, 일제시대]일본경영과 경제발전, ...
[일본경영, 경제발전, 디자인전략, 품질장려상, 지상파방송, 일제시대]일본경영과 경제발전, ... [한국의 관광입지와 관광산업] 우리나라의 관광입지조건과 관광산업 (삼국시대 관광, 고려시...
[한국의 관광입지와 관광산업] 우리나라의 관광입지조건과 관광산업 (삼국시대 관광, 고려시... [한국문화사] 쌀의 어원과 벼의 전파, 쌀농사의 시작과 발전(철의 사용, 조선시대의 벼농사),...
[한국문화사] 쌀의 어원과 벼의 전파, 쌀농사의 시작과 발전(철의 사용, 조선시대의 벼농사),... [한국문화사] <담배의 이해> 담배의 개념, 담배의 어원, 담배의 원산지와 전래과정, 조선시대...
[한국문화사] <담배의 이해> 담배의 개념, 담배의 어원, 담배의 원산지와 전래과정, 조선시대...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흐름 -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흐름 -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 일제식민지시대의 가족제도의 변화 - 조선관습조사의 문제, 호적법의 개정과 호주제, 일본의 ...
일제식민지시대의 가족제도의 변화 - 조선관습조사의 문제, 호적법의 개정과 호주제, 일본의 ... 한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과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조선시대 지...
한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과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조선시대 지... 아동의 개념과 아동복지의 이념 및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아동의 개념, 아동복지의 이념, 아...
아동의 개념과 아동복지의 이념 및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아동의 개념, 아동복지의 이념, 아... [한국현대소설론] 소설사회학적 연구의 실례 - 집단과 개인, 일제강점기 소설 연구방법, 일제...
[한국현대소설론] 소설사회학적 연구의 실례 - 집단과 개인, 일제강점기 소설 연구방법, 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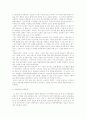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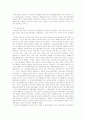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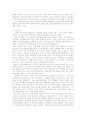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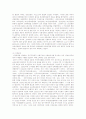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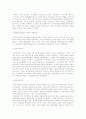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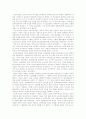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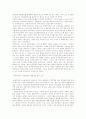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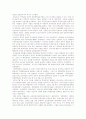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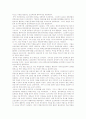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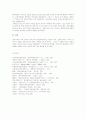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