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1. 상징 (象徵, Symbol)
(1) 상징과 비유
(2) 상징의 종류
2. 구광본 「만남」
(1) ‘그대 보는 순간’, 그 ‘순간’ 에 대하여
(2) 그대의 땀방울, 땀, 물방울, 바다 : 생명의 원천, 정화와 재생의 경로
(3) ‘그대’, 불쑥 솟아올라 내게
3. 황동규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1) 움직이게 되어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여야 한다
(2) 고여 있는 모든 것을 위한 노래
(3) 구르고 굴러, 상처투성이가 될지라도
Ⅲ. 결론
- ‘바퀴를 굴리며’ 그대를 ‘만나다’
- 들어가며
Ⅱ. 본론
1. 상징 (象徵, Symbol)
(1) 상징과 비유
(2) 상징의 종류
2. 구광본 「만남」
(1) ‘그대 보는 순간’, 그 ‘순간’ 에 대하여
(2) 그대의 땀방울, 땀, 물방울, 바다 : 생명의 원천, 정화와 재생의 경로
(3) ‘그대’, 불쑥 솟아올라 내게
3. 황동규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1) 움직이게 되어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여야 한다
(2) 고여 있는 모든 것을 위한 노래
(3) 구르고 굴러, 상처투성이가 될지라도
Ⅲ. 결론
- ‘바퀴를 굴리며’ 그대를 ‘만나다’
본문내용
.
동시에 <만남>은 물을 시인의 세계로 끌어 들이는 촉촉한 힘을 가졌다. ‘나’와 그대가 만난 곳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와도 같은 방파제다. 피로에 찌든 과거가 작열하는 여름처럼 끈적거리던 발걸음 앞으로 그대가 등장한다. 그대는 그대이지만, 물방울이고 땀방울이다. 기쁘게 흘린 땀이다. 그리하여 그대다. 그대는 사랑이다. 그 순간, ‘나’가 진정으로 넘쳐 흐르는 물의 기쁨을 만나는, 놀라왔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만남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랑이다. 그대와의 만남을 통해서야 비로소 화자는 그대에게 흠뻑 젖기를, 목을 축이기를 기원하고 동시에 기쁘게 땀 흘리는 궁극의 자신에게까지 다다른다. 그리하여 결국 물은 사랑을 상징하는 내면적 매개물로서, 내가 사랑하는 그대도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랑을 관통한 나의 모습도 되는 것이다.
황동규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는 시가 사회와 세계의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시대를 조망하는 슬프고도 첨예한 시선의 무게가 둥그렇지만 굴러가지 않는 상징물들을 통해 괴롭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 시는 제목 그대로 이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고, ‘바퀴’라는 원형적 상징은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기하학적 도형이라는 원, 그는 본질을 담은 존재이고 동시에 순환이라는 상징을 가진다. 바퀴는 곧 원이 덧씌워진 모양이며 동시에 구름을 전제로 하는 운동성의 상징이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순환을 담보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을 직시할 수 없는 정체와 퇴보의 현상을 의미하며,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지금 바퀴를 거듭 굴리고자 한다. 이것은 ‘굴린다’는 행위를 통한 개인적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즉, 실존에 대한 인식과 잘못된 현실, 무기력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희망이 반영된, 바퀴를 바라보는 투영하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굴러야 할 것들이 구르지 않는 현실, 구리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다시 굴려야하는 현실에서 화자는 모든 바퀴를 굴리고 싶은 현실에의 의미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는 시대와 결별하지 못한다. 그럴 수 없다. 유신정권 하에서 폭력과 억압 속에 멈춰버린 역사, 본질과 진실이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화자는 굴리고 싶어한다. 망가뜨리고 싶은 어린 날, 숨찬 공화국과 같은 표현은 화자의 눈에 비친 부정적 시대상을 극대화하며, 이는 항거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와 충돌하게 된다. 결국 화자는 역사와 현실의 순환을 주도하고 실존과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고자, 바퀴를 굴리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거듭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만남>과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이 두 시의 차이는 각 시의 ‘상징’이 갖는 방향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황동규의 시가 시대적 맥락과 당시의 사회상에 깊이 박혀 있다고 한다면, 구광본의 시에는 그러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황동규의 시에서 관습적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공화국이 내포하는 관습적 상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 억압과 은폐, 왜곡이 자행되었던 암흑과도 같은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이것은 시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의 상황과 모습을 핍진하게 드러낸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특수한 체제적 아픔을 간직한 이 시대적 맥락은 결국 화자가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역사를 순환 시키고자 하는 의지, 즉, 바퀴를 굴리고 싶어 하는 원인이 된다.
반면 구광본의 시는 사회적, 역사적 상황보다는 인간 개인의 경험과 내면, 정서에 중심을 두고 있다. 때문에 구광본의 시에서는 개인적 상징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그것은 ‘물’로 상징화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게 한다.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랑과 물이 주는 생명과 정화, 재생의 이미지를 확고히 결합시킴으로써 시는 가장 소중한 ‘만남’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시대적 맥락과 개인의 감정이라는 문제를 차치하고 본다면, 황동규의 시에서도-굴러가는 바퀴를 통해 생명력이 발휘된다는 해석과 바퀴에서 굴러가야 한다고 말하는 시점부터 ‘생’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때- 구광본의 시에서도 ‘생명’에 대한 함의를 찾아 볼 수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공통점도 발견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시가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결코 같지만은 않기 때문에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만남>에서 ‘물’이 상징하는 생명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서 오는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내면의 것이다. 첫눈에 반하는 순간,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쿵쾅거리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라도 할 듯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마음은, 메말랐던 화자가 그대의 물에 젖어들게 되는 것과 같다. 파삭하고 건조했던 심장이 생명을 얻어 뛰는 듯한 느낌은 시 속에서 ‘흠뻑 젖고 싶다’, ‘목을 축이고 싶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은 결국 그 때까지 몰랐던 감정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으며, 이 때 ‘생명’의 의미는 새로운 나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에서 굴러가는 ‘바퀴’가 상징하는 ‘생명력’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다. 시인은 본질과 순환을 함의하는 바퀴의 원형적 상징을 통해서 구르지 못하고, 구른다 해도 제대로 구르지 못하는 70년대의 현실에 ‘바퀴를 굴리고 싶다’고 뜨겁게 소리친다. 바퀴는 ‘굴러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역동성이 부여된 존재이며, 이것은 순환하고 움직여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황동규의 시에서 나타나는 ‘생명’은 비정상적인 시대의 억압 속에서 떨어지려 하는 모든 것을 길 위에 굴려 그 실존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한 힘이고 노력이며, 그것을 위한 역동적인 움직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만남>은 물을 시인의 세계로 끌어 들이는 촉촉한 힘을 가졌다. ‘나’와 그대가 만난 곳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와도 같은 방파제다. 피로에 찌든 과거가 작열하는 여름처럼 끈적거리던 발걸음 앞으로 그대가 등장한다. 그대는 그대이지만, 물방울이고 땀방울이다. 기쁘게 흘린 땀이다. 그리하여 그대다. 그대는 사랑이다. 그 순간, ‘나’가 진정으로 넘쳐 흐르는 물의 기쁨을 만나는, 놀라왔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만남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랑이다. 그대와의 만남을 통해서야 비로소 화자는 그대에게 흠뻑 젖기를, 목을 축이기를 기원하고 동시에 기쁘게 땀 흘리는 궁극의 자신에게까지 다다른다. 그리하여 결국 물은 사랑을 상징하는 내면적 매개물로서, 내가 사랑하는 그대도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랑을 관통한 나의 모습도 되는 것이다.
황동규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는 시가 사회와 세계의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시대를 조망하는 슬프고도 첨예한 시선의 무게가 둥그렇지만 굴러가지 않는 상징물들을 통해 괴롭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 시는 제목 그대로 이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고, ‘바퀴’라는 원형적 상징은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기하학적 도형이라는 원, 그는 본질을 담은 존재이고 동시에 순환이라는 상징을 가진다. 바퀴는 곧 원이 덧씌워진 모양이며 동시에 구름을 전제로 하는 운동성의 상징이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순환을 담보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을 직시할 수 없는 정체와 퇴보의 현상을 의미하며,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지금 바퀴를 거듭 굴리고자 한다. 이것은 ‘굴린다’는 행위를 통한 개인적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즉, 실존에 대한 인식과 잘못된 현실, 무기력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희망이 반영된, 바퀴를 바라보는 투영하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굴러야 할 것들이 구르지 않는 현실, 구리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다시 굴려야하는 현실에서 화자는 모든 바퀴를 굴리고 싶은 현실에의 의미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는 시대와 결별하지 못한다. 그럴 수 없다. 유신정권 하에서 폭력과 억압 속에 멈춰버린 역사, 본질과 진실이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화자는 굴리고 싶어한다. 망가뜨리고 싶은 어린 날, 숨찬 공화국과 같은 표현은 화자의 눈에 비친 부정적 시대상을 극대화하며, 이는 항거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와 충돌하게 된다. 결국 화자는 역사와 현실의 순환을 주도하고 실존과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고자, 바퀴를 굴리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거듭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만남>과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이 두 시의 차이는 각 시의 ‘상징’이 갖는 방향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황동규의 시가 시대적 맥락과 당시의 사회상에 깊이 박혀 있다고 한다면, 구광본의 시에는 그러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황동규의 시에서 관습적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공화국이 내포하는 관습적 상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 억압과 은폐, 왜곡이 자행되었던 암흑과도 같은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이것은 시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의 상황과 모습을 핍진하게 드러낸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특수한 체제적 아픔을 간직한 이 시대적 맥락은 결국 화자가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역사를 순환 시키고자 하는 의지, 즉, 바퀴를 굴리고 싶어 하는 원인이 된다.
반면 구광본의 시는 사회적, 역사적 상황보다는 인간 개인의 경험과 내면, 정서에 중심을 두고 있다. 때문에 구광본의 시에서는 개인적 상징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그것은 ‘물’로 상징화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게 한다.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랑과 물이 주는 생명과 정화, 재생의 이미지를 확고히 결합시킴으로써 시는 가장 소중한 ‘만남’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시대적 맥락과 개인의 감정이라는 문제를 차치하고 본다면, 황동규의 시에서도-굴러가는 바퀴를 통해 생명력이 발휘된다는 해석과 바퀴에서 굴러가야 한다고 말하는 시점부터 ‘생’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때- 구광본의 시에서도 ‘생명’에 대한 함의를 찾아 볼 수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공통점도 발견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시가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결코 같지만은 않기 때문에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만남>에서 ‘물’이 상징하는 생명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서 오는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내면의 것이다. 첫눈에 반하는 순간,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쿵쾅거리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라도 할 듯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마음은, 메말랐던 화자가 그대의 물에 젖어들게 되는 것과 같다. 파삭하고 건조했던 심장이 생명을 얻어 뛰는 듯한 느낌은 시 속에서 ‘흠뻑 젖고 싶다’, ‘목을 축이고 싶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은 결국 그 때까지 몰랐던 감정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으며, 이 때 ‘생명’의 의미는 새로운 나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에서 굴러가는 ‘바퀴’가 상징하는 ‘생명력’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다. 시인은 본질과 순환을 함의하는 바퀴의 원형적 상징을 통해서 구르지 못하고, 구른다 해도 제대로 구르지 못하는 70년대의 현실에 ‘바퀴를 굴리고 싶다’고 뜨겁게 소리친다. 바퀴는 ‘굴러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역동성이 부여된 존재이며, 이것은 순환하고 움직여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황동규의 시에서 나타나는 ‘생명’은 비정상적인 시대의 억압 속에서 떨어지려 하는 모든 것을 길 위에 굴려 그 실존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한 힘이고 노력이며, 그것을 위한 역동적인 움직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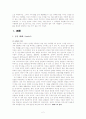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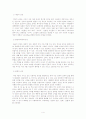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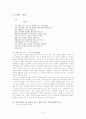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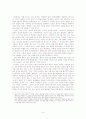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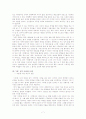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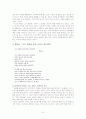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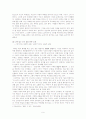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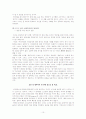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