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본 마당
1. 성선설
2. 성악설의 개념
Ⅲ 성선설, 성악설의 비교
Ⅳ 그 외의 인간 본성론
Ⅴ 성선설, 성악설의 현대적 조명
본 마당
1. 성선설
2. 성악설의 개념
Ⅲ 성선설, 성악설의 비교
Ⅳ 그 외의 인간 본성론
Ⅴ 성선설, 성악설의 현대적 조명
본문내용
惡)고 한다. 생각건대 \'이유선악\'이라는 말은 원래 정명도에게서 유래되었다. 명도는 현실세계를 선악상대로 보고, 선증악감(善增惡減), 선감악증(善減惡增)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치의 본체야 물론 순선이라 한다. 그러므로 선악공존은 현실세계에 속하는 것이지 본체세계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율곡의 입장도 명도와 동일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율곡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정자의 말에 \'사람은 기품(氣稟)을 받아서 나매 이치에 선악(善惡)이 있다\'고 하니, 이것은 사람을 깨우침에 간절히 명료하게 해명한 곳이다. 그 이른바 이치는 그것이 기운을 타고 유행한 이치를 가리킨 것으로 이치의 본연이 아니다. 본연의 이치는 본래 순선이나 기운을 타고 유행하면 그 나누어짐이 만수(萬殊)이다. 기품에 선악이 있으니, 이치도 선악이 있게 된다(理有善惡). 대저 이치의 본연은 순선이지만 이미 기운을 탈 즈음에는 뒤섞이어 가지런하지 않다. 청정지귀(淸淨至貴)의 물건에서 오예지천(汚穢至賤)의 곳에까지 이치는 없는 데가 없으니, 청정에 있어서는 이치도 청정하고, 오예에 있어서는 이치도 오예하다. 오예한 것을 이치의 본연이 아니라는 것 같음은 옳지만 드디어 오예한 물건에 이치가 없다고 함은 옳지 못하다. 대저 본연이란 것은 이치의 일(一)이요, 유행이란 것은 분(分)의 수(殊)이다. 유행의 이치를 버리고 따로 본연의 이치를 구함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이치의 선악이 있음을 가지고 이치의 본연이라 하는 것 같은 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즉 이일(理一)의 본연은 순선이지만 그것이 나타나 유행함으로써 현상의 기만수(氣萬殊)로 되면 청정과 오예의 차별이 생기므로 선악이 있게 되며, 그것은 주재로서의 이치(理)의 소이이므로 이치 역시 선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치의 본연을 가지고 선악이 있다고 해도 불가하고, 이치의 분수를 가지고 순선이라 해도 불가하다. 그러면 도대체 악(惡)은 무엇을 이름인가? 그것을 {중용}에서는 \'지나침\'(過)과 \'미치지 못함\'(不及)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자연세계에는 필연 즉 소이연으로서의 이치가 지배하는 것으로서 필연법칙일 따름이다. 그러나 인간세계에 있어서는 필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 당위의 세계 즉 소당연으로서의 이치를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 인간의 자유와 더불어 이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과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선악의 문제에 있어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선의 이념을 간직함으로 그 이념을 향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반가치적인 악에 대해서는 그 이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치판단에 있어 가치이념은 가져도 반가치이념은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선악의 기준은 다만 과(過)와 불급(不及)으로써 밖에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과와 불급은 악, 과와 불급이 없는 것은 선이다. 그러면 과와 불급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의 사욕(私欲) 즉 불교의 이른바 아집에서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무악(無我)의 경지는 그러한 과나 불급이 없으므로 순선일 수밖에 없다. 이에 율곡은 유행의 세계 즉 현실계에는 선악을 인정하지만 본체계에는 선악의 상대가 없는 것, 즉 순선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또 그의 수양론의 기저로도 되는 것인 바, 여기서 율곡은 본연지기(本然之氣)의 순선이라는 것을 상도함으로써 청탁혼합의 기질을 본연지기에로 회복할 것을 인간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기질을 교정할 것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생각건대 율곡의 \'이유선악설(理有善惡說)\'은 현상계의 상대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명을 다시 가치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는 현상적 가치의 상대성을 설파한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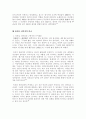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