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체제가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혁명적 운동을 했다고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순 없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것을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동학농민혁명운동’이란 정의는 어쩌면 이러한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용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인 한 가지를 빼먹고 있다. 농민들의 혁명운동을 무참히 짓 발아 버린 것이 누구인가? 중앙권력에서 민씨세력을 몰아내고 구체제를 붕괴시킨 것이 농민들이었던가? 갑오개혁이 농민들의 요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지식층들의 순수한 의도인가? 러일 전쟁(조선의 식민화를 위한 주변 강대국과의 전쟁준비)을 준비하는 일본이 조선 땅에서의 동학농민혁명운동과 같은 커다란 민란의 제 봉기를 두려워해 계획적(의도적)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한 것은 아닌가?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농민군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점은 실패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었다. 그 중 조선의 사회문화적 문제로 이 혁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부유층의 부재는 가장 큰 아쉬움이다. 농민군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는 없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 세력권을 넓히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영향에서 농민군의 힘만으로 사회정치제도를 개혁하고 나라는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단지 프랑스 대혁명이 즉시 민주공화정을 실시하였음에 비하여 동학은 군주에의 개혁까지로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혁명의 공통성에 대해 지적해 볼 수 있는 한계성을 드러낸 관점인 것이다.
동학의 12개조의 폐정개혁에 어떠한 계층에 의하여서건 진행 되어졌더라면 동학혁명은 사실상 프랑스 시민혁명의 성격과 같이 착실히 진행되어 군주제의 사회 곧 민주공화제의 사회로 급전환 되었을 것이다.
이선희의 글처럼 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조선침략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농민군을 쉽게 제거함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하며 열강을 눈치를 살폈다.
1905년 8월에 포츠머스에서 강화회담이 열렸다. 조선은 ‘우리의 주권 범위 내에 실질적으로 놓여 있어야만 하고’ 만주는 ‘어느 정도 이해범위(a sphere of interest)가 되어야 하며, 일본의 경제적 특권은 북방의 러시아 영토까지 확장되어야만 한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조선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승인을 얻었다.
일본은 영국이나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얻자 1905년 7월에 보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헤이그 밀사 후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였다. 곧 조선군대의 대부분이 해산되었다. 이후부터 조선의 반일론자들은 폭력으로 전환하였다. 소동이 확대되자 일본내각은 마침내 1909년 봄에 보호국의 간접 통치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노골적으로 합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역사상 가장 순수한 폭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혁명은 일본의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이 시작됨으로 인해 끝나버린 것이다. 지배지식자본계급층의 개인이기주의와 억압복종착취계급층의 유교적 도덕성으로 인한 순수한 복종이 충실히 혼합되어진 조선사회는 폭력이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변화혁명폭력적 대응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성공을 목전에 두고 일본군에 의해 산산조각 난다.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인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원인제공을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의 침략 아니 대륙의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의 침략에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 힘에 의해 이 혁명적 운동이 성공 못한 것을 원망해야 되고, 그 일본의 폭력을 폭력으로서 제압하지 못한 동학농민혁명의 몇 가지 한계점을 아쉬워해야 한다.
댓돌에 신발이 올라가기 전 바람에 작은 모래들이 날라 가듯 동학혁명에 참가한 농민들은 사라졌다. 후에 신발에 짓밟힌 댓돌처럼 조선은 35년 간 숨죽인다. 공주 우금치에서의 농민군의 패배는 후의 일본의 강점기 시기의 끔찍한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평등과 자유를 향한 열정을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농민군들의 패배는 이후 피지배계층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절망감으로 또는 희망을 다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시 사회 암적 존재인 지배층에 대항해 용감히 싸운 농민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더 발전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전향상 시켜야 할 것 같다.
혁명적 운동을 했다고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순 없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것을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동학농민혁명운동’이란 정의는 어쩌면 이러한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용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인 한 가지를 빼먹고 있다. 농민들의 혁명운동을 무참히 짓 발아 버린 것이 누구인가? 중앙권력에서 민씨세력을 몰아내고 구체제를 붕괴시킨 것이 농민들이었던가? 갑오개혁이 농민들의 요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지식층들의 순수한 의도인가? 러일 전쟁(조선의 식민화를 위한 주변 강대국과의 전쟁준비)을 준비하는 일본이 조선 땅에서의 동학농민혁명운동과 같은 커다란 민란의 제 봉기를 두려워해 계획적(의도적)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한 것은 아닌가?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농민군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점은 실패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었다. 그 중 조선의 사회문화적 문제로 이 혁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부유층의 부재는 가장 큰 아쉬움이다. 농민군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는 없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 세력권을 넓히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영향에서 농민군의 힘만으로 사회정치제도를 개혁하고 나라는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단지 프랑스 대혁명이 즉시 민주공화정을 실시하였음에 비하여 동학은 군주에의 개혁까지로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혁명의 공통성에 대해 지적해 볼 수 있는 한계성을 드러낸 관점인 것이다.
동학의 12개조의 폐정개혁에 어떠한 계층에 의하여서건 진행 되어졌더라면 동학혁명은 사실상 프랑스 시민혁명의 성격과 같이 착실히 진행되어 군주제의 사회 곧 민주공화제의 사회로 급전환 되었을 것이다.
이선희의 글처럼 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조선침략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농민군을 쉽게 제거함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하며 열강을 눈치를 살폈다.
1905년 8월에 포츠머스에서 강화회담이 열렸다. 조선은 ‘우리의 주권 범위 내에 실질적으로 놓여 있어야만 하고’ 만주는 ‘어느 정도 이해범위(a sphere of interest)가 되어야 하며, 일본의 경제적 특권은 북방의 러시아 영토까지 확장되어야만 한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조선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승인을 얻었다.
일본은 영국이나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얻자 1905년 7월에 보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헤이그 밀사 후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였다. 곧 조선군대의 대부분이 해산되었다. 이후부터 조선의 반일론자들은 폭력으로 전환하였다. 소동이 확대되자 일본내각은 마침내 1909년 봄에 보호국의 간접 통치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노골적으로 합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역사상 가장 순수한 폭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혁명은 일본의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이 시작됨으로 인해 끝나버린 것이다. 지배지식자본계급층의 개인이기주의와 억압복종착취계급층의 유교적 도덕성으로 인한 순수한 복종이 충실히 혼합되어진 조선사회는 폭력이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변화혁명폭력적 대응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성공을 목전에 두고 일본군에 의해 산산조각 난다.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인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원인제공을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의 침략 아니 대륙의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의 침략에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 힘에 의해 이 혁명적 운동이 성공 못한 것을 원망해야 되고, 그 일본의 폭력을 폭력으로서 제압하지 못한 동학농민혁명의 몇 가지 한계점을 아쉬워해야 한다.
댓돌에 신발이 올라가기 전 바람에 작은 모래들이 날라 가듯 동학혁명에 참가한 농민들은 사라졌다. 후에 신발에 짓밟힌 댓돌처럼 조선은 35년 간 숨죽인다. 공주 우금치에서의 농민군의 패배는 후의 일본의 강점기 시기의 끔찍한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평등과 자유를 향한 열정을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농민군들의 패배는 이후 피지배계층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절망감으로 또는 희망을 다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시 사회 암적 존재인 지배층에 대항해 용감히 싸운 농민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더 발전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전향상 시켜야 할 것 같다.
추천자료
 동학발생의 사회적배경 - 대한 제국 시기의 개혁,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주권의 상실, 동학...
동학발생의 사회적배경 - 대한 제국 시기의 개혁,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주권의 상실, 동학... 동학에 대해서
동학에 대해서 대한제국기 민중운동
대한제국기 민중운동 갑오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갑오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1894년 농민전쟁(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894년 농민전쟁(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갑오농민개혁에 대하여
갑오농민개혁에 대하여 [과외]중학 국사 중3-국사 5 근대국가운동
[과외]중학 국사 중3-국사 5 근대국가운동 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 운동의 전개
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 운동의 전개 사회주의 운동조선 공산당, 민족해방 운동을 전개하다
사회주의 운동조선 공산당, 민족해방 운동을 전개하다 갑오농민전쟁의 발원지 정읍
갑오농민전쟁의 발원지 정읍 24. 근대 국가 수립 운동
24.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소설『녹두장군(綠豆將軍)』을 통해 살펴본 동학의 사상과 사회변혁에의 의지 (송기숙 저)
소설『녹두장군(綠豆將軍)』을 통해 살펴본 동학의 사상과 사회변혁에의 의지 (송기숙 저) 신동엽(申東曄)의 민족정신과 『금강』을 통해 본 동학사상의 내포
신동엽(申東曄)의 민족정신과 『금강』을 통해 본 동학사상의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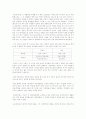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