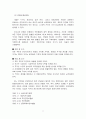목차
1. 정신보건법의 소개 1
2.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6
2.1. 정신보건법의 정신보건복지법화 6
2.2.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 정의의 문제 7
2.3. 강제입원의 사례를 통해 본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8
2.4.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인권침해 15
3. 정신보건법의 개선안 21
3.1. 정신보건법의 정신보건복지법화 21
3.2.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대한 개선방안 22
3.3. 강제입원의 사례를 통해 본 정신보건법의 개선방향 23
3.4. 인권침해 개선방안 24
4. 결론 25
2.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6
2.1. 정신보건법의 정신보건복지법화 6
2.2.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 정의의 문제 7
2.3. 강제입원의 사례를 통해 본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8
2.4.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인권침해 15
3. 정신보건법의 개선안 21
3.1. 정신보건법의 정신보건복지법화 21
3.2.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대한 개선방안 22
3.3. 강제입원의 사례를 통해 본 정신보건법의 개선방향 23
3.4. 인권침해 개선방안 24
4. 결론 25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1)의 소개
1.1 사회와 정신보건
몸이 아픈 것과 정신이 아픈 것과 다르다. 대체로 몸이 아픈 것은 쉽게 드러나지만 정신이 아픈 것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듯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눈을 보면 정신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데 이것은 군대고참이나 점쟁이가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정신건강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심리학, 의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서 임상경험을 통해 개발되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듯 객관적(?)인 정신건강은 의사나 심리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진단척도가 개발되기 이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소위 ‘미친 사람’, ‘바보’, ‘또라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이하 정신질환자)으로 사회적 진단(낙인)을 받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비정상이라고 불리며 건강한 사회에서 왕따(격리•수용) 당하였으며 때로는 지역사회가 이들을 떠맡기도 하였다. 가령, 필자가 사는 농촌마을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종종 보이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도시의 방랑자(?)보다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이들을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도 없게 되었으며 이들을 정신질환자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 국가적으로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세상은 각박하다. 이제는 정신질환자조차 가만 두질 않는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신의 이득을 최대로 하기 위한 사람들의 고군분투 행위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개인주의화, 산업화, 도시화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급격히 일어났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간 연대감은 약해지고 공동체는 붕괴되어가며 인심은 날로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쌓여만 간다. 사회병리적 시대에서 정신질환자의 증가와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이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가 된 것이다.
1.1 사회와 정신보건
몸이 아픈 것과 정신이 아픈 것과 다르다. 대체로 몸이 아픈 것은 쉽게 드러나지만 정신이 아픈 것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듯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눈을 보면 정신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데 이것은 군대고참이나 점쟁이가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정신건강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심리학, 의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서 임상경험을 통해 개발되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듯 객관적(?)인 정신건강은 의사나 심리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진단척도가 개발되기 이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소위 ‘미친 사람’, ‘바보’, ‘또라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이하 정신질환자)으로 사회적 진단(낙인)을 받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비정상이라고 불리며 건강한 사회에서 왕따(격리•수용) 당하였으며 때로는 지역사회가 이들을 떠맡기도 하였다. 가령, 필자가 사는 농촌마을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종종 보이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도시의 방랑자(?)보다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이들을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도 없게 되었으며 이들을 정신질환자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 국가적으로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세상은 각박하다. 이제는 정신질환자조차 가만 두질 않는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신의 이득을 최대로 하기 위한 사람들의 고군분투 행위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개인주의화, 산업화, 도시화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급격히 일어났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간 연대감은 약해지고 공동체는 붕괴되어가며 인심은 날로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쌓여만 간다. 사회병리적 시대에서 정신질환자의 증가와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이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가 된 것이다.
추천자료
 낮 병원 실습 소감문(정신과)
낮 병원 실습 소감문(정신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재활의료, 일반의료, 직무표준화, 병원견학(기관견학) 보고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재활의료, 일반의료, 직무표준화, 병원견학(기관견학) 보고서 정신보건과 자원봉사활동(정신보건센터, 낮병원,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역할, 과제)...
정신보건과 자원봉사활동(정신보건센터, 낮병원,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역할, 과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정신장애인의 정신과 병원 내에서의 사례관리(낮병원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신과 병원 내에서의 사례관리(낮병원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정의, 유형,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선...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정의, 유형,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선... 정신보건과 ‘곽호순병원’ 기관방문
정신보건과 ‘곽호순병원’ 기관방문 [사회복지와 인권] 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 (이슈, 국내법, 국제법, 해외사례, 문제점, 해결...
[사회복지와 인권] 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 (이슈, 국내법, 국제법, 해외사례, 문제점, 해결... 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ppt
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ppt 병원,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요양시설, 중독통합관리센터,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병원,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요양시설, 중독통합관리센터, 청소년사회복귀시설,... 장애인고용과 장애인복지정책문제점 개선방안(정신장애인인권문제, 장애인복지정책현황, 장애...
장애인고용과 장애인복지정책문제점 개선방안(정신장애인인권문제, 장애인복지정책현황, 장애... 장애인 인권이 가장 침해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복지적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
장애인 인권이 가장 침해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복지적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 간호,정신 간호, 요양 병원, 임상 실습 일지
간호,정신 간호, 요양 병원, 임상 실습 일지 정신장애인에 관한 영화를 하나 선택(아이앰샘, 샤인,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뷰티풀 마...
정신장애인에 관한 영화를 하나 선택(아이앰샘, 샤인,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뷰티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