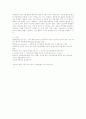목차
1.수분의 이송
2.영양물질의 이송
2.영양물질의 이송
본문내용
수압에 의해 밀려나오는 체관액을 섭취한다. 종종 이러한 액은 곧바로 몸을 통과해서 진딧물의 꽁무니에 방울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개미가 좋아하는 ‘감로 honeydew'이다. 식물생리학자들은 체관액을 연구하는 데 진딧물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1950년대에 두 명의 곤충생리학자가 개발한 것으로, 진딧물이 체관을 뚫으며 이산화탄소로 이들을 마취시키고 주둥이를 잘라 여기서 스며나오는 액을 분석한다. 두 연구자는 진딧물의 영양분에 흥미를 가졌지만 이 방법은 식물생리학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체관액은 밀도가 꽤 높은 액체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식물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때 그렇다. 체관액은 체관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여, 시간당 1m정도의 속도까지 낼 수 있다. 체관액의 구성은 90%가 설탕이고 나머지는 그 밖의 당류, 호르몬, 아미노산 등이다. 식물에서 이러한 물질의 이동을 특별히 전류 translocation라고 한다.
2.공급원에서 수용부로의 흐름
체관액은 식물의 필요에 따라 관다발에서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처음에는 발달하고 있는 엽원기 leaf primordium로 이동하며, 잎이 성숙해서 광합성을 시작하면 잎에서 나와 뿌리, 성숙하고 있는 과일이나 씨, 정단분열조직 apical meristem 또는 저장줄기나 저장뿌리로 이동한다. 이렇게 사용 또는 저장되기 위해 양분의 이동하는 목적지를 수용부(sink: 공학에서의 heat sink에서 온 말)라고 하며, 광합성을 하는 곳이든 양분이 저장된 곳이든 이동하는 양분이 기원된 곳을 공급원이라고 하다. 따라서 체관액은 공급원에서 수용부로 이동하며 이 두 부분 모두에 능동수송이 필요하다.
체관부에서 양분의 이동은 보통 농도기울기에 역행해서 일어난다. 이를테면 잎세포에서 당은 잎세포보다 당의 농도가 훨씬 높은 체관부 요소로 들어가고 또한 체관부의 당은 농도가 훨씬 더 높은 저장세포로 들어간다. 이렇게 물질이 농도기울기에 거슬러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보통 ATP가 쓰인다. 보통 체관에서 수송되는 주요 당은 설탕인데, 설탕은 수송된 뒤 녹말로 바뀌어 저장되었다가 다시 설탕으로 가수분해되어 체관에서 수송된다. 녹말 분자는 크기 때문에 작고 유동성이 큰 설탕 분자보다 한 곳에 머무르려는 성질이 강하다.
3.압류설
공급원에서 체관으로 양분을 적재하는 데, 수용부에서 하적되는 데 모두 능동수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양분의 흐름이 일어나는 것일까? 체관액의 흐름에 대한 많은 가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나온 ‘압류설 pressure flow hypothesis’이다. 1927년 독일의 생리학자 Ernst Munch가 제안했던 이 가설은 영양분의 능동수송 때문에 생기는 체관부와 물관부 사이의 수분퍼텐셜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당이 체관으로 능동수송되면 체관부는 인접한 물관부보다 수분퍼텐셜이 매우 낮아져서 수분퍼텐셜 기울기에 따라 물관부에서 체관부로 물이 이동한다. 이렇게 물이 밀려들면 체관의 수압이 높아져 물과 양분으로 이루어진 체관액에 힘이 가해지므로 체관액이 이동하게 된다. 수용부에서는 당이 능동수송으로 하적되기 때문에, 용질을 잃은 체관부의 수분퍼텐셜이 다시 높아져서 근처에 있는 물관부로 물이 되돌아간다.
따라서 식물체 안에서 물은 공급원에서는 물관부에서 체관부로, 수용부에서는 체관부에서 물관부로 순환한다. 체관 자체는 수송에 있어서 수동적일지 모르지만 반세포 companion cell와 체관부 유조직세포들은 능동수송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양분이 적재되어야 할지 하적되어야 할지를 결정해 준다.
체관액은 밀도가 꽤 높은 액체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식물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때 그렇다. 체관액은 체관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여, 시간당 1m정도의 속도까지 낼 수 있다. 체관액의 구성은 90%가 설탕이고 나머지는 그 밖의 당류, 호르몬, 아미노산 등이다. 식물에서 이러한 물질의 이동을 특별히 전류 translocation라고 한다.
2.공급원에서 수용부로의 흐름
체관액은 식물의 필요에 따라 관다발에서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처음에는 발달하고 있는 엽원기 leaf primordium로 이동하며, 잎이 성숙해서 광합성을 시작하면 잎에서 나와 뿌리, 성숙하고 있는 과일이나 씨, 정단분열조직 apical meristem 또는 저장줄기나 저장뿌리로 이동한다. 이렇게 사용 또는 저장되기 위해 양분의 이동하는 목적지를 수용부(sink: 공학에서의 heat sink에서 온 말)라고 하며, 광합성을 하는 곳이든 양분이 저장된 곳이든 이동하는 양분이 기원된 곳을 공급원이라고 하다. 따라서 체관액은 공급원에서 수용부로 이동하며 이 두 부분 모두에 능동수송이 필요하다.
체관부에서 양분의 이동은 보통 농도기울기에 역행해서 일어난다. 이를테면 잎세포에서 당은 잎세포보다 당의 농도가 훨씬 높은 체관부 요소로 들어가고 또한 체관부의 당은 농도가 훨씬 더 높은 저장세포로 들어간다. 이렇게 물질이 농도기울기에 거슬러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보통 ATP가 쓰인다. 보통 체관에서 수송되는 주요 당은 설탕인데, 설탕은 수송된 뒤 녹말로 바뀌어 저장되었다가 다시 설탕으로 가수분해되어 체관에서 수송된다. 녹말 분자는 크기 때문에 작고 유동성이 큰 설탕 분자보다 한 곳에 머무르려는 성질이 강하다.
3.압류설
공급원에서 체관으로 양분을 적재하는 데, 수용부에서 하적되는 데 모두 능동수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양분의 흐름이 일어나는 것일까? 체관액의 흐름에 대한 많은 가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나온 ‘압류설 pressure flow hypothesis’이다. 1927년 독일의 생리학자 Ernst Munch가 제안했던 이 가설은 영양분의 능동수송 때문에 생기는 체관부와 물관부 사이의 수분퍼텐셜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당이 체관으로 능동수송되면 체관부는 인접한 물관부보다 수분퍼텐셜이 매우 낮아져서 수분퍼텐셜 기울기에 따라 물관부에서 체관부로 물이 이동한다. 이렇게 물이 밀려들면 체관의 수압이 높아져 물과 양분으로 이루어진 체관액에 힘이 가해지므로 체관액이 이동하게 된다. 수용부에서는 당이 능동수송으로 하적되기 때문에, 용질을 잃은 체관부의 수분퍼텐셜이 다시 높아져서 근처에 있는 물관부로 물이 되돌아간다.
따라서 식물체 안에서 물은 공급원에서는 물관부에서 체관부로, 수용부에서는 체관부에서 물관부로 순환한다. 체관 자체는 수송에 있어서 수동적일지 모르지만 반세포 companion cell와 체관부 유조직세포들은 능동수송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양분이 적재되어야 할지 하적되어야 할지를 결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