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한국땅에 나쁜 사마리아인들
*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도전
* 세계화의 폐해
* 현대 경제학과의 관계
*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라
* 한국땅에 나쁜 사마리아인들
*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도전
* 세계화의 폐해
* 현대 경제학과의 관계
*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라
본문내용
총생산대비 1% 수준으로 예산 흑자를 유지하라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요구에 서명했던 정책들 탓에 말이다.
뇌물수수는 부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 효율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즉, 소득분배의 문제일 뿐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돈이 대부분 국내에 남아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했다고 한다. 반명 자이레의 경우는 부패한 돈이 대부분 국외로 빠져나가서 이 나라의 빈곤의 핵심적인 사유가 되었다. 경제학계에서는 가장 많은 뇌물을 내 놓을 의사가 있는 기업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라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이렇게 말했다.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엄격하고 지나치게 집중화된 그리고 부정직한 관료들이 존재하는 사회보다 더 나쁜 사회가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엄격하고 지나치게 집중화된 그리고 정직한 관료들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미끼는 없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한 경우 어김 없이 그 변명 거리로 부정부패와 취약한 민주주의 꼽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그 대안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시장 기능을 확대 도입할 것을 방안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부정부패는 대개 시장의 힘이 작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조치들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1세기 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양인들의 눈을 상기시켜보자. 일본은 근면하지 않고 게을렀으며 미래에 대한 생각없이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저분한 진흙집에 사는 그보다 못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까지 기록에 남아있다. 그보다 반세 전의 독일인들은 영국인들의 관점에서 나태하고, 협동심도 없으며, 이성적이지 못하고 도둑질마저 일삼는 자제심 없는 태평한 종족들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지금의 아프리카인들을 바라보는 잘 사는 나라들의 시선과 똑같을까? 그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간혹 사용하는 못사는 나라들에 대한 잣대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 특정한 문화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발전은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생각해야만 세상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따온 것이 이 책의 제목이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이었으나, 성경에서는 노상강도와 약탈을 당한 한 남자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사건이 인용되었다. 이 책을 읽노라면 결국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사마리아인들 속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고자하는 간절한 노력이 보인다. 정말로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 같은 정책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옳다고 확신하는 이데올로그들이다. 앞서 언급했듯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이 책은 그냥 오늘날의 현상을 노골적으로 비판만 하기 위해서 써진 글이라고 볼 수 없다. 저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때려잡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이단적인 정책들을 용인하는 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나쁜 사마리아인 국가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생의 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뇌물수수는 부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 효율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즉, 소득분배의 문제일 뿐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돈이 대부분 국내에 남아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했다고 한다. 반명 자이레의 경우는 부패한 돈이 대부분 국외로 빠져나가서 이 나라의 빈곤의 핵심적인 사유가 되었다. 경제학계에서는 가장 많은 뇌물을 내 놓을 의사가 있는 기업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라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이렇게 말했다.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엄격하고 지나치게 집중화된 그리고 부정직한 관료들이 존재하는 사회보다 더 나쁜 사회가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엄격하고 지나치게 집중화된 그리고 정직한 관료들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미끼는 없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한 경우 어김 없이 그 변명 거리로 부정부패와 취약한 민주주의 꼽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그 대안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시장 기능을 확대 도입할 것을 방안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부정부패는 대개 시장의 힘이 작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조치들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1세기 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양인들의 눈을 상기시켜보자. 일본은 근면하지 않고 게을렀으며 미래에 대한 생각없이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저분한 진흙집에 사는 그보다 못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까지 기록에 남아있다. 그보다 반세 전의 독일인들은 영국인들의 관점에서 나태하고, 협동심도 없으며, 이성적이지 못하고 도둑질마저 일삼는 자제심 없는 태평한 종족들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지금의 아프리카인들을 바라보는 잘 사는 나라들의 시선과 똑같을까? 그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간혹 사용하는 못사는 나라들에 대한 잣대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 특정한 문화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발전은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생각해야만 세상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따온 것이 이 책의 제목이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이었으나, 성경에서는 노상강도와 약탈을 당한 한 남자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사건이 인용되었다. 이 책을 읽노라면 결국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사마리아인들 속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고자하는 간절한 노력이 보인다. 정말로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 같은 정책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옳다고 확신하는 이데올로그들이다. 앞서 언급했듯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이 책은 그냥 오늘날의 현상을 노골적으로 비판만 하기 위해서 써진 글이라고 볼 수 없다. 저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때려잡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이단적인 정책들을 용인하는 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나쁜 사마리아인 국가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생의 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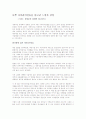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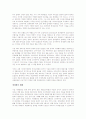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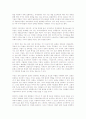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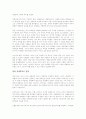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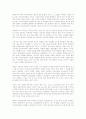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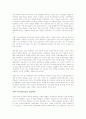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