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說
1. 연구주제
2. 문제의 제기
3. 논의의 배경 : 임오군란의 전후사정
Ⅱ. 임오군란
1. 의의
2. 배경과 원인: 서울의 사회경제구조와 하층민, 청·러의 이리분쟁
3. 전개과정
4. 결과: 외세의 개입과 운동의 좌절, 청의 대조선정책 변화와 영향력 확대
Ⅲ. 조선의 공법질서로의 편입
1. 조선과 서양 공법체계, 그 체계로의 편입
2. 중국의 새로운 조선정책: 조선책략
3.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Ⅳ. 結語
Ⅴ. 參考文獻
1. 연구주제
2. 문제의 제기
3. 논의의 배경 : 임오군란의 전후사정
Ⅱ. 임오군란
1. 의의
2. 배경과 원인: 서울의 사회경제구조와 하층민, 청·러의 이리분쟁
3. 전개과정
4. 결과: 외세의 개입과 운동의 좌절, 청의 대조선정책 변화와 영향력 확대
Ⅲ. 조선의 공법질서로의 편입
1. 조선과 서양 공법체계, 그 체계로의 편입
2. 중국의 새로운 조선정책: 조선책략
3.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Ⅳ. 結語
Ⅴ. 參考文獻
본문내용
인정, 양국에서의 자유로운 상행위의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서양 국제법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른 나라들과 평등하고 자주적인 조선을 만들기 위해 출발한 조선의 무역장정체결은 오히려 조선의 자주를 옭죄는 멍에가 되어버렸다.
Ⅳ. 結語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오군란은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충돌한 19세기에 조선이 기존에 속해있던 국제정치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틀이 뒤틀리는 속에서 서구문명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로부터 서양의 공법체계 속으로 편입할 것인가 청나라의 속방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당시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청의 대결 그리고 러시아의 존재와 서구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상당히 복잡한 문제의 중첩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군란은 하급군인의 급료의 지불을 연체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지만 그 속에는 조선이 개항을 하고 점차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겪어야 했던 열강의 착취와 조선내부의 사회·경제적인 모순이 들어앉아 있었다. 임오군란의 과정에서 고종이 권력을 대원군에게 이양함으로써 기존에 수행하였던 개혁·개화정책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고종의 배후세력이었던 명성황후와 민씨 척족들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시위세력이 대원군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원군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시 집권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개혁시도들이 무산되었다는 점에서는 일견 보수파와 개화파의 대립으로 평가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대원군의 집권으로 개화파의 개혁이 무산되고 청나라가 조선의 실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 아래에서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은 싹트기 시작했다.
임오군란과 그 사후처리로 인한 조선의 국내정치적 지각변동과 함께 조선의 운명을 쥐고 흔들게 될 국제정치적 사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오군란은 조선에 대한 청의 입장변화와 맞물려 군란의 진압에서부터 일본과의 사후교섭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청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게 되었다. 유구병합, 이리분쟁으로부터 서양 공법질서에서 국경과 조약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한 청은 조선을 서양식의 공법질서 아래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임오군란의 종료 후에 조선과 청 사이에 맺어진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은 양국이 최초로 맺은 근대적 의미의 통상장정으로 구미제국과의 불평등 관계에서 허덕이던 중국이 경제적 진출을 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명분상 종주권을 실질적으로 조선에 적용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성공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선과 청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 장정을 기본 틀로 하여 다른 조약국들 또한 같은 내용의 조약을 맺음으로써 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조선의 국제정치질서는 변화되었다.
조선은 기존의 사대관계로부터 벗어나 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주하는 독립국으로 일본이나 서구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의 보호를 받는 속방으로 양절체제를 구사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고 실력을 쌓으려던 시도를 하였지만 이것은 결국 조선을 국제공법질서에로 편입시켜 세계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선을 나눠먹으려는 각축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조선의 자주는 요원해지게 되었다.
임오군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사를 통해서 복잡다단한 한말의 전후사정에 대해서 맥을 짚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배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참고문헌들을 접하면서 국내정치상황과 국제정치상황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단지 한국사, 세계사가 아니라 한국정치사로서의 세계정치사, 세계정치사로서의 한국정치사라는 측면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의 인식의 지평이 조금 더 확장되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넓어진 듯하다.
Ⅴ. 參考文獻
황준헌, 조일문 역, 『조선책략』,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82.
김용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서울: 도서출판 원, 2004.
권석봉, 『청말 대조선정책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86.
김용구·하영선 공편, 『한국외교사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외교사Ⅰ』, 서울: 집문당, 1993.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 공법』, 서울: 나남출판, 1997.
H. J. W. Foster, \"His Fight to hold Corea\", 『Memoirs of the Viceroy: Li Hung Chang”, London: Constable and Company, 1913.
Ⅳ. 結語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오군란은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충돌한 19세기에 조선이 기존에 속해있던 국제정치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틀이 뒤틀리는 속에서 서구문명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로부터 서양의 공법체계 속으로 편입할 것인가 청나라의 속방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당시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청의 대결 그리고 러시아의 존재와 서구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상당히 복잡한 문제의 중첩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군란은 하급군인의 급료의 지불을 연체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지만 그 속에는 조선이 개항을 하고 점차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겪어야 했던 열강의 착취와 조선내부의 사회·경제적인 모순이 들어앉아 있었다. 임오군란의 과정에서 고종이 권력을 대원군에게 이양함으로써 기존에 수행하였던 개혁·개화정책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고종의 배후세력이었던 명성황후와 민씨 척족들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시위세력이 대원군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원군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시 집권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개혁시도들이 무산되었다는 점에서는 일견 보수파와 개화파의 대립으로 평가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대원군의 집권으로 개화파의 개혁이 무산되고 청나라가 조선의 실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 아래에서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은 싹트기 시작했다.
임오군란과 그 사후처리로 인한 조선의 국내정치적 지각변동과 함께 조선의 운명을 쥐고 흔들게 될 국제정치적 사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오군란은 조선에 대한 청의 입장변화와 맞물려 군란의 진압에서부터 일본과의 사후교섭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청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게 되었다. 유구병합, 이리분쟁으로부터 서양 공법질서에서 국경과 조약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한 청은 조선을 서양식의 공법질서 아래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임오군란의 종료 후에 조선과 청 사이에 맺어진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은 양국이 최초로 맺은 근대적 의미의 통상장정으로 구미제국과의 불평등 관계에서 허덕이던 중국이 경제적 진출을 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명분상 종주권을 실질적으로 조선에 적용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성공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선과 청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 장정을 기본 틀로 하여 다른 조약국들 또한 같은 내용의 조약을 맺음으로써 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조선의 국제정치질서는 변화되었다.
조선은 기존의 사대관계로부터 벗어나 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주하는 독립국으로 일본이나 서구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의 보호를 받는 속방으로 양절체제를 구사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고 실력을 쌓으려던 시도를 하였지만 이것은 결국 조선을 국제공법질서에로 편입시켜 세계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선을 나눠먹으려는 각축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조선의 자주는 요원해지게 되었다.
임오군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사를 통해서 복잡다단한 한말의 전후사정에 대해서 맥을 짚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배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참고문헌들을 접하면서 국내정치상황과 국제정치상황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단지 한국사, 세계사가 아니라 한국정치사로서의 세계정치사, 세계정치사로서의 한국정치사라는 측면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의 인식의 지평이 조금 더 확장되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넓어진 듯하다.
Ⅴ. 參考文獻
황준헌, 조일문 역, 『조선책략』,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82.
김용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서울: 도서출판 원, 2004.
권석봉, 『청말 대조선정책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86.
김용구·하영선 공편, 『한국외교사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외교사Ⅰ』, 서울: 집문당, 1993.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 공법』, 서울: 나남출판, 1997.
H. J. W. Foster, \"His Fight to hold Corea\", 『Memoirs of the Viceroy: Li Hung Chang”, London: Constable and Company, 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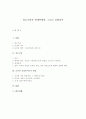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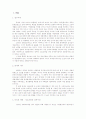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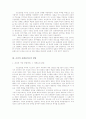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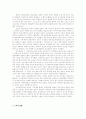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