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목차
Ⅰ 시작하는 글 : 주제 선정 이유와 국어교육과의 관계
Ⅱ 조선 사람의 양생문화와 현대 사회의 웰빙(Well Being) / 신민섭
1. 서 론
2. 우리의 고전 설화 속에 등장하는 양생 문화
3. 우리나라의 단학의 역사
4. 우리 민중들의 웰빙(Well Being) 그 구체적인 방법
5. 결 론
Ⅲ 조선 사람의 임신 출산 문화 / 안창화
1. 서 론
2. 산 속
3. 결 론
Ⅳ 문학작품과 의학서적에 드러난 조선 사람의 성문화 / 김호찬
1. 서론
2. 의학서적에 나타난 성생활의 모습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성생활의 모습
4.. 결론
Ⅴ 조선 시대 장례에 쓰인 노래와 금기어 / 조윤용
1. 상례의 전통
2.전통상장례 절차
3. 상장례 민속놀이
4. 상장례 금기
Ⅵ 조선 사람의 질병과 의료 문화 / 조원정
Ⅰ. 서론
Ⅱ. 조선시대 질병과 치병
1. 조선시대 질병의 이름
2. 조선시대의 3대 악병
3. 조선시대 역병 대처 방법
Ⅲ. 질병과 의례문화
-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병방법
1. 질병의 종류와 이해
2. 치병의례의 구조
Ⅶ.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역사
1. 삼국시대 이전의 보건의료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보건의료
3. 고려시대의 보건의료
4. 조선시대의 보건의료
5. 조선 말 서구 보건의료의 도입
6. 일제하의 보건의료
7. 해방이후의 보건의료
Ⅴ. 결론
Ⅱ 조선 사람의 양생문화와 현대 사회의 웰빙(Well Being) / 신민섭
1. 서 론
2. 우리의 고전 설화 속에 등장하는 양생 문화
3. 우리나라의 단학의 역사
4. 우리 민중들의 웰빙(Well Being) 그 구체적인 방법
5. 결 론
Ⅲ 조선 사람의 임신 출산 문화 / 안창화
1. 서 론
2. 산 속
3. 결 론
Ⅳ 문학작품과 의학서적에 드러난 조선 사람의 성문화 / 김호찬
1. 서론
2. 의학서적에 나타난 성생활의 모습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성생활의 모습
4.. 결론
Ⅴ 조선 시대 장례에 쓰인 노래와 금기어 / 조윤용
1. 상례의 전통
2.전통상장례 절차
3. 상장례 민속놀이
4. 상장례 금기
Ⅵ 조선 사람의 질병과 의료 문화 / 조원정
Ⅰ. 서론
Ⅱ. 조선시대 질병과 치병
1. 조선시대 질병의 이름
2. 조선시대의 3대 악병
3. 조선시대 역병 대처 방법
Ⅲ. 질병과 의례문화
-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병방법
1. 질병의 종류와 이해
2. 치병의례의 구조
Ⅶ.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역사
1. 삼국시대 이전의 보건의료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보건의료
3. 고려시대의 보건의료
4. 조선시대의 보건의료
5. 조선 말 서구 보건의료의 도입
6. 일제하의 보건의료
7. 해방이후의 보건의료
Ⅴ. 결론
본문내용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하는 것은 곧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으려고 정액을 지나치게 허비하는 것도 오히려 옳지 않거늘, 하물며 공연히 이를 허비해 버리겠는가’ 라고 경고한다.
조선 중기 이후의 방중술은 『의방유취』의 전통 중에서 절욕을 위주로 하는 방중술을 이어받았다. 광해군 때 이정창은 『수양총서류집』에서 「기욕(嗜慾)을 반성함」이라는 편을 두어 방중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제목처럼 성욕을 끊는 방중술 내용의 중심이다. 그는 남녀의 화합이 천지 만물화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정하면서 지나친 성욕은 원기를 갉아먹어 생명을 해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이정창은 성교 횟수에서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20세 이전은 이틀에 한 번, 20~30세는 사흘에 한 번, 30~40세는 열흘에 한 번, 40~50세는 7개월에 한 번, 60세를 넘기면 한 번도 하지 말라고 권한다.
사정을 줄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입방 금기 또한 『의방유취』의 절욕 방중술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술에 취해서 입방하지 말고, 화가 난 채 입방하지 말며, 과식한 후 입방하지 말고, 화가 난 채 입방하지 말며, 과식한 후 입방하지 말고, 크게 춥거나 덥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뇌성이 치거나 무지개가 뜰 때 입방하지 말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의학에서는 정은 타고날 때부터 한정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을 아끼라고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색욕을 멀리함으로써 정의 소모를 막는 것을 강조하였다.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성생활의 모습
1) 신화에 나타난 성의 표현양상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의 흔적은 대개 영웅의 출생과 관련한 내요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내용조차도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암시만 보일 뿐이다. 특히 단군이나 주몽신화 등의 북방계 신화를 제외하고는 영웅의 부계(父系)가 하늘 등과 같이 막연한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화에서 영웅의 출생과 관련한 임신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단군신화를 보면 이 대목은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단군신화를 제외하고는 대개 임신과정이나 탄생담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다.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
이러한 기록은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민족이 천손하강형 신화를 원초적으로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단군의 출생은 신이함이 없이 웅녀와 환웅이라는 남녀의 결합에 근거하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의 남녀는 인간의 남녀가 아니라 신과 변신한 곰과의 특이한 관계라는 점이다. 이러니 관계는 신화적인 관점에서 신과 신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하늘과 땅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단군신화에서 성의 표현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남녀로 상징되는 환웅과 웅녀의 관계를 통해 인간적인 잉태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때의 잉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을 잉태했다는 측면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인간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신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화에서 부모의 계열이 나타나는 경우는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로 국한된다. 이외의 신화들은 부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탈해와 같이 배를 타고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의 성적 관련이 없이 출현하는 예는 신화로써의 신성함을 강조적으로 부여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신화에서의 성은 인간적인 탄생과정에서 보여지는 성의 결합형태를 드러내는 대신에 신비한 출생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2) 전설에서 성의 표현
전설에서 성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은 <달래나보지>와 <홍수설화>계열의 이야기군이다. 이들은 근친상간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전자는 성욕을 후자는 자손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달래나보지> 형태는 크게 고개와 강을 그 증거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남매간이다. 특히 줄거리 상에서 남자가 여자 동생(혹은 누나)에게 성욕을 품게 만드는 계기가 물과 관련을 맺고 있어 주목된다. 그것은 여자가 옷차림을 변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만, 원초적으로는 생명의 잉태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규범에 의해 장애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남자의 자살이나 혹은 신(腎)을 돌로 찍어대는 비극으로 유도하게 만들었다. 충주의 달래강에 대한 두 가지 전설의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월 달래강이 있거든. 강이, 왜 달래강이냐 이카거든. 달래강이냐?
누이하고 동생하고 옷을 벗고 내를, 인제 강을 건네야 된다 마라. 강을 건넬라 카이 물이 많거든. 물이 많애 가이고 물을 건넬 수 가 없은께 서로 인제 옷을 홀딱 벗고 건넸단 마라. 건너이께, 누는 앞에 건네가고 동상은 뒤에 건네 오는데 옷을 벗고 동상이 그 참말로 낭심이 일어 났단 말이라. 응, 낭심이. 신이 일어난께 그 누이를 보고 동생이 누이를 보고 음양이 동하니 그 기맥한 일 아이라? 그린께 그 인제 동생이 이래 건네가미,
“누이는 뒤에, 누야는 누, 누 누나는 뒤에서 건너 오고 나는 앞에서 먼저 건너갈 것이니께 누는 앞에 건너 오라.”고 이칸께네,
“야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크미,
“왜 그래 내빼나?”
“난 같이, 먼저 건네 가겠다.”고 이카민서 건너 갔다 마라.
강이 널러여(넓어여), 달래강이. 그기 충주 단월강인데. 그런데, 그래 먼저 건너가 가이고 저 갱빈에 고만 갱빈 사장에 올라 가서 갱빈을 건너 가만 그 돌 올라 가는데 돌 서더리(모서리)가 있거든. 돌 서더리다가, 바우다가 고만 낭심을 갖다 놓고 찌었어. ‘요놈의 암만 음양지가 죄가 없다 카지마는 누이 동상간에, 으? 남매간에 이러 행동이 나가 음양이 동하니 이건 나도서는(놓아 두어서는) 안된께, 이거 찧고 내가 죽을
조선 중기 이후의 방중술은 『의방유취』의 전통 중에서 절욕을 위주로 하는 방중술을 이어받았다. 광해군 때 이정창은 『수양총서류집』에서 「기욕(嗜慾)을 반성함」이라는 편을 두어 방중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제목처럼 성욕을 끊는 방중술 내용의 중심이다. 그는 남녀의 화합이 천지 만물화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정하면서 지나친 성욕은 원기를 갉아먹어 생명을 해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이정창은 성교 횟수에서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20세 이전은 이틀에 한 번, 20~30세는 사흘에 한 번, 30~40세는 열흘에 한 번, 40~50세는 7개월에 한 번, 60세를 넘기면 한 번도 하지 말라고 권한다.
사정을 줄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입방 금기 또한 『의방유취』의 절욕 방중술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술에 취해서 입방하지 말고, 화가 난 채 입방하지 말며, 과식한 후 입방하지 말고, 화가 난 채 입방하지 말며, 과식한 후 입방하지 말고, 크게 춥거나 덥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뇌성이 치거나 무지개가 뜰 때 입방하지 말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의학에서는 정은 타고날 때부터 한정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을 아끼라고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색욕을 멀리함으로써 정의 소모를 막는 것을 강조하였다.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성생활의 모습
1) 신화에 나타난 성의 표현양상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의 흔적은 대개 영웅의 출생과 관련한 내요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내용조차도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암시만 보일 뿐이다. 특히 단군이나 주몽신화 등의 북방계 신화를 제외하고는 영웅의 부계(父系)가 하늘 등과 같이 막연한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화에서 영웅의 출생과 관련한 임신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단군신화를 보면 이 대목은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단군신화를 제외하고는 대개 임신과정이나 탄생담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다.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
이러한 기록은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민족이 천손하강형 신화를 원초적으로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단군의 출생은 신이함이 없이 웅녀와 환웅이라는 남녀의 결합에 근거하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의 남녀는 인간의 남녀가 아니라 신과 변신한 곰과의 특이한 관계라는 점이다. 이러니 관계는 신화적인 관점에서 신과 신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하늘과 땅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단군신화에서 성의 표현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남녀로 상징되는 환웅과 웅녀의 관계를 통해 인간적인 잉태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때의 잉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을 잉태했다는 측면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인간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신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화에서 부모의 계열이 나타나는 경우는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로 국한된다. 이외의 신화들은 부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탈해와 같이 배를 타고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의 성적 관련이 없이 출현하는 예는 신화로써의 신성함을 강조적으로 부여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신화에서의 성은 인간적인 탄생과정에서 보여지는 성의 결합형태를 드러내는 대신에 신비한 출생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2) 전설에서 성의 표현
전설에서 성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은 <달래나보지>와 <홍수설화>계열의 이야기군이다. 이들은 근친상간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전자는 성욕을 후자는 자손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달래나보지> 형태는 크게 고개와 강을 그 증거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남매간이다. 특히 줄거리 상에서 남자가 여자 동생(혹은 누나)에게 성욕을 품게 만드는 계기가 물과 관련을 맺고 있어 주목된다. 그것은 여자가 옷차림을 변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만, 원초적으로는 생명의 잉태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규범에 의해 장애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남자의 자살이나 혹은 신(腎)을 돌로 찍어대는 비극으로 유도하게 만들었다. 충주의 달래강에 대한 두 가지 전설의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월 달래강이 있거든. 강이, 왜 달래강이냐 이카거든. 달래강이냐?
누이하고 동생하고 옷을 벗고 내를, 인제 강을 건네야 된다 마라. 강을 건넬라 카이 물이 많거든. 물이 많애 가이고 물을 건넬 수 가 없은께 서로 인제 옷을 홀딱 벗고 건넸단 마라. 건너이께, 누는 앞에 건네가고 동상은 뒤에 건네 오는데 옷을 벗고 동상이 그 참말로 낭심이 일어 났단 말이라. 응, 낭심이. 신이 일어난께 그 누이를 보고 동생이 누이를 보고 음양이 동하니 그 기맥한 일 아이라? 그린께 그 인제 동생이 이래 건네가미,
“누이는 뒤에, 누야는 누, 누 누나는 뒤에서 건너 오고 나는 앞에서 먼저 건너갈 것이니께 누는 앞에 건너 오라.”고 이칸께네,
“야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크미,
“왜 그래 내빼나?”
“난 같이, 먼저 건네 가겠다.”고 이카민서 건너 갔다 마라.
강이 널러여(넓어여), 달래강이. 그기 충주 단월강인데. 그런데, 그래 먼저 건너가 가이고 저 갱빈에 고만 갱빈 사장에 올라 가서 갱빈을 건너 가만 그 돌 올라 가는데 돌 서더리(모서리)가 있거든. 돌 서더리다가, 바우다가 고만 낭심을 갖다 놓고 찌었어. ‘요놈의 암만 음양지가 죄가 없다 카지마는 누이 동상간에, 으? 남매간에 이러 행동이 나가 음양이 동하니 이건 나도서는(놓아 두어서는) 안된께, 이거 찧고 내가 죽을
키워드
추천자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서평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서평 [인문과학]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읽고
[인문과학]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읽고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고전문학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고전문학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조선-“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읽고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조선-“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읽고 가사문학에 대하여
가사문학에 대하여 이기영의 생애와 작품세계 -
이기영의 생애와 작품세계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사회 &#8228; 경제생활 이야기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사회 &#8228; 경제생활 이야기 언어속에서의 성의식과 성차별
언어속에서의 성의식과 성차별 차문화의 역사, 전래,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일제강점기,근대와 현대의 차문화
차문화의 역사, 전래,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일제강점기,근대와 현대의 차문화 [한국교육사][삼국교육][고구려교육][백제교육][신라교육][조선교육][실학교육]한국교육사 삼...
[한국교육사][삼국교육][고구려교육][백제교육][신라교육][조선교육][실학교육]한국교육사 삼... 문학과 젠더 성의 하위문화 (동성애자 환경설)
문학과 젠더 성의 하위문화 (동성애자 환경설) [관료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행정문화]관료제와 민주주의, 관료제와 다원주의, 관료제와 행...
[관료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행정문화]관료제와 민주주의, 관료제와 다원주의, 관료제와 행... [프랑스사회와문화] 프랑스 사람들과 프랑스 사회, 프랑스의 가정생활과 결혼 그리고 여성해...
[프랑스사회와문화] 프랑스 사람들과 프랑스 사회, 프랑스의 가정생활과 결혼 그리고 여성해... 조선후기의 서민문화 (판소리, 홍길동전)
조선후기의 서민문화 (판소리, 홍길동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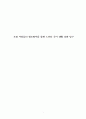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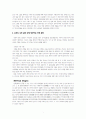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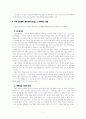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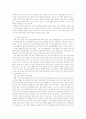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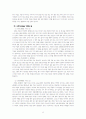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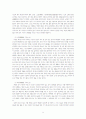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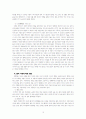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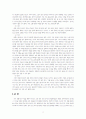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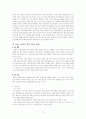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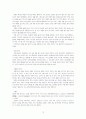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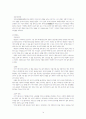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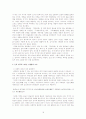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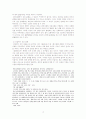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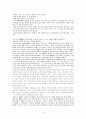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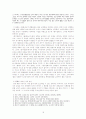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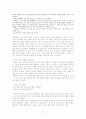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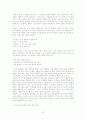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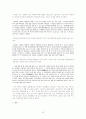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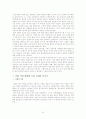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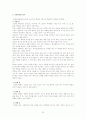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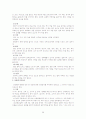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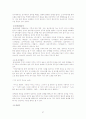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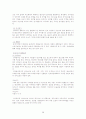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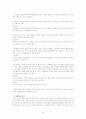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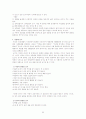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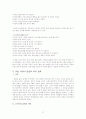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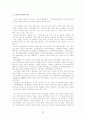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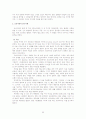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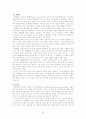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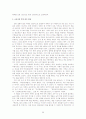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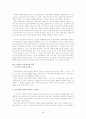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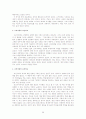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