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II.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난민보호의 주요쟁점
1. 난민(Refugees)이란
2. 국제난민법상 개념
3. 국제법상 난민보호의 주요쟁점
1) 난민정의
2) 강제송환금지원칙
3) 비호(asylum)권
Ⅲ. 제2차 대전이후 유럽에서의 난민발생과 난민정책
1. 1945년 - 1970년
2. 1970년대 -1980년대
3. 1990년대 이후
Ⅳ. 국제난민법의 제원칙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2. 추방 및 인도의 금지
3. 기본적 인권의 존중
Ⅴ. 유럽연합(EU)국가에 있어서의 난민보호장치 및 제도
1. 난민보호에 관한 국내 입법조치
2. 입국전(入國前) 제조치
3. 비호심사절차
4. 잠정적 보호에 대한 EU 국가의 입장
1) 잠정적 보호의 개념
2) 잠정적 보호의 대상
3) 잠정적 보호의 기간
4) 잠정적 보호 대상자의 권리
Ⅵ. 결론
II.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난민보호의 주요쟁점
1. 난민(Refugees)이란
2. 국제난민법상 개념
3. 국제법상 난민보호의 주요쟁점
1) 난민정의
2) 강제송환금지원칙
3) 비호(asylum)권
Ⅲ. 제2차 대전이후 유럽에서의 난민발생과 난민정책
1. 1945년 - 1970년
2. 1970년대 -1980년대
3. 1990년대 이후
Ⅳ. 국제난민법의 제원칙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2. 추방 및 인도의 금지
3. 기본적 인권의 존중
Ⅴ. 유럽연합(EU)국가에 있어서의 난민보호장치 및 제도
1. 난민보호에 관한 국내 입법조치
2. 입국전(入國前) 제조치
3. 비호심사절차
4. 잠정적 보호에 대한 EU 국가의 입장
1) 잠정적 보호의 개념
2) 잠정적 보호의 대상
3) 잠정적 보호의 기간
4) 잠정적 보호 대상자의 권리
Ⅵ. 결론
본문내용
는 장치로 잠정적 보호개념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잠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혹은 잠정적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여 난민의 지위에 해당되는 자를 잠정적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잠정적 보호는 무력충돌이나 대량인권침해로 인한 대량난민이 발생한 경우 대량탈출자를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의미이지 난민의 지위에 해당되는 자를 그 지위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정적 보호의 경우, 잠정적 보호 기간중 개별적인 난민지위를 심사하여 난민에 해당되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 「Position on Temporary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the Need for a Supplementary Refugee Defin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9, 1997, 536쪽.
3) 잠정적 보호의 기간
EU 국가간에 잠정적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러나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이하 ECRE라 약칭함)은 잠정적 보호기간을 최소한 6개월에서 2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 위의 글, 538쪽.
잠정적 보호기간은 그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기간을 특정하기보다 대량난민(탈출자)의 출신국가의 박해 원인이 종료되어 안전한 귀환이 보장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대량난민발생국의 객관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리고 귀환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난민지위의 심사 후에 귀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mnesty International, Refugees: Human Rights have no borders, 1997, 80쪽.
난민보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국적국이나 거주국에서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량난민 송출국의 박해사유가 장기적인 경우 이러한 잠정적 보호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량난민의 보호를 위한 접수국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대량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대량난민의 접수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가에 대하여도 사회, 경제, 정치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접수국만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국가가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사태의 조속하고 적절한 해결을 이룰 수 있다. EU 국가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잠정적 보호를 위한 비용분담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일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4) 잠정적 보호 대상자의 권리
잠정적 보호대상자는 아직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강제추방의 금지는 당연히 잠정적 보호대상자에게 인정되어야 하며, 대량인권침해와 같은 박해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상태에서 접수국과 송출국이 송환협상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잠정적 보호대상자에게도 최소한의 공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을 할 권리, 이산가족의 재회 등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잠정적 보호기간은 접수국의 영주허가를 위한 체류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영주허가기간에 예외적인 체류허가기간을 영주허가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Ⅵ. 결론
이상에서 EU 국가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난민관련제도를 살펴 보았다. EU의 대표기구인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50년 유럽인권협약의 기본원리를 통하여 비호신청자의 권리보호를 추구하려는 데 비하여, EU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국의 국내사정을 이유로 특히 경제적 비용부담, 실업문제, 사회문제 등에 의하여 1990년대 탈냉전 이후 상당히 난민수용에 소극적, 제한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양자조약 혹은 다자조약 특히 Schenegn이행협정과 Dublin 협약을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외치면서 대외적으로 외부국경 강화, 단일비자정책추구 등 일련의 공동정책을 통하여 비호신청자 및 난민에 대한 유입제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국가(출신국)와 안전한 제3국의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한 국가의 출신자 내지 안전한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비호신청자에 대한 보호신청의 기각조치를 통하여 사실상 난민불수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개념을 확대하는 국제적 경향, 즉 UNHCR이 협약상 난민 이외의 사실상 난민 혹은 Mandate 난민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에 의하여 초래된(man-made)\" 국외 혹은 국내 대량 탈출자를 보호하려는 것과는 달리, EU 국가들은 1951년 난민을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종전에 비호신청자에 인정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 내지 금지시키거나, 시혜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국가의 난민보호정책은 비호신청자들의 국적국 내지 거주국 보다 발달되어 있으며, 그들의 인권보장 장치 및 사회보장제도 또한 보다 발달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EU 국가들은 난민유입을 억제하기보다 난민발생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노력을 국제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유럽의 대량난민 발생에 대하여 EU 국가들의 공동대응 노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잠정적 보호 장치에 의하여 대량난민을 접수국이 수용하고 이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책임이 논의되고 있다.
) Sarah Collinson, 앞의 책, 145-146쪽.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 잠정적 보호 장치가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대량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접수국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대량난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대량난민의 발생 가능성이 항존하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우리 난민정책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 「Position on Temporary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the Need for a Supplementary Refugee Defin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9, 1997, 536쪽.
3) 잠정적 보호의 기간
EU 국가간에 잠정적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러나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이하 ECRE라 약칭함)은 잠정적 보호기간을 최소한 6개월에서 2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 위의 글, 538쪽.
잠정적 보호기간은 그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기간을 특정하기보다 대량난민(탈출자)의 출신국가의 박해 원인이 종료되어 안전한 귀환이 보장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대량난민발생국의 객관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리고 귀환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난민지위의 심사 후에 귀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mnesty International, Refugees: Human Rights have no borders, 1997, 80쪽.
난민보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국적국이나 거주국에서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량난민 송출국의 박해사유가 장기적인 경우 이러한 잠정적 보호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량난민의 보호를 위한 접수국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대량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대량난민의 접수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가에 대하여도 사회, 경제, 정치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접수국만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국가가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사태의 조속하고 적절한 해결을 이룰 수 있다. EU 국가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잠정적 보호를 위한 비용분담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일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4) 잠정적 보호 대상자의 권리
잠정적 보호대상자는 아직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강제추방의 금지는 당연히 잠정적 보호대상자에게 인정되어야 하며, 대량인권침해와 같은 박해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상태에서 접수국과 송출국이 송환협상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잠정적 보호대상자에게도 최소한의 공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을 할 권리, 이산가족의 재회 등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잠정적 보호기간은 접수국의 영주허가를 위한 체류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영주허가기간에 예외적인 체류허가기간을 영주허가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Ⅵ. 결론
이상에서 EU 국가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난민관련제도를 살펴 보았다. EU의 대표기구인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50년 유럽인권협약의 기본원리를 통하여 비호신청자의 권리보호를 추구하려는 데 비하여, EU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국의 국내사정을 이유로 특히 경제적 비용부담, 실업문제, 사회문제 등에 의하여 1990년대 탈냉전 이후 상당히 난민수용에 소극적, 제한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양자조약 혹은 다자조약 특히 Schenegn이행협정과 Dublin 협약을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외치면서 대외적으로 외부국경 강화, 단일비자정책추구 등 일련의 공동정책을 통하여 비호신청자 및 난민에 대한 유입제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국가(출신국)와 안전한 제3국의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한 국가의 출신자 내지 안전한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비호신청자에 대한 보호신청의 기각조치를 통하여 사실상 난민불수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개념을 확대하는 국제적 경향, 즉 UNHCR이 협약상 난민 이외의 사실상 난민 혹은 Mandate 난민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에 의하여 초래된(man-made)\" 국외 혹은 국내 대량 탈출자를 보호하려는 것과는 달리, EU 국가들은 1951년 난민을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종전에 비호신청자에 인정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 내지 금지시키거나, 시혜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국가의 난민보호정책은 비호신청자들의 국적국 내지 거주국 보다 발달되어 있으며, 그들의 인권보장 장치 및 사회보장제도 또한 보다 발달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EU 국가들은 난민유입을 억제하기보다 난민발생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노력을 국제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유럽의 대량난민 발생에 대하여 EU 국가들의 공동대응 노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잠정적 보호 장치에 의하여 대량난민을 접수국이 수용하고 이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책임이 논의되고 있다.
) Sarah Collinson, 앞의 책, 145-146쪽.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 잠정적 보호 장치가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대량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접수국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대량난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대량난민의 발생 가능성이 항존하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우리 난민정책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추천자료
 국제통상의 이해에 팰요한 개념
국제통상의 이해에 팰요한 개념 국제법 주요 판례
국제법 주요 판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개념,주요이념, 장애인복지 특성, 장애인복지 발달원인, 장애인 실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개념,주요이념, 장애인복지 특성, 장애인복지 발달원인, 장애인 실태,... [노인복지][노인복지서비스][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체계][노인문제][고령화][고령화사회][노...
[노인복지][노인복지서비스][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체계][노인문제][고령화][고령화사회][노...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독도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독도 [외고폐지논란]외고폐지론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 및 주요 쟁점 고찰, 외교 폐지 논란에 대한 ...
[외고폐지논란]외고폐지론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 및 주요 쟁점 고찰, 외교 폐지 논란에 대한 ... [안락사]안락사, 살인인가? 죽을 권리인가? - 안락사 허용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리에 ...
[안락사]안락사, 살인인가? 죽을 권리인가? - 안락사 허용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리에 ...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아동복지4E)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
아동복지4E)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 아동복지D) 보육대상에 따른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개념과 복지적 의...
아동복지D) 보육대상에 따른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개념과 복지적 의...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장애 패러다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에 관련된 주요 장애인과 사회서비스정책의 쟁점에 관하여
장애 패러다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에 관련된 주요 장애인과 사회서비스정책의 쟁점에 관하여 2017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시험과제물 D형(시리아 난민 사태)
2017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시험과제물 D형(시리아 난민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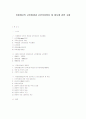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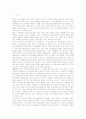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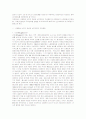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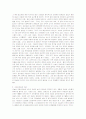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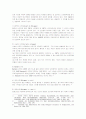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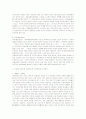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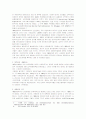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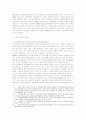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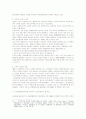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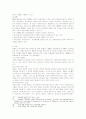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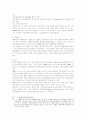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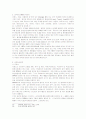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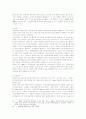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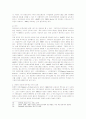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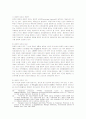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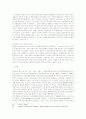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