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춘향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 설화기원설과 무가기원설
▶ <춘향가>의 하이라이트, 오리정 이별대목
- 이별대목으로 본 판소리의 특질
▶ 대중 속의 <춘향가>
- 설화기원설과 무가기원설
▶ <춘향가>의 하이라이트, 오리정 이별대목
- 이별대목으로 본 판소리의 특질
▶ 대중 속의 <춘향가>
본문내용
가 큰 작품으로 그 수법에 있어서는 계몽적인 것이지만 시대적인 의미는 크다. 그 외에 뮤지컬에서도 「춘향가」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각색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물론 오페라나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장르이지만, 우리 민족 고유의 판소리적 특징을 잘 살려서 관중들도 참여 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색깔이 묻어나는 오페라나 뮤지컬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춘향가는 여느 고전과는 달리 영화화 하여 대중들에게 더 알려졌다. 입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책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다른 고전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큰 관심사인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영화로 만들어진 「춘향가」는 대부분이 「춘향가」의 원작 그대로의 내용을 살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던 「춘향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지만, 그 가운데 최초로 판소리 <춘향가>를 바탕으로 제작된 임권택 감독판 「춘향전」은 국창 인간 문화재 조상현의 <춘향가>가 영화 전반에 흐르며, 이것을 그대로 영상화했기 때문에 가장 원작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소설과 드라마에서도 「춘향가」는 다각도로 조명되어지고 있다. 「춘향가」가 바탕이 되어 나온 고전 소설 「춘향전」의 내용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고,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각색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춘향가」와 「춘향전」은 일맥상통하므로 소설과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춘향가」도 주목할 만 하다. 김연수의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라는 소설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성춘향과 이몽룡, 변사또의 내면 세계를 묘사한다. 또한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KBS 드라마 「쾌걸춘향」도 현대인의 정서에 맞추어 ‘춘향 이야기’를 각색하기도 했다. 내용 설정이 <춘향가>에 비해 다소 획기적이며, <춘향가> 속 춘향은 변사또의 수청 요구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현재의 춘향은 몽룡과 변사또 사이를 고민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이 드라마 <쾌걸 춘향>에서는 <춘향가>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몽룡과 변사또의 갈등 구조, 춘향의 정절, 변사또와 춘향의 갈등 구조는 예나 다를 것 없이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운명에 꺾이지 않고 사회적 억압에 맞서는 강함 이면에 버선을 앞에 두고 울었던 성춘향과 ‘자신의 일을 쟁취해 가는 강한 여성’이라는 쾌걸 춘향의 거리는 다소 먼 듯하다. 고전의 재생산에 있어서 지나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면, 원작의 내용과 동떨어져 왜곡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쾌걸 춘향> 속 춘향은 사랑만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닌, 현시대를 살아가는 강한 여성상을 가지고 쾌걸이 되어 행복을 이룬다는 점에서 참신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춘향가」는 여러 매체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내어지고 있다. 비단 「춘향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판소리 작품들 또한 장르적인 특성을 살리거나,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하여 다양하게 나타내어 질 수 있다. 최동현 군산대 교수(국문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판소리의 기능 보유자가 고법 전수자까지 포함해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 정도 수로는 판소리의 주요 소리별 전승자를 체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 한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기능 보유자와 전수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네스코에서 종묘제례악(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과 종묘제례(56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판소리의 전승과 보급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힘 써야 할 것이다.
춘향가는 여느 고전과는 달리 영화화 하여 대중들에게 더 알려졌다. 입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책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다른 고전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큰 관심사인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영화로 만들어진 「춘향가」는 대부분이 「춘향가」의 원작 그대로의 내용을 살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던 「춘향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지만, 그 가운데 최초로 판소리 <춘향가>를 바탕으로 제작된 임권택 감독판 「춘향전」은 국창 인간 문화재 조상현의 <춘향가>가 영화 전반에 흐르며, 이것을 그대로 영상화했기 때문에 가장 원작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소설과 드라마에서도 「춘향가」는 다각도로 조명되어지고 있다. 「춘향가」가 바탕이 되어 나온 고전 소설 「춘향전」의 내용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고,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각색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춘향가」와 「춘향전」은 일맥상통하므로 소설과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춘향가」도 주목할 만 하다. 김연수의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라는 소설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성춘향과 이몽룡, 변사또의 내면 세계를 묘사한다. 또한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KBS 드라마 「쾌걸춘향」도 현대인의 정서에 맞추어 ‘춘향 이야기’를 각색하기도 했다. 내용 설정이 <춘향가>에 비해 다소 획기적이며, <춘향가> 속 춘향은 변사또의 수청 요구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현재의 춘향은 몽룡과 변사또 사이를 고민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이 드라마 <쾌걸 춘향>에서는 <춘향가>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몽룡과 변사또의 갈등 구조, 춘향의 정절, 변사또와 춘향의 갈등 구조는 예나 다를 것 없이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운명에 꺾이지 않고 사회적 억압에 맞서는 강함 이면에 버선을 앞에 두고 울었던 성춘향과 ‘자신의 일을 쟁취해 가는 강한 여성’이라는 쾌걸 춘향의 거리는 다소 먼 듯하다. 고전의 재생산에 있어서 지나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면, 원작의 내용과 동떨어져 왜곡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쾌걸 춘향> 속 춘향은 사랑만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닌, 현시대를 살아가는 강한 여성상을 가지고 쾌걸이 되어 행복을 이룬다는 점에서 참신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춘향가」는 여러 매체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내어지고 있다. 비단 「춘향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판소리 작품들 또한 장르적인 특성을 살리거나,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하여 다양하게 나타내어 질 수 있다. 최동현 군산대 교수(국문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판소리의 기능 보유자가 고법 전수자까지 포함해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 정도 수로는 판소리의 주요 소리별 전승자를 체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 한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기능 보유자와 전수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네스코에서 종묘제례악(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과 종묘제례(56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판소리의 전승과 보급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힘 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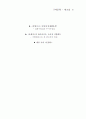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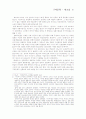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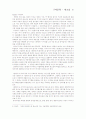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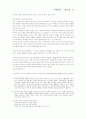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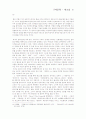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