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태국의 의식주
2. 태국의 축제문화
3. 태국의 여성(신문기사중심
4. 태국의 사회구조와 가치관
5. 풍습과 명절
2. 태국의 축제문화
3. 태국의 여성(신문기사중심
4. 태국의 사회구조와 가치관
5. 풍습과 명절
본문내용
코타이 왕국 시대에 리타이 왕(1347-1374)이 왕의 신분으로서는 최초로 출가하였고, 그 후의 역대 왕들도 따라하게 되었다. 이러한 출가행위가 당시의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그후 하나의 풍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공덕을 쌓는 행위로서 일반국민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덕은 일시적이라도 출가하여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대개 우기 3개월 동안의 \"카오판사(입안거)\" 기간에 가장 많이 출가한다.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망인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 염려되어 자식으로서 또는 혈육으로서 불문에 입문하면 망인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고 승천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데서 장례식이 끝난 후 곧바로 출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부엇나화이\' 또는 \'부엇나쏩(불 앞 또는 시신 앞에서 출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가장 큰 효행으로 세간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된다. 수도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3개월이 일반적이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일년 또는 일생 동안 환속하지 않기도 한다.
태국의 상좌부 불교는 승려의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을 전면 금지하므로 승려의 식생활은 모두 재가신도들이 바치는 완전히 조리된 음식물 공양으로 이루어진다. 사원에는 부엌이 없고 채소를 가꾸는 텃밭도 없다. 승려는 돈이나 금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음식을 재가신도들이 보시하는 대로 공양하기 때문에 육식, 채식을 가리지 않지만 낮 12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는 씹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
출가자가 일정기간 동안 수도한 후 환속하면 도덕적으로 완숙된 인간으로 인식되며 성관의 의미로 \"팃(배우고 깨달아 인격을 갖춘 자)\" 이라는 경칭을 이름앞에 붙여 부른다. 이는 참된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불교적 윤리체계의 행동화와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에서 중책을 맡거나, 신용거래를 하거나, 청혼을 하거나 그밖에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팃\"의 경칭은 책임과 신뢰의 표상이다. 청혼할 때 남성의 수도생활 경력은 필수요건이다. 여자측의 부모는 신랑감의 가문이나 재산, 인물, 지위 등을 보는 것외에 \"팃\"이냐 아니냐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는 외적조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출가할 사람은 부모가 준비해 준 향. 초. 꽃을 쟁반에 담아들고 문중 어른들과 존경하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출가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를 \"깐라부엇\"이라고 한다. 인사를 받는 사람은 \"싸투(선과가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칭찬해주며, 형편에 따라 축의금을 주는 관습도 있다. 출가로 인해 장기간 결근을 하는 일이 발생해도 어느 직장에서도 이때만은 유급휴가를 허락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되어 있다. 대기업에서는 취업조건에 직원들의 출가를 위한 휴가기간과 인원수를 명문화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현직에 있는 중이라도 얼마든지 출가를 허락받을 수 있다. \"부엇낙\"은 미혼 남성들이 출가하지만 간혹 나이든 기혼자가 출가하기도 한다. 아내나 애인이 출가를 방해하면 수행의 방해자인 \"만(사마)\"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돈을 빌렸거나 죄를 범하여 출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출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출가전에 채권자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부채를 상환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청정한 마음이 없으면 수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가의식과 환속의식은 가문의 큰 경사에 속한다. 출가의식은 집에서 성대하게 행하는데 여유있는 가정에서는 2-3일간 큰 잔치를 벌이기도 해서 비용이 결혼식에 드는 비용과 거의 같다. 환속의식은 가족들만이 사원으로 가서 간단한 의식을 치른 후 집에 돌아온다.
태국의 상좌부 불교는 승려의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을 전면 금지하므로 승려의 식생활은 모두 재가신도들이 바치는 완전히 조리된 음식물 공양으로 이루어진다. 사원에는 부엌이 없고 채소를 가꾸는 텃밭도 없다. 승려는 돈이나 금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음식을 재가신도들이 보시하는 대로 공양하기 때문에 육식, 채식을 가리지 않지만 낮 12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는 씹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
출가자가 일정기간 동안 수도한 후 환속하면 도덕적으로 완숙된 인간으로 인식되며 성관의 의미로 \"팃(배우고 깨달아 인격을 갖춘 자)\" 이라는 경칭을 이름앞에 붙여 부른다. 이는 참된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불교적 윤리체계의 행동화와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에서 중책을 맡거나, 신용거래를 하거나, 청혼을 하거나 그밖에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팃\"의 경칭은 책임과 신뢰의 표상이다. 청혼할 때 남성의 수도생활 경력은 필수요건이다. 여자측의 부모는 신랑감의 가문이나 재산, 인물, 지위 등을 보는 것외에 \"팃\"이냐 아니냐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는 외적조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출가할 사람은 부모가 준비해 준 향. 초. 꽃을 쟁반에 담아들고 문중 어른들과 존경하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출가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를 \"깐라부엇\"이라고 한다. 인사를 받는 사람은 \"싸투(선과가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칭찬해주며, 형편에 따라 축의금을 주는 관습도 있다. 출가로 인해 장기간 결근을 하는 일이 발생해도 어느 직장에서도 이때만은 유급휴가를 허락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되어 있다. 대기업에서는 취업조건에 직원들의 출가를 위한 휴가기간과 인원수를 명문화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현직에 있는 중이라도 얼마든지 출가를 허락받을 수 있다. \"부엇낙\"은 미혼 남성들이 출가하지만 간혹 나이든 기혼자가 출가하기도 한다. 아내나 애인이 출가를 방해하면 수행의 방해자인 \"만(사마)\"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돈을 빌렸거나 죄를 범하여 출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출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출가전에 채권자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부채를 상환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청정한 마음이 없으면 수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가의식과 환속의식은 가문의 큰 경사에 속한다. 출가의식은 집에서 성대하게 행하는데 여유있는 가정에서는 2-3일간 큰 잔치를 벌이기도 해서 비용이 결혼식에 드는 비용과 거의 같다. 환속의식은 가족들만이 사원으로 가서 간단한 의식을 치른 후 집에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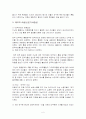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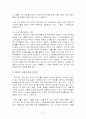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