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서 론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목적과 활동
2.1 수립의 배경
2.2 수립의 목적
2.3 활동
3. 임시정부 헌법의 변천과정
4.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법적성격
5.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특징
5.1 민주주의 헌장으로 선포한 제1차 헌법
5.2 삼권분립의 이상을 추구한 제2차 헌법
5.3 독립운동 체제에 맞춘 제3차 헌법
5.4 관리정부형태를 지향한 제4차 헌법
5.5 전시체제에 부응한 제5차 헌법
5.6 광복을 준비한 제6차 헌법
6. 임시정부 헌법 변천에 나타난 이념
6.1 자유민주주의 선언
6.2 기본권 개념의 변화
6.3 헌법과 건국강령과의 관계
7. 결 론
참고문헌
1. 서 론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목적과 활동
2.1 수립의 배경
2.2 수립의 목적
2.3 활동
3. 임시정부 헌법의 변천과정
4.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법적성격
5.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특징
5.1 민주주의 헌장으로 선포한 제1차 헌법
5.2 삼권분립의 이상을 추구한 제2차 헌법
5.3 독립운동 체제에 맞춘 제3차 헌법
5.4 관리정부형태를 지향한 제4차 헌법
5.5 전시체제에 부응한 제5차 헌법
5.6 광복을 준비한 제6차 헌법
6. 임시정부 헌법 변천에 나타난 이념
6.1 자유민주주의 선언
6.2 기본권 개념의 변화
6.3 헌법과 건국강령과의 관계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法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法\'이란 것이 바로 그러한 주권을 가리켰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했다.
56) 제6차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主權은 人民 全體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主權이 光復運動者 전체에 있음.
그러니까 주권이 국가에 고유한 연후에 군주에 귀속하느냐 국민에 귀속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건국강령의 주권과 헌법상의 주권 규정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에 6차 헌법에서 취학권·취업권·부양권 등의 수익권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건국강령과 비교하면 다소 후퇴한 느낌이 있다.
57) 建國綱領 제3장 建國 제4항 (가); 勞動權 休息權 被救濟權 被保險權 被免費受學權 參政權 選擧權 被選擧權 罷免權 立法權과 社會 各種 組織에 가입하는 權利가 있음.
이것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수정 정도를 논할 것이 아니라, 건국후의 문제는 건국강령의 규정을 우선할 것으로 예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에 건국강령의 토지국유화의 규정과 헌법상 재산권의 규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토지국유화를 보면 건국강령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토지국유화를 규정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가장 진보적이었다고 하는 1944년의 6차 헌법의 재산권 규정을 보아도, 그러한 점이나 그러한 분위기조차 찾아 볼 수 없다.
58) 제5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하열 각항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이라고 한 연후에 제8항에서 다음과 같이 재산권을 명시하였다.
제8항; \"法律에 의치 않으면 財産의 徵發 沒收 혹 抽稅를 받지 않는 權利\".
그러므로 헌법은 자본주의를 표방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파업권을 인정한 것이나 수익권 조항을 설치한 것을 보면, 자유방임주의의 사유재산 신성불가침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집하던 방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위한 수정자본주의를 표방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던 건국강령과 임시정부 헌법은 이념상 일치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7. 결 론
1차 헌법은 선언적 헌장이고 2차 헌법과 6차 헌법은 임시정부의 준비정부체제를 갖추기 위한 헌법이었다. 3·4·5차 헌법은 독립운동 체제의 약헌적 헌법이었다. 이념의 특징은 1919년 제1차 헌법에서 6차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내용이었다. 다만 제1차 헌법에서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약간 비추었고, 제6차 헌법에서는 노동권과 수익권 조항을 설치하여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한 발전된 내용이었다. 그러한 변화는 세계경제공황 이후 1940년을 전후하여 케인즈경제학이 풍미하던 세계정세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에 정부형태의 변화는 1919년의 대통령중심제, 1925년의 내각책임제, 1927년의 관리정부형태, 1940년과 1944년의 절충식 정부형태로 변천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독립운동 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정부 존립의 현실적 조건은 재정과 인원이었다. 임시정부가 정식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지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었더냐 재정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었던가의 문제는 존립과 운영의 위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초기 1920년을 지나면서 인원이 점점 임시정부를 떠나갔다. 그리하여 국민대표회의를 열어 수습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하였다. 결국 1925년에 이어 1927년에는 관리정부 방식으로 개헌했던 것이다. 한편 그것이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이동기를 맞아서 편리한 점도 있었던 것은 우연한 결과였다. 1940년에 중경에 정착하면서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에 대비할 것은 물론, 1941년 태평양전쟁에 대비하여 강력한 지도체제가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과 1944년의 개헌이 있었던 것이다.
1944년의 개헌은 전시체제에 맞추기 위한 것뿐 아니라 중국관내 독립운동 단체를 망라한 통일전선의 형성이라는 임시정부 개편에 부응한 개헌이었다는 의미가 컸다. 그리고 광복을 전망한 체제정비의 필요라는 이유도 컸다. 임시정부는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이므로 광복을 전망하면서 당연히 개헌이 필요했던 것이다. 강력한 지도체제를 위하여 1919년의 헌법처럼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다음에 대통령(주석)중심제를 표방하면서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수용한 절충식 정부형태를 채택한 것이다.
59) 1919년의 권력구조도 절충식 정부형태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 의회 소집권까지 장악할 정도로 삼권 위에 존재하듯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행정부를 국무원이 장악하여 내각책임제를 가미했다고 해도 그대로 대통령중심제로 이해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끝으로 해방이 광복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임시정부를 새 조국 건설과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환국할 수 없었으므로 외지적 종결의 역사를 안아야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1948년에 수립한 남한의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치를 천명함으로써 겨우 역사적 명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8년의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참조하여 제정했다는 것도 밝혔다.
60) 兪鎭午, 『新稿憲法解義』, 탐구당, 1952, 26쪽.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지향하던 이념이 수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44년의 헌법이 지향하던 수정자본주의의 이념이 1948년의 헌법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던 것은 건국강령의 진보성에 연유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1) 1948년 헌법의 제84조부터 규정된 제6장 경제조항을 보면, 문서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도 그 한계내에서 보장할 정도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
그렇게 만든 1948년의 헌법인데 그의 진보성이 준수되었던가 즉, 진보적 이념이 실천되었던가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헌법제정회의록 1(國會圖書館, 1967)
근대한국정치 사상사(崔昌圭, 一潮閣, 1977)
소앙선생문집(三均學會, 횃불사, 1979)
그런데 헌법에서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했다.
56) 제6차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主權은 人民 全體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主權이 光復運動者 전체에 있음.
그러니까 주권이 국가에 고유한 연후에 군주에 귀속하느냐 국민에 귀속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건국강령의 주권과 헌법상의 주권 규정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에 6차 헌법에서 취학권·취업권·부양권 등의 수익권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건국강령과 비교하면 다소 후퇴한 느낌이 있다.
57) 建國綱領 제3장 建國 제4항 (가); 勞動權 休息權 被救濟權 被保險權 被免費受學權 參政權 選擧權 被選擧權 罷免權 立法權과 社會 各種 組織에 가입하는 權利가 있음.
이것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수정 정도를 논할 것이 아니라, 건국후의 문제는 건국강령의 규정을 우선할 것으로 예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에 건국강령의 토지국유화의 규정과 헌법상 재산권의 규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토지국유화를 보면 건국강령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토지국유화를 규정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가장 진보적이었다고 하는 1944년의 6차 헌법의 재산권 규정을 보아도, 그러한 점이나 그러한 분위기조차 찾아 볼 수 없다.
58) 제5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하열 각항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이라고 한 연후에 제8항에서 다음과 같이 재산권을 명시하였다.
제8항; \"法律에 의치 않으면 財産의 徵發 沒收 혹 抽稅를 받지 않는 權利\".
그러므로 헌법은 자본주의를 표방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파업권을 인정한 것이나 수익권 조항을 설치한 것을 보면, 자유방임주의의 사유재산 신성불가침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집하던 방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위한 수정자본주의를 표방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던 건국강령과 임시정부 헌법은 이념상 일치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7. 결 론
1차 헌법은 선언적 헌장이고 2차 헌법과 6차 헌법은 임시정부의 준비정부체제를 갖추기 위한 헌법이었다. 3·4·5차 헌법은 독립운동 체제의 약헌적 헌법이었다. 이념의 특징은 1919년 제1차 헌법에서 6차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내용이었다. 다만 제1차 헌법에서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약간 비추었고, 제6차 헌법에서는 노동권과 수익권 조항을 설치하여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한 발전된 내용이었다. 그러한 변화는 세계경제공황 이후 1940년을 전후하여 케인즈경제학이 풍미하던 세계정세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에 정부형태의 변화는 1919년의 대통령중심제, 1925년의 내각책임제, 1927년의 관리정부형태, 1940년과 1944년의 절충식 정부형태로 변천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독립운동 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정부 존립의 현실적 조건은 재정과 인원이었다. 임시정부가 정식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지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었더냐 재정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었던가의 문제는 존립과 운영의 위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초기 1920년을 지나면서 인원이 점점 임시정부를 떠나갔다. 그리하여 국민대표회의를 열어 수습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하였다. 결국 1925년에 이어 1927년에는 관리정부 방식으로 개헌했던 것이다. 한편 그것이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이동기를 맞아서 편리한 점도 있었던 것은 우연한 결과였다. 1940년에 중경에 정착하면서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에 대비할 것은 물론, 1941년 태평양전쟁에 대비하여 강력한 지도체제가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과 1944년의 개헌이 있었던 것이다.
1944년의 개헌은 전시체제에 맞추기 위한 것뿐 아니라 중국관내 독립운동 단체를 망라한 통일전선의 형성이라는 임시정부 개편에 부응한 개헌이었다는 의미가 컸다. 그리고 광복을 전망한 체제정비의 필요라는 이유도 컸다. 임시정부는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이므로 광복을 전망하면서 당연히 개헌이 필요했던 것이다. 강력한 지도체제를 위하여 1919년의 헌법처럼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다음에 대통령(주석)중심제를 표방하면서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수용한 절충식 정부형태를 채택한 것이다.
59) 1919년의 권력구조도 절충식 정부형태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 의회 소집권까지 장악할 정도로 삼권 위에 존재하듯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행정부를 국무원이 장악하여 내각책임제를 가미했다고 해도 그대로 대통령중심제로 이해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끝으로 해방이 광복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임시정부를 새 조국 건설과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환국할 수 없었으므로 외지적 종결의 역사를 안아야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1948년에 수립한 남한의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치를 천명함으로써 겨우 역사적 명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8년의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참조하여 제정했다는 것도 밝혔다.
60) 兪鎭午, 『新稿憲法解義』, 탐구당, 1952, 26쪽.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지향하던 이념이 수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44년의 헌법이 지향하던 수정자본주의의 이념이 1948년의 헌법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던 것은 건국강령의 진보성에 연유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1) 1948년 헌법의 제84조부터 규정된 제6장 경제조항을 보면, 문서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도 그 한계내에서 보장할 정도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
그렇게 만든 1948년의 헌법인데 그의 진보성이 준수되었던가 즉, 진보적 이념이 실천되었던가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헌법제정회의록 1(國會圖書館, 1967)
근대한국정치 사상사(崔昌圭, 一潮閣, 1977)
소앙선생문집(三均學會, 횃불사, 1979)
키워드
추천자료
 태극기의 유래와 역사 상징 의미 그리기 게양법
태극기의 유래와 역사 상징 의미 그리기 게양법 한국현대정치사 해방후~유신체제 - 용어정리 및 정치적 사건 보충자료
한국현대정치사 해방후~유신체제 - 용어정리 및 정치적 사건 보충자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이승만을 돌아보며,
이승만을 돌아보며, 회계 의의, 회계 목적, 회계 유용성, 회계원칙, 회계순환과정, 재무제표 목적, 회계 발달사, ...
회계 의의, 회계 목적, 회계 유용성, 회계원칙, 회계순환과정, 재무제표 목적, 회계 발달사, ...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행정사에 관하여(1공화국~국민의정부)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행정사에 관하여(1공화국~국민의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 노무현정부의 패러디임시프트
노무현정부의 패러디임시프트 [공직구조] 한국정부의 공직구조 변천(발전과정), 공무원의 종류(유형),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공직구조] 한국정부의 공직구조 변천(발전과정), 공무원의 종류(유형),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정부조직구조 政府組織] 정부조직 (政府組織) - 정부조직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한국) 정...
[정부조직구조 政府組織] 정부조직 (政府組織) - 정부조직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한국) 정... 남북한 정치사상 및 이념
남북한 정치사상 및 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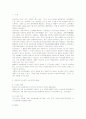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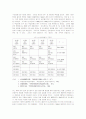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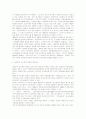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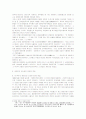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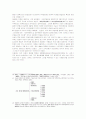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