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만식 그는 누구 인가?
2. 채만식이 만든 작품 연대표
3. 채만식 그 만의 작품세계, 특징
4. <심봉사>가 만들어 졌던 해의 시대적 상황
5. <심봉사> 세부 소개
1) 줄거리
2) 작품 속 인물 분석
3) 극본에서 나타난 내용상 표현상 특징
6. <심청전>의 결말과 다른 결말을 내림으로 해서 <심봉사>에서 이야기 하
려했던 것
7. 작품에서 나타난 희극의 특징
8. <심봉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
9. 작가의 의도
2. 채만식이 만든 작품 연대표
3. 채만식 그 만의 작품세계, 특징
4. <심봉사>가 만들어 졌던 해의 시대적 상황
5. <심봉사> 세부 소개
1) 줄거리
2) 작품 속 인물 분석
3) 극본에서 나타난 내용상 표현상 특징
6. <심청전>의 결말과 다른 결말을 내림으로 해서 <심봉사>에서 이야기 하
려했던 것
7. 작품에서 나타난 희극의 특징
8. <심봉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
9. 작가의 의도
본문내용
뀐다. 전체 8장으로 이루어진 7막은 1장에서는 궁중장면, 2장에서는 승선장면, 3장에서는 다시 궁중장면이 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의식적으로 넘어선 이러한 방법은 장봉사의 이야기를 회상 수법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영화에서 흔히 쓰는 수법으로 관객에게 훨씬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3) 극형식 상의 이중극적 구조
심봉사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위기 부분이 각각 양분되어 심청가가 판소리로서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징인 삽화식 구성이 살아 있다. 전반부는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에 제수로 인당수에 빠지게 되고, 용궁으로 가게되는 부분까지이고 후반부는 심봉사가 우여곡절 끝에 눈을 번쩍 뜨게 된다는 내용이다.
8. [심청전]의 결말과 다른 결말을 내림으로 [심봉사]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 것
작가 부기
정확하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심청전>에서 간파하기 쉬웠던 심봉사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딸을 파는 행위는 동기의 여하간에 잘못된 것이며 비판을 받아야 할 행위임에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심청전>에서는 심청이 왕비로 환생하고 결국 심봉사마저 눈을 뜨게 됨으로써, ‘행복한 결말’에 도취한 독자들은 심봉사의 잘못은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기〕
이것을 각색함에 있어서 첫째 제호를 「심봉사」라고 한 것, 또 「심청전」의 커다란 저류가 되어 있는 불교의 ‘눈에 보이는 힘’을 완전히 말살 무시한 것, 그리고 특히 재래 「심청전」의 전통으로 보아 너무도 대담하게 결말을 지은 것 등에 대해서 필자로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을 믿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한 태도로 집필을 한 것은 아닌 것만을 말해 둔다.
심봉사의 행위가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다고 하여 그 원인행위가 무시되거나 용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채만식은 심청의 환생을 거부하여, 심봉사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도록 하였다. 잘못된 동기는 결국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뚜렷한 자각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9. 작가의 의도
일제의 암흑기에서 눈을 뜬다고 하더라도 절망과 허위와 죽음이라는 의미만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심봉사는 자기부정의 행위를 통하여 일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말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인물을 통하여 채만식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자기부정적인 항거를 시도하였고, 동시에 시대의 격심한 괴리를 독자에게 확인시키는 효과도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심봉사를 통한 사회의 기존 가치관에 대한 도전은 힘의 대결에서 현실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생각되나 삶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로서 심봉사였다면 앞으로 대결을 기약할 수 없는 근원적이 모순에 빠진다고 본다. 기존 가치관에 대한 회의를 보이는 심봉사는 30년대 채만식 희곡이 잉태한 비극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다.
3) 극형식 상의 이중극적 구조
심봉사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위기 부분이 각각 양분되어 심청가가 판소리로서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징인 삽화식 구성이 살아 있다. 전반부는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에 제수로 인당수에 빠지게 되고, 용궁으로 가게되는 부분까지이고 후반부는 심봉사가 우여곡절 끝에 눈을 번쩍 뜨게 된다는 내용이다.
8. [심청전]의 결말과 다른 결말을 내림으로 [심봉사]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 것
작가 부기
정확하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심청전>에서 간파하기 쉬웠던 심봉사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딸을 파는 행위는 동기의 여하간에 잘못된 것이며 비판을 받아야 할 행위임에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심청전>에서는 심청이 왕비로 환생하고 결국 심봉사마저 눈을 뜨게 됨으로써, ‘행복한 결말’에 도취한 독자들은 심봉사의 잘못은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기〕
이것을 각색함에 있어서 첫째 제호를 「심봉사」라고 한 것, 또 「심청전」의 커다란 저류가 되어 있는 불교의 ‘눈에 보이는 힘’을 완전히 말살 무시한 것, 그리고 특히 재래 「심청전」의 전통으로 보아 너무도 대담하게 결말을 지은 것 등에 대해서 필자로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을 믿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한 태도로 집필을 한 것은 아닌 것만을 말해 둔다.
심봉사의 행위가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다고 하여 그 원인행위가 무시되거나 용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채만식은 심청의 환생을 거부하여, 심봉사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도록 하였다. 잘못된 동기는 결국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뚜렷한 자각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9. 작가의 의도
일제의 암흑기에서 눈을 뜬다고 하더라도 절망과 허위와 죽음이라는 의미만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심봉사는 자기부정의 행위를 통하여 일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말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인물을 통하여 채만식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자기부정적인 항거를 시도하였고, 동시에 시대의 격심한 괴리를 독자에게 확인시키는 효과도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심봉사를 통한 사회의 기존 가치관에 대한 도전은 힘의 대결에서 현실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생각되나 삶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로서 심봉사였다면 앞으로 대결을 기약할 수 없는 근원적이 모순에 빠진다고 본다. 기존 가치관에 대한 회의를 보이는 심봉사는 30년대 채만식 희곡이 잉태한 비극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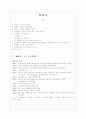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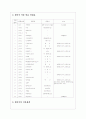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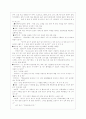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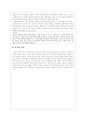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