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1.연암 박지원의 사상관
-1 양반계층을 비판
-2 서민들에 대한 긍정
-3 이용후생을 주창
2. 연암 소설 속의 비판관
-1 호질
-2 양반전
-3 허생전
마무리
1.연암 박지원의 사상관
-1 양반계층을 비판
-2 서민들에 대한 긍정
-3 이용후생을 주창
2. 연암 소설 속의 비판관
-1 호질
-2 양반전
-3 허생전
마무리
본문내용
주는 조건으로 양반자리를 사려고 하자 군수가 이에 그 조서를 작성하여 조건들을 제시하자 이에 불만족한 부자는 이를 수정하고자 하고, 다시금 수정한 조서내용을 들은 부자는 양반이 할 것이 못된다고 하며 달아나버리고는, 다시는 양반이란 소리를 입에 담지도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다.
실상 이 단편 내에서 양반의 대표로써 등장하는 가난한 선비는 비록 빈곤하나 그 성품이 어질고 뭇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로써 그려내고 있고, 부자는 비록 돈이 많지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로써 그려내면서, 비록 몰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서민은 출세해도 서민일 뿐이라는 그런 봉건지배적인 모습을 내비치는 듯하다, 이런 자세는 양반이 서민이 된 후 겸손해짐에 군수가 이를 두고 진짜 양반이라 하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실상 더 보자면 비록 양반의 정신이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나 결국 그래봤자 사회에 하등 도움 되지 않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고, 실상 가치있는 자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서민이라는, 결국 돈많은 사람이 양반이라는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99, 179p
봉건붕괴사상적 인식이 작품 전체에서 지배적으로 내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그가 이 소설을 쓸 때에 그 서두에 작중 내에서 환곡을 축낸 죄로 옥에 갇히는 장면이라던지, 그의 처가 그 모습을 두고 양반이란 한푼 값어치도 없는 것이라고 한탄하는 모습 등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이러한 비판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한다. 부자가 양반을 사기위해 군수가 증서를 꾸며 읽는데, 첫 증서에서는 양반이 능히 행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다. 구절 하나하나마다 어렵고 힘든 일 뿐이다.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써는 도리어 양반이란 직책이 가지는 불합리적인 면모와 무능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상, 첫 증서에 나타나는 일들은 추워도 화롯불 쬐지 말기, 걸을 때에는 느릿느릿 걷기, 매일같이 책 깨알같이 배껴 쓰기, 돈을 들고 다니지 말기, 쌀값 절대 물어보지 말기 등등 모두 실생활에서 쓸모없는 것들이다. 도리어 세상 돌아가는 꼴과는 격리된, 단지 체면 지키기에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합리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부자가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면 가운데에서도 양반이란 계급이 놀고먹는 편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내비치면서 서민들이 과연 이러한 과중한 직책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것은 양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부자가 이 기회를 포기하고 도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거나 하는 것이라던지, 연암이 이 소설 서문에 양반직을 사고 파는 것을 옮지 않은 것이라 적고 있는 것에서 민현식, ‘다시보는 연암 박지원’, 인물과 사상사, 1999, 4P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일종의 계급 질서에 대한 옹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민에게 부담스러운 증서의 요구에 불만을 가진 부자는 새로 증서를 꾸며주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두 번째 증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양반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위도식적이고 흉폭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벼슬로 배를 불리고, 방안에서 기생이나 놀리며 서민들의 곡식으로 학 먹이로 소진하고, 서민들을 무도하게 동원하며 여차하면 처벌하는 그런 장부에서의 항목은 당시의 타락한 양반의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실상 이러한 모습은 서민들이 보기에는 부자의 말마따나 ‘도둑놈’이라고 비유할 만큼 증오의 대상이었다. 작가는 이러한 양반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능력, 비합리적, 타락성 세 가지를 골고루 차례대로 아우르고 늘어놓으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러한 무도한 양반에 대한 선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언제나 양반이란 대상에 눌려 살아야만 하는 입장의 서민들의 모습을 부자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려내고 있다.
-2 호질
호질은 사회의 허위에 차고 썩은 곳을 직접적으로 찔러 밝히는 그런 성향의 소설이다. 내용은 대락 이렇다.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려 자신의 몸에 붙은 귀신들에게 의견을 논하도록 하며 의사, 무당, 아 칭송받는 북곽선생이란 자가 있었고, 또 동쪽에 동리자란 이름의 수절 잘하기로 이름났지만, 실은 배다른 아들이 다섯이나 되는 과부가 살아, 이 둘이 서로 연정을 나누는데, 이 북곽선생을 여우가 둔갑한 가짜라 생각한 다섯 아들이 이를
실상 이 단편 내에서 양반의 대표로써 등장하는 가난한 선비는 비록 빈곤하나 그 성품이 어질고 뭇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로써 그려내고 있고, 부자는 비록 돈이 많지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로써 그려내면서, 비록 몰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서민은 출세해도 서민일 뿐이라는 그런 봉건지배적인 모습을 내비치는 듯하다, 이런 자세는 양반이 서민이 된 후 겸손해짐에 군수가 이를 두고 진짜 양반이라 하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실상 더 보자면 비록 양반의 정신이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나 결국 그래봤자 사회에 하등 도움 되지 않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고, 실상 가치있는 자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서민이라는, 결국 돈많은 사람이 양반이라는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99, 179p
봉건붕괴사상적 인식이 작품 전체에서 지배적으로 내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그가 이 소설을 쓸 때에 그 서두에 작중 내에서 환곡을 축낸 죄로 옥에 갇히는 장면이라던지, 그의 처가 그 모습을 두고 양반이란 한푼 값어치도 없는 것이라고 한탄하는 모습 등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이러한 비판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한다. 부자가 양반을 사기위해 군수가 증서를 꾸며 읽는데, 첫 증서에서는 양반이 능히 행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다. 구절 하나하나마다 어렵고 힘든 일 뿐이다.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써는 도리어 양반이란 직책이 가지는 불합리적인 면모와 무능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상, 첫 증서에 나타나는 일들은 추워도 화롯불 쬐지 말기, 걸을 때에는 느릿느릿 걷기, 매일같이 책 깨알같이 배껴 쓰기, 돈을 들고 다니지 말기, 쌀값 절대 물어보지 말기 등등 모두 실생활에서 쓸모없는 것들이다. 도리어 세상 돌아가는 꼴과는 격리된, 단지 체면 지키기에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합리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부자가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면 가운데에서도 양반이란 계급이 놀고먹는 편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내비치면서 서민들이 과연 이러한 과중한 직책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것은 양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부자가 이 기회를 포기하고 도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거나 하는 것이라던지, 연암이 이 소설 서문에 양반직을 사고 파는 것을 옮지 않은 것이라 적고 있는 것에서 민현식, ‘다시보는 연암 박지원’, 인물과 사상사, 1999, 4P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일종의 계급 질서에 대한 옹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민에게 부담스러운 증서의 요구에 불만을 가진 부자는 새로 증서를 꾸며주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두 번째 증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양반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위도식적이고 흉폭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벼슬로 배를 불리고, 방안에서 기생이나 놀리며 서민들의 곡식으로 학 먹이로 소진하고, 서민들을 무도하게 동원하며 여차하면 처벌하는 그런 장부에서의 항목은 당시의 타락한 양반의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실상 이러한 모습은 서민들이 보기에는 부자의 말마따나 ‘도둑놈’이라고 비유할 만큼 증오의 대상이었다. 작가는 이러한 양반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능력, 비합리적, 타락성 세 가지를 골고루 차례대로 아우르고 늘어놓으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러한 무도한 양반에 대한 선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언제나 양반이란 대상에 눌려 살아야만 하는 입장의 서민들의 모습을 부자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려내고 있다.
-2 호질
호질은 사회의 허위에 차고 썩은 곳을 직접적으로 찔러 밝히는 그런 성향의 소설이다. 내용은 대락 이렇다.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려 자신의 몸에 붙은 귀신들에게 의견을 논하도록 하며 의사, 무당, 아 칭송받는 북곽선생이란 자가 있었고, 또 동쪽에 동리자란 이름의 수절 잘하기로 이름났지만, 실은 배다른 아들이 다섯이나 되는 과부가 살아, 이 둘이 서로 연정을 나누는데, 이 북곽선생을 여우가 둔갑한 가짜라 생각한 다섯 아들이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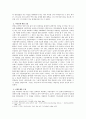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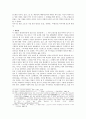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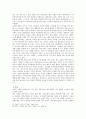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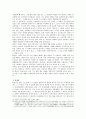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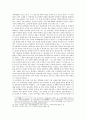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