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으로 나타내며 그림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본질을 체득하려는 관찰의 중시나, 구법(句法) 및 장법(章法)론 역시 소식과 황정견 등에 의해 채용되었는데, 무엇보다도 화론의 시론으로의 전면적 차감에 힘썼던 사람은 문인화를 창시하기도 한 소식이다. 그의 ‘수물부형(隨物賦形)’, ‘흉중성죽(胸中成竹)’론을 비롯한 많은 이론은 화론의 시학으로의 차감이다.
결국 송대에 와서 시화선(詩畵禪)이 상호 조응하게 된 데에는, 시와 선과 수묵화가 모두 ‘언진이의부진(言盡而意不盡)’의 생략과 함축, 재현이 아닌 표현, 그리고 마치 주역(周易)과 같이 언어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기호 체계로 인식되면서, 문인들이 그 공유성에 대해 상호 차감적(借鑑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문화적 성숙에서 기인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양상으로 송대의 시학은 당대와는 다른 형이상학적 사변(思辨) 형상(形象)의 구현이라는 특색을 보이며 전개되었다. 매요신의 평담론이나 소식의 중변론(中邊論)은 모두 그 예술적 구현에 관한 이론이다. 송시는 당대(唐代)의 청년적 기상과는 다른 원숙하고 노경(老境)한 풍격을 지니며, 생동하는 백화의 통속 문예와는 다른 문인적 아취(雅趣)를 드러냈다. 이러한 외적 수경(瘦硬)과 내적 풍부는 송대 시인의 사변 심미의 전형으로 자리잡아갔으며 송대의 중심부 시인들에서 그 화려한 꽃을 피웠고, 남송대 시인들의 시학적 전범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송시의 역사는 당시를 비판적으로 학습하면서 당시와 송시를 비교 검토한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풍격적으로 송시는 관념론적 사변 철학에 힘입어 평담(平淡) 노경(老境)한 의경미를 드러낸다. 북송이 당시 학습을 통한 개성의 수립기라고 한다면, 남송은 북송시의 학습과 자립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송 후기에는 북송과 다르게 사대부 문인에 국한하지 않고 평민 시인들이 대거 시사(詩社)적 형태로 활동한 점에서 비록 아직은 소수의 권역이긴 하지만 대아지당(大雅之堂)으로부터 아속공상(雅俗共賞)을 향한 진일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중국시사 중에서 차지하는 송대 시학의 위상과 의미를 간략히 단계화함으로써 중국문학사에서 송대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한다. 시의 심미적 단계로 말하자면, 중국시는 공자 이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인격(人格) 심미’ 단계에서, 위진 현학(玄學)의 자연 추구적인 ‘자연(自然) 심미’의 단계로, 그리고 다시 당대의 정태적(靜態的) 회화(繪畵) 위주의 ‘서정(抒情) 심미’ 단계로 나아간 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송대의 ‘사변(思辨) 심미’ 단계로 전이(轉移)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와 음악의 관계에서 보자면, 선진 양한의 음악과의 불가분의 ‘가시적(歌詩的) 단계’에서, 육조 당대의 음송되는 ‘송시적(誦詩的)[음시적(吟詩的)] 단계’로, 그리고 송대에는 고시 위주의 수필적 교유시인 ‘설시적(說詩的) 단계’로 이행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중국문학사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송대 이후 중국 고전시는 그 운용의 폐쇄성과 장르 자체의 한계적 속성으로 인하여,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다. 대신 비평 방면에서는 시학 이론의 전문화를 꾀하며 오히려 문인들의 심미적 품평(品評)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시 비평이라는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볼 때 근세에 이르기까지 중국 고전시는 비록 상층 문인들 간에는 ‘대아지당(大雅之堂)’의 지위를 놓치지 않았으나, 대중들과 함께 하는 ‘아속공상(雅俗共賞)’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고,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와 함께 백화 중심의 통속 문예 장르에 발전사적 주도권을 내주며 상대적 정체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송대는 그 확고한 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송대에 와서 시화선(詩畵禪)이 상호 조응하게 된 데에는, 시와 선과 수묵화가 모두 ‘언진이의부진(言盡而意不盡)’의 생략과 함축, 재현이 아닌 표현, 그리고 마치 주역(周易)과 같이 언어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기호 체계로 인식되면서, 문인들이 그 공유성에 대해 상호 차감적(借鑑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문화적 성숙에서 기인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양상으로 송대의 시학은 당대와는 다른 형이상학적 사변(思辨) 형상(形象)의 구현이라는 특색을 보이며 전개되었다. 매요신의 평담론이나 소식의 중변론(中邊論)은 모두 그 예술적 구현에 관한 이론이다. 송시는 당대(唐代)의 청년적 기상과는 다른 원숙하고 노경(老境)한 풍격을 지니며, 생동하는 백화의 통속 문예와는 다른 문인적 아취(雅趣)를 드러냈다. 이러한 외적 수경(瘦硬)과 내적 풍부는 송대 시인의 사변 심미의 전형으로 자리잡아갔으며 송대의 중심부 시인들에서 그 화려한 꽃을 피웠고, 남송대 시인들의 시학적 전범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송시의 역사는 당시를 비판적으로 학습하면서 당시와 송시를 비교 검토한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풍격적으로 송시는 관념론적 사변 철학에 힘입어 평담(平淡) 노경(老境)한 의경미를 드러낸다. 북송이 당시 학습을 통한 개성의 수립기라고 한다면, 남송은 북송시의 학습과 자립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송 후기에는 북송과 다르게 사대부 문인에 국한하지 않고 평민 시인들이 대거 시사(詩社)적 형태로 활동한 점에서 비록 아직은 소수의 권역이긴 하지만 대아지당(大雅之堂)으로부터 아속공상(雅俗共賞)을 향한 진일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중국시사 중에서 차지하는 송대 시학의 위상과 의미를 간략히 단계화함으로써 중국문학사에서 송대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한다. 시의 심미적 단계로 말하자면, 중국시는 공자 이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인격(人格) 심미’ 단계에서, 위진 현학(玄學)의 자연 추구적인 ‘자연(自然) 심미’의 단계로, 그리고 다시 당대의 정태적(靜態的) 회화(繪畵) 위주의 ‘서정(抒情) 심미’ 단계로 나아간 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송대의 ‘사변(思辨) 심미’ 단계로 전이(轉移)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와 음악의 관계에서 보자면, 선진 양한의 음악과의 불가분의 ‘가시적(歌詩的) 단계’에서, 육조 당대의 음송되는 ‘송시적(誦詩的)[음시적(吟詩的)] 단계’로, 그리고 송대에는 고시 위주의 수필적 교유시인 ‘설시적(說詩的) 단계’로 이행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중국문학사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송대 이후 중국 고전시는 그 운용의 폐쇄성과 장르 자체의 한계적 속성으로 인하여,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다. 대신 비평 방면에서는 시학 이론의 전문화를 꾀하며 오히려 문인들의 심미적 품평(品評)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시 비평이라는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볼 때 근세에 이르기까지 중국 고전시는 비록 상층 문인들 간에는 ‘대아지당(大雅之堂)’의 지위를 놓치지 않았으나, 대중들과 함께 하는 ‘아속공상(雅俗共賞)’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고,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와 함께 백화 중심의 통속 문예 장르에 발전사적 주도권을 내주며 상대적 정체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송대는 그 확고한 분기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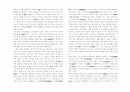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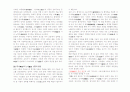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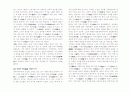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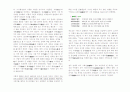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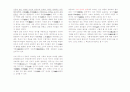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