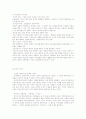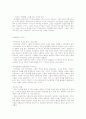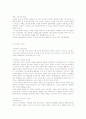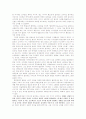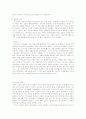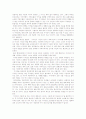목차
1.지식인이란 누구인가
2.과거의 지식인
3.변질되는 지식인
4.미디어형 지식인
5.지식인의 딜레마
2.과거의 지식인
3.변질되는 지식인
4.미디어형 지식인
5.지식인의 딜레마
본문내용
하다. 이 공간을 우리는 시장이라 부를 수도 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시장으로 쓸어 넣어 버렸고 지식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1970년대는 자본주의의 모든 국면 중에서도 마케팅이 급격하게 부상했고,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제치고 영상매체가 전면에 나섰으며 그것은 전 세계의 인터넷 망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쉴새 없이 퍼부어대는 정보의 과잉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혼란스러워했고, 매체 자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어느 게 맞는 말이야?'라고 물을 틈도 없이 '이것이 맞는 말이야'라는 메시지를 믿어 버리게 된 것이다. 신문은 배달되어야 하고 읽어야 하므로 점차 대중들은 방송을 더 믿게 되었다.
지식인이 이렇게 된 것은 지식인 때문만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이유, 즉 목구멍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올곧은 소리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장 글 써서 먹고 살고 싶은 지식인은 조선일보에 밉보이면 안 되고, 텔레비전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뜨는 세상인데 어찌 매스미디어를 경원시하겠는가 말이다.
유명 지식인들은 무슨 이슈가 있을 때면 미디어에 등장해서 떠들어댄다. 겉보기에는 지식인 자신의 주의주장을 펴는 듯하지만 그들이 매스미디어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미디어의 검열을 거쳤음을 의미하므로, 그들의 주장은 미디어가 선택한 미디어의 주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토론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결렬하게 대립한다 해도 그들은 '미디어가 선택한 자'들이라는 패거리에 속한다. 매체자본은 말썽 피울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텔레비전에 초대하지 않으며, 신문사에서 원고청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지식인들이 배제되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고 수주가 필수적이다. 광고 수주를 위해서는 말썽이 생기지 않는 두리뭉실한 주제만을 다루어야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시장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으며 이는 문화생산의 장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작용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시청률과 판매부수라는 요소는 미디어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 압력은 앞서 말했듯이 출연자와 필자선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에서 살아 남아야하는 필자들은 점점 더 미디어의 입맛에 자신을 맞추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문화생산의 원칙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며, 이는 "대중선동의 논리, 즉 시청률의 논리가 내적 비판의 논리를 대체"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 않다. 둘 뿐이다. 체제 안으로 흡수-고용(co-opt)되어 살아가거나, 아니면 꿋꿋이 살아가거나 뿐이다
지식인과 미디어와 권력, 그 구조에 관하여
1.지식인이란 누구인가
2.과거의 지식인
3.변질되는 지식인
4.미디어형 지식인
5.지식인의 딜레마
1970년대는 자본주의의 모든 국면 중에서도 마케팅이 급격하게 부상했고,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제치고 영상매체가 전면에 나섰으며 그것은 전 세계의 인터넷 망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쉴새 없이 퍼부어대는 정보의 과잉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혼란스러워했고, 매체 자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어느 게 맞는 말이야?'라고 물을 틈도 없이 '이것이 맞는 말이야'라는 메시지를 믿어 버리게 된 것이다. 신문은 배달되어야 하고 읽어야 하므로 점차 대중들은 방송을 더 믿게 되었다.
지식인이 이렇게 된 것은 지식인 때문만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이유, 즉 목구멍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올곧은 소리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장 글 써서 먹고 살고 싶은 지식인은 조선일보에 밉보이면 안 되고, 텔레비전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뜨는 세상인데 어찌 매스미디어를 경원시하겠는가 말이다.
유명 지식인들은 무슨 이슈가 있을 때면 미디어에 등장해서 떠들어댄다. 겉보기에는 지식인 자신의 주의주장을 펴는 듯하지만 그들이 매스미디어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미디어의 검열을 거쳤음을 의미하므로, 그들의 주장은 미디어가 선택한 미디어의 주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토론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결렬하게 대립한다 해도 그들은 '미디어가 선택한 자'들이라는 패거리에 속한다. 매체자본은 말썽 피울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텔레비전에 초대하지 않으며, 신문사에서 원고청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지식인들이 배제되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고 수주가 필수적이다. 광고 수주를 위해서는 말썽이 생기지 않는 두리뭉실한 주제만을 다루어야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시장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으며 이는 문화생산의 장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작용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시청률과 판매부수라는 요소는 미디어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 압력은 앞서 말했듯이 출연자와 필자선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에서 살아 남아야하는 필자들은 점점 더 미디어의 입맛에 자신을 맞추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문화생산의 원칙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며, 이는 "대중선동의 논리, 즉 시청률의 논리가 내적 비판의 논리를 대체"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 않다. 둘 뿐이다. 체제 안으로 흡수-고용(co-opt)되어 살아가거나, 아니면 꿋꿋이 살아가거나 뿐이다
지식인과 미디어와 권력, 그 구조에 관하여
1.지식인이란 누구인가
2.과거의 지식인
3.변질되는 지식인
4.미디어형 지식인
5.지식인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