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어는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것을 발명하고 혼동시키는 데 이용된다. ”
“언어는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었다. 세상 무엇보다도 위선적 동물인 인간이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일을 표현할 때 견유주의(犬儒主義)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개 같은 짓을 의미한다. 언어는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었다. 그들이 파렴치한 것을 견유주의라고 부른다면 위선을 인간주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 사람은 얼마나 이상한 동물인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거짓말하기 위해 말하며 옷을 입는다. 말을 하고 옷을 입고 송장을 보관하는 동물! 불쌍한 인간! ”
이라며 이성이 만들어낸 언어의 위선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렇다. 우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결국 나 자신도 혼란스러워 질 때도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이고 진심일까?
이 소설 속에서도 아우구스토는 에우헤니아와 로사리오 또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이라고 믿게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선적인 언어로 말해왔었던 것일 수도 있다. 또 에우헤니아도 아우구스토에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만약 언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전할까? 눈? 코? 귀? 아마 눈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언어는 자꾸 인간을 위선적으로 만들지만 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르페오는 주인인 아우구스토가 독백으로 얘기할 때 언어로는 이해가 안가지만 그의 눈을 보면서 마음을 읽는다.
이 소설은 주인공의 독백과 여러 등장인물과의 대화로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말로 풀어나간다. 나도 부분 부분의 독백과 대화에서 느끼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줄거리를 쓸 때 내가 기억에 남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부분을 넣었다. 그 소설속의 글 자체가 인간을 정의하고 내면 심리를 나타내고, 주인공이나 작가인 우나무노, 소설을 읽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다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에필로그의 마지막에 오르페오는
“사람들은 고통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끝을 맺는다. 아우구스토의 경우는 고통과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택했지만, 죽는 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고통으로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나약함이 더 강해지며, 더 위대한 결실을 맺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엔 그 고통을 뛰어넘어 타인의 입장으로 나의 고통을 바라 볼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
아우구스토의 선택이 잘못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진 않다.
모든 인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우구스토처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자아에 대한 의심을 한다. 소설속의 허구적 인간의 삶을 통해 나 자신도 평소에는 깊게 생각 해 보지 못한 여러 철학적이고 더 인간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참고 문헌: 미겔 데 우나무노 조민현 옮김, <안개>, 민음사, 2005
“언어는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었다. 세상 무엇보다도 위선적 동물인 인간이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일을 표현할 때 견유주의(犬儒主義)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개 같은 짓을 의미한다. 언어는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었다. 그들이 파렴치한 것을 견유주의라고 부른다면 위선을 인간주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 사람은 얼마나 이상한 동물인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거짓말하기 위해 말하며 옷을 입는다. 말을 하고 옷을 입고 송장을 보관하는 동물! 불쌍한 인간! ”
이라며 이성이 만들어낸 언어의 위선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렇다. 우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결국 나 자신도 혼란스러워 질 때도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이고 진심일까?
이 소설 속에서도 아우구스토는 에우헤니아와 로사리오 또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이라고 믿게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선적인 언어로 말해왔었던 것일 수도 있다. 또 에우헤니아도 아우구스토에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만약 언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전할까? 눈? 코? 귀? 아마 눈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언어는 자꾸 인간을 위선적으로 만들지만 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르페오는 주인인 아우구스토가 독백으로 얘기할 때 언어로는 이해가 안가지만 그의 눈을 보면서 마음을 읽는다.
이 소설은 주인공의 독백과 여러 등장인물과의 대화로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말로 풀어나간다. 나도 부분 부분의 독백과 대화에서 느끼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줄거리를 쓸 때 내가 기억에 남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부분을 넣었다. 그 소설속의 글 자체가 인간을 정의하고 내면 심리를 나타내고, 주인공이나 작가인 우나무노, 소설을 읽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다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에필로그의 마지막에 오르페오는
“사람들은 고통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끝을 맺는다. 아우구스토의 경우는 고통과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택했지만, 죽는 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고통으로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나약함이 더 강해지며, 더 위대한 결실을 맺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엔 그 고통을 뛰어넘어 타인의 입장으로 나의 고통을 바라 볼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
아우구스토의 선택이 잘못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진 않다.
모든 인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우구스토처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자아에 대한 의심을 한다. 소설속의 허구적 인간의 삶을 통해 나 자신도 평소에는 깊게 생각 해 보지 못한 여러 철학적이고 더 인간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참고 문헌: 미겔 데 우나무노 조민현 옮김, <안개>, 민음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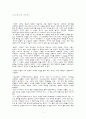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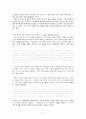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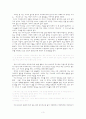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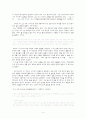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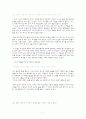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