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품 외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영화배우를 클로즈업한 장면은 그 배우의 선전이 되고, 인기 가요는 그 멜로디를 위한 광고가 되는 것이다. 선전과 문화 산업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가 된다. 넷째, 선전과 문화 산업은 기계적으로 반복 재생산되고, 기술은 인간을 조종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된다. 양자는 친숙하면서도 충격적이어야 하고, 쉬우면서 인상적이어야 하며, 기교는 숙달되어 있지만 단순해야 한다는 공통된 규범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은 산만하면도 고분고분하지 않는 소비자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말하는 언어를 통해 스스로 문화의 선전적 성격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 언어가 내용이 없는 기호가 될수록 언어는 더욱 더 명료하게 말할 이의 의도를 전달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언어의 내용은 공허해진다. 언어의 소리와 내용은 해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서로 구별될 때 비로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다. 말이라는 형태는 내용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내용을 반영하기도 한다. 양자를 분리시켜 말의 흐름이나 사물에 대한 말의 관계를 자의적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말과 사물의 미신적 융합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이제 ‘말’은 단순한 기호일 뿐 아무것도 의미해서는 안 되기에 사물에 완전히 밀착되게 되고, ‘말’은 내용이 없는 상투어로 굳어진다. ‘말’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관계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정화(합리화, 기호화)된 ‘말’은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대신에 대상을 추상적인 계기의 드러남으로 취급함으로써, 표현의 무자비한 명료성을 강요당하게 된다. 그 결과 대상은 이름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담지할 수가 없다. 합리화되기 이전의 말이 동경과 함께 거짓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합리화된 말은 거짓보다는 오히려 동경을 위해 억지로 입어야 하는 외투가 되어 버렸다.
이제 언어는 실증주의가 세계를 눈도 귀도 없는 자료로 환원시키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록행위로 제한되기에 기호들은 더 이상 파고들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기호화된 언어는 주술적인 언어와 유사해진다. 주술은 무엇보다 이름으로서의 언어에 따라다닌다. 이름은 그 효력을 계산할 수 있는 자의적이고 조종 가능한 기호로 변화했지만 전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람의 이름은 선전을 위한 고유상표로 쓰이든지 표준화된 집합명사가 되어 시대를 앞서가는 참신성을 얻는다. 이에 비해 가문을 표시하는 성은 가문의 역사와 연관되어 그 사람을 개별화시켜 주기 때문에 낡아빠진 것처럼 들린다.
말의 지시적인 기능에 내재된 기호적 성격은 언어의 빠른 유통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민요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매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지만 대중가요는 번개처럼 빠르다. 이와 같은 대중가요의 ‘선풍적 인기’는 전체주의적 선전 매체에 의해 이미 사용된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시대에 모든 사람의 입에 올려지는 상품 이름이 판매고를 증가시키면서 친숙한 것으로 만든다. 선전에 의해 한 번 말해진 언어가 빠르게 유포되고, 되풀이되는 형상은 전체주의에서 외치는 구호와 흡사하다. 사람들은 기호화된 말을 더 이상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건 반사에 불과한 말이나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은 형식이 내용과 멀어질수록 말이 지시하는 대상과 더욱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상표가 된다.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의 뒤에는 경제적인 압박이 버티고 있기에 항상 동일한 것을 선택하는 자유이다. 문화 산업은 인간의 내밀한 반응까지 모델로 제시하고 있기에 고유한 개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개성의 상실은 문화 산업이 선전에서 승리했다는 것과 소비자들은 문화 상품을 꿰뚫어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말하는 언어를 통해 스스로 문화의 선전적 성격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 언어가 내용이 없는 기호가 될수록 언어는 더욱 더 명료하게 말할 이의 의도를 전달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언어의 내용은 공허해진다. 언어의 소리와 내용은 해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서로 구별될 때 비로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다. 말이라는 형태는 내용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내용을 반영하기도 한다. 양자를 분리시켜 말의 흐름이나 사물에 대한 말의 관계를 자의적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말과 사물의 미신적 융합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이제 ‘말’은 단순한 기호일 뿐 아무것도 의미해서는 안 되기에 사물에 완전히 밀착되게 되고, ‘말’은 내용이 없는 상투어로 굳어진다. ‘말’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관계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정화(합리화, 기호화)된 ‘말’은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대신에 대상을 추상적인 계기의 드러남으로 취급함으로써, 표현의 무자비한 명료성을 강요당하게 된다. 그 결과 대상은 이름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담지할 수가 없다. 합리화되기 이전의 말이 동경과 함께 거짓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합리화된 말은 거짓보다는 오히려 동경을 위해 억지로 입어야 하는 외투가 되어 버렸다.
이제 언어는 실증주의가 세계를 눈도 귀도 없는 자료로 환원시키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록행위로 제한되기에 기호들은 더 이상 파고들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기호화된 언어는 주술적인 언어와 유사해진다. 주술은 무엇보다 이름으로서의 언어에 따라다닌다. 이름은 그 효력을 계산할 수 있는 자의적이고 조종 가능한 기호로 변화했지만 전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람의 이름은 선전을 위한 고유상표로 쓰이든지 표준화된 집합명사가 되어 시대를 앞서가는 참신성을 얻는다. 이에 비해 가문을 표시하는 성은 가문의 역사와 연관되어 그 사람을 개별화시켜 주기 때문에 낡아빠진 것처럼 들린다.
말의 지시적인 기능에 내재된 기호적 성격은 언어의 빠른 유통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민요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매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지만 대중가요는 번개처럼 빠르다. 이와 같은 대중가요의 ‘선풍적 인기’는 전체주의적 선전 매체에 의해 이미 사용된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시대에 모든 사람의 입에 올려지는 상품 이름이 판매고를 증가시키면서 친숙한 것으로 만든다. 선전에 의해 한 번 말해진 언어가 빠르게 유포되고, 되풀이되는 형상은 전체주의에서 외치는 구호와 흡사하다. 사람들은 기호화된 말을 더 이상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건 반사에 불과한 말이나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은 형식이 내용과 멀어질수록 말이 지시하는 대상과 더욱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상표가 된다.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의 뒤에는 경제적인 압박이 버티고 있기에 항상 동일한 것을 선택하는 자유이다. 문화 산업은 인간의 내밀한 반응까지 모델로 제시하고 있기에 고유한 개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개성의 상실은 문화 산업이 선전에서 승리했다는 것과 소비자들은 문화 상품을 꿰뚫어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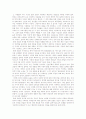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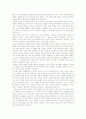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