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작가 김중혁.
그의 독특한 작품세계
i)무용지물 박물관
ii)「발명가 이눅씨의 설계도」
iii)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iv)「멍청한 유비쿼터스」
v) 「회색 괴물」
ⅵ)「바나나 주식회사」
ⅶ)「사백 미터 마라톤」
ⅷ)「펭귄 뉴스」
II. 김중혁 소설의 특징.
i) 사물과의 만남
ii)사물에 대한 애착
iii) 소설의 인물
iv) 김중혁의 비트
v)김중혁의 이분법
III.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i) 균형을 잃은 나
ii)나무 지도의 의미
iii)훌륭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iv)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결론
그의 독특한 작품세계
i)무용지물 박물관
ii)「발명가 이눅씨의 설계도」
iii)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iv)「멍청한 유비쿼터스」
v) 「회색 괴물」
ⅵ)「바나나 주식회사」
ⅶ)「사백 미터 마라톤」
ⅷ)「펭귄 뉴스」
II. 김중혁 소설의 특징.
i) 사물과의 만남
ii)사물에 대한 애착
iii) 소설의 인물
iv) 김중혁의 비트
v)김중혁의 이분법
III.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i) 균형을 잃은 나
ii)나무 지도의 의미
iii)훌륭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iv)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결론
본문내용
른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오차 측량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오차 측량원은 세상을 안전하게 보고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차 측량원은 오차만 측량할 뿐 생산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회의감을 느끼고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게다가 오차 측량원이 측량 할 수 없는 오차도 있다. 이렇듯 ‘나’는 측량 불가능한 오차들로 인해 언젠가부터 자신의 삶이 단단히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결코 그 원인을 알아내지는 못한다. 지도란 그런 것이다. 조그만 잘못되어도 결국 아주 크게 잘못 되는 것. 나는 그것을 어린시절 자신이 그린 지도에서 배웠다. 어린 시절 내가 그린 지도를 믿고 나를 믿을수록 나는 더욱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이 선택한 삶이 과연 훌륭한 것이었는지 확인한다. 그렇지만 생각할수록 나는 어딘가 크게 어긋나있는 것만 같은 것이다. 분명히 처음은 작은 잘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크게 어긋나 있다. 나는 그것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캐나다에 있는 삼촌에게서 받은 기이한 모양의 나무 지도를 만지면서부터 ‘나’는 비로소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던 어머니의 실체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을 찾게 된다. 그것은 결코 객관화 될 수 없는 매우 주관적인 감각이다.
ii)나무 지도의 의미
\'나무지도\'는 감촉으로 느껴서 가늠하게 하는 지도이다. 다시 말해 상상하는 지도인 것이다. 손가락을 나무 지도의 틈새에 넣고, 그 굴곡을 느끼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해안선의 굴곡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말한다. 촉각과 상상력이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작품에 나와 있듯이 이런 나무지도는 현실의 지형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지만 이런 지도독해법이야 말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지도는 현실에 대한 기억과 감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그것의 결과물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이 나무지도는 상상하는 지도이기에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무지도가 보여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실인 것이다. 어둠 속에서 상상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삶의 진실. 김중혁은 나무지도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무지도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순전히 촉각과 상상만으로 제작된 지도가 사라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은 역설로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상상력을 통한 지도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iii)훌륭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에스키모의 나무지도를 보내주는 삼촌, 그 삼촌과 나는 어딘가 통해있다. 삼촌은 내가 힘들어할 때 언제나 답을 내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 삼촌은 말한다. ‘에스키모들에게는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 모든 존재의 목표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훌륭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어.’ 삼촌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가 여태 잊고 지내오거나 지나쳐온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구나, 하고 나무지도를 보내준 삼촌은 말한다. 훌륭한 것은 결국 비교를 통해 생기는 것이다. 모두가 같으면 훌륭한 것도 없다. 인간은 그 크지 않은 차이를 비교하며 훌륭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들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있으며 또 각각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삼촌은 나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려고 한 것이다.
iv)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끝을 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듯이 끝은 단순한 마지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나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어딘가 방향을 잘못 든 것은 아닐지, 나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끝에 서있다. 이때 삼촌은 나에게 세상의 끝이라는 툴레로 오기를 권유한다.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없는 에스키모가 사는 곳으로 오게 해 인간이란 존재가 없는 지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삼촌은 말한다. 삼촌은 나의 한계인 나의 끝에 부딪힌 나를 세상의 끝으로 부름으로써 끝을 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생각한다. 지구가 둥근 이상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세상의 끝에 가더라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가야하는 그리고 가기를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 나침반의 방향이 항상 같은 곳을 가리키듯 자신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는 것이다.
결론
김중혁의 소설에는 사물에 대한 집착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사물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게 하고 잊혀진 것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며,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사람보다 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생물을 무생물처럼 여기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에서 사물로 등장한 나무지도는 상상력의 지도이며,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할 길을 보여준다. 즉 나무지도는 어둠 속에서 상상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삶의 진실을 보여준 것이다. 주인공 ‘나’는 나무지도를 통해 에스키모인들 사이에서 ‘훌륭한’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인간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있으며 또 각각의 목표가 있다는 것임을 말해준다. 김중혁이 말하고 싶은 것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 고민해본다. 방향을 잘못 든 것이 아닌지 이리저리 흔들릴 때, 세상의 끝으로 가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기를 작가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ii)나무 지도의 의미
\'나무지도\'는 감촉으로 느껴서 가늠하게 하는 지도이다. 다시 말해 상상하는 지도인 것이다. 손가락을 나무 지도의 틈새에 넣고, 그 굴곡을 느끼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해안선의 굴곡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말한다. 촉각과 상상력이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작품에 나와 있듯이 이런 나무지도는 현실의 지형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지만 이런 지도독해법이야 말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지도는 현실에 대한 기억과 감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그것의 결과물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이 나무지도는 상상하는 지도이기에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무지도가 보여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실인 것이다. 어둠 속에서 상상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삶의 진실. 김중혁은 나무지도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무지도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순전히 촉각과 상상만으로 제작된 지도가 사라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은 역설로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상상력을 통한 지도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iii)훌륭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에스키모의 나무지도를 보내주는 삼촌, 그 삼촌과 나는 어딘가 통해있다. 삼촌은 내가 힘들어할 때 언제나 답을 내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 삼촌은 말한다. ‘에스키모들에게는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 모든 존재의 목표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훌륭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어.’ 삼촌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가 여태 잊고 지내오거나 지나쳐온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구나, 하고 나무지도를 보내준 삼촌은 말한다. 훌륭한 것은 결국 비교를 통해 생기는 것이다. 모두가 같으면 훌륭한 것도 없다. 인간은 그 크지 않은 차이를 비교하며 훌륭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들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있으며 또 각각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삼촌은 나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려고 한 것이다.
iv)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끝을 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듯이 끝은 단순한 마지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나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어딘가 방향을 잘못 든 것은 아닐지, 나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끝에 서있다. 이때 삼촌은 나에게 세상의 끝이라는 툴레로 오기를 권유한다.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없는 에스키모가 사는 곳으로 오게 해 인간이란 존재가 없는 지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삼촌은 말한다. 삼촌은 나의 한계인 나의 끝에 부딪힌 나를 세상의 끝으로 부름으로써 끝을 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생각한다. 지구가 둥근 이상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세상의 끝에 가더라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가야하는 그리고 가기를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 나침반의 방향이 항상 같은 곳을 가리키듯 자신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는 것이다.
결론
김중혁의 소설에는 사물에 대한 집착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사물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게 하고 잊혀진 것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며,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사람보다 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생물을 무생물처럼 여기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에서 사물로 등장한 나무지도는 상상력의 지도이며,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할 길을 보여준다. 즉 나무지도는 어둠 속에서 상상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삶의 진실을 보여준 것이다. 주인공 ‘나’는 나무지도를 통해 에스키모인들 사이에서 ‘훌륭한’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인간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있으며 또 각각의 목표가 있다는 것임을 말해준다. 김중혁이 말하고 싶은 것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 고민해본다. 방향을 잘못 든 것이 아닌지 이리저리 흔들릴 때, 세상의 끝으로 가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기를 작가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사회복지 딜레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딜레마에 관한 연구 스퀴데리부인에 나타난 추리소설적 요소(작품분석 포함)
스퀴데리부인에 나타난 추리소설적 요소(작품분석 포함) 중국 시대별 소설 정리
중국 시대별 소설 정리 조선시대 대표문학, 고소설 연구
조선시대 대표문학, 고소설 연구  한국의 판타지 소설에 대하여
한국의 판타지 소설에 대하여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대화성 연구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대화성 연구 [대중문학과 판타지소설] (이우혁의 퇴마록과 왜란종결자를 중심으로)
[대중문학과 판타지소설] (이우혁의 퇴마록과 왜란종결자를 중심으로) 시, 소설, 비평 중심으로 본 전후문학 (1950년대, 그것은 끝이자 처음이었다) [모더니즘 시][...
시, 소설, 비평 중심으로 본 전후문학 (1950년대, 그것은 끝이자 처음이었다) [모더니즘 시][... 국어교과서 수록 현대소설 교육의 실제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국어교과서 수록 현대소설 교육의 실제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오페라의 유령 소설 vs 영화
오페라의 유령 소설 vs 영화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생활과 추리소설
생활과 추리소설  인정세태를 보여준 소설 몽당치마
인정세태를 보여준 소설 몽당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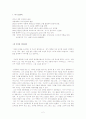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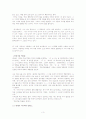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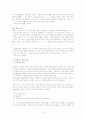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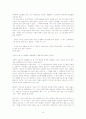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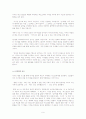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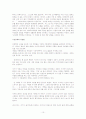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