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눈을 도로 감으라
2.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3. 석가여래의 혜안으로……
4. 인식방법의 현실성·상대성
5. 형상적 인식의 논리
6. '진지'와 '실천'
<후기>
2.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3. 석가여래의 혜안으로……
4. 인식방법의 현실성·상대성
5. 형상적 인식의 논리
6. '진지'와 '실천'
<후기>
본문내용
언급이 있다. 특히 그가 황해도 연암협(燕岩峽)에 있을 시절(그의 나이 42세에서 44세 무렵), \"풀이나 꽃, 짐승이나 벌레 같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모두 지극한 경계가 있어 조물 자연의 묘를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혹 어떤 사물을 접해서 오랜 시각을 묵묵히 시선을 집중하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양 시냇가 바위에 앉아서 가만히 읊조리고 천천히 거닐다가는 문득 \'우두커니 잊어버린 듯[ 然若忘]\' 하였으며, 그러다가 때로 \'신묘한 깨달음( 契)\'이 있으면 즉시 붓을 잡아 메모를 했다 한다. 이런 일련의 태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바 그 자신의 이론의 실천인 셈이다. 특히 \'우두커니 잊어버린 듯\'은 고도의 집중의 자태일 것이며, 그런 나머지 때로 \'신묘한 깨달음\'이 떠오르곤 한다. \'신묘한 깨달음\'의 문자적 전이 자잘하게 써놓은 메모지가 상자에 그득할 만큼 쌓였던 바 그는 스스로 다짐하기를 \"뒷날 다시 검토를 가해서 체계를 잡은 다음이라야 하나의 완전한 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다. 그런데 오랜 훗날 그 초고들을 꺼내 보고는 모두 물에 씻어버렸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과정록}에서는 연암 자신이 이미 노안이 되어 잔글씨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그런 이유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연암은 {열하일기}라는 대저를 완성한 한편, 자신의 구고(舊稿)들을 대개 손수 정리해서 문집 형태로 엮어 놓았다. 그의 연암협(燕巖峽)의 초고들은 이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유득공(柳得恭)의 언급에 의하면 연암은 {열하일기}를 끝맺고 나서 자신의 구고들을 모두 폐기했다 한다. 과연 그때 무엇을 폐기했던지? 우리는 지금 {연암집}에서 {열하일기} 이전 작품들도 많이 볼 수 있으므로, 모두 폐기했다함은 분명 사실과 어긋나는 말이다. 어쩌면 \'연암협의 초고\'를 가리킨 것이 아닐까.
\'연암협의 초고\'는 {과정록}의 언급으로 미루어 대체로 자연물에 대한 관찰이 주내용을 이루었을 것이다. 새롭고 놀라운 자연미의 형상이 담뿍 담겨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연암의 관심은 자연 세계보다 인간의 현실 사회적·시사적인 쪽으로 경도되었으며, 이에 연암협을 빠져 나와 중국대륙을 여행하고 마침내 {열하일기}를 저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창조주체로서의 연암을 {열하일기}가 대변하게 되었다.
급기야 새롭고 놀라운 자연미의 형상을 그려낸 창작물의 하나가 폐기되어 영영 사라져 버린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그 편린들은 {연암집}에 실린 여러 산문 및 시편 속에서 주옥처럼 이채를 띠고 있다.
{열하일기}는 \'있는 세계\'의 통찰로부터 \'있어야 할 세계\'를 모색한 내용으로 굳이 구분 짓자면 \'보고\' 형태의 산문에 속하는 것이다. \'있는 세계\'를 표피적·현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질과 핵심을 간파하려 했기 때문에 이성인식이 강조되었거니와, 거기에 동태적·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독자에게 실감을 주기 위해 형상화의 수법이 구사되고 있다.
\'설리(說理)\'와 \'서사(敍事)\'의 절묘한 결합으로 과학과 예술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인식론과 미의식의 고도의 실현은 바로 이 {열하일기}에서 성취된 것이다.
*{한국한문학연구} 제11집, 1988. {실사구시의 한국학}(2000년)에 수룩하면서 수정한 것임.
독서를 정밀하고 부지런하게 하기로는 포희씨만한 이가 없다. 그 정신과 의태(意態)는 천지만물을 포괄망라하고 만물에 흩어져 있으니, 이것은 다만 글자로 쓰이지 않고 글로 되지 않은 글일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그늘진 뜨락에서 이따금 새가 지저귄다.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외쳐 말하기를 “이것은 내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이고,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하는 글이로다” 하였다. 오색 채색을 문장이라고 한다면 문장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오늘 나는 책을 읽었다. <박지원, ‘答京之之二’(답경지지이)〉
역사는 한번 돌면 다시 돌아오는 수레바퀴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스를 수 없이 흘러가버리는 물줄기와 같다. 물은 차면 넘치고,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하지만 물줄기를 어디로 터줄 것인가는 우리들 선택의 몫이다. 그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름에 사로잡히면 본질을 보지 못한다. 그것은 개라는 개념이 짖지 않는 것과 같다. 단순히 책만 읽는 행위가 독서가 아니듯, 진정한 독서는 세상을 책으로 읽는 것이어야 한다. 진리는 책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암 박지원이 산골짜기에서조차 세상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저 허공 속을 울며 나는 것은 얼마나 생의로운가? 그런데 이를 적막하게 ‘조鳥’란 한 글자로 말살시켜 빛깔도 없애고 그 모습과 소리도 누락시켰으니, 이 어찌 마을 제사에 나아가는 시골 늙은이의 지팡이 위에 새겨진 새와 다르랴! 어떤 이는 그것이 너무 평범하니 산뜻하게 바꾼다 하여 ‘금禽’자로 고친다. 이것은 책 읽고 글 짓는 자의 잘못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푸른 나무 그늘진 뜨락에서 이따금 새가 지저귄다.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외쳐 말하기를, “이것은 내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이고,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하는 글이로다” 하였다. 오색 채색을 문장이라고 한다면 문장으로 이보다 나은 것은 없을 것이다. 오늘 나는 책을 읽었다. ‘답경지지이(答京之之二)’
글자에 머리를 처박는 것은 독서가 아니다. 책장을 한장 한장 넘긴다고 책 읽는 것은 아니다.
내 잠든 정신을 깨우지 못하고, 내 삶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 쓸모 없는 지식, 죽은 정보는 읽지 않느니만 못하다. 문자로 된 책을 읽는 것만이 독서가 아니다.아침 출근길의 짧은 일별一瞥, 이전에 무심히 지나치던 사물과의 느닷없는 만남,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에서 발견하는 낮섦, 아니면 아침에 들창을 열었을 때 내 귀를 울리던 새소리의새삼스런 감동, 이런 것들이 진짜 독서다. 책은 도서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책을 읽어 지식을 얻듯 세계와 만나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이 진짜 독서다. 책은 우주다. 세계는 책이다. 우주 만물은 하나하나가 열려진 텍스트다. 거기에 적힌 의미의 정수를 빨아들일 수 있는사람은 훌륭한 독서가다. 책을 읽어 삶이 향상될 수 없다면 그런 책은 읽어 무엇 하겠는가?
왜 그랬을까? {과정록}에서는 연암 자신이 이미 노안이 되어 잔글씨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그런 이유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연암은 {열하일기}라는 대저를 완성한 한편, 자신의 구고(舊稿)들을 대개 손수 정리해서 문집 형태로 엮어 놓았다. 그의 연암협(燕巖峽)의 초고들은 이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유득공(柳得恭)의 언급에 의하면 연암은 {열하일기}를 끝맺고 나서 자신의 구고들을 모두 폐기했다 한다. 과연 그때 무엇을 폐기했던지? 우리는 지금 {연암집}에서 {열하일기} 이전 작품들도 많이 볼 수 있으므로, 모두 폐기했다함은 분명 사실과 어긋나는 말이다. 어쩌면 \'연암협의 초고\'를 가리킨 것이 아닐까.
\'연암협의 초고\'는 {과정록}의 언급으로 미루어 대체로 자연물에 대한 관찰이 주내용을 이루었을 것이다. 새롭고 놀라운 자연미의 형상이 담뿍 담겨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연암의 관심은 자연 세계보다 인간의 현실 사회적·시사적인 쪽으로 경도되었으며, 이에 연암협을 빠져 나와 중국대륙을 여행하고 마침내 {열하일기}를 저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창조주체로서의 연암을 {열하일기}가 대변하게 되었다.
급기야 새롭고 놀라운 자연미의 형상을 그려낸 창작물의 하나가 폐기되어 영영 사라져 버린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그 편린들은 {연암집}에 실린 여러 산문 및 시편 속에서 주옥처럼 이채를 띠고 있다.
{열하일기}는 \'있는 세계\'의 통찰로부터 \'있어야 할 세계\'를 모색한 내용으로 굳이 구분 짓자면 \'보고\' 형태의 산문에 속하는 것이다. \'있는 세계\'를 표피적·현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질과 핵심을 간파하려 했기 때문에 이성인식이 강조되었거니와, 거기에 동태적·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독자에게 실감을 주기 위해 형상화의 수법이 구사되고 있다.
\'설리(說理)\'와 \'서사(敍事)\'의 절묘한 결합으로 과학과 예술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인식론과 미의식의 고도의 실현은 바로 이 {열하일기}에서 성취된 것이다.
*{한국한문학연구} 제11집, 1988. {실사구시의 한국학}(2000년)에 수룩하면서 수정한 것임.
독서를 정밀하고 부지런하게 하기로는 포희씨만한 이가 없다. 그 정신과 의태(意態)는 천지만물을 포괄망라하고 만물에 흩어져 있으니, 이것은 다만 글자로 쓰이지 않고 글로 되지 않은 글일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그늘진 뜨락에서 이따금 새가 지저귄다.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외쳐 말하기를 “이것은 내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이고,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하는 글이로다” 하였다. 오색 채색을 문장이라고 한다면 문장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오늘 나는 책을 읽었다. <박지원, ‘答京之之二’(답경지지이)〉
역사는 한번 돌면 다시 돌아오는 수레바퀴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스를 수 없이 흘러가버리는 물줄기와 같다. 물은 차면 넘치고,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하지만 물줄기를 어디로 터줄 것인가는 우리들 선택의 몫이다. 그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름에 사로잡히면 본질을 보지 못한다. 그것은 개라는 개념이 짖지 않는 것과 같다. 단순히 책만 읽는 행위가 독서가 아니듯, 진정한 독서는 세상을 책으로 읽는 것이어야 한다. 진리는 책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암 박지원이 산골짜기에서조차 세상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저 허공 속을 울며 나는 것은 얼마나 생의로운가? 그런데 이를 적막하게 ‘조鳥’란 한 글자로 말살시켜 빛깔도 없애고 그 모습과 소리도 누락시켰으니, 이 어찌 마을 제사에 나아가는 시골 늙은이의 지팡이 위에 새겨진 새와 다르랴! 어떤 이는 그것이 너무 평범하니 산뜻하게 바꾼다 하여 ‘금禽’자로 고친다. 이것은 책 읽고 글 짓는 자의 잘못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푸른 나무 그늘진 뜨락에서 이따금 새가 지저귄다.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외쳐 말하기를, “이것은 내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이고,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하는 글이로다” 하였다. 오색 채색을 문장이라고 한다면 문장으로 이보다 나은 것은 없을 것이다. 오늘 나는 책을 읽었다. ‘답경지지이(答京之之二)’
글자에 머리를 처박는 것은 독서가 아니다. 책장을 한장 한장 넘긴다고 책 읽는 것은 아니다.
내 잠든 정신을 깨우지 못하고, 내 삶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 쓸모 없는 지식, 죽은 정보는 읽지 않느니만 못하다. 문자로 된 책을 읽는 것만이 독서가 아니다.아침 출근길의 짧은 일별一瞥, 이전에 무심히 지나치던 사물과의 느닷없는 만남,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에서 발견하는 낮섦, 아니면 아침에 들창을 열었을 때 내 귀를 울리던 새소리의새삼스런 감동, 이런 것들이 진짜 독서다. 책은 도서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책을 읽어 지식을 얻듯 세계와 만나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이 진짜 독서다. 책은 우주다. 세계는 책이다. 우주 만물은 하나하나가 열려진 텍스트다. 거기에 적힌 의미의 정수를 빨아들일 수 있는사람은 훌륭한 독서가다. 책을 읽어 삶이 향상될 수 없다면 그런 책은 읽어 무엇 하겠는가?
추천자료
 동양의 미
동양의 미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미의 인식 태도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미의 인식 태도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인가?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인가? 9.11테러와 미-아프간 전쟁을 통해 본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9.11테러와 미-아프간 전쟁을 통해 본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무역정책론]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축산물 대응방안 (한우의 브랜드화 전략)
[무역정책론]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축산물 대응방안 (한우의 브랜드화 전략) 21세기 패션의 미적 범주 유형PPt
21세기 패션의 미적 범주 유형PPt 영화의 세계와 철학-'미(아름다움)'에 관하여-
영화의 세계와 철학-'미(아름다움)'에 관하여- 고등학교 경제과(경제교육)의 개정중점, 고등학교 경제과(경제교육) 교육의미와 목표, 고등학...
고등학교 경제과(경제교육)의 개정중점, 고등학교 경제과(경제교육) 교육의미와 목표, 고등학... 대한제국의 성립 및 광무개혁에 대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서술 양상 비교 분석 : 미군정...
대한제국의 성립 및 광무개혁에 대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서술 양상 비교 분석 : 미군정...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미적)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미적) 태권도의 기술적 요소와 예술적 가치의 미의 관계(
태권도의 기술적 요소와 예술적 가치의 미의 관계( [서평, 독후감] 『블랙 라이크 미(black like me)』 _ 존 하워드 그리핀 저
[서평, 독후감] 『블랙 라이크 미(black like me)』 _ 존 하워드 그리핀 저 한국관료제의 역사(미 군정~이명박정부)
한국관료제의 역사(미 군정~이명박정부) [미중관계 기말 보고서] 중국의 한·중·일 다자협력과 미국의 대응 :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
[미중관계 기말 보고서] 중국의 한·중·일 다자협력과 미국의 대응 :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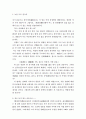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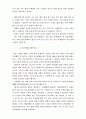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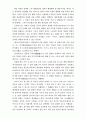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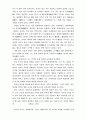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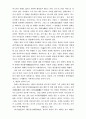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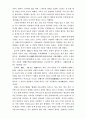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