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사이렌 : 대체된 지배
1) 자연의 지배에서 인간의 지배로 : 강제된 노동
2) 지배의 원리 : 노예와 주인
① 사유를 멈춘 노예
② 주인의 굴레
3. 로크파겐 : 새로운 지배의 유지
1) 지배에 대한 위협 : 노동으로부터 해방의 경험
2) 지배의 유지 : 다시 강제되는 노동
4. 폴리페모스 : 지배의 결말과 극복 가능성
1) 지배 원리의 확립 : 개인의 노동에서 익명적 노동으로
2) 지배의 결과 : 익명적 노동의 결말
3) 지배원리에 대한 도전과 절망 : 개인의 노동의 익명성에 대한 저항
5. 나오며
2. 사이렌 : 대체된 지배
1) 자연의 지배에서 인간의 지배로 : 강제된 노동
2) 지배의 원리 : 노예와 주인
① 사유를 멈춘 노예
② 주인의 굴레
3. 로크파겐 : 새로운 지배의 유지
1) 지배에 대한 위협 : 노동으로부터 해방의 경험
2) 지배의 유지 : 다시 강제되는 노동
4. 폴리페모스 : 지배의 결말과 극복 가능성
1) 지배 원리의 확립 : 개인의 노동에서 익명적 노동으로
2) 지배의 결과 : 익명적 노동의 결말
3) 지배원리에 대한 도전과 절망 : 개인의 노동의 익명성에 대한 저항
5. 나오며
본문내용
맹목적 믿음)에는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전체가 곧잘 잊곤 하는 개인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뿐 벗어날 수 없는 전체의 개인에 대한 지배원리를 여전히 인식하지 못한다. 마치 생존에 국한된 노동에서 개인이 노동에서 소외된 자신을 노동의 현장이 아닌 소비의 현장에서 되찾는 것처럼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찍힌 자신의 이름표에만 관심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런 방식의 전체에 대한 개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속 개인의 자기 보존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은 개인의 인생을 비극적 결말로 향하게 한다. 평생 자신의 이름까지 내던지며 생존만을 위해 살아온 오디세우스를 기다리는 것은 전체의 자기 보존 속에 결코 획득될 수 없는 ‘나’의 자기 보존에 대한 깨달음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자기 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허송세월로 보내는 방황”(96쪽)으로 회상되는 그의 인생이다.
5. 나오며
오디세우스는 계몽을 통해 자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자유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지배를 마주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배원리의 지속에도 전체성은 개인을 완전히 잠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배의 원리는 계몽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몽의 본래 모습은 낭만주의와의 마지막 남은 타협조차 거부하는 무한한 사유(부정)이지 어느 부분에 멈춰버린 사유가 아니다. 특정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립된 계몽된 인간의 모습으로서 자기 보존에 목매는 오디세우스는 특정 순간에 멈춰버린 단지 계몽되었던 인간에 불과하다.
계몽된 인간도 계속되는 무한한 사유의 운동을 멈출 수 없다. 사유하는 개인에 대한 망각을 유도하기 위한 온갖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다. 멈추지 않는 사유의 운동은 자신을 기꺼이 전체에 몸담게 한 개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안에서 개인으로서의 자기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강제된 노동의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을 거부당한 개인이 사유의 운동을 통해 이유도 묻지도 못하면서 노동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극도의 자기 소외가 이러한 노력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맹목적인 전체의 자기 보존의 추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믿음은 개인을 오디세우스의 말년에 담긴 삶의 허무한 귀결로 안내한다.
삶의 허무한 귀결은 오직 이러한 믿음의 맹목성으로 사유를 향할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계몽의 본래 모습을 복권시켜야 한다. 자신의 이름을 빼앗긴 오디세우스가 전체에 저항하던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나는 사유가 이제 전체에 개인을 귀속시키는 오래된 계몽의 맹목성으로 향해야 한다. 그리하여 계몽이 자기 자신마저 대상으로 삼고 다시 예전에 신화를 넘어선 것처럼 그 자신을 넘어서는 계몽의 계몽을 해야 한다. 끝없는 계몽의 지속만이 또 다시 계몽이 지배 원리에 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개인을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무엇인가를 위한 새로운 의도를 갖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의지를 갖지 않으려 하는 데 있을 것이다.
5. 나오며
오디세우스는 계몽을 통해 자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자유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지배를 마주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배원리의 지속에도 전체성은 개인을 완전히 잠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배의 원리는 계몽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몽의 본래 모습은 낭만주의와의 마지막 남은 타협조차 거부하는 무한한 사유(부정)이지 어느 부분에 멈춰버린 사유가 아니다. 특정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립된 계몽된 인간의 모습으로서 자기 보존에 목매는 오디세우스는 특정 순간에 멈춰버린 단지 계몽되었던 인간에 불과하다.
계몽된 인간도 계속되는 무한한 사유의 운동을 멈출 수 없다. 사유하는 개인에 대한 망각을 유도하기 위한 온갖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다. 멈추지 않는 사유의 운동은 자신을 기꺼이 전체에 몸담게 한 개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안에서 개인으로서의 자기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강제된 노동의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을 거부당한 개인이 사유의 운동을 통해 이유도 묻지도 못하면서 노동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극도의 자기 소외가 이러한 노력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맹목적인 전체의 자기 보존의 추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믿음은 개인을 오디세우스의 말년에 담긴 삶의 허무한 귀결로 안내한다.
삶의 허무한 귀결은 오직 이러한 믿음의 맹목성으로 사유를 향할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계몽의 본래 모습을 복권시켜야 한다. 자신의 이름을 빼앗긴 오디세우스가 전체에 저항하던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나는 사유가 이제 전체에 개인을 귀속시키는 오래된 계몽의 맹목성으로 향해야 한다. 그리하여 계몽이 자기 자신마저 대상으로 삼고 다시 예전에 신화를 넘어선 것처럼 그 자신을 넘어서는 계몽의 계몽을 해야 한다. 끝없는 계몽의 지속만이 또 다시 계몽이 지배 원리에 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개인을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무엇인가를 위한 새로운 의도를 갖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의지를 갖지 않으려 하는 데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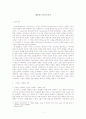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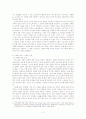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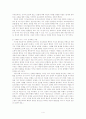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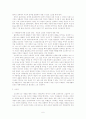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