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학살의 원인
2. 누가 유대인을 죽였는가?
3. 복종과 저항의 갈림길에 선 유대인들
4. 홀로코스트는 끝났는가?
2. 누가 유대인을 죽였는가?
3. 복종과 저항의 갈림길에 선 유대인들
4. 홀로코스트는 끝났는가?
본문내용
말로 언제나 손익계산에 분주했던 나치스 최고 지도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성인으로서 나치시기를 살았던 세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나치 독일이 패망한 1945년 전후에 태어난 손자 세대에게까지 책임을 대물림하는 것은 무리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패전 40주년 기념일에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이 했던 연설 가운데 한 대목을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국민 가운데 대다수는 그 당시에 어린이였거나 혹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자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단지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죄를 뒤집어씌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들은 이들에게 심각한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결과를 넘겨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 없는 화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수백만 명씩 죽어간 그 경험이 이 세상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내면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정치적 책임을 떠맡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역사에 작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이체커는 독일의 전후 세대가 전전 세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근거로서 홀로코스트가 유대인들에게 남긴 잔혹한 상처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가장 큰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일 것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재앙이 지나간 후에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혈육을 잃은 데서 오는 절대적 상실감, 혼자 살아남은 데서 비롯된 죄의식, 인간에 대한 불신감은 그들을 평생 괴롭혔다. “그들은 이미 수용소를 떠났지만, 수용소는 평생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처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비틀린 삶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도 없을 것이다.
홀로코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의 삶 속에서 홀로코스트가 아직도 고통스러운 현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2세대, 3세대를 지나면서도 그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홀로코스트의 충격이 아물어서 유대인들의 집단의식 속에 구속사의 한 분수령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홀로코스트 추념일이 몇 번이나 더 필요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가해자의 나라 독일에서도 홀로코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대인들에 대한 배상금과 보상금 지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유대인을 죽인 민족’이라는 징표가 독일인들의 뇌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안네의 일기>,<피아니스트> 같은 영화를 여전히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그런 영화가 나오고 흥행에 성공을 거두는 한, 홀로코스트는 독일인들의 집단의식 속에 과거가 아닌 현재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 가운데 대다수는 그 당시에 어린이였거나 혹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자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단지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죄를 뒤집어씌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들은 이들에게 심각한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결과를 넘겨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 없는 화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수백만 명씩 죽어간 그 경험이 이 세상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내면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정치적 책임을 떠맡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역사에 작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이체커는 독일의 전후 세대가 전전 세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근거로서 홀로코스트가 유대인들에게 남긴 잔혹한 상처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가장 큰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일 것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재앙이 지나간 후에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혈육을 잃은 데서 오는 절대적 상실감, 혼자 살아남은 데서 비롯된 죄의식, 인간에 대한 불신감은 그들을 평생 괴롭혔다. “그들은 이미 수용소를 떠났지만, 수용소는 평생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처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비틀린 삶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도 없을 것이다.
홀로코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의 삶 속에서 홀로코스트가 아직도 고통스러운 현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2세대, 3세대를 지나면서도 그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홀로코스트의 충격이 아물어서 유대인들의 집단의식 속에 구속사의 한 분수령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홀로코스트 추념일이 몇 번이나 더 필요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가해자의 나라 독일에서도 홀로코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대인들에 대한 배상금과 보상금 지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유대인을 죽인 민족’이라는 징표가 독일인들의 뇌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안네의 일기>,<피아니스트> 같은 영화를 여전히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그런 영화가 나오고 흥행에 성공을 거두는 한, 홀로코스트는 독일인들의 집단의식 속에 과거가 아닌 현재로 남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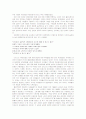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