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생활사 연구에서 씨름의 의의
Ⅱ 씨름의 범주 확인―각저(脚抵)와의 구분
Ⅲ 씨름을 함에 있어 시․공간상 비 제한적인 특성
Ⅳ 씨름이 벌어지는 공간의 구성과 씨름의 의미
1. 오늘날 씨름이 행해지는 공간의 설정과 현대인에게 씨름의 의미
2. 전근대 사회 씨름이 행해지던 공간의 재구성과 당시 씨름의 의미
(1) 김홍도의 『씨름』과 傳 신윤복의 『대쾌도』에 나타난 씨름
(2) 김준근의 『기산풍속도첩』에 나타난 19세기 말 씨름의 변화상
Ⅴ 오늘날 씨름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와 씨름 연구의 의의
*참고문헌
Ⅱ 씨름의 범주 확인―각저(脚抵)와의 구분
Ⅲ 씨름을 함에 있어 시․공간상 비 제한적인 특성
Ⅳ 씨름이 벌어지는 공간의 구성과 씨름의 의미
1. 오늘날 씨름이 행해지는 공간의 설정과 현대인에게 씨름의 의미
2. 전근대 사회 씨름이 행해지던 공간의 재구성과 당시 씨름의 의미
(1) 김홍도의 『씨름』과 傳 신윤복의 『대쾌도』에 나타난 씨름
(2) 김준근의 『기산풍속도첩』에 나타난 19세기 말 씨름의 변화상
Ⅴ 오늘날 씨름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와 씨름 연구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선사회 내부에서 농업이외의 산업인 상업의 발달 등 전통적인 조선사회의 변동과정과 연관을 맺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풍속도첩을 그린 김준근의 주 활동 시기가 1890년대 이후이고, 외국인 선교사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산풍속도첩』의 경우 전통적인 조선사회의 변화상을 많이 반영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씨름이 노동을 공동으로 행하는 공동체의 공동유희의 성격을 점점 탈피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조선말엽의 사회적 변동의 완료형으로서 농업중심의 집단적 마을구조가 거의 완전히 해체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씨름이 집단적 유희가 아닌 승부중심의 스포츠로 변화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Ⅴ 오늘날 씨름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와 씨름 연구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전근대사회의 문화적 양식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름의 경우 한동안 프로스포츠로 발전하며, 폭넓은 인기를 구가하였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근대사회 유희문화의 성격을 파악하며, 전근대사회 유희 향유의 생활모습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전근대 사회 씨름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유희적 성격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집단내부에서 참여자와 관람자의 구분이 없는 놀이의 측면으로 향유된 것으로서 경기자와 관람자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입장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놀이라는 측면이다. 또 하나는 조선사회는 농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농업노동에 있어 집단적 노동력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사회로서 노동이외의 여가 또한 공동노동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으로 즐기는 집단적인 유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 같은 씨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공동체의식에 기반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참여자와 관람자간의 유동적인 변화는 참여자와 관람자간의 유기적인 관련성, 즉 경기자와 응원자간의 밀접한 관계를 상정하게 하며, 이런 조선사회 씨름의 특징은 오늘날 여가 향유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파악되는 인간관계의 강화와 확대라는 요소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요소는 공동체적 유대가 강조되는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오늘날 씨름이 인기를 잃은 이유는 이런 전근대사회의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씨름은 엘리트체육교육과정을 거친 선수들에 의해 행해지는 프로스포츠로서 참여자와 관람자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옛날과 같은 참여자와 관람자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다. 또한 사회구조상 조선사회와 현대사회가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므로, 조선사회와 같이 씨름에 대한 집단 공동체적 의식을 바탕으로 씨름이란 유희를 현대인이 즐길 수는 없게 된 것이며, 한편 오늘날에도 집단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는데, 이런 다른 스포츠를 비교해 보면 근래의 씨름은 그 운영방식에서의 오류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근대 사회와 많은 변화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집단적 공동체사회란 점에서 볼 때 지역적 공동체의식은 프로스포츠의 필수적인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영국의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축구의 경우 런던 북부를 연고로 하는 “Arsenal”의 경우 무기공장 노동자이 主서포터즈였고, 오늘날에도 노동자들이 주된 서포터즈가 되고 있다. 또한 런던 서부를 연고로 하는 “Chelsea”의 경우 중산층을 중심으로 서포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축구는 국가대표팀은 매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지역연고제의 확고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프로축구는 그 팬층이 투텁지 못하며, 프로야구의 경우 여러 야구단이 없어지고 생기는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역연고의 이동 없이 어느 정도 확고해지면서 프로축구에 비해 꾸준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계층과 지역중심으로 오늘날에도 프로 스포츠로 대변되는 유희에서 집단적 공동체의식은 일정정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경우 여가는 노동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지 않고, 여가선택의 과정에 개인적경제적인 다양한 조건이 고려되고, 그 폭이 매우 넓으므로 씨름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씨름이란 여가 선택의 대상이 다른 여가선택의 대상에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전근대사회의 문화적 양식이 현대사회 들어 생명력을 잃은 것과 달리 씨름은 오늘날 침체를 겪고 있지만 문화적인 변동과 교체가 격렬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근대 사회인 조선시대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남아있는 전통문화이다. 격한 사회적 변동기가 지났으나 씨름은 없어진 옛날 놀이가 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한때 프로스포츠로서 많은 인기를 구가하였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향유되던 씨름이 지니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공시적인 그리고 대중의 기호에 부응할 만한 충분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씨름의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전통의 갖는 의의에 대한 검토와 현대사회에서 전근대사회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시기를 거치며 많은 생활문화적인 양식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렇듯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어 왔던,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 양상과 결부되어 점차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생활문화인 씨름에 대한 생활공간의 재구성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의 시도는 오늘날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박물관의 진열장 안의 유물처럼 박제되어가는 우리의 많은 전통문화와 지금껏 정치사 중심의 사관(史觀)에 밀려 관심의 뒤에 물러나 있던 생활사를 연구하고 예전의 생활모습을 재구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서(漢書)』
『경도잡지(京都雜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서울: 동방문화사, 2005,
《참고그림》
김준근, 『기산풍속도첩』
김홍도, 『씨름』
傳 신윤복, 『대쾌도(大快圖)』
Ⅴ 오늘날 씨름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와 씨름 연구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전근대사회의 문화적 양식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름의 경우 한동안 프로스포츠로 발전하며, 폭넓은 인기를 구가하였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근대사회 유희문화의 성격을 파악하며, 전근대사회 유희 향유의 생활모습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전근대 사회 씨름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유희적 성격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집단내부에서 참여자와 관람자의 구분이 없는 놀이의 측면으로 향유된 것으로서 경기자와 관람자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입장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놀이라는 측면이다. 또 하나는 조선사회는 농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농업노동에 있어 집단적 노동력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사회로서 노동이외의 여가 또한 공동노동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으로 즐기는 집단적인 유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 같은 씨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공동체의식에 기반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참여자와 관람자간의 유동적인 변화는 참여자와 관람자간의 유기적인 관련성, 즉 경기자와 응원자간의 밀접한 관계를 상정하게 하며, 이런 조선사회 씨름의 특징은 오늘날 여가 향유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파악되는 인간관계의 강화와 확대라는 요소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요소는 공동체적 유대가 강조되는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오늘날 씨름이 인기를 잃은 이유는 이런 전근대사회의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씨름은 엘리트체육교육과정을 거친 선수들에 의해 행해지는 프로스포츠로서 참여자와 관람자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옛날과 같은 참여자와 관람자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다. 또한 사회구조상 조선사회와 현대사회가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므로, 조선사회와 같이 씨름에 대한 집단 공동체적 의식을 바탕으로 씨름이란 유희를 현대인이 즐길 수는 없게 된 것이며, 한편 오늘날에도 집단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는데, 이런 다른 스포츠를 비교해 보면 근래의 씨름은 그 운영방식에서의 오류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근대 사회와 많은 변화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집단적 공동체사회란 점에서 볼 때 지역적 공동체의식은 프로스포츠의 필수적인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영국의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축구의 경우 런던 북부를 연고로 하는 “Arsenal”의 경우 무기공장 노동자이 主서포터즈였고, 오늘날에도 노동자들이 주된 서포터즈가 되고 있다. 또한 런던 서부를 연고로 하는 “Chelsea”의 경우 중산층을 중심으로 서포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축구는 국가대표팀은 매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지역연고제의 확고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프로축구는 그 팬층이 투텁지 못하며, 프로야구의 경우 여러 야구단이 없어지고 생기는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역연고의 이동 없이 어느 정도 확고해지면서 프로축구에 비해 꾸준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계층과 지역중심으로 오늘날에도 프로 스포츠로 대변되는 유희에서 집단적 공동체의식은 일정정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경우 여가는 노동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지 않고, 여가선택의 과정에 개인적경제적인 다양한 조건이 고려되고, 그 폭이 매우 넓으므로 씨름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씨름이란 여가 선택의 대상이 다른 여가선택의 대상에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전근대사회의 문화적 양식이 현대사회 들어 생명력을 잃은 것과 달리 씨름은 오늘날 침체를 겪고 있지만 문화적인 변동과 교체가 격렬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근대 사회인 조선시대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남아있는 전통문화이다. 격한 사회적 변동기가 지났으나 씨름은 없어진 옛날 놀이가 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한때 프로스포츠로서 많은 인기를 구가하였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향유되던 씨름이 지니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공시적인 그리고 대중의 기호에 부응할 만한 충분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씨름의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전통의 갖는 의의에 대한 검토와 현대사회에서 전근대사회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시기를 거치며 많은 생활문화적인 양식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렇듯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어 왔던,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 양상과 결부되어 점차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생활문화인 씨름에 대한 생활공간의 재구성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의 시도는 오늘날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박물관의 진열장 안의 유물처럼 박제되어가는 우리의 많은 전통문화와 지금껏 정치사 중심의 사관(史觀)에 밀려 관심의 뒤에 물러나 있던 생활사를 연구하고 예전의 생활모습을 재구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서(漢書)』
『경도잡지(京都雜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서울: 동방문화사, 2005,
《참고그림》
김준근, 『기산풍속도첩』
김홍도, 『씨름』
傳 신윤복, 『대쾌도(大快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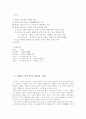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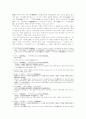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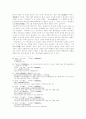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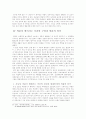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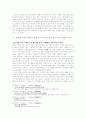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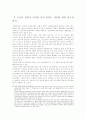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