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동화 -자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
Ⅱ. 교감-시인의 주관적 느낌
Ⅲ. 관조 -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
Ⅳ. 대립 - 자연 도피, 또 다른 지향
Ⅱ. 교감-시인의 주관적 느낌
Ⅲ. 관조 -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
Ⅳ. 대립 - 자연 도피, 또 다른 지향
본문내용
한 속세의 삶이나 어떤 유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새 노래\'는 자연이 주는 무량 무한(無量無限)의 은혜와 축복을 뜻하는 것으로 자연에 있어서의 \'무상(無償)의 생활\'을 의미하며, \'공으로\'는 자연과는 반대로 현실 생활이 유상(有償) 생활임을 역설적으로 암시한다고 하겠다.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면, \'강냉이가 익걸랑 / 함께 와 자셔도 좋소.\'는 이에 대응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노래\'가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와 축복을 대유하는 것처럼 \'강냉이\'는 자연에 인간의 노동이 가해져 이루어지는 오곡 백과의 대유이며, 함께 와 먹어도 좋다는 것은 돈을 내고 사 먹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으로, 즉 무상으로 먹어도 좋다는 의미로 시인의 넉넉한 마음씨가 잘 드러나 있다.
마지막 연의 \'왜 사냐건 / 웃지요.\' 라는 심경은 이백(李白)의 시 <산중문답(山中問答)>*의 둘째 구절 \'笑而不答心自閑\'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 시는 삶의 허무 의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일되어 무위의 상태에 다다른 시인의 인생관 내지 삶에 대한 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1930년대 중반 유행처럼 번지던 서구적 취향의 모더니즘 시 세계와는 상반된, 다분히 한국적이면서 동양적 생활 철학을 반영하여 자연을 관조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이 시는 참다운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Ⅳ. 대립 - 자연 도피, 또 다른 지향
옥매원의 밤
-홍애리-
수천 수만 개의 꽃등을 단 매화나무가 날리는 향이 지어 놓은 그늘 아래 꽃잎 띄운 술잔에 열이레 둥근 달도 살그머니 내려와 꽃잎을 타고 앉아 술에 젖는데,
꽃을 감싸고도는 달빛의 피리 소리에 봄밤이 짧아 꽃 속의 긴 머리 닿아 내린 노랑저고리의 소녀가 꽃의 중심을 잡아,
매화를 만나 꽃잎을 안고 있는 술잔을 앞에 놓고 부르르 부르르 진저리를 치고 있는
시인들,
차마
잔을 들지도 못한 채 눈이 감겨 몸 벗어 집어던지고.
이 시는 자연을 완상하고 자연을 통해 이상과 현실에서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성정을 표현했다.
이 시는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겠으나 나는 대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비록 자연을 관조하고 깊은 애정을 통해 자연과 현실세계와의 조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연 시 혹은 생태 시와 상통하나 이 시는 환경파괴에 대한 고발이나 현실 이전의 상자연적 세계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태시나 자연 시와 다르다. 그는 자연을 특정한 이념의 알레고리나 현실도피 장소로서 선택하지 않는다. 이 시의 자연에는 배경으로든 전경으로든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 자연을 완상하는 다음과 같은 시에서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사람을 위한 자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가 아닐까 생각하여 대립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풀리는 한강가에서
-서정주-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같이
서리 묻은 섣달의 기러기 같이
하늘의 얼음장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 평생을 울고 가려 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민들레나 쑥니풀 같은 것들
또 한 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황토언덕
꽃상여
떼과부의 무리들
여기서서 또 한 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 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화자는 이제 삶의 아픔을 경험한 중년의 사내. 그에게 삶은 끝나지 않는 겨우살이 였지만 그에겐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법 없이 부딪치며 살아갈 작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한평생 울고가는 기러기같이 하늘의 어름장, 보이지 않는 삶의 벽을 가슴으로 깨치며 기러기같이 살아가려던 그를 무장해제라도 시키듯이 강물은 풀리고 햇빛과 물결을 보여준다. 그것은 힘겨운 겨우살이를 해온 그에게 위안이고 축복임에 작지 않은 기쁨일 수 있다. 허나 그는 그 의미를 반어적으로 되물어 본다. 겨울에서 봄으로의 바뀜은 또다시 봄에서 겨울로의 바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또다시 다년생 식물인 민들레, 쑥잎 따위들이 햇살에 겨우 들은 고개를 다시 숙이는 모습을 보라 함인가.. 구차하게 겨우 삶을 끝낸 꽃상여 행렬과 이제 남겨진 떼과부들을 바라보며 다시 겨울의 삶을 다짐하란 뜻인가..
그는 위로의 유혹과 무장해제를 거부한다. 스스로 치열한 가슴의 옹이를 만들던 그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오는 풀리는 한강을. 그는 부정한다.
\'새 노래\'는 자연이 주는 무량 무한(無量無限)의 은혜와 축복을 뜻하는 것으로 자연에 있어서의 \'무상(無償)의 생활\'을 의미하며, \'공으로\'는 자연과는 반대로 현실 생활이 유상(有償) 생활임을 역설적으로 암시한다고 하겠다.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면, \'강냉이가 익걸랑 / 함께 와 자셔도 좋소.\'는 이에 대응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노래\'가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와 축복을 대유하는 것처럼 \'강냉이\'는 자연에 인간의 노동이 가해져 이루어지는 오곡 백과의 대유이며, 함께 와 먹어도 좋다는 것은 돈을 내고 사 먹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으로, 즉 무상으로 먹어도 좋다는 의미로 시인의 넉넉한 마음씨가 잘 드러나 있다.
마지막 연의 \'왜 사냐건 / 웃지요.\' 라는 심경은 이백(李白)의 시 <산중문답(山中問答)>*의 둘째 구절 \'笑而不答心自閑\'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 시는 삶의 허무 의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일되어 무위의 상태에 다다른 시인의 인생관 내지 삶에 대한 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1930년대 중반 유행처럼 번지던 서구적 취향의 모더니즘 시 세계와는 상반된, 다분히 한국적이면서 동양적 생활 철학을 반영하여 자연을 관조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이 시는 참다운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Ⅳ. 대립 - 자연 도피, 또 다른 지향
옥매원의 밤
-홍애리-
수천 수만 개의 꽃등을 단 매화나무가 날리는 향이 지어 놓은 그늘 아래 꽃잎 띄운 술잔에 열이레 둥근 달도 살그머니 내려와 꽃잎을 타고 앉아 술에 젖는데,
꽃을 감싸고도는 달빛의 피리 소리에 봄밤이 짧아 꽃 속의 긴 머리 닿아 내린 노랑저고리의 소녀가 꽃의 중심을 잡아,
매화를 만나 꽃잎을 안고 있는 술잔을 앞에 놓고 부르르 부르르 진저리를 치고 있는
시인들,
차마
잔을 들지도 못한 채 눈이 감겨 몸 벗어 집어던지고.
이 시는 자연을 완상하고 자연을 통해 이상과 현실에서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성정을 표현했다.
이 시는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겠으나 나는 대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비록 자연을 관조하고 깊은 애정을 통해 자연과 현실세계와의 조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연 시 혹은 생태 시와 상통하나 이 시는 환경파괴에 대한 고발이나 현실 이전의 상자연적 세계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태시나 자연 시와 다르다. 그는 자연을 특정한 이념의 알레고리나 현실도피 장소로서 선택하지 않는다. 이 시의 자연에는 배경으로든 전경으로든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 자연을 완상하는 다음과 같은 시에서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사람을 위한 자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가 아닐까 생각하여 대립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풀리는 한강가에서
-서정주-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같이
서리 묻은 섣달의 기러기 같이
하늘의 얼음장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 평생을 울고 가려 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민들레나 쑥니풀 같은 것들
또 한 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황토언덕
꽃상여
떼과부의 무리들
여기서서 또 한 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 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화자는 이제 삶의 아픔을 경험한 중년의 사내. 그에게 삶은 끝나지 않는 겨우살이 였지만 그에겐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법 없이 부딪치며 살아갈 작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한평생 울고가는 기러기같이 하늘의 어름장, 보이지 않는 삶의 벽을 가슴으로 깨치며 기러기같이 살아가려던 그를 무장해제라도 시키듯이 강물은 풀리고 햇빛과 물결을 보여준다. 그것은 힘겨운 겨우살이를 해온 그에게 위안이고 축복임에 작지 않은 기쁨일 수 있다. 허나 그는 그 의미를 반어적으로 되물어 본다. 겨울에서 봄으로의 바뀜은 또다시 봄에서 겨울로의 바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또다시 다년생 식물인 민들레, 쑥잎 따위들이 햇살에 겨우 들은 고개를 다시 숙이는 모습을 보라 함인가.. 구차하게 겨우 삶을 끝낸 꽃상여 행렬과 이제 남겨진 떼과부들을 바라보며 다시 겨울의 삶을 다짐하란 뜻인가..
그는 위로의 유혹과 무장해제를 거부한다. 스스로 치열한 가슴의 옹이를 만들던 그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오는 풀리는 한강을. 그는 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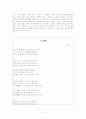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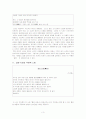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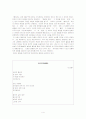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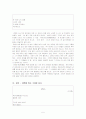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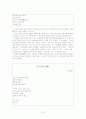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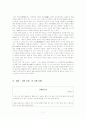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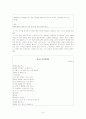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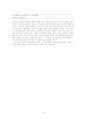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