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용운
<님의 침묵>
<연구 1> 의지론적 관점
<연구 2> 불교적 관점
<당신을 보았습니다>
<연구1> 민족적 저항성
<연구 2> 삶의 상실된 가치원리
<알 수 없어요>
<연구 1> 은유적 님의 인식
<연구 2> 절대진리를 향한 열정
<님의 침묵>
<연구 1> 의지론적 관점
<연구 2> 불교적 관점
<당신을 보았습니다>
<연구1> 민족적 저항성
<연구 2> 삶의 상실된 가치원리
<알 수 없어요>
<연구 1> 은유적 님의 인식
<연구 2> 절대진리를 향한 열정
본문내용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를 보면 앞날에 올 님과의 만남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의 독립사상의 근저에 살아있는 국권회복의 의지가 시상화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시의 창조의 관례에서 ‘님’의 인식은 우리의 시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것으로서,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에 이르는 법칙성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신동욱, <한용운의 생애와 문학>, 『한국현대시인연구 8 - 한용운』, 문학세계사, 1993.
<연구 2> 절대진리를 향한 열정
한용운의「알 수 없어요」는 6연을 제외하면 모든 연이 <어떠어떠한 것은 누구의 무엇입니까?>라는 구문으로 되어 었다. 1연부터 5연까지 열거되어 있는 <어떠어떠한 것>들은 모두 시인의 섬세한 관찰이 목격한 자연 세계의 신비로운 모습들이다. 시인이 관찰하고 묘사한 세계의 모습을 자신의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에 대한 감상의 본령이 되어야 한다.
시인은 다섯 개의 사물 또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노래한다.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시내, 저녁 노을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존재한다. 오동잎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이고, 저녁 노을은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이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사물은 매우 풍성한 느낌과 의미를 갖는다. 시인은 구체적 상황 속의 정경을 멋진 언어로 선명하게 제시한다. 바로 이 정경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 이 시의 감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마지막 연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시인은 자연 현상을 노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가슴을 노래한다. 그리도 다소 엉뚱하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해석이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아주 소박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즉,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에 대한 이유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타는 것들은 언제나 그침이 있다. 장작을 태우면 한참 동안 불이 타다가 장작이 되면 불이 꺼져야 한다. 이런 상식에 입각하면 나의 불타는 가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한다. 그렇지만 그칠 줄 모르고 타는 것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연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의 가슴은 그칠 줄 모르고 탄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어서 생각해 볼 점은, 왜 시인의 가슴이 타는가 하는 의문이다. 보통 가슴이 탄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열정과 간구를 나타낸다. 시인은 끊임없는 열정과 간구 속에 있다. 그 대상이 분명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시에 나타난 그 ‘누구’란 과연 누구일까? 일차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답은 자연의 질서를 관장하는 절대자 혹은 절대적 진리다. 이렇게 보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가슴은 곧 절대적 진리를 향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사랑에 깊이 빠지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신비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 또는 상관물로 보일 수 있다.
<발표조 해석>
이 작품을 읽으면 한적한 암자에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는 만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작품 전반에 드러나는 섬세하고 고요한 성찰은 수도승다운 면모라고 할 수 있다. 한 폭의 동양화같은 잔잔한 서경들은 어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 각각의 서경들을 과감하게 하나로 묶음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냈다.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오동잎같은 묘한 부분부터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보이는 하늘에 이르기까지 또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시인은 가졌다. 그리고 자연물의 근원을 생각하며 정진하는 수도승의 고뇌가 시의 마지막을 아우르고 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행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정진하는 수도승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이 행을 조국을 향한 마음과 관련시키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발자취얼굴입김노래시를 조국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해석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알 수 없어요」는 끊임없이 정진하는 수도승의 고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라고 할 수 있다. 섬세한 시각으로 자연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그 근원을 찾아가는 시인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칠 줄 모르는 그의 굳은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토론주제
1. 이 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2. 각 연에서 던져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시를 보면 앞날에 올 님과의 만남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의 독립사상의 근저에 살아있는 국권회복의 의지가 시상화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시의 창조의 관례에서 ‘님’의 인식은 우리의 시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것으로서,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에 이르는 법칙성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신동욱, <한용운의 생애와 문학>, 『한국현대시인연구 8 - 한용운』, 문학세계사, 1993.
<연구 2> 절대진리를 향한 열정
한용운의「알 수 없어요」는 6연을 제외하면 모든 연이 <어떠어떠한 것은 누구의 무엇입니까?>라는 구문으로 되어 었다. 1연부터 5연까지 열거되어 있는 <어떠어떠한 것>들은 모두 시인의 섬세한 관찰이 목격한 자연 세계의 신비로운 모습들이다. 시인이 관찰하고 묘사한 세계의 모습을 자신의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에 대한 감상의 본령이 되어야 한다.
시인은 다섯 개의 사물 또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노래한다.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시내, 저녁 노을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존재한다. 오동잎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이고, 저녁 노을은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이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사물은 매우 풍성한 느낌과 의미를 갖는다. 시인은 구체적 상황 속의 정경을 멋진 언어로 선명하게 제시한다. 바로 이 정경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 이 시의 감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마지막 연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시인은 자연 현상을 노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가슴을 노래한다. 그리도 다소 엉뚱하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해석이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아주 소박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즉,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에 대한 이유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타는 것들은 언제나 그침이 있다. 장작을 태우면 한참 동안 불이 타다가 장작이 되면 불이 꺼져야 한다. 이런 상식에 입각하면 나의 불타는 가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한다. 그렇지만 그칠 줄 모르고 타는 것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연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의 가슴은 그칠 줄 모르고 탄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어서 생각해 볼 점은, 왜 시인의 가슴이 타는가 하는 의문이다. 보통 가슴이 탄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열정과 간구를 나타낸다. 시인은 끊임없는 열정과 간구 속에 있다. 그 대상이 분명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시에 나타난 그 ‘누구’란 과연 누구일까? 일차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답은 자연의 질서를 관장하는 절대자 혹은 절대적 진리다. 이렇게 보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가슴은 곧 절대적 진리를 향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사랑에 깊이 빠지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신비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 또는 상관물로 보일 수 있다.
<발표조 해석>
이 작품을 읽으면 한적한 암자에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는 만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작품 전반에 드러나는 섬세하고 고요한 성찰은 수도승다운 면모라고 할 수 있다. 한 폭의 동양화같은 잔잔한 서경들은 어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 각각의 서경들을 과감하게 하나로 묶음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냈다.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오동잎같은 묘한 부분부터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보이는 하늘에 이르기까지 또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시인은 가졌다. 그리고 자연물의 근원을 생각하며 정진하는 수도승의 고뇌가 시의 마지막을 아우르고 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행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정진하는 수도승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이 행을 조국을 향한 마음과 관련시키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발자취얼굴입김노래시를 조국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해석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알 수 없어요」는 끊임없이 정진하는 수도승의 고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라고 할 수 있다. 섬세한 시각으로 자연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그 근원을 찾아가는 시인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칠 줄 모르는 그의 굳은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토론주제
1. 이 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2. 각 연에서 던져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추천자료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은유구조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은유구조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타난 불교사상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타난 불교사상 [시감상문]한용운의 님의침묵
[시감상문]한용운의 님의침묵 [만해 한용운][님의 침묵]만해 한용운과 한용운의 시 및 님의 침묵 분석(한용운의 불교 사상,...
[만해 한용운][님의 침묵]만해 한용운과 한용운의 시 및 님의 침묵 분석(한용운의 불교 사상,... [만해 한용운][만해 한용운의 사상][님의 침묵][시 세계]만해 한용운의 사상, 님의 침묵과 시...
[만해 한용운][만해 한용운의 사상][님의 침묵][시 세계]만해 한용운의 사상, 님의 침묵과 시... [만해 한용운][님의 침묵]만해 한용운과 님의 침묵(만해 한용운 생애, 만해 한용운 연보, 만...
[만해 한용운][님의 침묵]만해 한용운과 님의 침묵(만해 한용운 생애, 만해 한용운 연보, 만... 한용운- 님의 침묵 지도안
한용운- 님의 침묵 지도안 한용운 '님의침묵' 지도안과 피피티
한용운 '님의침묵' 지도안과 피피티 한용운, <님의 침묵>, <복종>, <나룻배와 행인>,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님의 침묵>, <복종>, <나룻배와 행인>, <알 수 없어요>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의 문학사적 의의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의 문학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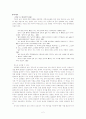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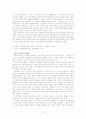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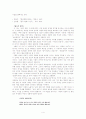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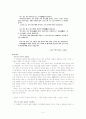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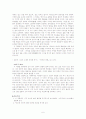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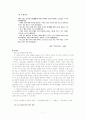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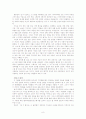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