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헌법제판소 결정정족수의 입법적 연혁과 법적근거
1. 헌법소송에 있어 결정정족수 규정의 연혁
2. 결정종족수에 관한 법적근거
Ⅲ. 재판부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 결정정족수
1. 가중된 결정정족수의 일반적 문제점
2. 법률의 위헌결정에 있어 결정정종수
3.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4. 종전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의견변경
Ⅳ.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결정정족수
1. 권한쟁의심판의 일반적 내용
2.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
1) 권한쟁의심판의 계쟁물로서의 법률
2) 권한쟁의에서 다투어진 법률의 효력
3. 법률에 관한 권한쟁의결정을 할 경우의 정족수
1) 가중된 결정정족수와 일반적인 결정정족수
2) 정족수의 편차에 대한 처리방안
Ⅴ. 문제 및 개선방안
1. 문제의 정리
2. 개선방안
1) 결정정족수를 과반수로 완화
2) 구성과정에서 가중다수결의 도입
Ⅰ. 문제제기
Ⅱ. 헌법제판소 결정정족수의 입법적 연혁과 법적근거
1. 헌법소송에 있어 결정정족수 규정의 연혁
2. 결정종족수에 관한 법적근거
Ⅲ. 재판부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 결정정족수
1. 가중된 결정정족수의 일반적 문제점
2. 법률의 위헌결정에 있어 결정정종수
3.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4. 종전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의견변경
Ⅳ.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결정정족수
1. 권한쟁의심판의 일반적 내용
2.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
1) 권한쟁의심판의 계쟁물로서의 법률
2) 권한쟁의에서 다투어진 법률의 효력
3. 법률에 관한 권한쟁의결정을 할 경우의 정족수
1) 가중된 결정정족수와 일반적인 결정정족수
2) 정족수의 편차에 대한 처리방안
Ⅴ. 문제 및 개선방안
1. 문제의 정리
2. 개선방안
1) 결정정족수를 과반수로 완화
2) 구성과정에서 가중다수결의 도입
본문내용
判에 있어서는 請求認容決定이 선고되지만 法律은 合憲으로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관한 위헌여부의 판단은 主文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理由에서 그러한 취지를 설시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權限爭議審判의 請求認容은 主文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權限爭議審判에 있어 審判請求의 認容決定을 하는 것이지만 근거가 된 법률의 효력은 존속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심판청구인에 의해 또다시 당해 법률에 관해 심판청구가 되었을 경우 前訴와 동일한 형태의 결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당해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법률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러한 방안도 重要한 理由의 羈束力을 인정하는 경우 법률에 관한 위헌해석의 기속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거듭 논란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이것이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운용함에 있어 問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Ⅴ. 문제 및 개선방안
1. 문제의 정리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헌법소송에 있어서의 결정정족수는 제헌헌법에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무비판적으로 현재에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에 대한 갈등은 大法院이 憲法訴訟을 담당하던 제3공화국헌법하에서 표면화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후 더이상 이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재판관에 대해 제척, 기피 및 회피가 있을 경우 헌법소송절차 전반에 있어 審判請求의 인용결정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決定定足數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 것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 것이다. 이것은 헌법체계 상 부조화현상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가 없이 憲法改正이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절차를 헌법상의 제도로 도입함에 있어서는 관련제도와의 상충관계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고려없이 헌법개정과정에서 수용된 것이 바로 權限爭議審判에 있어서의 決定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이 행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원적인 적용상태가 등장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의 해결방안으로는, 즉 法律에 관해서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지만 權限爭議審判에 있어서는 審判請求의 認容決定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문에서는 단지 권한쟁의에 관한 판단만을 제시하고, 법률에 관한 위헌여부의 판단은 이유에서 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현행의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정족수를 특정한 경우에 대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중하여 규정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결정정족수를 과반수로 완화
법률의 위헌결정등 에 관한 定足數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아울러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審理定足數도 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에 있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원래 개선방안으로는 헌법개정과정에서 決定定足數를 裁判官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는 方案과 裁判官의 過半數로 규정하는 方案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過半數로 하여야만 문제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에 있어 審理定足數를 7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다 할지라도 부당하게 적은 인원에 의해 위헌결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즉 최소한 4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여야만 審判請求의 認容決定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具體的인 人員을 限定하는 것은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첫째로는, 재판관이 闕位나 除斥, 忌避, 回避 등으로 缺員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부담을 심판청구인이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權限爭議審判에 있어 係爭物이 法律이 되었을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2) 구성과정에서 가중다수결의 도입
헌법재판의 일정절차에 있어 決定定足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예컨대 헌법재판소로부터의 입법자의 존중이라든가 소수파의 보호 등에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목적은 다른 방법에 의해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구성과정에서 加重多數決을 규정하여 民主的 正當性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행법상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재판관의 구성절차는 삼부구성형 을 채택하고 있는 것 등이다.
아무튼 재판관의 임기는 6년보다 장기인 10년이나 12년으로 하고 單任制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성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추천회의
) 예컨대 제3공화국헌법상의 法官推薦會議가 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에서 헌법재판관후보를 추천하고, 國會가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임명동의에 대한 의결을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보자를 大統領이 임명하는 이른바 단계적 구성방법
) 裵俊相, 法學論叢 제9집, 37면; 拙稿, 論文集 제13집, 441면 이하 참조.
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充電 도 가능하고 또 政治的 任命可能性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관추천회의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국회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상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반면에 결정절차에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현재의 방법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구성절차에 있어 민주적인 요소를 최대한 투입시키고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그 통제를 완화함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Ⅴ. 문제 및 개선방안
1. 문제의 정리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헌법소송에 있어서의 결정정족수는 제헌헌법에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무비판적으로 현재에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에 대한 갈등은 大法院이 憲法訴訟을 담당하던 제3공화국헌법하에서 표면화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후 더이상 이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재판관에 대해 제척, 기피 및 회피가 있을 경우 헌법소송절차 전반에 있어 審判請求의 인용결정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決定定足數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 것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 것이다. 이것은 헌법체계 상 부조화현상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가 없이 憲法改正이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절차를 헌법상의 제도로 도입함에 있어서는 관련제도와의 상충관계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고려없이 헌법개정과정에서 수용된 것이 바로 權限爭議審判에 있어서의 決定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이 행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원적인 적용상태가 등장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의 해결방안으로는, 즉 法律에 관해서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지만 權限爭議審判에 있어서는 審判請求의 認容決定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문에서는 단지 권한쟁의에 관한 판단만을 제시하고, 법률에 관한 위헌여부의 판단은 이유에서 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현행의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정족수를 특정한 경우에 대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중하여 규정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결정정족수를 과반수로 완화
법률의 위헌결정등 에 관한 定足數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아울러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審理定足數도 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에 있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원래 개선방안으로는 헌법개정과정에서 決定定足數를 裁判官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는 方案과 裁判官의 過半數로 규정하는 方案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過半數로 하여야만 문제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에 있어 審理定足數를 7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다 할지라도 부당하게 적은 인원에 의해 위헌결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즉 최소한 4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여야만 審判請求의 認容決定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具體的인 人員을 限定하는 것은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첫째로는, 재판관이 闕位나 除斥, 忌避, 回避 등으로 缺員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부담을 심판청구인이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權限爭議審判에 있어 係爭物이 法律이 되었을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2) 구성과정에서 가중다수결의 도입
헌법재판의 일정절차에 있어 決定定足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예컨대 헌법재판소로부터의 입법자의 존중이라든가 소수파의 보호 등에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목적은 다른 방법에 의해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구성과정에서 加重多數決을 규정하여 民主的 正當性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행법상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재판관의 구성절차는 삼부구성형 을 채택하고 있는 것 등이다.
아무튼 재판관의 임기는 6년보다 장기인 10년이나 12년으로 하고 單任制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성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추천회의
) 예컨대 제3공화국헌법상의 法官推薦會議가 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에서 헌법재판관후보를 추천하고, 國會가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임명동의에 대한 의결을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보자를 大統領이 임명하는 이른바 단계적 구성방법
) 裵俊相, 法學論叢 제9집, 37면; 拙稿, 論文集 제13집, 441면 이하 참조.
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充電 도 가능하고 또 政治的 任命可能性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관추천회의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국회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상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반면에 결정절차에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현재의 방법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구성절차에 있어 민주적인 요소를 최대한 투입시키고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그 통제를 완화함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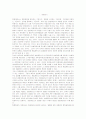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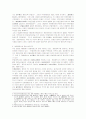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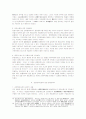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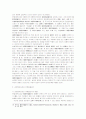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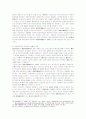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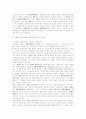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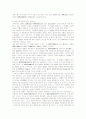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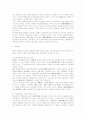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