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실험 목적
Ⅱ. 배경 이론
Ⅲ. 실험 기구
Ⅳ. 실험 과정
Ⅴ. 실험 결과 및 분석
Ⅵ. 고찰
Ⅱ. 배경 이론
Ⅲ. 실험 기구
Ⅳ. 실험 과정
Ⅴ. 실험 결과 및 분석
Ⅵ. 고찰
본문내용
이다. 함수비가 극적으로 증가한다면, 물 분자의 층이 두꺼워져 물 분자 간에도 서로 반발하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는 모래 입자와 물 분자 간에 인력과 상쇄되므로 모래 입자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모관현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
② 점성토 분석
사질토와는 달리 입자들이 서로 붙어있는 경향을 가진 점성토를 다졌음에도 몰드를 제거했을 때 쓰러진 이유는 너무 높은 높이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에서 쓰러진 점성토의 사진을 봤을 때 사질토와는 달리 입자들이 서로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점토 분말 50g에 함수비 40%에 해당하는 물 20g을 넣고 섞은 후, 주사위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을 때 형상을 유지하는 것은 점성토의 입자들이 매우 작아 공기가 물로 이동할 수 없고 극성이 존재하는 점토 입자와 이중 층수를 지닌 물 분자가 만나면서 흡착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 흡착작용이 입자 간 거리를 좁히고 분자력을 강하게 하므로 입자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질토와는 달리 점성토를 물에 담갔을 때 형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점토 시료를 진공 챔버에 넣고 진공압을 가할 때 성형시킨 시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소의 기압에서는 점토의 입자가 매우 작아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진공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시료 속 공기를 배출시켰다. 시료 속 공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간극이 생겼으며, 점토의 입자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흙입자들 간의 인력이 작용하지 못하고 형상이 무너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함수비 측정 분석
건조 후 측정한 함수비 캔+시료(21.8g)와 함수비 캔(17.46)을 빼면 흙 입자의 무게(4.34g)가 나오고, 건조 전 함수비 캔+시료(23.46g)와 건조 후 함수비 캔+시료(21.8g)을 빼면 물의 무게인 1.66g가 나온다.
함수비는 흙 입자의 무게와 흙 속 물의 무게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므로 물 무게(1.66g)를 흙 입자의 무게(4.34g)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38.24%인 함수비를 측정할 수 있다.
(흙 입자의 비중)=2.65, (점토의 간극비)=1.2로 가정할 때, 포화도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Ⅵ. 고찰
이번 함수비 실험을 진행한 후, 사질토와 점성토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파악했고, 실제 함수비, 포화도를 산출해 보았다.
실험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점착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질토로 모래성을 쌓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함수비 실험을 통해서 사질토는 입자들의 크기가 균질하므로 내부에 공간이 많이 존재하고, 전자기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입자 간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거의 없으며, 입자의 크기가 다른 흙보다 크므로 중력의 힘이 강해 쌓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점성토는 사질토와는 달리 점토 입자 들 사이의 흡착력으로 인하여 결합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사질토와는 달리 입자 간의 간격도 작으므로 쉽게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측정한 함수비는 38.24% 가 나왔는데 가정한 이론적 함수비(40%)보다 작게 나왔다. 우리 조는 주사위 모양으로 시료를 성형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함에 따라 손의 열에 의해 주사위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였고, 이 이유로 주사위의 각 면이 매끄럽게 유지되지 못하고 균열이 생겨 표면적이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균열 증가로 시료 속의 수분 증발이 촉진되었으며, 오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흙과 물을 섞는 과정에서 모든 시료에서의 함수비가 균일해지기 전에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트레이에서 탈락한 흙이 오차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점성토와 물을 섞을 때, 분자간의 인력이 너무 강해 손으로 시료에 물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오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이번 실험에서 우리는 흙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조교님들의 말에 의존하여 각 시료의 무게를 500g, 50g 으로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도 오차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다. 보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작은 요인도 지나치지 않고 과정에 포함해야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Ⅶ. 참고문헌
① 우상인, 박정희 교수님. 제 4장. 흙의 삼상/함수비. 2023년도. p.19-22.
② 우상인 교수님. 제 1장. 흙의 기본성질. 2022년도. p.17-21.
③ 실험, et al. \"표면장력측정.\"
② 점성토 분석
사질토와는 달리 입자들이 서로 붙어있는 경향을 가진 점성토를 다졌음에도 몰드를 제거했을 때 쓰러진 이유는 너무 높은 높이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에서 쓰러진 점성토의 사진을 봤을 때 사질토와는 달리 입자들이 서로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점토 분말 50g에 함수비 40%에 해당하는 물 20g을 넣고 섞은 후, 주사위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을 때 형상을 유지하는 것은 점성토의 입자들이 매우 작아 공기가 물로 이동할 수 없고 극성이 존재하는 점토 입자와 이중 층수를 지닌 물 분자가 만나면서 흡착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 흡착작용이 입자 간 거리를 좁히고 분자력을 강하게 하므로 입자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질토와는 달리 점성토를 물에 담갔을 때 형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점토 시료를 진공 챔버에 넣고 진공압을 가할 때 성형시킨 시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소의 기압에서는 점토의 입자가 매우 작아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진공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시료 속 공기를 배출시켰다. 시료 속 공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간극이 생겼으며, 점토의 입자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흙입자들 간의 인력이 작용하지 못하고 형상이 무너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함수비 측정 분석
건조 후 측정한 함수비 캔+시료(21.8g)와 함수비 캔(17.46)을 빼면 흙 입자의 무게(4.34g)가 나오고, 건조 전 함수비 캔+시료(23.46g)와 건조 후 함수비 캔+시료(21.8g)을 빼면 물의 무게인 1.66g가 나온다.
함수비는 흙 입자의 무게와 흙 속 물의 무게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므로 물 무게(1.66g)를 흙 입자의 무게(4.34g)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38.24%인 함수비를 측정할 수 있다.
(흙 입자의 비중)=2.65, (점토의 간극비)=1.2로 가정할 때, 포화도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Ⅵ. 고찰
이번 함수비 실험을 진행한 후, 사질토와 점성토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파악했고, 실제 함수비, 포화도를 산출해 보았다.
실험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점착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질토로 모래성을 쌓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함수비 실험을 통해서 사질토는 입자들의 크기가 균질하므로 내부에 공간이 많이 존재하고, 전자기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입자 간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거의 없으며, 입자의 크기가 다른 흙보다 크므로 중력의 힘이 강해 쌓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점성토는 사질토와는 달리 점토 입자 들 사이의 흡착력으로 인하여 결합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사질토와는 달리 입자 간의 간격도 작으므로 쉽게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측정한 함수비는 38.24% 가 나왔는데 가정한 이론적 함수비(40%)보다 작게 나왔다. 우리 조는 주사위 모양으로 시료를 성형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함에 따라 손의 열에 의해 주사위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였고, 이 이유로 주사위의 각 면이 매끄럽게 유지되지 못하고 균열이 생겨 표면적이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균열 증가로 시료 속의 수분 증발이 촉진되었으며, 오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흙과 물을 섞는 과정에서 모든 시료에서의 함수비가 균일해지기 전에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트레이에서 탈락한 흙이 오차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점성토와 물을 섞을 때, 분자간의 인력이 너무 강해 손으로 시료에 물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오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이번 실험에서 우리는 흙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조교님들의 말에 의존하여 각 시료의 무게를 500g, 50g 으로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도 오차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다. 보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작은 요인도 지나치지 않고 과정에 포함해야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Ⅶ. 참고문헌
① 우상인, 박정희 교수님. 제 4장. 흙의 삼상/함수비. 2023년도. p.19-22.
② 우상인 교수님. 제 1장. 흙의 기본성질. 2022년도. p.17-21.
③ 실험, et al. \"표면장력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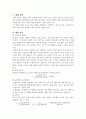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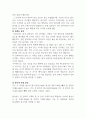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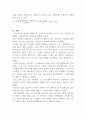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