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한림별곡의 구조적 특성
2.1.1 경기체가란 무엇인가
2.1.2 경기체가엔 어떤 작품이 있는가
2.1.3 경기체가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각 학자들간의 분석
2.1.4 경기체가의 정전으로서 한림별곡의 구조적 분석
2.1.5 한림별곡이 다른 경기체가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2.2 한림별곡의 신역사주의적 접근
2.2.1 신역사주의란 무엇인가
2.2.1.1 신역사주의의 배경
2.2.1.2신역사주의의 특징
2.2.1.3 신역사주의적 관점에서의 텍스트 접근 방법의 의의
2.2.2 한림별곡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접근
2.2.2.1 고려시대
2.2.2.2 조선시대
3. 결론
2. 본론
2.1 한림별곡의 구조적 특성
2.1.1 경기체가란 무엇인가
2.1.2 경기체가엔 어떤 작품이 있는가
2.1.3 경기체가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각 학자들간의 분석
2.1.4 경기체가의 정전으로서 한림별곡의 구조적 분석
2.1.5 한림별곡이 다른 경기체가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2.2 한림별곡의 신역사주의적 접근
2.2.1 신역사주의란 무엇인가
2.2.1.1 신역사주의의 배경
2.2.1.2신역사주의의 특징
2.2.1.3 신역사주의적 관점에서의 텍스트 접근 방법의 의의
2.2.2 한림별곡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접근
2.2.2.1 고려시대
2.2.2.2 조선시대
3. 결론
본문내용
서사물을 창작했다는 것은, 무신들에게 있어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무신들이 자신들만의 암호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신들에 대한 무시 내지 멸시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역사주의 비평방법으로 보았을 때, 앞의 텍스트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당시의 서사물들에서는, 억압적인 담론통제 상황에 의해 직접비판적인 서사는 없다. 하지만, 진화의 <봉사입급>이나 이규보의 <경설>등에는 문인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이 간간히 나타나며, 따라서, 한림별곡은 압제적인 무단정치상황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암시를 보여준 서사물로 생각된다.
무신정권은 머지않아 몽고의 침입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된다. 몽고는 국호를 \'원\'으로 고치고,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마국인 고려에서는 그에 협조하여 일신상의 영달을 누리는 세력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원세력을 등에 업고, 대토지를 소유하며, 정치, 경제 등을 잠식해 나갔다. 대표적 인물은 기철, 권겸 등이다. 이들의 정치 배타적 성향은 극에 달해, 많은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하는 등, 오히려 문벌귀족 하의 사회적 모순보다, 그 폐해가 컸다. 앞서 이미 묘청의 난과 무신의 난을 통해 두번의 실패를 겪은 문인들의 꿈 또한 권문세족의 발호에 의해 또다시 꺾여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권문세족의 폐단도 \'원\'의 세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한족의 나라인 \'명\'이 흥기하게 됨으로서, 점차 줄어들 기미를 보이게 된다. 공민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원, 명 교체기)을 잘 읽어 내어 개혁을 실시하였다. 공민왕은 이미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던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많은 인재를 등용하였는데, 이시기의 문인들인 신진사류들은 이러한 기회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정계에 진출하였다. 비록 공민왕의 개혁이 좌절되었지만, 이러한 신진사류들은 새로 들어온 성리학을 이념적 무기로 삼고, 유교정치이념을 내세우며, 또한 새롭게 성장한 신흥무인세력과 함께,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2.2.2.선택된 시대로서 - 조선초기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과, 정도전, 권근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로 알려져 있다. 이들 건국 세력들은 보통 훈구세력들로 불려져 왔다. 건국 초기에 한림별곡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다. 악학궤범, 고려사 악지, 악학편고, 악장가사, 금보 등 현존하는 당시의 텍스트에서 한림별곡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한림별곡을 중심으로 경기체가에 관심을 가졌을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체가는 충효가 한 작품을 제외하고, 조선 초기부터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쓰였다. 물론 이 이외에도 경기체가는 더 창작되었을 수도 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한 주류에서 밀려났던것 같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체가가 주로 창작된 시기는 훈구세력이 정치의 중심에 섰던 시기와 일치한다. 경기체가는 왜, 조선 초기에 주로 쓰였으며, 특히, 세종과 성종시기에 많이 쓰였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밝힌 방법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그물망처럼 구성해보고자 한다.
- 불씨잡변, 정도전
噫. 世之人 厭常而喜怪 棄實利而崇虛法 如此 可勝歎哉. 客不覺 下拜 曰 今聞夫子之言 始知儒者之言爲正 而佛氏之說爲非也. 子之言 揚雄不如也.
아 ! 세상 사람들이 떳떳함을 싫어하고 괴이한 것을 좋아하며, 실리를 버리고 허법을 숭상함이 이와 같으니 가히 한탄스럽구나.\"
하니 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절을 하고 말하기를 \"이제 그대의 말을 듣고 비로소 儒者의 말이 옳고 불씨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대의 말은 양웅도 그러하지 못하다.\"
於是幷書卷末 以備一說焉.
이에 권말에 병서하여 일설을 갖춘다.
정도전의 불씨잡변은 조선 초 집권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의 이념적 성격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그들,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인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를 살핌으로서, 그들이 괴이하고, 모순됨을 주장하여, 이러한 사상은 당시 척불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척불운동의 이면에는 조선의 건국 세력은 고려의 멸망과 함께, 그 전 시대인 고려를 부정하여 자신들의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 최초의 목표였다. 유교의 관점에서도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건국세력은 불충으로 매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이들은 고려 정권의 부당함을 폭로하여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그들의 이념부터 부정하는 것이 선행되야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들을 토대로 볼 때, 신역사주의 비평 방법에 따르면, 작품의 해석은 현실에 대한 특정한 이해관계들을 유지하는 약호와 관계 안에서 극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는 작품을, 현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작품을 읽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용도로 이용하는데, 조선 시대의 훈구 세력들로 대표되는, 개국공신 세력들은 한림별곡을 개국을 정당화하는 서사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을 개국한 세력들의 특징은 새로이 일어난 세력의 특성상 활기차고 패기있는 성향을 보이고, 자신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문인들의 활달한 생활이 담겨 있는 한림별곡을, 그들의 눈으로 고려시대의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담론통제 상황에서 문치주의를 주장한 서사물로 재조명한 것이다.
즉, 조선건국세력에게 한림별곡은 두 가지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하나는 앞선시대를 최대한 부정해서 자신들의 건국의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건국세력, 자신들이 희망하는 정치사상이, 한림별곡의 작자들의 이상인 문치주의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텍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성격을 짐작하게끔 할 수 있다.
- 김종서의 시조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파랑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박철희, 『문학개론』, 형설출판사, 1985, pp146
- 이방원의 하여가
이런들 엇떠하며 저런들 엇떠하리
만수산 드렁
따라서, 신역사주의 비평방법으로 보았을 때, 앞의 텍스트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당시의 서사물들에서는, 억압적인 담론통제 상황에 의해 직접비판적인 서사는 없다. 하지만, 진화의 <봉사입급>이나 이규보의 <경설>등에는 문인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이 간간히 나타나며, 따라서, 한림별곡은 압제적인 무단정치상황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암시를 보여준 서사물로 생각된다.
무신정권은 머지않아 몽고의 침입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된다. 몽고는 국호를 \'원\'으로 고치고,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마국인 고려에서는 그에 협조하여 일신상의 영달을 누리는 세력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원세력을 등에 업고, 대토지를 소유하며, 정치, 경제 등을 잠식해 나갔다. 대표적 인물은 기철, 권겸 등이다. 이들의 정치 배타적 성향은 극에 달해, 많은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하는 등, 오히려 문벌귀족 하의 사회적 모순보다, 그 폐해가 컸다. 앞서 이미 묘청의 난과 무신의 난을 통해 두번의 실패를 겪은 문인들의 꿈 또한 권문세족의 발호에 의해 또다시 꺾여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권문세족의 폐단도 \'원\'의 세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한족의 나라인 \'명\'이 흥기하게 됨으로서, 점차 줄어들 기미를 보이게 된다. 공민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원, 명 교체기)을 잘 읽어 내어 개혁을 실시하였다. 공민왕은 이미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던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많은 인재를 등용하였는데, 이시기의 문인들인 신진사류들은 이러한 기회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정계에 진출하였다. 비록 공민왕의 개혁이 좌절되었지만, 이러한 신진사류들은 새로 들어온 성리학을 이념적 무기로 삼고, 유교정치이념을 내세우며, 또한 새롭게 성장한 신흥무인세력과 함께,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2.2.2.선택된 시대로서 - 조선초기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과, 정도전, 권근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로 알려져 있다. 이들 건국 세력들은 보통 훈구세력들로 불려져 왔다. 건국 초기에 한림별곡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다. 악학궤범, 고려사 악지, 악학편고, 악장가사, 금보 등 현존하는 당시의 텍스트에서 한림별곡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한림별곡을 중심으로 경기체가에 관심을 가졌을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체가는 충효가 한 작품을 제외하고, 조선 초기부터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쓰였다. 물론 이 이외에도 경기체가는 더 창작되었을 수도 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한 주류에서 밀려났던것 같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체가가 주로 창작된 시기는 훈구세력이 정치의 중심에 섰던 시기와 일치한다. 경기체가는 왜, 조선 초기에 주로 쓰였으며, 특히, 세종과 성종시기에 많이 쓰였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밝힌 방법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그물망처럼 구성해보고자 한다.
- 불씨잡변, 정도전
噫. 世之人 厭常而喜怪 棄實利而崇虛法 如此 可勝歎哉. 客不覺 下拜 曰 今聞夫子之言 始知儒者之言爲正 而佛氏之說爲非也. 子之言 揚雄不如也.
아 ! 세상 사람들이 떳떳함을 싫어하고 괴이한 것을 좋아하며, 실리를 버리고 허법을 숭상함이 이와 같으니 가히 한탄스럽구나.\"
하니 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절을 하고 말하기를 \"이제 그대의 말을 듣고 비로소 儒者의 말이 옳고 불씨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대의 말은 양웅도 그러하지 못하다.\"
於是幷書卷末 以備一說焉.
이에 권말에 병서하여 일설을 갖춘다.
정도전의 불씨잡변은 조선 초 집권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의 이념적 성격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그들,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인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를 살핌으로서, 그들이 괴이하고, 모순됨을 주장하여, 이러한 사상은 당시 척불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척불운동의 이면에는 조선의 건국 세력은 고려의 멸망과 함께, 그 전 시대인 고려를 부정하여 자신들의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 최초의 목표였다. 유교의 관점에서도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건국세력은 불충으로 매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이들은 고려 정권의 부당함을 폭로하여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그들의 이념부터 부정하는 것이 선행되야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들을 토대로 볼 때, 신역사주의 비평 방법에 따르면, 작품의 해석은 현실에 대한 특정한 이해관계들을 유지하는 약호와 관계 안에서 극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는 작품을, 현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작품을 읽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용도로 이용하는데, 조선 시대의 훈구 세력들로 대표되는, 개국공신 세력들은 한림별곡을 개국을 정당화하는 서사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을 개국한 세력들의 특징은 새로이 일어난 세력의 특성상 활기차고 패기있는 성향을 보이고, 자신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문인들의 활달한 생활이 담겨 있는 한림별곡을, 그들의 눈으로 고려시대의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담론통제 상황에서 문치주의를 주장한 서사물로 재조명한 것이다.
즉, 조선건국세력에게 한림별곡은 두 가지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하나는 앞선시대를 최대한 부정해서 자신들의 건국의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건국세력, 자신들이 희망하는 정치사상이, 한림별곡의 작자들의 이상인 문치주의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텍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성격을 짐작하게끔 할 수 있다.
- 김종서의 시조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파랑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박철희, 『문학개론』, 형설출판사, 1985, pp146
- 이방원의 하여가
이런들 엇떠하며 저런들 엇떠하리
만수산 드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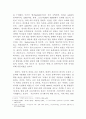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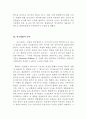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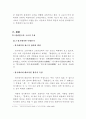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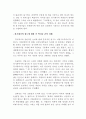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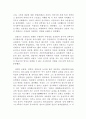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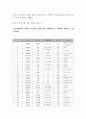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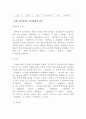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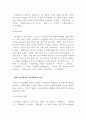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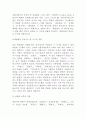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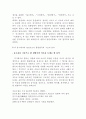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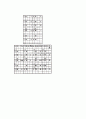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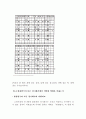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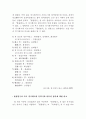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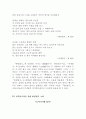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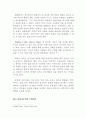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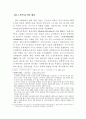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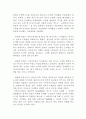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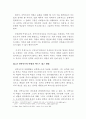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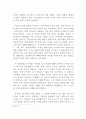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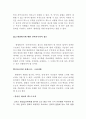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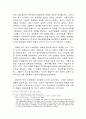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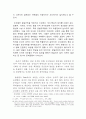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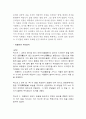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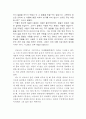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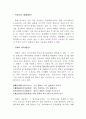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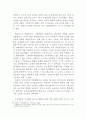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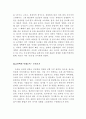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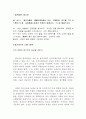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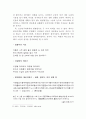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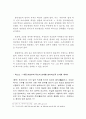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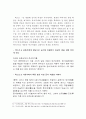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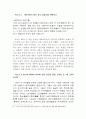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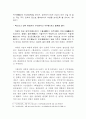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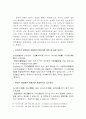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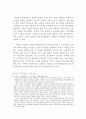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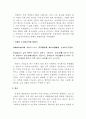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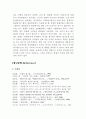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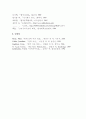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