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정조즉위 초의 시대적 상황
2. 정조의 학문 ․ 정치사상
3. 규장각의 설립
4. 규장각의 도서관적 기능
4.1 왕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4.2 왕실자료의 보관과 서적 수집, 출판기능
4.3 보존도서관으로서의 문화정책 기구의 기능
4.4 각신과 검서
4.5 규장각 각신과 검서의 권한
4.6 정조가 규장각에 하교한 수교(受敎)
4.7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교육
5. 규장각의 유례와 연혁
5.1 규장각의 시작
5.2 역대 왕의 유물 보존과 국왕의 국정 자문 학술기관으로 설립
5.3 서적 간행 기능을 흡수
5.4 최고 권력기관
5.5 외규장각의 설치
5.6 규장각 기능의 축소
5.7 고종 시대 규장각 기능의 부침(浮沈)
5.8 병인양요(丙寅洋擾)와 외규장각(外奎章閣)의 파괴
5.9 각사(各司)및 사고(史庫) 도서의 이전 통합, 제실도서(帝室圖書)
5.10 일제 통치기의 규장각과 규장각도서
5.11 현재의 규장각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Ⅱ.본 론
1. 정조즉위 초의 시대적 상황
2. 정조의 학문 ․ 정치사상
3. 규장각의 설립
4. 규장각의 도서관적 기능
4.1 왕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4.2 왕실자료의 보관과 서적 수집, 출판기능
4.3 보존도서관으로서의 문화정책 기구의 기능
4.4 각신과 검서
4.5 규장각 각신과 검서의 권한
4.6 정조가 규장각에 하교한 수교(受敎)
4.7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교육
5. 규장각의 유례와 연혁
5.1 규장각의 시작
5.2 역대 왕의 유물 보존과 국왕의 국정 자문 학술기관으로 설립
5.3 서적 간행 기능을 흡수
5.4 최고 권력기관
5.5 외규장각의 설치
5.6 규장각 기능의 축소
5.7 고종 시대 규장각 기능의 부침(浮沈)
5.8 병인양요(丙寅洋擾)와 외규장각(外奎章閣)의 파괴
5.9 각사(各司)및 사고(史庫) 도서의 이전 통합, 제실도서(帝室圖書)
5.10 일제 통치기의 규장각과 규장각도서
5.11 현재의 규장각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고, 개항 이후에는 상해(上海)에서 서양의 책들도 상당히 구입하여 규장각 부속 건물에 비치하였다. 고종의 개혁정치는 규장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되었다.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으로 왕실의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규장각은 신설된 궁내부(宮內府)에 귀속되었고, 이듬해에는 규장원(奎章院)으로 개칭되어 궁내부 산하 6개 기관 중 하나로 격하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고종 34년(1897)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정권이 바뀌고 왕실의 권한이 회복되면서 궁내부 관제가 개편될 때 규장원(奎章院)이 다시 규장각(奎章閣)으로 환원되고 기능도 회복되어 근대화 사업과 관계되는 신서(新書)를 다시 구입 관리하였다.
5.8 병인양요(丙寅洋擾)와 외규장각(外奎章閣)의 파괴
고종 3년(1866)발생한 병인양요 때에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외규장각 건물과 소장도서 5천여 책을 방화 파괴하면서 의궤(儀軌) 3백여 책을 약탈해 갔다. 그 책들이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수년 전부터 우리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반환 교섭을 벌여 왔다.
<그림>휘경원원소도감의궤/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던 외규장각 도서1권
<그림>외규장각 주변의 프랑스 군인들/강화부의 관아와 행궁, 그리고 외규장각 주변을 행진하는 프랑스 군대. 1866년. 프랑스 해군장교 앙리 쥐베르 그림
<그림>강화도 고려궁지에 복원되어진 외규장각
5.9 각사(各司)및 사고(史庫) 도서의 이전 통합, 제실도서(帝室圖書)
고종이 순종에 양위한 직후인 융희1년(1907) 11월의 관제(官制)개정으로 규장각의 기능이 대폭 변경되었다. 규장각은 전래의 기본 임무인 역대 왕의 유물과 저술을 보관하는 업무 이외에 종친부와 홍문관의 업무를 통괄 담당하게 되었다. 우선 직제가 칙임(勅任)의 대제학(大提學) 1인과 제학(提學) 10인 이내, 주임(奏任)의 부제학(副提學) 10인 이내 외에 고문으로 칙임의 기후관(祇侯官) 10인으로 확대되었는데, 당시 최고의 중신(重臣)들 중에서 선임되었다.
규장각의 주 업무가 국유 도서관리가 되면서, 홍문관(弘文館), 시강원(侍講院), 집옥재(集玉齋), 춘추관(春秋館) 등에 소장되었던 책들과 지방의 사고(史庫)에 보관되었던 전적(典籍) 도합 10여만 권이 규장각 도서로 통합되어 제실도서(帝室圖書)로 명명되었다. 이때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등이 규장각으로 이관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정족산 사고/전등사 대웅전 뒤쪽에 있는 삼성각에서 서쪽으로 5분만 걸어가면 정족산 사고인 장사각과 선원각이 있다. 정족산 사고는 1678년(조선 숙종4년)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장소이다.
5.10 일제 통치기의 규장각과 규장각도서
1910년 한일합방으로 규장각은 폐지되고, 제실도서는 잠시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으나, 이듬해(1911) 11월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인수하고, 역대 왕의 어제, 어필, 선원보첩 등은 창경궁 내에 이론식 건물 봉모당(奉慕堂)과 보각(譜閣)을 지어 보관하고 이왕직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1912년에는 제실도서를 참사관분실(參事官分室)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도서의 명칭이 奎章閣圖書로 바뀌었다.
1923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이 설립된 후, 조선총독부는 규장각도서를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28년부터 1930년 사이에 3차에 걸쳐 실행하였다. 이 때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된 책이 총 161,561책이었으며, 그 중 일반 동양도서로 분류된 20,648책을 제외한 140,913책이 규장각도서로 지정되었다.
규장각도서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된 후 창덕궁 내의 규장각 건물들은 수난을 겪게 되었다. 이문원 자리에는 일제의 창덕궁 경찰서가 들어섰고, 대유재(大酉齋)와 소유재(小酉齋)에는 검도장이 들어섰다. 이안각(移安閣)과 주합루(宙合樓)와 부용정(芙蓉亭)은 남아서 오늘날 창덕궁 후원안의 주요 명소가 되어 있으나, 열고관(閱庫觀), 개유와(皆酉窩), 서고(西庫)등의 부속 건물들은 헐렸다.
열고관과 개유와/지금은 사라진 정조임금 서재, 펜화
5.11 현재의 규장각
1973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설립, 도서관으로부터 규장각도서 이관자료 인수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조선 정조 즉위 원년(25세, 1776년)에 정조의 어명으로 설립되었으며, 오늘까지 살아서 한국학을 대표하고 있다.
현재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보 및 보물을 포함한 26만여 점의 고도서, 고문서, 고지도, 정부기록류, 책판 등을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은 자료를 보존, 관리함은 물론이고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한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전시 및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이자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세계적인 한국학 중심 기관이라는 종합적인 기능을 완비해 나가고 있다.
창덕궁 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내부
Ⅲ. 결 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장각은 정조 시대에 만들어진 왕실도서관이다. 창덕궁에 만들어 졌는데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면서 폐쇄되고 말았다. 그러나 규장각의 장서들은 다행히 모두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현재는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에 남아 있다. 규장각은 국립도서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도서관이라기보다 문화와 정치의 산실이라고 보아진다. 최근 국내외에서 고조되고 있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열의는 규장각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규장각의 조선의 명품들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실과 더불어 프랑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기약 없는 현실에 가슴 아프다.
Ⅳ. 참고문헌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도서출판 책과함께 2007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2001
박현욱 조선 정조조 규장각 검서관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서명균 조선후기 왕실기록관리의 법제화과정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3
이보경 창덕궁 규장각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1
방유미 정조의 왕권중심 정치와 사회 경제개혁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2000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으로 왕실의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규장각은 신설된 궁내부(宮內府)에 귀속되었고, 이듬해에는 규장원(奎章院)으로 개칭되어 궁내부 산하 6개 기관 중 하나로 격하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고종 34년(1897)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정권이 바뀌고 왕실의 권한이 회복되면서 궁내부 관제가 개편될 때 규장원(奎章院)이 다시 규장각(奎章閣)으로 환원되고 기능도 회복되어 근대화 사업과 관계되는 신서(新書)를 다시 구입 관리하였다.
5.8 병인양요(丙寅洋擾)와 외규장각(外奎章閣)의 파괴
고종 3년(1866)발생한 병인양요 때에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외규장각 건물과 소장도서 5천여 책을 방화 파괴하면서 의궤(儀軌) 3백여 책을 약탈해 갔다. 그 책들이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수년 전부터 우리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반환 교섭을 벌여 왔다.
<그림>휘경원원소도감의궤/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던 외규장각 도서1권
<그림>외규장각 주변의 프랑스 군인들/강화부의 관아와 행궁, 그리고 외규장각 주변을 행진하는 프랑스 군대. 1866년. 프랑스 해군장교 앙리 쥐베르 그림
<그림>강화도 고려궁지에 복원되어진 외규장각
5.9 각사(各司)및 사고(史庫) 도서의 이전 통합, 제실도서(帝室圖書)
고종이 순종에 양위한 직후인 융희1년(1907) 11월의 관제(官制)개정으로 규장각의 기능이 대폭 변경되었다. 규장각은 전래의 기본 임무인 역대 왕의 유물과 저술을 보관하는 업무 이외에 종친부와 홍문관의 업무를 통괄 담당하게 되었다. 우선 직제가 칙임(勅任)의 대제학(大提學) 1인과 제학(提學) 10인 이내, 주임(奏任)의 부제학(副提學) 10인 이내 외에 고문으로 칙임의 기후관(祇侯官) 10인으로 확대되었는데, 당시 최고의 중신(重臣)들 중에서 선임되었다.
규장각의 주 업무가 국유 도서관리가 되면서, 홍문관(弘文館), 시강원(侍講院), 집옥재(集玉齋), 춘추관(春秋館) 등에 소장되었던 책들과 지방의 사고(史庫)에 보관되었던 전적(典籍) 도합 10여만 권이 규장각 도서로 통합되어 제실도서(帝室圖書)로 명명되었다. 이때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등이 규장각으로 이관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정족산 사고/전등사 대웅전 뒤쪽에 있는 삼성각에서 서쪽으로 5분만 걸어가면 정족산 사고인 장사각과 선원각이 있다. 정족산 사고는 1678년(조선 숙종4년)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장소이다.
5.10 일제 통치기의 규장각과 규장각도서
1910년 한일합방으로 규장각은 폐지되고, 제실도서는 잠시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으나, 이듬해(1911) 11월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인수하고, 역대 왕의 어제, 어필, 선원보첩 등은 창경궁 내에 이론식 건물 봉모당(奉慕堂)과 보각(譜閣)을 지어 보관하고 이왕직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1912년에는 제실도서를 참사관분실(參事官分室)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도서의 명칭이 奎章閣圖書로 바뀌었다.
1923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이 설립된 후, 조선총독부는 규장각도서를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28년부터 1930년 사이에 3차에 걸쳐 실행하였다. 이 때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된 책이 총 161,561책이었으며, 그 중 일반 동양도서로 분류된 20,648책을 제외한 140,913책이 규장각도서로 지정되었다.
규장각도서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된 후 창덕궁 내의 규장각 건물들은 수난을 겪게 되었다. 이문원 자리에는 일제의 창덕궁 경찰서가 들어섰고, 대유재(大酉齋)와 소유재(小酉齋)에는 검도장이 들어섰다. 이안각(移安閣)과 주합루(宙合樓)와 부용정(芙蓉亭)은 남아서 오늘날 창덕궁 후원안의 주요 명소가 되어 있으나, 열고관(閱庫觀), 개유와(皆酉窩), 서고(西庫)등의 부속 건물들은 헐렸다.
열고관과 개유와/지금은 사라진 정조임금 서재, 펜화
5.11 현재의 규장각
1973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설립, 도서관으로부터 규장각도서 이관자료 인수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조선 정조 즉위 원년(25세, 1776년)에 정조의 어명으로 설립되었으며, 오늘까지 살아서 한국학을 대표하고 있다.
현재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보 및 보물을 포함한 26만여 점의 고도서, 고문서, 고지도, 정부기록류, 책판 등을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은 자료를 보존, 관리함은 물론이고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한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전시 및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이자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세계적인 한국학 중심 기관이라는 종합적인 기능을 완비해 나가고 있다.
창덕궁 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내부
Ⅲ. 결 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장각은 정조 시대에 만들어진 왕실도서관이다. 창덕궁에 만들어 졌는데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면서 폐쇄되고 말았다. 그러나 규장각의 장서들은 다행히 모두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현재는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에 남아 있다. 규장각은 국립도서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도서관이라기보다 문화와 정치의 산실이라고 보아진다. 최근 국내외에서 고조되고 있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열의는 규장각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규장각의 조선의 명품들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실과 더불어 프랑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기약 없는 현실에 가슴 아프다.
Ⅳ. 참고문헌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도서출판 책과함께 2007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2001
박현욱 조선 정조조 규장각 검서관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서명균 조선후기 왕실기록관리의 법제화과정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3
이보경 창덕궁 규장각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1
방유미 정조의 왕권중심 정치와 사회 경제개혁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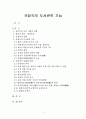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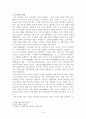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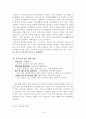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