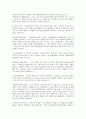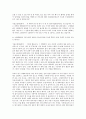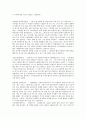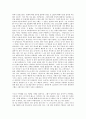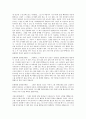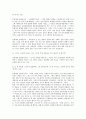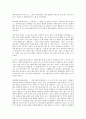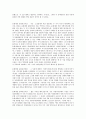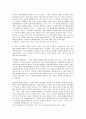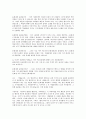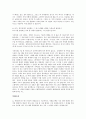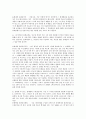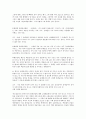목차
없음
본문내용
많이 있고 타버린 나무들도 있고 지반침하도 염려가 된다면서요?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너무 승급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입니다.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 : 성급하죠. 그리고 지금 2차 붕괴도 우려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물을 부었으면, 그리고 물을 붓고 난 다음에 당일 날도 밑에 바닥이 다 얼었지만 석재에다가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그 석축은 수축과 팽창이 계속 반복했는데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점검할 거냐, 그 문 있고 60년대 선생님 실측보고서 얘기하시는데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60년대 보수공사 할 때의 모습이, 2006년도에 실측 조사한 건 현재 있던 것 한 거니까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60년대 공사할 때 공사한 사진이 일제 때 원래 모습이 남아 있던 것하고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남대문 숭례문은 60년대부터 원형을 잃어버렸다,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 더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한마디 드릴까요. 일제 때 사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 해체 보수할 때 보면 기둥에 ...같은 게 꽂혀 있어요. 조선 초기 건물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빼 보니까 이후에 후대에 일제 때 그걸 갖다 낀 거예요. 또 기둥에 조각해서 보기 좋게 한다고 한 것이 그 후에 만들었다가 꽂아서 못으로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부 회의를 해 가지고 옛날 원형대로 가자, 그래서 진짜 그때 원형에 가깝게 간 거지 일제 때 변형이 됐다고...
복원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2년, 3년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기간을 우리가 미리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가 되죠. 어떤 문화유산이든 간에 최소한 아주 긴 시간을 상정하고 정밀하게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 당면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나라들에서 20년, 30년, 심지어 50년까지 걸리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2년, 3년에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어떤 재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복원방식에 대해서는 일제 것을 가지고 할 건가, 아니면 조선 초기의 모습이니까 그때 것을 가지고 할 건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문가들이 조금 상의해서 하시되 가급적이면 조선 초기 모습을 하는 것이
더 좋죠.
교수 :그건 당연히 국보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그 이유는 현재 숭례문의 하부구조인 육축 부분이 100% 그대로 남아 있고 양쪽도 남아 있고 1층과 2층 일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전소가 아니고 하부 기단부까지도 전소가 안 된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 국보 1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지금 사고가... 저를 비유하겠습니다. 지금 사고 났는데 모두 다 70% 이상을 성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 그러면 내 뼈대만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게 원래 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물론 어떤 형태에서 제 이름은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상실될 대로 상실된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숙정문 같은 경우 축대가 남아 있어요. 축대라는 의미는 서울 도성의 기본프레임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축대가 남아 있다고...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 : 숙정문은...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도문화재라는 거죠. 국보나 보물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숭례문은 이미 국보의 성격은 상실했다 라는 거예요. 70% 이상...
교수 : 물론 그 문화재의 진정성이나 정체성은 조금은 상실했을지라도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의미가 어느 정도가 잔존하고 현존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 : 이참에 국보 1호, 2호, 3호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국보관리번호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숭례문을 가지고 마치 지금 이렇게 상처 받은 거 또 부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70% 이상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국보가 유지시킨 국보를 유지하겠다, 이건 위장이고 오히려 우리의 가식이 아닙니까,
북대문인데, 대문은 대문인데 조선 후기 건물에서도 아주 기능도 아주 저조하게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볼 적에, 장인들이 볼 적에는 그 지은 기법 같은 것도 창작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기능 자격이 떨어지는 거고 숭례문은 옛날에 조선 초기 건물로서 참 1963년도에 완공을 했지만 대량적으로 목재를 한 것도 아니고 옛날의 그 목재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기법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결국은 숭례문이라는 하나의 유산을 물적 가치로만 볼 것이냐 아니나 하는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물적 가치로만 볼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아마 천 교수님 의견이신 것 같고, 또 우리 황 위원장님 생각은 반대이신 것 같은데 듣다보면 조금씩 다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요. 결국은 복원을, 복구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닐까요, 혹시?
교수 : 지금 현재 어디까지 남아 있고 이 문화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정체성이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 당연히 국보 1호는 존
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조건물이나 한옥구조의 화재진압에 대해 소방관들에게 가르쳐준 적이 있느냐, 무조건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다양한 건축구조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 최재욱씨께서는요. ‘그 사람이 왜 방화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약자가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또 중학교 학생이라고 밝힌 김상중군은요. ‘박물관의 유물은 삼엄한 경비를 받는데 우리나라 얼굴이라는 국보 1호가 개별 유물들보다도 허술한 경비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타깝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끝으로 최동욱씨께서는 ‘숭례문이 허술한 문화재관리시스템 속에서 소실됐는데 이를 국민의 모금을 통해 복구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 : 성급하죠. 그리고 지금 2차 붕괴도 우려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물을 부었으면, 그리고 물을 붓고 난 다음에 당일 날도 밑에 바닥이 다 얼었지만 석재에다가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그 석축은 수축과 팽창이 계속 반복했는데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점검할 거냐, 그 문 있고 60년대 선생님 실측보고서 얘기하시는데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60년대 보수공사 할 때의 모습이, 2006년도에 실측 조사한 건 현재 있던 것 한 거니까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60년대 공사할 때 공사한 사진이 일제 때 원래 모습이 남아 있던 것하고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남대문 숭례문은 60년대부터 원형을 잃어버렸다,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 더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한마디 드릴까요. 일제 때 사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 해체 보수할 때 보면 기둥에 ...같은 게 꽂혀 있어요. 조선 초기 건물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빼 보니까 이후에 후대에 일제 때 그걸 갖다 낀 거예요. 또 기둥에 조각해서 보기 좋게 한다고 한 것이 그 후에 만들었다가 꽂아서 못으로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부 회의를 해 가지고 옛날 원형대로 가자, 그래서 진짜 그때 원형에 가깝게 간 거지 일제 때 변형이 됐다고...
복원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2년, 3년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기간을 우리가 미리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가 되죠. 어떤 문화유산이든 간에 최소한 아주 긴 시간을 상정하고 정밀하게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 당면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나라들에서 20년, 30년, 심지어 50년까지 걸리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2년, 3년에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어떤 재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복원방식에 대해서는 일제 것을 가지고 할 건가, 아니면 조선 초기의 모습이니까 그때 것을 가지고 할 건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문가들이 조금 상의해서 하시되 가급적이면 조선 초기 모습을 하는 것이
더 좋죠.
교수 :그건 당연히 국보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그 이유는 현재 숭례문의 하부구조인 육축 부분이 100% 그대로 남아 있고 양쪽도 남아 있고 1층과 2층 일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전소가 아니고 하부 기단부까지도 전소가 안 된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 국보 1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지금 사고가... 저를 비유하겠습니다. 지금 사고 났는데 모두 다 70% 이상을 성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 그러면 내 뼈대만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게 원래 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물론 어떤 형태에서 제 이름은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상실될 대로 상실된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숙정문 같은 경우 축대가 남아 있어요. 축대라는 의미는 서울 도성의 기본프레임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축대가 남아 있다고...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 : 숙정문은...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도문화재라는 거죠. 국보나 보물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숭례문은 이미 국보의 성격은 상실했다 라는 거예요. 70% 이상...
교수 : 물론 그 문화재의 진정성이나 정체성은 조금은 상실했을지라도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의미가 어느 정도가 잔존하고 현존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 : 이참에 국보 1호, 2호, 3호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국보관리번호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숭례문을 가지고 마치 지금 이렇게 상처 받은 거 또 부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70% 이상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국보가 유지시킨 국보를 유지하겠다, 이건 위장이고 오히려 우리의 가식이 아닙니까,
북대문인데, 대문은 대문인데 조선 후기 건물에서도 아주 기능도 아주 저조하게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볼 적에, 장인들이 볼 적에는 그 지은 기법 같은 것도 창작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기능 자격이 떨어지는 거고 숭례문은 옛날에 조선 초기 건물로서 참 1963년도에 완공을 했지만 대량적으로 목재를 한 것도 아니고 옛날의 그 목재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기법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결국은 숭례문이라는 하나의 유산을 물적 가치로만 볼 것이냐 아니나 하는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물적 가치로만 볼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아마 천 교수님 의견이신 것 같고, 또 우리 황 위원장님 생각은 반대이신 것 같은데 듣다보면 조금씩 다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요. 결국은 복원을, 복구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닐까요, 혹시?
교수 : 지금 현재 어디까지 남아 있고 이 문화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정체성이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 당연히 국보 1호는 존
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조건물이나 한옥구조의 화재진압에 대해 소방관들에게 가르쳐준 적이 있느냐, 무조건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다양한 건축구조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 최재욱씨께서는요. ‘그 사람이 왜 방화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약자가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또 중학교 학생이라고 밝힌 김상중군은요. ‘박물관의 유물은 삼엄한 경비를 받는데 우리나라 얼굴이라는 국보 1호가 개별 유물들보다도 허술한 경비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타깝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끝으로 최동욱씨께서는 ‘숭례문이 허술한 문화재관리시스템 속에서 소실됐는데 이를 국민의 모금을 통해 복구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