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그러므로 쾌락이 곧 선인 것은 아니고, 또 쾌락이라 해서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과 종류가 다르므로 혹은 그 유래하는 바가 다르므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쾌락이 무엇이며, 또 어떤 종류의 것인가는,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들추어보면 좀 더 명백하게 될 것이다. 쾌락이란 하나의 전체요, 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어떤 쾌락이 좀더 오래 계속된다고 해서 그 형상이 완성되는 법은 없다. 또 쾌락에는 운동이라든가 생성이란 것이 없다. 쾌락은 하나의 전체이니 말이다. 모든 감성에 있어서 각기 거기 대응하는 쾌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 감성이 최선의 상태에 있는 동시에 최선의 대상에 대해서 활동할 때에 두드러지게 쾌락이 생긴다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 대상과 지각자가 모두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언제나 쾌락이 있는 법이다. 거기엔 쾌락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적 대상 혹은 감성적 대상과 이것을 식별하는 능력 혹은 관조하는 능력이 다 같이 마땅히 그것들이 있어야 할 상태에 있는 한, 그 활동에는 언제나 쾌락이 있다. 그런데 쾌락은 사람들이 욕구하는 삶도 완전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쾌락을 찾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쾌락은 모든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또 삶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쾌락은 활동을 강화하며, 또 어떤 일을 강화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고유한 것이지만,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다. 또 완전하고 다시없이 행복한 사람의 활동이 한 가지이건 혹은 그 이상이건, 이러한 활동을 완전하게 하는 쾌락이야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고유한 쾌락이요, 나머지 쾌락은 제 2차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렇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온갖 덕친애쾌락에 관해서 이야기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행복의 본성을 개설(槪說)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행복이야말로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일의 궁극 목적이니 말이다. 행복한 생활은 덕있는 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 덕있는 생활이란 노력을 요하는 것이요, 오락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그 자신의 상태에 어울리는 활동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요, 따라서 선한 사람에게는 덕에 맞는 활동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행복은 오락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좋은 쪽의 활동은 그대로 곧 보다 좋은 활동이요, 또 보다 많은 행복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즉, 행복은 소일거리에 있지 않고 덕있는 활동에 깃들여 있다. 행복이란 것이 덕을 따른 활동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최고의 덕을 따른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것에든지 그것에 고유한 것이 본성상 그것에 가장 좋고 즐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성을 따른 생활이 가장 좋고 즐거운 것이다. 이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이 또한 가장 행복한 생활이다. 최고의 의미에서 있어서 행복은 관조적 생활이다. 관조적인 생활이란 첫째, 이 활동이 최선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그것이 가장 연속적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속성 치고 불완전한 것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관조적인 삶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순수관조와 똑같은 범위에 널려 있으며, 또 관조를 더욱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하다. 행복은 순수관조에 그저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관조 속에 깃들어 있다. 순수관조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어떤 형태의 순수관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덕을 따른 생활은 제 2차적으로 행복하다. 그런 덕을 따른 활동은 우리들 인간의 형편에 어울리는 것이니 말이다. 덕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계약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온갖 행동 그리고 정념에 관련하여 우리들 각자의 의무를 지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성품의 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념과 결부되어 있다. 실천지도 역시 성품의 덕과 결부되어 있다. 윤리적인 덕은 실천지와 합치되고 정의와 관련을 가지는 까닭에 그것은 우리의 복합적 본성에 속한다. 그리고 복합적이 덕은 인간적이지만 이에 반해 이성의 덕은 독립적인 것이다. 이처럼 덕에 관해서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름지기 덕을 소유하며 활동시키려고 해야 하며, 혹은 선하게 되는 데 다른 길이 있는가 살펴서 이것을 시도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청소년 시절에 바른 양육과 훈도(訓導)를 받는 것만으로는 덕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어른이 되어서도 각기 그 일에 종사하고 또 그것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까닭에,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고 또 일반적으로 말하여 생활 전체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만 한다. 즉,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의 양육과 여러 가지 종사하는 일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법률을 만듦에 있어 입법자는 마땅히 사람들을 권유하여 덕에 나아가도록 해야 하며 또 고귀한 일을 하도록 편달(鞭撻)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선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양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붙여야 하며 여러 가지 가치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며 또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나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할진대,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모름지기 일종의 이성과 올바른 명령을 따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때 이 명령에는 힘이 있어야만 한다. 법률은 구속력이 있고, 동시에 그것은 일종의 실천지(實踐知)와 이성에서 우러나오는 규칙이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하여간 사람들을 자기의 배려에 의하여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입법(立法)할 줄 아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선인들은 입법에 관한 문제를 탐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일반으로 국제(國制)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인간성에 관한 우리의 철학을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한다.
쾌락이 무엇이며, 또 어떤 종류의 것인가는,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들추어보면 좀 더 명백하게 될 것이다. 쾌락이란 하나의 전체요, 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어떤 쾌락이 좀더 오래 계속된다고 해서 그 형상이 완성되는 법은 없다. 또 쾌락에는 운동이라든가 생성이란 것이 없다. 쾌락은 하나의 전체이니 말이다. 모든 감성에 있어서 각기 거기 대응하는 쾌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 감성이 최선의 상태에 있는 동시에 최선의 대상에 대해서 활동할 때에 두드러지게 쾌락이 생긴다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 대상과 지각자가 모두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언제나 쾌락이 있는 법이다. 거기엔 쾌락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적 대상 혹은 감성적 대상과 이것을 식별하는 능력 혹은 관조하는 능력이 다 같이 마땅히 그것들이 있어야 할 상태에 있는 한, 그 활동에는 언제나 쾌락이 있다. 그런데 쾌락은 사람들이 욕구하는 삶도 완전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쾌락을 찾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쾌락은 모든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또 삶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쾌락은 활동을 강화하며, 또 어떤 일을 강화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고유한 것이지만,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다. 또 완전하고 다시없이 행복한 사람의 활동이 한 가지이건 혹은 그 이상이건, 이러한 활동을 완전하게 하는 쾌락이야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고유한 쾌락이요, 나머지 쾌락은 제 2차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렇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온갖 덕친애쾌락에 관해서 이야기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행복의 본성을 개설(槪說)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행복이야말로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일의 궁극 목적이니 말이다. 행복한 생활은 덕있는 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 덕있는 생활이란 노력을 요하는 것이요, 오락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그 자신의 상태에 어울리는 활동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요, 따라서 선한 사람에게는 덕에 맞는 활동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행복은 오락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좋은 쪽의 활동은 그대로 곧 보다 좋은 활동이요, 또 보다 많은 행복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즉, 행복은 소일거리에 있지 않고 덕있는 활동에 깃들여 있다. 행복이란 것이 덕을 따른 활동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최고의 덕을 따른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것에든지 그것에 고유한 것이 본성상 그것에 가장 좋고 즐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성을 따른 생활이 가장 좋고 즐거운 것이다. 이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이 또한 가장 행복한 생활이다. 최고의 의미에서 있어서 행복은 관조적 생활이다. 관조적인 생활이란 첫째, 이 활동이 최선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그것이 가장 연속적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속성 치고 불완전한 것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관조적인 삶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순수관조와 똑같은 범위에 널려 있으며, 또 관조를 더욱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하다. 행복은 순수관조에 그저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관조 속에 깃들어 있다. 순수관조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어떤 형태의 순수관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덕을 따른 생활은 제 2차적으로 행복하다. 그런 덕을 따른 활동은 우리들 인간의 형편에 어울리는 것이니 말이다. 덕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계약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온갖 행동 그리고 정념에 관련하여 우리들 각자의 의무를 지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성품의 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념과 결부되어 있다. 실천지도 역시 성품의 덕과 결부되어 있다. 윤리적인 덕은 실천지와 합치되고 정의와 관련을 가지는 까닭에 그것은 우리의 복합적 본성에 속한다. 그리고 복합적이 덕은 인간적이지만 이에 반해 이성의 덕은 독립적인 것이다. 이처럼 덕에 관해서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름지기 덕을 소유하며 활동시키려고 해야 하며, 혹은 선하게 되는 데 다른 길이 있는가 살펴서 이것을 시도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청소년 시절에 바른 양육과 훈도(訓導)를 받는 것만으로는 덕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어른이 되어서도 각기 그 일에 종사하고 또 그것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까닭에,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고 또 일반적으로 말하여 생활 전체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만 한다. 즉,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의 양육과 여러 가지 종사하는 일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법률을 만듦에 있어 입법자는 마땅히 사람들을 권유하여 덕에 나아가도록 해야 하며 또 고귀한 일을 하도록 편달(鞭撻)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선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양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붙여야 하며 여러 가지 가치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며 또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나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할진대,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모름지기 일종의 이성과 올바른 명령을 따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때 이 명령에는 힘이 있어야만 한다. 법률은 구속력이 있고, 동시에 그것은 일종의 실천지(實踐知)와 이성에서 우러나오는 규칙이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하여간 사람들을 자기의 배려에 의하여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입법(立法)할 줄 아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선인들은 입법에 관한 문제를 탐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일반으로 국제(國制)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인간성에 관한 우리의 철학을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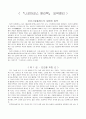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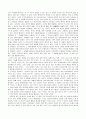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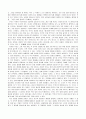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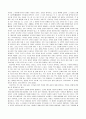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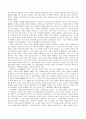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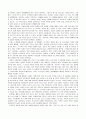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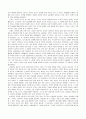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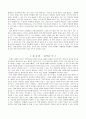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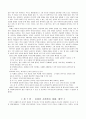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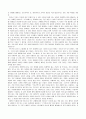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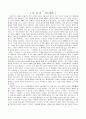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