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무진기행」의 배경
<2> 자아의 내면 바라보기
<3> 자아와 타자와의 동일시
결론
※참고문헌
본론
<1> 「무진기행」의 배경
<2> 자아의 내면 바라보기
<3> 자아와 타자와의 동일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끓어오르는데, 이는 그의 숨겨진 내면의 욕구이다. 그는 미쳐버리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자살시체를 통해 느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불면증에 시달린 것이 여자의 임종을 지켜주기 때문으로 생각한 것도, 자신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⑥ 조씨와의 동일시
\"야, 이 약아빠진 놈아, 넌 빽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물어 놓고 기껏 내가 어디서 굴러 온 줄도 모르는 말라빠진 음악 선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맘이 시원하겠다는 거냐?\" 말하고 나서 그는 유쾌해 죽겠다는 듯이 웃어댔다.…중략…속도 모르는 박군은 그 여자를 좋아한대.\" …중략…\"그 여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호소를 하는데 그 여자가 모두 내게 보여주거든. 박군은 내게 연애편지를 쓰는 셈이지.\"…중략…사실 나는, 몇 시간 전에 조가 얘기했듯이 <빽이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만난 것을 반드시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위의 책, 김승옥, pp.133~135.
이런 조씨의 모습에서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출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결혼관을 통해, 윤희중을 부러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는 윤희중의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욕망인 동시에 윤희중에게 있었을 욕망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조의 속물적인 모습은 윤희중이 지니는 세속적 측면의 투영인 것이다. 여기에서 윤희중은 이미 속물이 되어버린 자신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냉소하지만 주어진 세속적인 안위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은 현재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나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근원적인 욕구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현실과 바람사이의 괴리를 실감하게 된다. 「<무진기행>과 <흑준마> 대비 연구」, 양뢰, 서울대학교 (석사). 2003, pp. 38~39
결론
1960년대 소설인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당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개인의 내면의 세계에 치중했다. 당시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개인주의와 인간소외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김승옥의 소설에서는 소외의 문제에 중심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소외의 양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이것은 자기 동일성을 상실하며, 다른 곳에서 자신을 동일시시킨다. 이렇게 타자와의 동일시를 거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아는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기 동일성을 상실이 가져오는 속물화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분열된 자아는 통일되지 못하고 자기 동일성의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진은 희중에게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고향이 아닌, 혼돈스러운 안개에 휩싸인 곳이다.
김승옥의 자기 세계에의 탐구는 개인주의 문학의 출발임과 동시에 1950년대의 황폐성과 1960년대의 부조리한 현실이 낳은 상황적 산물이며, 존재가 안주할 삶의 기반이 없다는 것을 형상화한 “1960년대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김승옥 소설의 시대적 의미와 의식세계 연구」, 김종운, 목원대학교(석사), 2003, p. 27.
※참고문헌
김선주,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자기세계’의 변모과정」, 건국대학교(석사), 2003.
김승옥, 「무진기행」, (주)교육평가연구원, 2002.
김종운, 「김승옥 소설의 시대적 의미와 의식세계 연구」, 목원대학교(석사), 2003.
배성희, 「김승옥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2.
양뢰, 「<무진기행>과 <흑준마>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2003.
허관무, 「김승옥의 무진기행연구」, 동국대학교(석사), 2001.
⑥ 조씨와의 동일시
\"야, 이 약아빠진 놈아, 넌 빽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물어 놓고 기껏 내가 어디서 굴러 온 줄도 모르는 말라빠진 음악 선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맘이 시원하겠다는 거냐?\" 말하고 나서 그는 유쾌해 죽겠다는 듯이 웃어댔다.…중략…속도 모르는 박군은 그 여자를 좋아한대.\" …중략…\"그 여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호소를 하는데 그 여자가 모두 내게 보여주거든. 박군은 내게 연애편지를 쓰는 셈이지.\"…중략…사실 나는, 몇 시간 전에 조가 얘기했듯이 <빽이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만난 것을 반드시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위의 책, 김승옥, pp.133~135.
이런 조씨의 모습에서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출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결혼관을 통해, 윤희중을 부러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는 윤희중의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욕망인 동시에 윤희중에게 있었을 욕망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조의 속물적인 모습은 윤희중이 지니는 세속적 측면의 투영인 것이다. 여기에서 윤희중은 이미 속물이 되어버린 자신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냉소하지만 주어진 세속적인 안위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은 현재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나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근원적인 욕구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현실과 바람사이의 괴리를 실감하게 된다. 「<무진기행>과 <흑준마> 대비 연구」, 양뢰, 서울대학교 (석사). 2003, pp. 38~39
결론
1960년대 소설인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당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개인의 내면의 세계에 치중했다. 당시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개인주의와 인간소외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김승옥의 소설에서는 소외의 문제에 중심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소외의 양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이것은 자기 동일성을 상실하며, 다른 곳에서 자신을 동일시시킨다. 이렇게 타자와의 동일시를 거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아는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기 동일성을 상실이 가져오는 속물화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분열된 자아는 통일되지 못하고 자기 동일성의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진은 희중에게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고향이 아닌, 혼돈스러운 안개에 휩싸인 곳이다.
김승옥의 자기 세계에의 탐구는 개인주의 문학의 출발임과 동시에 1950년대의 황폐성과 1960년대의 부조리한 현실이 낳은 상황적 산물이며, 존재가 안주할 삶의 기반이 없다는 것을 형상화한 “1960년대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김승옥 소설의 시대적 의미와 의식세계 연구」, 김종운, 목원대학교(석사), 2003, p. 27.
※참고문헌
김선주,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자기세계’의 변모과정」, 건국대학교(석사), 2003.
김승옥, 「무진기행」, (주)교육평가연구원, 2002.
김종운, 「김승옥 소설의 시대적 의미와 의식세계 연구」, 목원대학교(석사), 2003.
배성희, 「김승옥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2.
양뢰, 「<무진기행>과 <흑준마>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2003.
허관무, 「김승옥의 무진기행연구」, 동국대학교(석사), 2001.
추천자료
 고전주의와낭만주의
고전주의와낭만주의 모더니즘 연구
모더니즘 연구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 비판적 리얼리즘
비판적 리얼리즘 자연주의 문학론
자연주의 문학론 포스트모더니즘 : 모더니즘의 계승과 대안
포스트모더니즘 : 모더니즘의 계승과 대안 김동인과 자연주의
김동인과 자연주의 포르투갈문학 고답주의
포르투갈문학 고답주의 [낭만주의][낭만주의 발생배경][낭만주의시대][낭만주의 음악][낭만주의 문학]낭만주의의 발...
[낭만주의][낭만주의 발생배경][낭만주의시대][낭만주의 음악][낭만주의 문학]낭만주의의 발... [자연주의]자연주의(자연주의사상) 작가와 작품, 자연주의(자연주의사상)와 사실주의(사실주...
[자연주의]자연주의(자연주의사상) 작가와 작품, 자연주의(자연주의사상)와 사실주의(사실주... [인문과학] 한국의 모더니즘
[인문과학] 한국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A+)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A+) 소설의 공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탁류에 나타난 공간성, 날개에 나타난 공간상)
소설의 공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탁류에 나타난 공간성, 날개에 나타난 공간상) 항존주의 본질주의 진보주의 재건주의 교육철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항존주의 본질주의 진보주의 재건주의 교육철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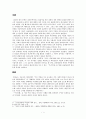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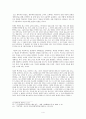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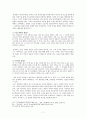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