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몸에 대한 관점들
- 몸에 나타나는 권력
- 소통하지 못하는 몸
- 소통하는 몸
Ⅲ. 결론
Ⅱ. 본론
- 몸에 대한 관점들
- 몸에 나타나는 권력
- 소통하지 못하는 몸
- 소통하는 몸
Ⅲ. 결론
본문내용
내가 만일〉 중에서―
종두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이전에 볼 수 없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공주는 그에게 있어 이미 노래와 같은 ―하늘이고, 시인이고,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기쁨의 존재인 것이다. 그 속에서 둘은 깊은 호흡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은 육체적인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의 소통은 타자에 의해 깨어져버리고 만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단절일 뿐 정신적인 단절은 아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종두는 공주가 두려워하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해준다. 종두에게 있어 나뭇가지를 잘라 없애버리는 행위는 공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공주는 그가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후 라디오 소리를 높여 자신이 마음을 전한다. 공주의 라디오 소리를 들은 종두는 나무 위에서 춤을 춘다. 춤을 추는 행위는 공주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의 표현이며 자유의 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는 경찰에게 잡혀가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종두의 편지를 생각하며 따스한 햇살 아래 방을 쓸고 있는 공주는 더 이상 혼자만의 세계에 살고있는 자아가 아니다. 타자와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이 둘의 소통은 타자들―둘을 제외한 사람들―이 제외된 둘 만이 가질 수 있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세계로 한 걸음 진보한 것이다. 여전히 사회는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억압하고 있지만 그들의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전한 몸으로 소통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우리의 편견, 사회의 관습에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면 아마 그들에 대한 억압과 편견은 계속될 테지만, 그들은 저마다의 세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완전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결론
〈오아시스〉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통해 거대한 권력―고정관념과 편견―이 개인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두 인물―종두, 공주―를 통해서 사회가 기대하는 몸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그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의 위치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권력이 사회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된 인물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라는 공간에서 이 부당함을 극복하려 하고, 환상과 현실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찾으려 한다.
비록 그들의 환상과 사회 혹은 정상인들의 현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마지막까지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세계에 남아 버린다고 해도 그들 자신의 세계에서만은 완벽하고 완전한 주체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구차해 보이고 하찮은 사랑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있어 사랑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들이다. 종두와 공주는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완전한 몸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종두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이전에 볼 수 없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공주는 그에게 있어 이미 노래와 같은 ―하늘이고, 시인이고,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기쁨의 존재인 것이다. 그 속에서 둘은 깊은 호흡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은 육체적인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의 소통은 타자에 의해 깨어져버리고 만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단절일 뿐 정신적인 단절은 아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종두는 공주가 두려워하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해준다. 종두에게 있어 나뭇가지를 잘라 없애버리는 행위는 공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공주는 그가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후 라디오 소리를 높여 자신이 마음을 전한다. 공주의 라디오 소리를 들은 종두는 나무 위에서 춤을 춘다. 춤을 추는 행위는 공주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의 표현이며 자유의 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는 경찰에게 잡혀가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종두의 편지를 생각하며 따스한 햇살 아래 방을 쓸고 있는 공주는 더 이상 혼자만의 세계에 살고있는 자아가 아니다. 타자와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이 둘의 소통은 타자들―둘을 제외한 사람들―이 제외된 둘 만이 가질 수 있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세계로 한 걸음 진보한 것이다. 여전히 사회는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억압하고 있지만 그들의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전한 몸으로 소통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우리의 편견, 사회의 관습에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면 아마 그들에 대한 억압과 편견은 계속될 테지만, 그들은 저마다의 세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완전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결론
〈오아시스〉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통해 거대한 권력―고정관념과 편견―이 개인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두 인물―종두, 공주―를 통해서 사회가 기대하는 몸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그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의 위치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권력이 사회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된 인물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라는 공간에서 이 부당함을 극복하려 하고, 환상과 현실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찾으려 한다.
비록 그들의 환상과 사회 혹은 정상인들의 현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마지막까지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세계에 남아 버린다고 해도 그들 자신의 세계에서만은 완벽하고 완전한 주체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구차해 보이고 하찮은 사랑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있어 사랑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들이다. 종두와 공주는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완전한 몸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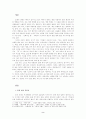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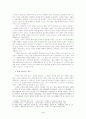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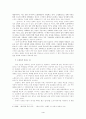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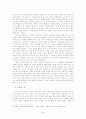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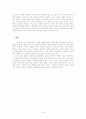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