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5위체제의 확립
2. 5위의 병종
1) 병종의 세 가지 종류
3. 금군
1) 내금위
2) 겸사복
3) 우림위
4) 그 외의 금군 구실을 한 것
5) 그 밖의 관서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1) 초기의 군 계급
2) 5위의 군 계급
3) 군 편제
5. 수도방위의 실제
1) 입직(入直)
2) 행순(行巡)
3) 시위 · 첩고 · 첩종
2. 5위의 병종
1) 병종의 세 가지 종류
3. 금군
1) 내금위
2) 겸사복
3) 우림위
4) 그 외의 금군 구실을 한 것
5) 그 밖의 관서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1) 초기의 군 계급
2) 5위의 군 계급
3) 군 편제
5. 수도방위의 실제
1) 입직(入直)
2) 행순(行巡)
3) 시위 · 첩고 · 첩종
본문내용
새김.
를 주고받음. 또한 왕의 행재시(行在時) 유도삼대장(留都三大將)이 세 곳에 나누어 주둔하였으며, 매일 장소를 바꾸어 임무를 수행.
- 이와 같은 입직 규정은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큰 골격은 유 지되었던 것으로 보임.
2) 행순(行巡)
- 궁궐 내외나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것으로 5위군이 평시에 가진 큰 기능.
- 5위의 위장과 부장은 군사 10명을 인솔하고 시간을 나누어 순찰한 뒤에 이상 여부를 직접 왕에게 알리도록 함. 도성 내외의 순찰에는 군사적 기능이 거의 없는 위 제외하고, 군사기능 가진 5위의 각 1부씩의 입직에서 교대한 출직 군사를 두 곳으로 나누어 정하고 행순
- 궁성 4문 밖에 숙직하는 일도 병조에서 각각 상호군이나 대호군, 호군 중의 한사람을 정해 정병 5명 배정.
- 광화문 지키는 호군은 군호(軍號)를 받고 통행금지 시간에 정병 2명으로 요령(鐸)을 흔 들며 궁성 순찰.
- 경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통행금지와 궁궐이나 도성의 문을 일제히 닫음으로 외부와 의 접촉 단절. 문을 폐쇄하고 통행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절차에 맞게 통행 허락. 또한 야간이 아닌 평시에 있어서 궁궐이나 도성의 내외를 경비하는 데에는 경수소 (警守所) 복처(伏處)라고도 하며 도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각 동의 입구에 이문(里門)을 세우고, 또 주요 가로(街路)에는 이를 설치하여 치안을 유지. 그 설치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1436년(세종 18) 3월 도성 안팎의 경수소를 정비한 기록으로 보아 국초부터 있던 것으로 보이며 1450년(문종 즉위년) 6월 5가(家)마다 1개를 설치하고 장정 5~6명을 배치하여 숙직하게 하였고, 세조 때는 도성 안에 87개소, 도성 밖에 19개소, 모두 106개소가 있었으며 모든 경수소에는 보병(步兵) 2명이 부근에 사는 방리인(坊里人) 5명을 거느리고 활 ·칼 ·대창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숙직. 그런데 방리인 중에는 노약자가 많아 도적을 만나면 잡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 1462년(세조 8) 6월부터는 갑사·별시위·파적위 등과 기 ·보병등을 동원하여 2명씩 배치시켜 방리인과 함께 숙직하게 하였는데, 이들은 3일마다 교대. 명종 이전까지는 주로 도성을 중심으로 설치하였는데, 강원·황해 일대에 도적이 많아짐에 따라 1551년(명종6) 전국 각처에 도적이 통행할 만한 곳에 설치하여 도적을 막도록 함. 조선 후기까지 존속.
이외에 문을 지키는 파수군을 고정 배치.
- 대개 대문에는 30명, 중문과 대문의 좌우 협문에는 20명 등을 배치.
3) 시위 · 첩고 · 첩종
- 시위 : 좁은 의미의 시립(侍立). 왕이 군의 습진(習陣)을 보기 위한 의식인 대열, 강무
혹은 순행, 타위(打圍) 임금이 스스로 나아가서 행(行)하는 사냥.
등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 병조가 왕이 명령하는 대로 시위조건을 만들어 공문을 담당 군문에 보내면 그에 따라 시위.
- 첩고(疊鼓), 첩종(疊鐘)
: 대내에 입직한 군사들을 집합시킬 때 큰 북을 계속해 두드리는 것과 궁중의 누마루에 걸려있던 대종을 계속해서 울려 군사들을 대열시키기 위한 신호로써 평시에 있어서 비상에 처하여 왕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생각. 궁중에 큰 북이 계속해서 울리면 문을 지키는 자 이외의 모든 군사는 근정전 뜰에 모여 그 방향을 점하고 정렬. 왕을 호위, 시립. 그리고 5위 소속의 군사는 광화문 앞길부터 열을 지어 시립. 군사뿐 아니라 백관들도 조방(朝房) 조신(朝臣)들이 조회(朝會) 때를 기다리느라고 모여 있던 방. 대궐문 밖에 있었음.
에 모여 대기.
* 금군과 5위군은 왕권 보호를 중심한 입직, 행순, 시위 등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곧 왕권의 소재와 수도권의 방위가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5위군의 직무 수행의 기능이 수도방위제도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5위제도는 성종 말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훈척정치(勳戚政治)의 결과 문신이 상위직(上位職)을 차지하여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무력함이 드러나 제도적 붕괴를 가져와서 임진왜란 이후 설치되는 5군영(五軍營)에 그 자리를 물려 주고 대폭 축소되어 궁 성의 숙위(宿衛)만 맡았다.
☞ 참고문헌 ☜
신명호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게 2002
「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서의식, 강봉룡 외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솔 2003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를 주고받음. 또한 왕의 행재시(行在時) 유도삼대장(留都三大將)이 세 곳에 나누어 주둔하였으며, 매일 장소를 바꾸어 임무를 수행.
- 이와 같은 입직 규정은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큰 골격은 유 지되었던 것으로 보임.
2) 행순(行巡)
- 궁궐 내외나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것으로 5위군이 평시에 가진 큰 기능.
- 5위의 위장과 부장은 군사 10명을 인솔하고 시간을 나누어 순찰한 뒤에 이상 여부를 직접 왕에게 알리도록 함. 도성 내외의 순찰에는 군사적 기능이 거의 없는 위 제외하고, 군사기능 가진 5위의 각 1부씩의 입직에서 교대한 출직 군사를 두 곳으로 나누어 정하고 행순
- 궁성 4문 밖에 숙직하는 일도 병조에서 각각 상호군이나 대호군, 호군 중의 한사람을 정해 정병 5명 배정.
- 광화문 지키는 호군은 군호(軍號)를 받고 통행금지 시간에 정병 2명으로 요령(鐸)을 흔 들며 궁성 순찰.
- 경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통행금지와 궁궐이나 도성의 문을 일제히 닫음으로 외부와 의 접촉 단절. 문을 폐쇄하고 통행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절차에 맞게 통행 허락. 또한 야간이 아닌 평시에 있어서 궁궐이나 도성의 내외를 경비하는 데에는 경수소 (警守所) 복처(伏處)라고도 하며 도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각 동의 입구에 이문(里門)을 세우고, 또 주요 가로(街路)에는 이를 설치하여 치안을 유지. 그 설치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1436년(세종 18) 3월 도성 안팎의 경수소를 정비한 기록으로 보아 국초부터 있던 것으로 보이며 1450년(문종 즉위년) 6월 5가(家)마다 1개를 설치하고 장정 5~6명을 배치하여 숙직하게 하였고, 세조 때는 도성 안에 87개소, 도성 밖에 19개소, 모두 106개소가 있었으며 모든 경수소에는 보병(步兵) 2명이 부근에 사는 방리인(坊里人) 5명을 거느리고 활 ·칼 ·대창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숙직. 그런데 방리인 중에는 노약자가 많아 도적을 만나면 잡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 1462년(세조 8) 6월부터는 갑사·별시위·파적위 등과 기 ·보병등을 동원하여 2명씩 배치시켜 방리인과 함께 숙직하게 하였는데, 이들은 3일마다 교대. 명종 이전까지는 주로 도성을 중심으로 설치하였는데, 강원·황해 일대에 도적이 많아짐에 따라 1551년(명종6) 전국 각처에 도적이 통행할 만한 곳에 설치하여 도적을 막도록 함. 조선 후기까지 존속.
이외에 문을 지키는 파수군을 고정 배치.
- 대개 대문에는 30명, 중문과 대문의 좌우 협문에는 20명 등을 배치.
3) 시위 · 첩고 · 첩종
- 시위 : 좁은 의미의 시립(侍立). 왕이 군의 습진(習陣)을 보기 위한 의식인 대열, 강무
혹은 순행, 타위(打圍) 임금이 스스로 나아가서 행(行)하는 사냥.
등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 병조가 왕이 명령하는 대로 시위조건을 만들어 공문을 담당 군문에 보내면 그에 따라 시위.
- 첩고(疊鼓), 첩종(疊鐘)
: 대내에 입직한 군사들을 집합시킬 때 큰 북을 계속해 두드리는 것과 궁중의 누마루에 걸려있던 대종을 계속해서 울려 군사들을 대열시키기 위한 신호로써 평시에 있어서 비상에 처하여 왕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생각. 궁중에 큰 북이 계속해서 울리면 문을 지키는 자 이외의 모든 군사는 근정전 뜰에 모여 그 방향을 점하고 정렬. 왕을 호위, 시립. 그리고 5위 소속의 군사는 광화문 앞길부터 열을 지어 시립. 군사뿐 아니라 백관들도 조방(朝房) 조신(朝臣)들이 조회(朝會) 때를 기다리느라고 모여 있던 방. 대궐문 밖에 있었음.
에 모여 대기.
* 금군과 5위군은 왕권 보호를 중심한 입직, 행순, 시위 등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곧 왕권의 소재와 수도권의 방위가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5위군의 직무 수행의 기능이 수도방위제도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5위제도는 성종 말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훈척정치(勳戚政治)의 결과 문신이 상위직(上位職)을 차지하여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무력함이 드러나 제도적 붕괴를 가져와서 임진왜란 이후 설치되는 5군영(五軍營)에 그 자리를 물려 주고 대폭 축소되어 궁 성의 숙위(宿衛)만 맡았다.
☞ 참고문헌 ☜
신명호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게 2002
「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서의식, 강봉룡 외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솔 2003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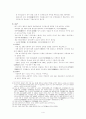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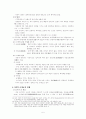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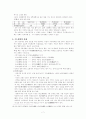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