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年去來)의 꽃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년거래의 꽃’이란, 십체라는 것이 모든 부류의 흉내 연기를 의미함에 대해, 어렸을 적의 연기 모습이라든가 초심자 적의 기술, 한창 때인 장년기의 연기, 그리고 노년기의 예풍 등 시기마다 자기 것이 된 기예들을 현재의 자기 기예에 모조리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비밀스러워야 피는 꽃
秘する花を知る事。秘すれば花なり、秘せずば花なるべからずとなり。この分け目を知る事、肝要の花なり。
비밀스러워야 피는 꽃에 대해 알아야 한다. 비밀스러우면 꽃이 되며, 비밀스럽지 못하면 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 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유를 분간하여 제대로 아는 것에 꽃 개화의 비결이 있다. ... 관객들에 있어서 “이 대목이 꽃이다”라는 인식조차 못하게 해야 연기자의 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3. 풍자화전의 극미학, 꽃과 유현.
1) 무대 위의 꽃, 하나(はな:花)
제아미는 노가쿠(能樂)의 추구해야 하는 바를 ‘하나(꽃)’라는 말로 표현한다. 풍자화전의 앞부분에서 젊음의 꽃 등을 언급하면서는 ‘꽃’이 일시적 외양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대에서 관객에게 전해지는 매혹의 순간, 감동의 순간 또한 ‘하나’라 칭하며, 이렇게 감동을 전하는 일을 예능인이 평생 궁구해야 할 화두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꽃’은 <풍자화전> 전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이는 극적 매력과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대 위의 즐거움으로서의 하나: 연기의 매력, 배우의 아름다움과 같이 눈길을 잡아끄는 꽃. 재미있고(面白しろき) 진기한(めづらしき) 면.
-일시성으로서의 하나: 피었다 사라지는 벚꽃의 순간적 아름다움과 같이 일시적 무대예술의 극장성(theatricality)을 상징, 일순간의 꽃을 피우기 위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극예술의 특성과 부합하며, 책에서 언급하는 꽃의 씨앗을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과도 어울림.
-소통으로서의 하나: 극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배우와 관객의 마음이 함께할 때의 예술적 성취로서 나타나는 미(美) 개념
‘꽃’의 개념은 다양하게 쓰이나 결국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관객을 감동시키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극적 감동의 순간에 주목한 데에서 일생 예능에 인생을 바치며 관객을 만족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간아미, 제아미 부자의 미학이 전하여진다.
2) 보다 깊은 아름다움, 유겐(幽玄)
유현(幽玄)은 원래 중국에서 도교(道敎)나 불교의 경지가 심원하고 미묘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된 용어로, 무로마치(室町) 시대에는 초기에 ‘화려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의미로 ‘품위 있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담겨진 헤이안 귀족 여성의 모습’이 주된 모티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런 미의식은 시간이 지나며 외면적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정신세계를 충실하게 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한다. 이런 경향은 풍자화전의 ‘문답 갖가지’에서도 보이듯 서늘한 것(冷) 시든 것(萎) 절제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제아미의 유현 개념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개념에서 점점 차원 높은 내적 성찰과 감동을 포함하는 내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유현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하나’와 ‘유겐’은 모두 당시의 주관객 층인 귀족들의 정신세계를 풍부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요소들이다. ‘하나(花)’가 연기자의 연기가 관객의 호응을 얻는 것을 광범위하게 표상하는 포괄적인 미개념이라고 한다면, 유겐(幽玄)은 ‘하나’에 포함되는 보다 이상적인 미(美)로서 연기자가 관객들의 심층심리를 만족시키는 최상의 미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아미가 생각하는 이상미는 후기저술로 갈수록 <하나(花)>에서 시작하여 <유겐(幽玄)>으로, <유겐(幽玄)>에서 <무(無)>로, <무(無)>에서 <묘(妙)>로 그 중점을 옮겨가며, 당시 지식인들의 유행이자 자신이 깊이 천착해 들어가는 선(禪) 사상과 맞물려 갈수록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경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간다.
4. 맺는 말
제아미는 예능인으로서의 삶이 가장 위태로울 때, 자신과 같은 시련을 겪을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비전으로 이 책을 써내려갔다.
이 <오의>편에 이르기까지 적어온 설들은 전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창출해낸 이론이 아니다. 유년기로부터 선친의 지도 덕분으로 성인으로 큰 이래 20여 년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두었던 대로 그 유풍(遺風)을 계승하여 사루가쿠의 예도를 위하고 우리 가통을 위하여 이것을 저술한 것이지, 사사로이 내 멋대로 남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에 쓴 내용들은 노에 열심인 예능인이 아니면 절대 보여주지 말 것.
비전다운 연기의 방법과 요령도 충분하지만 책을 통해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진정한 예능인이 궁구해야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지속적 탐구 자세, 인기에 자만하지 않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신을 연마하는 자세이다. 제아미 자신도 아버지 간아미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꽃을 피우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궁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위의 다른 예풍들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강조하는 구절들은 그가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능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케 한다. 제아미의 비전은 실전적인 경험에서 나온 만큼 현재에도 통하여, 예능계에서 몸담은 사람에게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극히 중요한 지적으로 예리하게 다가온다.
제아미의 자신을 수양하는 자세, 아름다움에 대한 정신적 추구, 시대와 관객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가치는 현재에까지 간제류(世流)가 남아 간제노악당(世能樂堂)을 오늘날 도심에 만날 수 있는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풍을 배워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길이 되며, 이것은 예능인의 삶을 영속케 하는 가문의 비전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참고자료
김충영 / 風姿花傳 / 지만지 고전천줄 / 2008
김학현 / 能 - 노의 고전 風姿花傳. 일본의 전통연희 1-노 / 열화당 / 1997
http://www.janis.or.jp/users/shujim/fusikadn.htm
http://www.kanze.net/
비밀스러워야 피는 꽃
秘する花を知る事。秘すれば花なり、秘せずば花なるべからずとなり。この分け目を知る事、肝要の花なり。
비밀스러워야 피는 꽃에 대해 알아야 한다. 비밀스러우면 꽃이 되며, 비밀스럽지 못하면 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 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유를 분간하여 제대로 아는 것에 꽃 개화의 비결이 있다. ... 관객들에 있어서 “이 대목이 꽃이다”라는 인식조차 못하게 해야 연기자의 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3. 풍자화전의 극미학, 꽃과 유현.
1) 무대 위의 꽃, 하나(はな:花)
제아미는 노가쿠(能樂)의 추구해야 하는 바를 ‘하나(꽃)’라는 말로 표현한다. 풍자화전의 앞부분에서 젊음의 꽃 등을 언급하면서는 ‘꽃’이 일시적 외양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대에서 관객에게 전해지는 매혹의 순간, 감동의 순간 또한 ‘하나’라 칭하며, 이렇게 감동을 전하는 일을 예능인이 평생 궁구해야 할 화두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꽃’은 <풍자화전> 전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이는 극적 매력과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대 위의 즐거움으로서의 하나: 연기의 매력, 배우의 아름다움과 같이 눈길을 잡아끄는 꽃. 재미있고(面白しろき) 진기한(めづらしき) 면.
-일시성으로서의 하나: 피었다 사라지는 벚꽃의 순간적 아름다움과 같이 일시적 무대예술의 극장성(theatricality)을 상징, 일순간의 꽃을 피우기 위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극예술의 특성과 부합하며, 책에서 언급하는 꽃의 씨앗을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과도 어울림.
-소통으로서의 하나: 극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배우와 관객의 마음이 함께할 때의 예술적 성취로서 나타나는 미(美) 개념
‘꽃’의 개념은 다양하게 쓰이나 결국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관객을 감동시키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극적 감동의 순간에 주목한 데에서 일생 예능에 인생을 바치며 관객을 만족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간아미, 제아미 부자의 미학이 전하여진다.
2) 보다 깊은 아름다움, 유겐(幽玄)
유현(幽玄)은 원래 중국에서 도교(道敎)나 불교의 경지가 심원하고 미묘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된 용어로, 무로마치(室町) 시대에는 초기에 ‘화려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의미로 ‘품위 있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담겨진 헤이안 귀족 여성의 모습’이 주된 모티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런 미의식은 시간이 지나며 외면적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정신세계를 충실하게 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한다. 이런 경향은 풍자화전의 ‘문답 갖가지’에서도 보이듯 서늘한 것(冷) 시든 것(萎) 절제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제아미의 유현 개념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개념에서 점점 차원 높은 내적 성찰과 감동을 포함하는 내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유현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하나’와 ‘유겐’은 모두 당시의 주관객 층인 귀족들의 정신세계를 풍부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요소들이다. ‘하나(花)’가 연기자의 연기가 관객의 호응을 얻는 것을 광범위하게 표상하는 포괄적인 미개념이라고 한다면, 유겐(幽玄)은 ‘하나’에 포함되는 보다 이상적인 미(美)로서 연기자가 관객들의 심층심리를 만족시키는 최상의 미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아미가 생각하는 이상미는 후기저술로 갈수록 <하나(花)>에서 시작하여 <유겐(幽玄)>으로, <유겐(幽玄)>에서 <무(無)>로, <무(無)>에서 <묘(妙)>로 그 중점을 옮겨가며, 당시 지식인들의 유행이자 자신이 깊이 천착해 들어가는 선(禪) 사상과 맞물려 갈수록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경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간다.
4. 맺는 말
제아미는 예능인으로서의 삶이 가장 위태로울 때, 자신과 같은 시련을 겪을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비전으로 이 책을 써내려갔다.
이 <오의>편에 이르기까지 적어온 설들은 전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창출해낸 이론이 아니다. 유년기로부터 선친의 지도 덕분으로 성인으로 큰 이래 20여 년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두었던 대로 그 유풍(遺風)을 계승하여 사루가쿠의 예도를 위하고 우리 가통을 위하여 이것을 저술한 것이지, 사사로이 내 멋대로 남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에 쓴 내용들은 노에 열심인 예능인이 아니면 절대 보여주지 말 것.
비전다운 연기의 방법과 요령도 충분하지만 책을 통해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진정한 예능인이 궁구해야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지속적 탐구 자세, 인기에 자만하지 않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신을 연마하는 자세이다. 제아미 자신도 아버지 간아미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꽃을 피우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궁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위의 다른 예풍들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강조하는 구절들은 그가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능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케 한다. 제아미의 비전은 실전적인 경험에서 나온 만큼 현재에도 통하여, 예능계에서 몸담은 사람에게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극히 중요한 지적으로 예리하게 다가온다.
제아미의 자신을 수양하는 자세, 아름다움에 대한 정신적 추구, 시대와 관객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가치는 현재에까지 간제류(世流)가 남아 간제노악당(世能樂堂)을 오늘날 도심에 만날 수 있는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풍을 배워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길이 되며, 이것은 예능인의 삶을 영속케 하는 가문의 비전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참고자료
김충영 / 風姿花傳 / 지만지 고전천줄 / 2008
김학현 / 能 - 노의 고전 風姿花傳. 일본의 전통연희 1-노 / 열화당 / 1997
http://www.janis.or.jp/users/shujim/fusikadn.htm
http://www.kanz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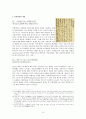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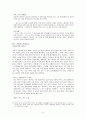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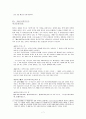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