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제선정 동기
2. 문화읽기 대상
3. 문화읽기를 위해 적용할 이론
4. 영화 이퀼리브리엄(Equilibrium) 문화읽기
1) 지식의 구조화
2) 광인의 규정
3) 권력기재
(1) 프로지움
(2) 건 커터 (Gun cutter)
(3) 방송
4) 개인의 주체 형성
5) 권력의 주체들
6) 절대적 진리의 부재 (광인에 의한 광인 잡기)
5. 마치며
2. 문화읽기 대상
3. 문화읽기를 위해 적용할 이론
4. 영화 이퀼리브리엄(Equilibrium) 문화읽기
1) 지식의 구조화
2) 광인의 규정
3) 권력기재
(1) 프로지움
(2) 건 커터 (Gun cutter)
(3) 방송
4) 개인의 주체 형성
5) 권력의 주체들
6) 절대적 진리의 부재 (광인에 의한 광인 잡기)
5. 마치며
본문내용
한다. 이 장면은 감정을 느끼는 광인을 처벌해 왔던 권력의 주체 또한 감정을 느끼는 광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식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광인을 규정한 주체도 광인이며, 광인으로 낙인찍힌 자도 똑 같은 광인이라는 것이다. 즉 ‘광인’을 규정하는 진짜 지식은 없고 권력을 손에 넣은 자, 힘을 가진 자가 ‘광인’됨을 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이다.
제2권력의 죽음 이후 제3권력은 사회전체를 통제했던 권력기재의 하나인 ‘방송’망을 무너뜨리고, 광인들로 이루러진 반체제 세력들은 핵심적 권력기재인‘프로지움’생산 공장을 폭파 시킨다. 이럼으로써 감정을 느끼는 광인들에 의해 사회체제는 무너지고 광인들에 의한 새로운 지배가 시작된다. 제1권력에 의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 형성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를 통제하고 광인들을 처벌했지만 권력기재의 붕괴로 인해 제거하려 했던 광인들이 정상인화 되어 버리게 된다. 이는 권력을 소유한다면 얼마든지 진리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감정을 느끼는 자들에게 의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게 된다. 바로 새로운 지식에 의한 또 다른‘광인에 의한 광인 잡기’가 시작 되는 것이다.
5. 마치며
푸코의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영화를 분석해보았는데, 사실상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푸코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화읽기가 진행 된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이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를 단순한 유희적‘시간 죽이기’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에서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더 많은 텍스트를 같이 분석을 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의 중심 텍스트가 되는 ‘이퀼리브리엄’과 비슷한 구조와 형식을 지는 영화는 찾아보면 분명히 많이 있음이 분명한데, 본 연구 외에도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 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만 없었다면, 다수의 영화를 ‘지식과 권력’에 맞추어 분석하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찾아내어 이야기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어쨌든 이번 연구를 통해서 무심코 재미삼아 보고 지나쳤던 영화들을 문화의 한 텍스트로서 바라보고 감상 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자체가 참 기쁘고 감사하다.
제2권력의 죽음 이후 제3권력은 사회전체를 통제했던 권력기재의 하나인 ‘방송’망을 무너뜨리고, 광인들로 이루러진 반체제 세력들은 핵심적 권력기재인‘프로지움’생산 공장을 폭파 시킨다. 이럼으로써 감정을 느끼는 광인들에 의해 사회체제는 무너지고 광인들에 의한 새로운 지배가 시작된다. 제1권력에 의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 형성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를 통제하고 광인들을 처벌했지만 권력기재의 붕괴로 인해 제거하려 했던 광인들이 정상인화 되어 버리게 된다. 이는 권력을 소유한다면 얼마든지 진리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감정을 느끼는 자들에게 의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게 된다. 바로 새로운 지식에 의한 또 다른‘광인에 의한 광인 잡기’가 시작 되는 것이다.
5. 마치며
푸코의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영화를 분석해보았는데, 사실상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푸코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화읽기가 진행 된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이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를 단순한 유희적‘시간 죽이기’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에서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더 많은 텍스트를 같이 분석을 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의 중심 텍스트가 되는 ‘이퀼리브리엄’과 비슷한 구조와 형식을 지는 영화는 찾아보면 분명히 많이 있음이 분명한데, 본 연구 외에도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 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만 없었다면, 다수의 영화를 ‘지식과 권력’에 맞추어 분석하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찾아내어 이야기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어쨌든 이번 연구를 통해서 무심코 재미삼아 보고 지나쳤던 영화들을 문화의 한 텍스트로서 바라보고 감상 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자체가 참 기쁘고 감사하다.
추천자료
 삐에르 부르디외의 문화론(아비투스)
삐에르 부르디외의 문화론(아비투스) [인문과학] [비교문화론]한국의 소주와 러시아의 보드카 술문화
[인문과학] [비교문화론]한국의 소주와 러시아의 보드카 술문화 롤랑바르트의 기호학 분석- 대중문화의 이해
롤랑바르트의 기호학 분석- 대중문화의 이해 [정치문화론] 신정치문화에 대해서
[정치문화론] 신정치문화에 대해서 [정보문화론] 정보사회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보문화론] 정보사회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구조주의 문화론
구조주의 문화론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이론의 현시적 적용 - 대중매체와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이론의 현시적 적용 - 대중매체와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일본대중문화] 일본야구의 이해, 분석
[일본대중문화] 일본야구의 이해, 분석 후기 구조주의 문화론
후기 구조주의 문화론 [대중문화]립싱크 어떻게 볼 것인가?
[대중문화]립싱크 어떻게 볼 것인가? 마르크스 문화론
마르크스 문화론 [식문화론]일본의 한류
[식문화론]일본의 한류 청소년기의 사회환경인 가정, 학교, 친구, 대중매체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의 영향을 쓰고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환경인 가정, 학교, 친구, 대중매체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의 영향을 쓰고 특히... [중국문화론] 불상문화에 관해서 (불교 전파, 불교 미술의 역사)
[중국문화론] 불상문화에 관해서 (불교 전파, 불교 미술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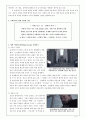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