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삶과 철학
2.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
3. 작품 내용요약
4. 당대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5. 중세 파리의 묘사에 드러나는 낭만성
6.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랑의 의미
7. 맺음말
2.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
3. 작품 내용요약
4. 당대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5. 중세 파리의 묘사에 드러나는 낭만성
6.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랑의 의미
7. 맺음말
본문내용
.
6.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랑의 의미
휴머니즘에 대한 애정으로 작품을 쓰는 위고의 이 소설은 내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파리의 노트르담\'이 아닌 \'노틀담의 꼽추\'로 번역된 제목 덕에 마치 이 소설의 주인공은 카지모도와 에스메랄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는 클로드 부주교야말로 진정한 낭만주의적 면모를 갖춘 캐릭터로 여겨진다. 흉측한 외관과는 달리 순진하고 고결한 정신적 사랑을 베푸는 카지모도는 확실히 위고의 아낌을 받았을 캐릭터임엔 분명하지만 그러한 인간상은 도달할 수 없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반면 한 여자에 의해 그토록 안정적으로 구축해 놓았던 자신의 자리와 신념들을 내던지는 클로드 부주교는 인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윤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사랑에 대한 열망에 승복하게 되는 클로드 부주교는 에스메랄다를 향한 애증의 감정을 끊임없이 토로하지만 그의 사랑은 위고에게 단순히 욕정으로 치부된다. 이러한 삼각관계는 어떠한 현실적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결말로 맺어지는데 마지막 장면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위고는 스스로 쥘리앙 소렐과도 같은 악인이면서도 악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캐릭터를 창조해 놓고도 특별히 의식하지 못한 듯 하다. 더군다나 클로드 부주교의 최후 장면은 몹시도 어색하다. 이처럼 적어도 빅토르 위고가 쓴 글에서 사람은 결코 아름답다거나 경험해 보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여기서 사랑은 얄궂은 운명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몰이꾼 같다. 그러나 결코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쨌든 이 소설은 누구에게나 단단해 보였던 한 인간의 삶이 애증과 질투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사랑으로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 세상을 저주해 본 적이 있는 이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소설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7. 맺음말
<노틀담의 꼽추>를 처음 만났던 것은 안소니 퀸 주연의 영화였다 그땐 시각적인 면에 너무 치우쳤던 나머지 안소니 퀸의 연기에만 감탄하다가 정작 원작의 감동은 지나쳐 버렸던 것 같다. 그 후에도 책을 읽긴 했으나 너무 어릴 때였기도 하려니와 처음 영화에서의 인상이 너무 깊어서 영화 장면만을 일깨우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노틀담의 꼽추>를 선입견 없이 대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
클로드 부주교의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 에스메랄다의 순결하고 티없는 아름다움. 카지모도의 맑은 영혼과 고결한 사랑. 그리고 15세기 말의 중세 파리 서민들의 삶이 많은 것을 보기엔 어린 나이로는 무리가 아니었나 싶다. 누군가 그랬다, 명작이란 읽을 수록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이 다른 것이라고. 먼 훗날 내가 에스메랄다와 같은 자녀를 두고 있는 나이에 이 책을 다시 읽게된다면 그땐 지금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만 신체적인 기형이었던 카지모도와 사랑을 모르는 정신적인 불구였던 페뷔스 둘 중에 누가 정말 장애가 있는 인물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다.
6.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랑의 의미
휴머니즘에 대한 애정으로 작품을 쓰는 위고의 이 소설은 내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파리의 노트르담\'이 아닌 \'노틀담의 꼽추\'로 번역된 제목 덕에 마치 이 소설의 주인공은 카지모도와 에스메랄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는 클로드 부주교야말로 진정한 낭만주의적 면모를 갖춘 캐릭터로 여겨진다. 흉측한 외관과는 달리 순진하고 고결한 정신적 사랑을 베푸는 카지모도는 확실히 위고의 아낌을 받았을 캐릭터임엔 분명하지만 그러한 인간상은 도달할 수 없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반면 한 여자에 의해 그토록 안정적으로 구축해 놓았던 자신의 자리와 신념들을 내던지는 클로드 부주교는 인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윤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사랑에 대한 열망에 승복하게 되는 클로드 부주교는 에스메랄다를 향한 애증의 감정을 끊임없이 토로하지만 그의 사랑은 위고에게 단순히 욕정으로 치부된다. 이러한 삼각관계는 어떠한 현실적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결말로 맺어지는데 마지막 장면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위고는 스스로 쥘리앙 소렐과도 같은 악인이면서도 악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캐릭터를 창조해 놓고도 특별히 의식하지 못한 듯 하다. 더군다나 클로드 부주교의 최후 장면은 몹시도 어색하다. 이처럼 적어도 빅토르 위고가 쓴 글에서 사람은 결코 아름답다거나 경험해 보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여기서 사랑은 얄궂은 운명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몰이꾼 같다. 그러나 결코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쨌든 이 소설은 누구에게나 단단해 보였던 한 인간의 삶이 애증과 질투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사랑으로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 세상을 저주해 본 적이 있는 이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소설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7. 맺음말
<노틀담의 꼽추>를 처음 만났던 것은 안소니 퀸 주연의 영화였다 그땐 시각적인 면에 너무 치우쳤던 나머지 안소니 퀸의 연기에만 감탄하다가 정작 원작의 감동은 지나쳐 버렸던 것 같다. 그 후에도 책을 읽긴 했으나 너무 어릴 때였기도 하려니와 처음 영화에서의 인상이 너무 깊어서 영화 장면만을 일깨우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노틀담의 꼽추>를 선입견 없이 대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
클로드 부주교의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 에스메랄다의 순결하고 티없는 아름다움. 카지모도의 맑은 영혼과 고결한 사랑. 그리고 15세기 말의 중세 파리 서민들의 삶이 많은 것을 보기엔 어린 나이로는 무리가 아니었나 싶다. 누군가 그랬다, 명작이란 읽을 수록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이 다른 것이라고. 먼 훗날 내가 에스메랄다와 같은 자녀를 두고 있는 나이에 이 책을 다시 읽게된다면 그땐 지금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만 신체적인 기형이었던 카지모도와 사랑을 모르는 정신적인 불구였던 페뷔스 둘 중에 누가 정말 장애가 있는 인물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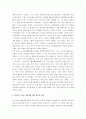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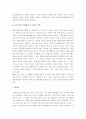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