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시의 미적 중요성
Ⅲ. 낭만주의 시의 미적 개념
Ⅳ. 남궁벽 시의 미적 개념
Ⅴ. 이인로 파한집의 미적 경계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시의 미적 중요성
Ⅲ. 낭만주의 시의 미적 개념
Ⅳ. 남궁벽 시의 미적 개념
Ⅴ. 이인로 파한집의 미적 경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에 두면, 이 말을 문면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처음 보한집을 구상하고, 편집한 것에 ‘견한’이 의미있는 목적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곧 ‘파한’의 의미망에서 ‘한’의 경계를 상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최자가 서문을 쓴 이듬해(1254, 고종41), 이장용이 써 준 발문에 의하면, ‘보한’의 의미는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앞당겨 말하면, ‘한미’를 비익한다는 뜻으로 풀고 있다.
숭경 연간(1212~1213)에 대간 이미수가 평소 기록한 것을 쓰고, 대략 평론하여 ‘파한’이라고 이름붙였다. 지금 참정 최공(:최자)이 속편하고 ‘보한’이라고 이름했다. 대저 ‘한’이란 소요하며 일삼는 것이 없음을 일컫는다. 한하되 한묵을 일삼으면, 그 한은 온전치 않게 되기에 ‘파’라고 했으니, ‘비박하여 깨치다’는 뜻으로 여긴 것이다. 그런데 (최자의 ‘보한집’은) 조용히 음영하고, 천화를 창발하여, 오직 한미를 돕기에, ‘보’라고 했다. 그런즉, 참정의 명명이 절로 고상하다. 청하공이 공명과 부귀로운 지위에 있으면서, 경사를 (익히고), 문장에 깊었는데, 이 책을 보고 기뻐하여, 이에 말하기를, “거기엔 공무에서 물러나 쉬면서, 재실에서 읊조리고, 훌륭한 선비를 맞이하며, 손으로 펼치고 입으로 노래함이 있으니, 족히 태평성세를 수식하고, 문화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그런즉 국가의 한가로운 아름다움에 있어서, 어찌 보탬이 적겠는가? ‘보한’의 뜻을 여기에서 더욱 알겠다. (숭경중, 이대간미수필소소기자, 약위평론, 명파한. 금참정최공, 속편지, 명보한. 부한자, 소요무사지칭야. 한이사한묵, 기한부전, 고왈파(□). 고이위비파야. 종용소영, 창발천화, 지소이비익한미, 고왈보. 연칙참정지명제, 기자고의. (□□)청하공거공명부귀지지, 이(□□)경사, 심어문장, 견차서이열지, 내왈기유자공퇴식, 개음재, 영가사, 수피구영, 이자청활, 족이분택대평, 단청문화, 칙어국가한가지미, 기(□)소보?, 보한지의, 어차익지야.)
위 논의에 의하면, ‘한’이란, 소요하며 아무런 일삼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한’하면서 한묵을 일삼고 있으니, 이와 같으면 한은 온전한 형태가 아니다. 곧 ‘한’이란 ‘무사’의 경지인데, ‘사한묵’이라고 했으니, 이는 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곧 ‘비파’의 ‘파’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본래 ‘파한’은 ‘소한’의 뜻으로, 한가로운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엔 한가로움을 즐기는 태도가 들어있다. 그런데, ‘파’가 ‘비파’의 뜻을 취한다면, ‘한’의 경계가 지닌 맛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다. ‘한’이란 자연스런 성정에 기반하여, 천지와 여유롭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자연스런 태도이며, 시를 자영하고 수창하는 것은, 그런 한취있는 생활을 북돋우고, 제대로 영위토록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이장용은 오히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가 지닌 파열성 보다는 세상의 화해로움을 드러내고, ‘한미’를 도울 수 있는 화해성에 눈을 두고, ‘보한’이란 이름이 훨씬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장용이 ‘보한’의 의미를 또렷하게 깨닫는 것은 청하공(:최항)의 언급에 기인한다. 곧 공무가 끝난 여가에 선비를 맞아 시를 짓고, 청담을 나누며 태평성세임을 과시하고, 문화를 아름답게 아로새긴다면, 나라가 한가로운 아름다움에 보탬이 있을 것이란 것이다. 앞서 ‘비익한미’의 ‘한미’가 ‘국가한가지미’로 좀더 구체적인 의미를 띠게 된 것이다.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한미를 구현하기 위해, 시화가 소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보한’이란 개인의 ‘한미’, ‘국가의 한가한 아름다움’을 ‘비익’하고 ‘보’해준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한’의 경계는 이인로의 ‘파한’, 최자의 ‘견한’, 이장용의 ‘보한’ 속으로 포섭되면서,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인로는 ‘한’을 현실속에서 빚어질 수 있는 두 가지 경계로 나누고, ‘파한’과 ‘의한’의 처방을 내리고 있다. 물론 ‘파한’으로 제명한 것을 보면, 본원적 의미의 소한으로서의 ‘파한’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엔 세속의 모습을 재설정하는 데서, 그가 쓰고 있는 ‘한’이, 탈현실적인 것만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탈현실적 한엔 현실에 들러붙은 한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내비쳐지고 있다. 그가 산수를 찾아 소요하지만, 그것으로 소유하여 수창의 공간으로 만들려하고, 방달의 인간을 들먹이지만 오히려 간신의 풍모를 찾고 있는, 다소 일치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의 한의 경계가 지닌 내적 모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수미의 추구가 객관을 향하고 있다면, 인간미의 추구는 주체를 향하고 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문학예술의 주요한 물적 자산이요, 기초이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작-심미대상 이 바로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을 바라보는 각도와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당자의 미적 경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Ⅵ. 결론
한 인간은 자신의 사상을 지니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아, 즉 가치관에 기인한 모든 체험은 하나의 시 정신을 형성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 정신을 음율로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요, 색채나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회화라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시이다. 다시 말해 체득한 시정신을 시의 형식과 제약 속에 융화시켜 창조한 것이 시가 되는 것이다. 시는 영혼의 창이니, 기억에의 향수니, 천계의 소리니, 생명의 악동이니, 울굴에서의 해방이니, 공리의 연장이니 하여 제가끔 일가언을 세운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모두 개인이 느낀 시관일 따름이다. 이하 개제된 사전적 정의를 포함한 여러 정의들 역시 광범위한 시의 일부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
참고문헌
김영철, 현대시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사, 1992
박영민,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여성정감의 미적 특질-이안중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1996
이승훈, 모더니즘 시론, 문예출판사, 1995
이승훈, 한국 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사, 2000
조영복, 1920년대 동인지 시대 시의 관념성과 은유의 탄생, 문학과 교육9, 1999
숭경 연간(1212~1213)에 대간 이미수가 평소 기록한 것을 쓰고, 대략 평론하여 ‘파한’이라고 이름붙였다. 지금 참정 최공(:최자)이 속편하고 ‘보한’이라고 이름했다. 대저 ‘한’이란 소요하며 일삼는 것이 없음을 일컫는다. 한하되 한묵을 일삼으면, 그 한은 온전치 않게 되기에 ‘파’라고 했으니, ‘비박하여 깨치다’는 뜻으로 여긴 것이다. 그런데 (최자의 ‘보한집’은) 조용히 음영하고, 천화를 창발하여, 오직 한미를 돕기에, ‘보’라고 했다. 그런즉, 참정의 명명이 절로 고상하다. 청하공이 공명과 부귀로운 지위에 있으면서, 경사를 (익히고), 문장에 깊었는데, 이 책을 보고 기뻐하여, 이에 말하기를, “거기엔 공무에서 물러나 쉬면서, 재실에서 읊조리고, 훌륭한 선비를 맞이하며, 손으로 펼치고 입으로 노래함이 있으니, 족히 태평성세를 수식하고, 문화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그런즉 국가의 한가로운 아름다움에 있어서, 어찌 보탬이 적겠는가? ‘보한’의 뜻을 여기에서 더욱 알겠다. (숭경중, 이대간미수필소소기자, 약위평론, 명파한. 금참정최공, 속편지, 명보한. 부한자, 소요무사지칭야. 한이사한묵, 기한부전, 고왈파(□). 고이위비파야. 종용소영, 창발천화, 지소이비익한미, 고왈보. 연칙참정지명제, 기자고의. (□□)청하공거공명부귀지지, 이(□□)경사, 심어문장, 견차서이열지, 내왈기유자공퇴식, 개음재, 영가사, 수피구영, 이자청활, 족이분택대평, 단청문화, 칙어국가한가지미, 기(□)소보?, 보한지의, 어차익지야.)
위 논의에 의하면, ‘한’이란, 소요하며 아무런 일삼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한’하면서 한묵을 일삼고 있으니, 이와 같으면 한은 온전한 형태가 아니다. 곧 ‘한’이란 ‘무사’의 경지인데, ‘사한묵’이라고 했으니, 이는 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곧 ‘비파’의 ‘파’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본래 ‘파한’은 ‘소한’의 뜻으로, 한가로운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엔 한가로움을 즐기는 태도가 들어있다. 그런데, ‘파’가 ‘비파’의 뜻을 취한다면, ‘한’의 경계가 지닌 맛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다. ‘한’이란 자연스런 성정에 기반하여, 천지와 여유롭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자연스런 태도이며, 시를 자영하고 수창하는 것은, 그런 한취있는 생활을 북돋우고, 제대로 영위토록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이장용은 오히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가 지닌 파열성 보다는 세상의 화해로움을 드러내고, ‘한미’를 도울 수 있는 화해성에 눈을 두고, ‘보한’이란 이름이 훨씬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장용이 ‘보한’의 의미를 또렷하게 깨닫는 것은 청하공(:최항)의 언급에 기인한다. 곧 공무가 끝난 여가에 선비를 맞아 시를 짓고, 청담을 나누며 태평성세임을 과시하고, 문화를 아름답게 아로새긴다면, 나라가 한가로운 아름다움에 보탬이 있을 것이란 것이다. 앞서 ‘비익한미’의 ‘한미’가 ‘국가한가지미’로 좀더 구체적인 의미를 띠게 된 것이다.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한미를 구현하기 위해, 시화가 소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보한’이란 개인의 ‘한미’, ‘국가의 한가한 아름다움’을 ‘비익’하고 ‘보’해준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한’의 경계는 이인로의 ‘파한’, 최자의 ‘견한’, 이장용의 ‘보한’ 속으로 포섭되면서,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인로는 ‘한’을 현실속에서 빚어질 수 있는 두 가지 경계로 나누고, ‘파한’과 ‘의한’의 처방을 내리고 있다. 물론 ‘파한’으로 제명한 것을 보면, 본원적 의미의 소한으로서의 ‘파한’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엔 세속의 모습을 재설정하는 데서, 그가 쓰고 있는 ‘한’이, 탈현실적인 것만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탈현실적 한엔 현실에 들러붙은 한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내비쳐지고 있다. 그가 산수를 찾아 소요하지만, 그것으로 소유하여 수창의 공간으로 만들려하고, 방달의 인간을 들먹이지만 오히려 간신의 풍모를 찾고 있는, 다소 일치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의 한의 경계가 지닌 내적 모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수미의 추구가 객관을 향하고 있다면, 인간미의 추구는 주체를 향하고 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문학예술의 주요한 물적 자산이요, 기초이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작-심미대상 이 바로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을 바라보는 각도와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당자의 미적 경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Ⅵ. 결론
한 인간은 자신의 사상을 지니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아, 즉 가치관에 기인한 모든 체험은 하나의 시 정신을 형성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 정신을 음율로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요, 색채나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회화라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시이다. 다시 말해 체득한 시정신을 시의 형식과 제약 속에 융화시켜 창조한 것이 시가 되는 것이다. 시는 영혼의 창이니, 기억에의 향수니, 천계의 소리니, 생명의 악동이니, 울굴에서의 해방이니, 공리의 연장이니 하여 제가끔 일가언을 세운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모두 개인이 느낀 시관일 따름이다. 이하 개제된 사전적 정의를 포함한 여러 정의들 역시 광범위한 시의 일부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
참고문헌
김영철, 현대시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사, 1992
박영민,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여성정감의 미적 특질-이안중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1996
이승훈, 모더니즘 시론, 문예출판사, 1995
이승훈, 한국 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사, 2000
조영복, 1920년대 동인지 시대 시의 관념성과 은유의 탄생, 문학과 교육9,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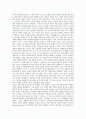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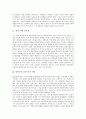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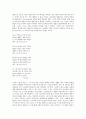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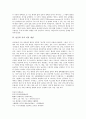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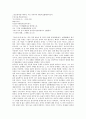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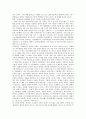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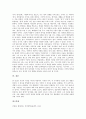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