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뒤를 따라 푸코도 역시 우리가 역사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한다. 역사적 글쓰기는 언제나 비유와 얽히게 되어서 결코 과학이 되지 못한다. 제프리 멜만 Jeffrey Mehlman의『혁명가 반복 Revolution and Repetition』(1979)은 마르크스의『프랑스 공화정 무월(霧月)
18일』이 어떻게 루이 나폴레옹의 \'혁명\'을 그의 아저씨의 혁명의 \'촌극적 farcial 반복\'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멜만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이 역사적 이야기는 지식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거기엔 다만 \'반복\'의 부조리한 비유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푸코는 작가들이 역사를 보았던 그러한 전략을, 단순한 텍스트의 유희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언술은 진짜 세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나 예술이나 과학에 있어서 권력은 언술을 통해서 얻어진다. 즉 언술은 \"우리가 사물에게 행하는 폭력\"인 것이다. 특정의 언술을 대신해서 행해지는 객관성의 주장은 언제나 가짜이다. 절대로 \'진정한\' 언술이란 없다. 다만 강력한 언술만 있을 뿐이다.
푸코의 가장 탁월한 미국인 제자는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W. Said 이다. 팔레스타인 출신으로서 사이드는 푸코의 니체적인 후기 구조주의 사상에 이끌리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언술의 이론을 현실의 사회적·정치적 투쟁과 연관시키도록 허용해 주기 때문이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그의 책은 학자들에 의해 수세대에 걸쳐 형성된 동양에 대한 서구의 이미지가 어떻게 산출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언술에 도전하면서 사이드는 푸코의 이론들의 논리를 따른다. 즉 언술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된다. 그것은 또한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반대도 유발시킨다, 라고 사이드는 말한다.
『세계와 텍스트와 비평가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1983)에서 사이드는 텍스트의 \'세속성 worldliness\'을 탐구한다. 그는 스피치가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해 있다는 견해, 그리고 텍스트는 현실 세계로부터 떠나 비평가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단지 애매 모호한 존재라는 견해를 부정한다. 그는 최근의 비평이 해석의 \'무제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텍스트와 현실 사이의 상호 연관을 단절하는 행위라고 믿는다. 사이드에게 있어서 오스카 와일드의 경우는, 텍스트를 현실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와일드는 자신이 모든 존재를 하나의 경구 속에 요약할 수 있는 유미주의적 이상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다. 하지만 글쓰기 행위는 결국 그로 하여금 \'일상의\' 세계와 충돌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즉 와일드가 서명한 편지 한 장이 그가 피소당한 형사 소송에 있어서 주요 서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사이드는 말한다. 텍스트의 사용과 그 결과는 \'저작권·권위·권력, 그리고 힘의 부과\'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비평가의 권력은 어떠한가? 사이드는, 우리가 비평 에세이를 쓸 때 우리는 텍스트와 청중 사이의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에세이는 문학 텍스트와 역사 사이에 서 있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둘 중 한편에 서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는 그 에세이이 진정한 역사적 맥락에 대해 흥미있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현실성 actuality, 즉 그 에세이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비텍스트적인 역사적 생동성과 현존의 원형 경기장인 현실성과 갖는 그 에세이의 스피치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기 구조주의 사상은 무텍스트적 nontextual\'인 것을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사이드의 용어들(현실성·무텍스트성·현존)은 후기 구조주의에 대해 무례한 언사가 된다. 그는 전후 관계의 문제에 대한 이 질문을 더 낯익은 푸코의 이론으로 이끌어간다. 즉 비평가는 결코 과거의 텍스트의 통일된 의미를 수동적으로 베낄 수는 없으며, 언제나 현재의 \'보관소\' 내부에서 글을 써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이드는 오늘날 현재의 \'보관소\'로부터 비개인적으로 산출된 지배적 언술에 의해 인정된 용어 속에서만 와일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사이드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위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 \'강력한\' 언술을 해나가고 있다.
구조주의자들은 텍스트를 정복하여 그 비밀을 열려고 했다.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무의식적·언어적 또는 역사적 힘들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이 헛된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시어\'는 \'지시 대상\'으로부터 떠나 떠다니고 있으며, 희열 jouissance 은 의미를 용해시키고 있고, 기호적인 것은 상징적인 것을 분열시키며, \'difference\'는 \'지시어\'와 \'지시 대상\' 사이에 틈을 만들고 있고, 권력은 기존의 지식을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 된다.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있다. 그들은 텍스트가 실제 말하고 있는 것과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텍스트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항해서 작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문학\'의 분리를 부정하며 비문학적 언술들을 문학으로 읽음으로써 그것들을 해체한다. 우리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언어 중심주의를 피하기 위한 자기네들의 시도에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가끔은 인정하듯이, 스스로의 주장에 저항하려는 그들 자신의 욕망도 결국엔 실패로 끝나게 될 운명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것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려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러한 견해를 요약하는 것부터 이미 그들의 실패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18일』이 어떻게 루이 나폴레옹의 \'혁명\'을 그의 아저씨의 혁명의 \'촌극적 farcial 반복\'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멜만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이 역사적 이야기는 지식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거기엔 다만 \'반복\'의 부조리한 비유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푸코는 작가들이 역사를 보았던 그러한 전략을, 단순한 텍스트의 유희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언술은 진짜 세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나 예술이나 과학에 있어서 권력은 언술을 통해서 얻어진다. 즉 언술은 \"우리가 사물에게 행하는 폭력\"인 것이다. 특정의 언술을 대신해서 행해지는 객관성의 주장은 언제나 가짜이다. 절대로 \'진정한\' 언술이란 없다. 다만 강력한 언술만 있을 뿐이다.
푸코의 가장 탁월한 미국인 제자는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W. Said 이다. 팔레스타인 출신으로서 사이드는 푸코의 니체적인 후기 구조주의 사상에 이끌리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언술의 이론을 현실의 사회적·정치적 투쟁과 연관시키도록 허용해 주기 때문이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그의 책은 학자들에 의해 수세대에 걸쳐 형성된 동양에 대한 서구의 이미지가 어떻게 산출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언술에 도전하면서 사이드는 푸코의 이론들의 논리를 따른다. 즉 언술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된다. 그것은 또한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반대도 유발시킨다, 라고 사이드는 말한다.
『세계와 텍스트와 비평가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1983)에서 사이드는 텍스트의 \'세속성 worldliness\'을 탐구한다. 그는 스피치가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해 있다는 견해, 그리고 텍스트는 현실 세계로부터 떠나 비평가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단지 애매 모호한 존재라는 견해를 부정한다. 그는 최근의 비평이 해석의 \'무제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텍스트와 현실 사이의 상호 연관을 단절하는 행위라고 믿는다. 사이드에게 있어서 오스카 와일드의 경우는, 텍스트를 현실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와일드는 자신이 모든 존재를 하나의 경구 속에 요약할 수 있는 유미주의적 이상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다. 하지만 글쓰기 행위는 결국 그로 하여금 \'일상의\' 세계와 충돌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즉 와일드가 서명한 편지 한 장이 그가 피소당한 형사 소송에 있어서 주요 서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사이드는 말한다. 텍스트의 사용과 그 결과는 \'저작권·권위·권력, 그리고 힘의 부과\'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비평가의 권력은 어떠한가? 사이드는, 우리가 비평 에세이를 쓸 때 우리는 텍스트와 청중 사이의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에세이는 문학 텍스트와 역사 사이에 서 있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둘 중 한편에 서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는 그 에세이이 진정한 역사적 맥락에 대해 흥미있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현실성 actuality, 즉 그 에세이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비텍스트적인 역사적 생동성과 현존의 원형 경기장인 현실성과 갖는 그 에세이의 스피치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기 구조주의 사상은 무텍스트적 nontextual\'인 것을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사이드의 용어들(현실성·무텍스트성·현존)은 후기 구조주의에 대해 무례한 언사가 된다. 그는 전후 관계의 문제에 대한 이 질문을 더 낯익은 푸코의 이론으로 이끌어간다. 즉 비평가는 결코 과거의 텍스트의 통일된 의미를 수동적으로 베낄 수는 없으며, 언제나 현재의 \'보관소\' 내부에서 글을 써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이드는 오늘날 현재의 \'보관소\'로부터 비개인적으로 산출된 지배적 언술에 의해 인정된 용어 속에서만 와일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사이드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위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 \'강력한\' 언술을 해나가고 있다.
구조주의자들은 텍스트를 정복하여 그 비밀을 열려고 했다.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무의식적·언어적 또는 역사적 힘들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이 헛된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시어\'는 \'지시 대상\'으로부터 떠나 떠다니고 있으며, 희열 jouissance 은 의미를 용해시키고 있고, 기호적인 것은 상징적인 것을 분열시키며, \'difference\'는 \'지시어\'와 \'지시 대상\' 사이에 틈을 만들고 있고, 권력은 기존의 지식을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 된다.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있다. 그들은 텍스트가 실제 말하고 있는 것과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텍스트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항해서 작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문학\'의 분리를 부정하며 비문학적 언술들을 문학으로 읽음으로써 그것들을 해체한다. 우리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언어 중심주의를 피하기 위한 자기네들의 시도에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가끔은 인정하듯이, 스스로의 주장에 저항하려는 그들 자신의 욕망도 결국엔 실패로 끝나게 될 운명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것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려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러한 견해를 요약하는 것부터 이미 그들의 실패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추천자료
 후기 과정중심 작문교육이론 연구
후기 과정중심 작문교육이론 연구 문학 비평 이론 중 신비평에 대한 조사
문학 비평 이론 중 신비평에 대한 조사 [분석/조사]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이론
[분석/조사]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이론 2007년 1학기 북한문학의이해 D형(북한의주체문예이론)
2007년 1학기 북한문학의이해 D형(북한의주체문예이론) 2007년 1학기 북한문학의이해 E형(북한의주체문예이론)
2007년 1학기 북한문학의이해 E형(북한의주체문예이론) 프로이드학파와 후기프로이드학파를 비교중심으로 정신분석이론을 정리하시오
프로이드학파와 후기프로이드학파를 비교중심으로 정신분석이론을 정리하시오 문화사회학과 바흐친,바흐친이론,소쉬르와바흐친,문학사회학
문화사회학과 바흐친,바흐친이론,소쉬르와바흐친,문학사회학 [고전시가][고전시가문학][설화]고전시가(고전시가문학)의 개념, 고전시가(고전시가문학)의 ...
[고전시가][고전시가문학][설화]고전시가(고전시가문학)의 개념, 고전시가(고전시가문학)의 ... 인간과교육3공통) (1)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2)피아제(Piaget)의...
인간과교육3공통) (1)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2)피아제(Piaget)의... 유아문학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지발달 발달이론에 적용하여 서술
유아문학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지발달 발달이론에 적용하여 서술 [유아문학] <유아의 발달특성과 유아문학> 인지발달과 유아문학, 언어발달과 유아문학, 사회·...
[유아문학] <유아의 발달특성과 유아문학> 인지발달과 유아문학, 언어발달과 유아문학, 사회·...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치료의 이론적 기초 - 가족치료와 개인치료의 차이, 초기 가족의 치...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치료의 이론적 기초 - 가족치료와 개인치료의 차이, 초기 가족의 치... 「문화는 비극인가?」 짐멜의 문화이론과 문화비극, 객관적 문화와 주관적 문화, 돈(화폐), ...
「문화는 비극인가?」 짐멜의 문화이론과 문화비극, 객관적 문화와 주관적 문화, 돈(화폐), ... 사회현상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에서 계급과 계층이 ...
사회현상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에서 계급과 계층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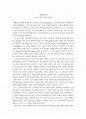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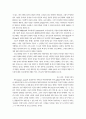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