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범한 이백
2. 이백의 약전
3. 이백의 사상
4. 이백의 예술성
2. 이백의 약전
3. 이백의 사상
4. 이백의 예술성
본문내용
를 따를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조국의 산천과 자연의 미를 힘차고 거창한 필치로서 묘사하여 만인에게 감동을 불어 넣어 주었다. 이 점, 시 속에서 말없이 심어 주고자 했던 그의 조국애의 일면임을 깊이 느껴야 하겠다. 그의 강렬한 애국정신은 자연 산천속에도 이렇듯 원색적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이백의 도가적 낭만사상의 발로는 역시 인간의 자유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증좌라 하겠다. 낡고 썩은 것이나, 강압적이고 포악한 것이나, 간교와 인위적인것이나, 모든 현실적인 억압이나 구속에서 벗어남으로써 삶을 보전하고 영원한 자연에 귀일시키고자 했다.
이러한<삶을 귀중히 여기는 길>은 현실초탈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현실적인 고통을 잊기 위한 음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짧은 삶을 아끼고 즐기자는 향락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이백의 시 속에 담겨진 술, 사랑, 즐거움 및 신선이 되겠다는생각 등을 잘 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두보가 <음중팔선가>에서 읊었듯이, (천자가 불러도 배를 타고 올 생각 안하고, 나는 술 속의 신선이라)고 외친 현실 경멸의 철학적 바탕도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백은 몹시 우정을 높이고 아낀 시인이었다. 허위와 간교에 싸인 정치사회에 진저리가 난 그는 평생을 자기와 같이 뜻이 통하고 악에 물들지 않은 벗들과 ‘통음고가‘했다.
그의 시집에는 벗을 위하고, 벗을 생각하고, 벗에게 보낸 시가 많다. 역시 호탕하면서도 인정에 약한 벗의 한 사람이라 하겠다.
모름지기 뛰어난 예술품은 그 사상의 위대성을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천의무봉하게 엮어진 시라, 혹 그 속에 깊이 유화되어 있는 그의 위대하고 복잡한 사상성을 소흘히 볼까 걱정이다.
4. 이백의 예술성
모든 예술은 내용과 형식이 잘 조화됨으로써 완성된다. 시도 마찬가지다. 내용인 사상만이 강하고 형식인 표현이 빈약해도 안 되지만 반대로 표현형식이 사상내용을 졸라매서도 안된다. 건안 이후 중국의 시문학은 대체로 형식미에만 흘렀다. 사상이나 기골 있는 정신은 위축되고 겉으로만 뻔질하고 잔재주로 꾸며 다진 이른바 ‘기려와 조탁’ 만의 시가판을 쳤다.
그러나 당대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기골 있는 문장정신과 사상을 담은 글을 되찾기 시작했다. 즉 고문운동이다.
산문에서 한유와 유종원이 혁신적인 큰 성과를 거두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시문단에서도 초당이후 점차로 속이 빈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기풍이 짙어
이백의 도가적 낭만사상의 발로는 역시 인간의 자유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증좌라 하겠다. 낡고 썩은 것이나, 강압적이고 포악한 것이나, 간교와 인위적인것이나, 모든 현실적인 억압이나 구속에서 벗어남으로써 삶을 보전하고 영원한 자연에 귀일시키고자 했다.
이러한<삶을 귀중히 여기는 길>은 현실초탈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현실적인 고통을 잊기 위한 음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짧은 삶을 아끼고 즐기자는 향락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이백의 시 속에 담겨진 술, 사랑, 즐거움 및 신선이 되겠다는생각 등을 잘 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두보가 <음중팔선가>에서 읊었듯이, (천자가 불러도 배를 타고 올 생각 안하고, 나는 술 속의 신선이라)고 외친 현실 경멸의 철학적 바탕도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백은 몹시 우정을 높이고 아낀 시인이었다. 허위와 간교에 싸인 정치사회에 진저리가 난 그는 평생을 자기와 같이 뜻이 통하고 악에 물들지 않은 벗들과 ‘통음고가‘했다.
그의 시집에는 벗을 위하고, 벗을 생각하고, 벗에게 보낸 시가 많다. 역시 호탕하면서도 인정에 약한 벗의 한 사람이라 하겠다.
모름지기 뛰어난 예술품은 그 사상의 위대성을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천의무봉하게 엮어진 시라, 혹 그 속에 깊이 유화되어 있는 그의 위대하고 복잡한 사상성을 소흘히 볼까 걱정이다.
4. 이백의 예술성
모든 예술은 내용과 형식이 잘 조화됨으로써 완성된다. 시도 마찬가지다. 내용인 사상만이 강하고 형식인 표현이 빈약해도 안 되지만 반대로 표현형식이 사상내용을 졸라매서도 안된다. 건안 이후 중국의 시문학은 대체로 형식미에만 흘렀다. 사상이나 기골 있는 정신은 위축되고 겉으로만 뻔질하고 잔재주로 꾸며 다진 이른바 ‘기려와 조탁’ 만의 시가판을 쳤다.
그러나 당대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기골 있는 문장정신과 사상을 담은 글을 되찾기 시작했다. 즉 고문운동이다.
산문에서 한유와 유종원이 혁신적인 큰 성과를 거두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시문단에서도 초당이후 점차로 속이 빈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기풍이 짙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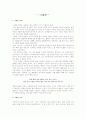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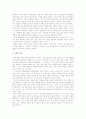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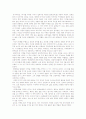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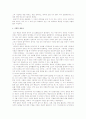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