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국미학에서 자연 개념과 무위의 미학
2. 노자사상의 배경
3. 무위자연의 개념
1)무위
2)자연
4. 오래된 미래 ‘무위자연’
2. 노자사상의 배경
3. 무위자연의 개념
1)무위
2)자연
4. 오래된 미래 ‘무위자연’
본문내용
인간세상은 대략 세 가지 층차의 ‘조작’으로 되어 있다. 최저층의 것은 자연생명의 ‘粉馳(분치)’이다. 인간은 모두 자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분치는 바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치는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층에 존재하는 인생의 고통이다. 그 다음 층에 존재한 것이 심리적인 정서이다. 喜怒(희노), 無常(무상) 등은 모두 심리적인 정서로 이러한 층차로 떨어지면 역시 고달픈 삶이 된다. 그 다음의 층은 사상적인 것으로 이는 생각에 있어 조작을 의미한다. 현상의 세계는 주로 생각에 따른 재해가 존재하는 곳으로 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다. 생각의 조작은 가장 번잡한 것이다. 모든 사상계통은 모두가 의념, 즉 관념의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행동을 통일시킴으로서 ‘나 만이 위대하다’는 ‘유일’의 특성을 지닌다. 도가는 여기에서 ‘무’를 말함으로서 ‘체계’를 거론함이 없이 이를 제거해번린다. 어떤 상, 더 나은 ‘체계’라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유일한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무’의 역할은 일종의 ‘소해(消解)’의 능력으로 모든 조작을 떨쳐버려 세계를 ‘本’과 ‘眞’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1) 모든 ‘권세’를 없애주는 것
먼저 인간이 ‘만능의 언어’라고 여기는 ‘권세’를 없애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는 일종의 ‘소해(消解)’의 역량이다. ‘도’라는 것은 언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언어는 중심이 아니다. ‘언어중심’을 없애는 것이 도를 체득하는 근본원칙이다. 고유의 ‘언어적 권세’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도를 알 수도, 이를 체득할 수도 없다.
老子제23장에서는 ‘希言自然(희언자연;말이 적은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도 역시 언어에 대한 소해(消解)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고대인들은 무리 지어 거주하였는데 추장이 명령을 전하고자 할 때면 영탁(鈴鐸;요령,방울)을 쳐서 대중을 모이게 하고, 영탁을 단앞에 거꾸로 놓고 말을 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말‘이란 일종의 ’권세‘를 지닌 ’話語(화어)‘였던 것이다. 고대의 ’言‘,’語‘,論’,‘義’,‘話’,‘說’,‘談’이라는 글자는 그 의미가 모두 비슷하였으며, 또는 서양언어에서의 ‘discourse\'에 해당한다. 이 말은 근세의 해체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였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話語‘라고 번역하고 있다. 우리의 ’言‘이란 글자는 모종의 ’권세‘라는 의미, 통괄력의 의미가 있으므로 그 의미는 때로 ‘discourse話語\'에 근접하기도 한다. ‘希言’이라는 것은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以道言也(이도언야)’ 즉 언어의 진실성을 경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希言’이라는 것은 ‘言(신언)’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동시에 신중하게 듣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話語‘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 ’자연‘과 ‘希言’을 같이 거론하는 것은 ‘言’이 반드시 자연적인 것이어야 하며 또한 ‘도’로서 ‘말’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노자는 현대 서양철학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논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연적’으로 ’話語‘의 통제력을 ‘소해(消解)’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노자의 말하고자 하는 것의 현대적 의미이며 동시에 여기에서 노자의 통찰력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노자의 사상 속에 ‘권세’라는 역량에 대한 회의가 ‘권세’역량에 대한 해소로 몰고가, 自然으로 해소함을 엿볼 수 있으며,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모두 절대적인 진리 일 수 없으며, 만물은 모두가 각기 마땅히 있어야 하는 위치가 있으므로 그 위치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위치에서 저절로 그러하게, 자유자재로 살아감이 곧 도에 합치하는 것임을 살필 수 있다.
2)영원히 ‘원초적’인 것을 유지해주는 상태
노자는 ‘功城身退(공성신퇴)’라고 했다. 여기서 물러난다는 것은 어디로 물러남인가? 이는 ‘처음’으로 물러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의 ‘退’는 의미상의 물러남이지 실재적인 것이 아니다. ‘공을 이루었다’고 하여 자만함은 물러남이 아니다. 공을 이룬 뒤의 ‘功’은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의 ‘영점’으로 ‘시작’과 같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이룰(爲)’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누구라도 ‘功’이 있을 수 있다. ‘爲’가 있으면 ‘功’이 잇을 수 있다. 노자가 爲를 말할 때는 항시 ‘無爲’의 뜻이다. 이 무위는 곧 ‘爲’로서 爲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해야 만이 마음은 한결 같은 상태가 된다. ‘爲’하면 ‘功’이 있게 되고 ‘功’은 ‘退’로 이어지니 ‘退’는 바로 공적을 이룬 뒤의 만족하는 심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행위’할 때의 ‘공적’은 하나의 목표이며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그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떠한 공적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飄風不終朝,(표풍불종조) 驟雨不終日.(취우불종일) 孰爲此者?(숙위차자?) 天地.(천지) 天地尙不能久,(천지상불능구) 而況於人乎(이황어인호)” 회오리 바람도 아침을 마치지 못하고, 거센 폭우도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천지도 오래갈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온산 위의환 편역, 앞의 책, p.165.)
라고 하였다. ‘天地’는 바람을 날리고 비를 모이게 하니 천지 역시 오래일 수 없고, 천지 역시 믿고 기댈 만 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다.
*참고문헌
민족미학연구소 엮음,『민족미학』제1권, 제3권, 도서출판 전망, 2005
문재곤 역, 『강좌중국철학』,예문서원, 1993,
김학목, 「老子의 無爲自然과 莊子의 逍遙」,『東洋哲學』제14집, 한국동양철학회 , 2001,
온산 위의환 편역, 『老子講論』,2006.
朴鍾赫, 「老子의 無爲自然과 輕物重生」,『中國學論叢』제20권, 國民大學校中國學硏究所 , 2004,
최재목역주, 『노자』, 을유문화사, 2008.
김충렬, 『노자강의』,예문서원, 2004,
이러한 분치는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층에 존재하는 인생의 고통이다. 그 다음 층에 존재한 것이 심리적인 정서이다. 喜怒(희노), 無常(무상) 등은 모두 심리적인 정서로 이러한 층차로 떨어지면 역시 고달픈 삶이 된다. 그 다음의 층은 사상적인 것으로 이는 생각에 있어 조작을 의미한다. 현상의 세계는 주로 생각에 따른 재해가 존재하는 곳으로 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다. 생각의 조작은 가장 번잡한 것이다. 모든 사상계통은 모두가 의념, 즉 관념의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행동을 통일시킴으로서 ‘나 만이 위대하다’는 ‘유일’의 특성을 지닌다. 도가는 여기에서 ‘무’를 말함으로서 ‘체계’를 거론함이 없이 이를 제거해번린다. 어떤 상, 더 나은 ‘체계’라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유일한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무’의 역할은 일종의 ‘소해(消解)’의 능력으로 모든 조작을 떨쳐버려 세계를 ‘本’과 ‘眞’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1) 모든 ‘권세’를 없애주는 것
먼저 인간이 ‘만능의 언어’라고 여기는 ‘권세’를 없애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는 일종의 ‘소해(消解)’의 역량이다. ‘도’라는 것은 언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언어는 중심이 아니다. ‘언어중심’을 없애는 것이 도를 체득하는 근본원칙이다. 고유의 ‘언어적 권세’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도를 알 수도, 이를 체득할 수도 없다.
老子제23장에서는 ‘希言自然(희언자연;말이 적은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도 역시 언어에 대한 소해(消解)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고대인들은 무리 지어 거주하였는데 추장이 명령을 전하고자 할 때면 영탁(鈴鐸;요령,방울)을 쳐서 대중을 모이게 하고, 영탁을 단앞에 거꾸로 놓고 말을 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말‘이란 일종의 ’권세‘를 지닌 ’話語(화어)‘였던 것이다. 고대의 ’言‘,’語‘,論’,‘義’,‘話’,‘說’,‘談’이라는 글자는 그 의미가 모두 비슷하였으며, 또는 서양언어에서의 ‘discourse\'에 해당한다. 이 말은 근세의 해체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였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話語‘라고 번역하고 있다. 우리의 ’言‘이란 글자는 모종의 ’권세‘라는 의미, 통괄력의 의미가 있으므로 그 의미는 때로 ‘discourse話語\'에 근접하기도 한다. ‘希言’이라는 것은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以道言也(이도언야)’ 즉 언어의 진실성을 경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希言’이라는 것은 ‘言(신언)’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동시에 신중하게 듣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話語‘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 ’자연‘과 ‘希言’을 같이 거론하는 것은 ‘言’이 반드시 자연적인 것이어야 하며 또한 ‘도’로서 ‘말’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노자는 현대 서양철학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논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연적’으로 ’話語‘의 통제력을 ‘소해(消解)’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노자의 말하고자 하는 것의 현대적 의미이며 동시에 여기에서 노자의 통찰력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노자의 사상 속에 ‘권세’라는 역량에 대한 회의가 ‘권세’역량에 대한 해소로 몰고가, 自然으로 해소함을 엿볼 수 있으며,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모두 절대적인 진리 일 수 없으며, 만물은 모두가 각기 마땅히 있어야 하는 위치가 있으므로 그 위치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위치에서 저절로 그러하게, 자유자재로 살아감이 곧 도에 합치하는 것임을 살필 수 있다.
2)영원히 ‘원초적’인 것을 유지해주는 상태
노자는 ‘功城身退(공성신퇴)’라고 했다. 여기서 물러난다는 것은 어디로 물러남인가? 이는 ‘처음’으로 물러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의 ‘退’는 의미상의 물러남이지 실재적인 것이 아니다. ‘공을 이루었다’고 하여 자만함은 물러남이 아니다. 공을 이룬 뒤의 ‘功’은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의 ‘영점’으로 ‘시작’과 같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이룰(爲)’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누구라도 ‘功’이 있을 수 있다. ‘爲’가 있으면 ‘功’이 잇을 수 있다. 노자가 爲를 말할 때는 항시 ‘無爲’의 뜻이다. 이 무위는 곧 ‘爲’로서 爲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해야 만이 마음은 한결 같은 상태가 된다. ‘爲’하면 ‘功’이 있게 되고 ‘功’은 ‘退’로 이어지니 ‘退’는 바로 공적을 이룬 뒤의 만족하는 심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행위’할 때의 ‘공적’은 하나의 목표이며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그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떠한 공적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飄風不終朝,(표풍불종조) 驟雨不終日.(취우불종일) 孰爲此者?(숙위차자?) 天地.(천지) 天地尙不能久,(천지상불능구) 而況於人乎(이황어인호)” 회오리 바람도 아침을 마치지 못하고, 거센 폭우도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천지도 오래갈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온산 위의환 편역, 앞의 책, p.165.)
라고 하였다. ‘天地’는 바람을 날리고 비를 모이게 하니 천지 역시 오래일 수 없고, 천지 역시 믿고 기댈 만 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다.
*참고문헌
민족미학연구소 엮음,『민족미학』제1권, 제3권, 도서출판 전망, 2005
문재곤 역, 『강좌중국철학』,예문서원, 1993,
김학목, 「老子의 無爲自然과 莊子의 逍遙」,『東洋哲學』제14집, 한국동양철학회 , 2001,
온산 위의환 편역, 『老子講論』,2006.
朴鍾赫, 「老子의 無爲自然과 輕物重生」,『中國學論叢』제20권, 國民大學校中國學硏究所 , 2004,
최재목역주, 『노자』, 을유문화사, 2008.
김충렬, 『노자강의』,예문서원,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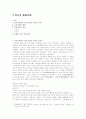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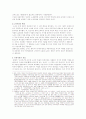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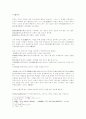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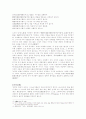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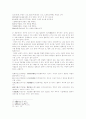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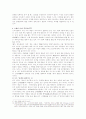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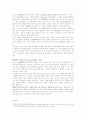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