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청초사(淸初史)의 의미와 중요성
(2). 문제의식 및 연구 방향
Ⅱ. 본론
(1). 홍타이지의 권력 장악
1). 출생과 성장
2). 한(汗)에 의한 지배체제의 확립
(2). 만(滿)·몽(蒙)·한(漢)의 결합
1). 만(滿)과 몽(蒙)의 결합
2). 만(滿)과 한(漢)의 결합
(3). 대청제국(大淸帝國)의 성립
1). 심양에서 성경으로
2). 팔기제(八旗制)의 완성
3). 한(汗)에서 황제(皇帝)로
Ⅲ. 결론 - 대청제국의 축소판을 이룬 홍타이지
(1). 청초사(淸初史)의 의미와 중요성
(2). 문제의식 및 연구 방향
Ⅱ. 본론
(1). 홍타이지의 권력 장악
1). 출생과 성장
2). 한(汗)에 의한 지배체제의 확립
(2). 만(滿)·몽(蒙)·한(漢)의 결합
1). 만(滿)과 몽(蒙)의 결합
2). 만(滿)과 한(漢)의 결합
(3). 대청제국(大淸帝國)의 성립
1). 심양에서 성경으로
2). 팔기제(八旗制)의 완성
3). 한(汗)에서 황제(皇帝)로
Ⅲ. 결론 - 대청제국의 축소판을 이룬 홍타이지
본문내용
타이지는 단순히 황제로 칭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문(文)과 무(武)가 합치된 청나라 황제의 전형을 보여준 최초의 대청제국(大淸帝國) 황제(皇帝)였던 것이다.
Ⅲ. 결론 - 대청제국의 축소판을 이룬 홍타이지
홍타이지의 묘호는 태종(太宗)이다. 태종이라는 묘호의 의미는 나라를 개창한 태조(太祖)와 의 권위 및 업적이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종이라는 묘호는 아무 군주에게나 붙이지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군주로는 당(唐)나라의 이세민과, 조선의 이방원이 잘 알려져 있다. 이 두 군주는 모두 건국 초기 어수선한 국정 상황을 정리하고, 강력한 왕권을 이룩하여 태평성대의 기반을 닦은 군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는 그 인지도가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기존의 청나라를 순치제 이후에 중점을 두고 파악한 이유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홍타이지는 출생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가면서 그 시작은 4대 버일러 중 서열 4위로 가장 약한 존재였으나, 제도적으로 한(汗)에 의한 지배권을 확립한 이후 결국에는 대청제국의 황제(皇帝)에 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어쩌면 그는 입지자전적인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그의 모습에서는 대청제국의 원형을 찾을 수가 있다. 먼저 그에게는 대청제국의 시작을 연 첫 수도 성경의 건설자로서의 모습, 실질적으로 군사권의 수장인 된 만주·몽골·한인 팔기의 완성가로서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문(文)과 무(武)가 합치된 황제로서의 모습에서 그는 대청제국의 첫 황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그는 만(滿)·몽(蒙)·한(漢)의 결합을 이루어 다민족 국가로서의 대청제국의 모습도 보여준다.
몽골족을 단순히 같은 유목민족으로서 그들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았고, 적극적인 법령과 군령의 시행으로 체제 안으로 끌어들였으며, 한족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국정의 공식적인 운영자로 인정한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포용가로서의 황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직접 지배한 만리장성 이북지역의 농경 지역(-한(漢))과 자신의 출신지인 만(滿), 그리고 외번으로서 내몽골 지역(-몽(蒙))을 간접 통치하에 둔 그의 모습에서 1750년대(건륭 20년대) 후반 청조의 최대 판도를 형성한 축소판을 볼 수 있다. 이시바시 다카오, 홍성구 역, p. 135.
결국 그가 이룬 동북부에서의 만(滿)·몽(蒙)·한(漢)의 통합이 입관 후 건륭제에 의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홍타이지가 이룩한 업적과 그에게서 나타는 다민족 국가로서의 청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홍타이지 자신이 다민족 국가로서의 청조를 완성하고 만(滿)·몽(蒙)·한(漢)의 결합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가 보여준 모습에서 다민족 국가로서의 청조의 모습을 강하게 읽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영향력은 결국 이후 황제들에 의해 완성되는 대일통(大一統)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점이 오늘날 청조의 역사를 새롭게 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며, 이 점에서 홍타이지는 언제까지나 살아 숨 쉬는 황제임에 틀림없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마스이 츠네오, 이진복 역. <<대청제국>>. 서울: 학민사, 2004.
신성곤, 윤혜역.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울: 서해문집, 2004.
엔 총니엔. 장성철 역. <<대청제국 12군주열전 - 상>>. 서울: 산수야, 2007.
이사바시 다카오. 홍성구 역. <<대청제국: 1616~1799-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서울: 휴머니스트, 2009.
임계순. <<청사: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서울: 신서원, 2000.
정혜중, 김형종, 유장근.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최학근 역. <<만주실록 상. 하>>. 서울: 보경문화사, 1992.
2. 참고문헌
김구진. <만주 \'Gurun\'의 성립>. <<인문과학>> 10. 2002.
김선민, <인삼(人蔘)과 강역(疆域) -후금(後金)-청(淸)의 강역인식과 대외관계의 변화->, <<명청사연구>> 30, 2008,
노기식. <후금의 요동진출 전후 만주와 몽골의 관계역전>. <<중국학논총>> 12. 1999.
노기식. <후금시기 만주와 몽골의 연맹관계>. <<명청사연구>> 11. 1999.
노기식. <홍타이지의 반(反) 릭단 만몽연맹 확대와 이용>. <<중국학논총>> 13. 2000.
서병국. <청 태종의 여진 민족 보존책 연구>. <<백산학보>> 16. 1974.
서병국. <청 태조의 여진 민족의식 연구>. <<관대논문집>> 7. 1979.
송미령. <천총연간(1627-1636年) 지배체제의 확립과정과 조선정책>. <<중국사연구>> 54. 2008.
유지원. <‘변성’에서 ‘도성’으로-후금과 청조체제 하의 심양->. <<동양사학연구>> 105. 2008,
유지원. <청 입관전 누루하치와 홍타이지의 종교정책>. <<명청사연구>> 16. 2002.
이상창. <신생 패권국 청나라의 성장요인 분석>. <<육사논문집>> 63. 2007.
조병학. <입관 전 후금의 몽골 및 만주족 통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허혜윤. <‘청사공정’의 배경과 현황 - 국가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다>. <<역사비평>> 82. 2008.
3. 영문 참고 문헌
Mark Elliott.. Modern Asian Studies, Vol. 34, No. 3 (Jul., 2000), pp. 623-662.
Mark Elliott..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1, No. 1 (Feb., 2002), pp. 165-177 .
Ⅲ. 결론 - 대청제국의 축소판을 이룬 홍타이지
홍타이지의 묘호는 태종(太宗)이다. 태종이라는 묘호의 의미는 나라를 개창한 태조(太祖)와 의 권위 및 업적이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종이라는 묘호는 아무 군주에게나 붙이지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군주로는 당(唐)나라의 이세민과, 조선의 이방원이 잘 알려져 있다. 이 두 군주는 모두 건국 초기 어수선한 국정 상황을 정리하고, 강력한 왕권을 이룩하여 태평성대의 기반을 닦은 군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는 그 인지도가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기존의 청나라를 순치제 이후에 중점을 두고 파악한 이유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홍타이지는 출생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가면서 그 시작은 4대 버일러 중 서열 4위로 가장 약한 존재였으나, 제도적으로 한(汗)에 의한 지배권을 확립한 이후 결국에는 대청제국의 황제(皇帝)에 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어쩌면 그는 입지자전적인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그의 모습에서는 대청제국의 원형을 찾을 수가 있다. 먼저 그에게는 대청제국의 시작을 연 첫 수도 성경의 건설자로서의 모습, 실질적으로 군사권의 수장인 된 만주·몽골·한인 팔기의 완성가로서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문(文)과 무(武)가 합치된 황제로서의 모습에서 그는 대청제국의 첫 황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그는 만(滿)·몽(蒙)·한(漢)의 결합을 이루어 다민족 국가로서의 대청제국의 모습도 보여준다.
몽골족을 단순히 같은 유목민족으로서 그들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았고, 적극적인 법령과 군령의 시행으로 체제 안으로 끌어들였으며, 한족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국정의 공식적인 운영자로 인정한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포용가로서의 황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직접 지배한 만리장성 이북지역의 농경 지역(-한(漢))과 자신의 출신지인 만(滿), 그리고 외번으로서 내몽골 지역(-몽(蒙))을 간접 통치하에 둔 그의 모습에서 1750년대(건륭 20년대) 후반 청조의 최대 판도를 형성한 축소판을 볼 수 있다. 이시바시 다카오, 홍성구 역, p. 135.
결국 그가 이룬 동북부에서의 만(滿)·몽(蒙)·한(漢)의 통합이 입관 후 건륭제에 의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홍타이지가 이룩한 업적과 그에게서 나타는 다민족 국가로서의 청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홍타이지 자신이 다민족 국가로서의 청조를 완성하고 만(滿)·몽(蒙)·한(漢)의 결합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가 보여준 모습에서 다민족 국가로서의 청조의 모습을 강하게 읽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영향력은 결국 이후 황제들에 의해 완성되는 대일통(大一統)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점이 오늘날 청조의 역사를 새롭게 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며, 이 점에서 홍타이지는 언제까지나 살아 숨 쉬는 황제임에 틀림없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마스이 츠네오, 이진복 역. <<대청제국>>. 서울: 학민사, 2004.
신성곤, 윤혜역.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울: 서해문집, 2004.
엔 총니엔. 장성철 역. <<대청제국 12군주열전 - 상>>. 서울: 산수야, 2007.
이사바시 다카오. 홍성구 역. <<대청제국: 1616~1799-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서울: 휴머니스트, 2009.
임계순. <<청사: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서울: 신서원, 2000.
정혜중, 김형종, 유장근.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최학근 역. <<만주실록 상. 하>>. 서울: 보경문화사, 1992.
2. 참고문헌
김구진. <만주 \'Gurun\'의 성립>. <<인문과학>> 10. 2002.
김선민, <인삼(人蔘)과 강역(疆域) -후금(後金)-청(淸)의 강역인식과 대외관계의 변화->, <<명청사연구>> 30, 2008,
노기식. <후금의 요동진출 전후 만주와 몽골의 관계역전>. <<중국학논총>> 12. 1999.
노기식. <후금시기 만주와 몽골의 연맹관계>. <<명청사연구>> 11. 1999.
노기식. <홍타이지의 반(反) 릭단 만몽연맹 확대와 이용>. <<중국학논총>> 13. 2000.
서병국. <청 태종의 여진 민족 보존책 연구>. <<백산학보>> 16. 1974.
서병국. <청 태조의 여진 민족의식 연구>. <<관대논문집>> 7. 1979.
송미령. <천총연간(1627-1636年) 지배체제의 확립과정과 조선정책>. <<중국사연구>> 54. 2008.
유지원. <‘변성’에서 ‘도성’으로-후금과 청조체제 하의 심양->. <<동양사학연구>> 105. 2008,
유지원. <청 입관전 누루하치와 홍타이지의 종교정책>. <<명청사연구>> 16. 2002.
이상창. <신생 패권국 청나라의 성장요인 분석>. <<육사논문집>> 63. 2007.
조병학. <입관 전 후금의 몽골 및 만주족 통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허혜윤. <‘청사공정’의 배경과 현황 - 국가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다>. <<역사비평>> 82. 2008.
3. 영문 참고 문헌
Mark Elliott.
Mark Ellio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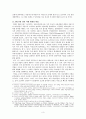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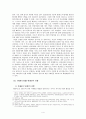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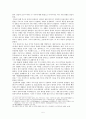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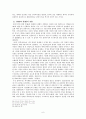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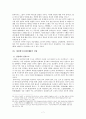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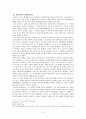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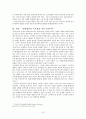










소개글